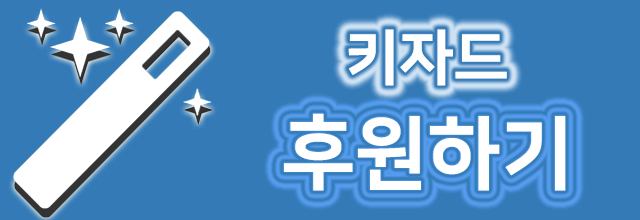mrpage의 등록된 링크
mrpage로 등록된 티스토리 포스트 수는 72건입니다.
부여(夫餘) [내부링크]
부여(夫餘) 서기전 2세기경부터 서기 494년까지 북만주지역에 존속하였던 예맥족의 국가이다. 훗날 538년부터 660년까지 불린 백제의 별칭인 남부여(南扶餘)와 구분하기 위해 북부여라고도 한다. 1. 경제 부여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쑹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반농, 반목으로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등이 유명하였다. 2. 정치체제 부여는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북쪽은 선비족, 남쪽은 고구려와 접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3세기 말엽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최후에는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馬加)·우가(牛加)·구가..
초기국가((初期國家)시대 [내부링크]
한국사의 초기국가((初期國家)시대 한국사에서 고구려·백제·신라가 고대 국가로서 체제를 정비한 4세기 이후를 삼국시대로 부르지만, 그 바로 이전의 시기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해서는 분분하다. 이 시기를 고고학계에서는 '원삼국시대'라 칭하면서 청동기의 소멸, 철 생산, 지석묘의 소멸을 그 특징으로 삼는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원삼국시대'라는 용어 대신 '삼한시대', '삼국시대전기', '초기국가시대' 등 다양하게 부른다. 초기국가라는 용어는 ‘고대 국가(중앙집권제국가)’ 이전의 원시적인 단계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1970년대 이후 등장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초기국가는 내적으로는 율령제 혹은 관료제와 같은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되지 못했으나, 외적으로는 왕권을 중심으로 주변의 복합 사회에 대해 분..
예맥(濊貊) [내부링크]
예맥(濊貊) 예맥(濊貊)은 기원전 2~3세기 경부터 한반도 북부 지역(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지역), 만주 지역(랴오닝성, 지린성 지역), 연해주 지역에 살던 민족이며, 부여·고구려·옥저·동예 등으로 불리는 여러 부족들은 모두 예맥에 속하며, 부여의 한 갈래로 한강 유역에 자리잡은 백제도 예맥족의 나라이다. 이 예맥족이 한반도 중남부에 살던 한족(韓族)과 함께 현대 한민족(韓民族)의 직계 조상이 되는 고대 민족이다.(대다수 학자들의 의견. 이설 있음)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편에 의하면 고구려는 요동 동쪽 천리에 있다. 남쪽으로는 조선(朝鮮)·예맥(濊貊), 동쪽으로는 옥저(沃沮), 북쪽으로는 부여(夫餘)와 접한다.[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고 기록되어있다. 예와 맥..
한군현(漢郡縣) · 한사군(漢四郡) [내부링크]
한군현(漢郡縣) · 한사군(漢四郡) BC108년 전한(前漢)의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뒤 그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낙랑(樂浪)·임둔(臨屯)·진번(眞蕃)·현도(玄菟)의 4군과 그 속현을 말한다. BC108년부터 AD314년까지 420여 년간 존속하였다. ▷ 낙랑군 (BC108년 ~ 313년) ▷ 진번군 (BC108년 ~ BC82년) ▷ 임둔군 (BC108년 ~ BC82년) ▷ 현도군 (BC107년 ~ 404년) ▷ 대방군 (204년경? ~ 314년) 근대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사군(四郡)이라 불렀고, 현대 한국사학계에서는 한군현(漢郡縣), 동방변군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한사군의 위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의 학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
8조의 법(8조법) [내부링크]
고조선시대에 8개 조항으로 된 법으로 8조금법(八條禁法), 8조법금(八條法禁)이라고도 불리운다. 중국 후한(後漢)의 역사가 반고(班固, 32~92)가 쓴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수록되어 있다. 중국의 〈사기〉와 〈한서〉에는 기자(箕子)가 8조(條)에 해당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기자팔조교라고도 한다. 당시의 법률은 대개 형법(刑法)으로 응보주의(應報主義)에 의거해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하고 엄격한 데 그 특징이 있었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로 만족했다. 모든 것을 선(善)과 악(惡)으로 구별했는데, 이는 신(神)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여겨 종교적 제사를 지낼 때 죄를 처벌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없고, 8개의 조문 중 아래의 3개 조문만이반고의 한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 [내부링크]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북방식)은 만주와 북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하게 해 준다.
빙하기 한반도 주변 지형도 [내부링크]
빙하기 한반도 주변 지형도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해발 200m가 넘는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가 빙하의 주변지역이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빙하의 영향은 적지 않았다.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낮아져서 중국 대륙, 한반도, 일본 열도, 대만 등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의 동해도 당시에는 호수였다. 간빙기에는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안선에 큰 변동이 있었다. 이처럼 자연 환경이 변함에 따라 동식물의 생장에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도 먹이를 찾아 광범한 이동 생활을 해야만 했다. 구석기 시대에는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
목지국(目支國) [내부링크]
목지국(目支國) 삼한(三韓)은 여러 개의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마한에 54개, 진한(辰韓)과 변한(弁韓)에는 각각 12개의 소국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소국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소국들은 자치독립적인 정치집단이었지만, 마한, 진한, 변한 중 한 곳에 소속되어 상당히 느슨한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소국들 중의 하나인 목지국(目支國)은 마한 소속의 소국 중 맹주국의 위치에 있었던 나라이다. 목지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천안 일대에 있었다는 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3세기 중반 이후 백제가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목지국은 마한 맹주국의 지위를 상실해 갔고, 이후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진국(辰國) [내부링크]
진(辰)[또는 진국(辰國)]은 한반도 중남부 삼한(三韓 : 부족연맹체 단계)이 생기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부족연맹체이다. 중국에는 전국시대가 끝나고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하여 진(秦)을 건국(BC221)을 건설하고, 이어 진한교체기(BC206~BC202)을 거쳐 유방이 한(漢)을 건국하는 격동기가 있었다. 이 진말(秦末)ㆍ한초(漢初)의 격동기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유이민(流移民)들이 동방으로 피난하여 왔다. 전국시대의 연(燕)ㆍ제(齊)ㆍ조(趙) 출신의 사람들은 고조선지역으로, 진(秦) 출신의 사람들은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위만도 이때 고조선 지역으로 넘어온 유이민이었으나, 나중에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된다. 이 중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한강 이남 지역에는 원시사회가 무너지고..
제정일치(祭政一致) [내부링크]
제정일치(祭政一致)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다는 사상 또는 정치체제이다. 즉, 신(神)을 대변하는 제사장(祭司長)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 또는 정치체제이다. 종교와 정치권력이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한국의 경우는 부여.고구려의 제천의식에서 제정일치의 사회형태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제정의 분리가 이루 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시기는 별읍이나 종교전문가인 천군이 등장하는 삼한사회부터라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세속적인 권력의 대표자인 군장과 직업적인 종교전문가인 천군이 별도로 존재하였다(제정분리). 제정분리는 고대국가 출현 이전의 군장 또는 족장사회단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우거왕(右渠王) [내부링크]
고조선시대의 왕. 위만(衛滿)의 손자로 고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이다. 위만이 즉위한 뒤, 고조선은 우세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력이 더욱 강대해졌다. 우거왕은 이것을 배경으로 중간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한강 이남에 있는 진국(辰國) 등 여러 나라가 한(漢)나라와 직접 교통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당시 몽고에서 만주로 뻗어오던 흉노가 고조선과 연결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한나라 정부를 더욱 자극시켜 고조선과 한나라는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대립관계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한무제(漢武帝)는 서기전 109년 마침내 무력으로 침략해왔다. 고조선은 이에 대항해 1년을 잘 싸웠으나 마침내 수도인 왕검성(王儉城)이 적군에게 ..
준왕(準王) [내부링크]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다. 지금의 랴오뚱지방에서 도망해 온 위만을 받아들여 한씨조선의 서북변 지방을 지키게 하였다가 위만이 왕검성을 공취(攻取)하자, 마한 땅으로 도망하여 이미 그 지역에 이주해 있던 유민(流民)을 지배하면서 한왕(韓王)이 되었다.
위만조선(衛滿朝鮮) [내부링크]
위만이 집권한 이후부터 BC 108년 멸망할 때까지의 고조선을 말한다. 보통 고조선을 단군조선(檀君朝鮮).기자조선(箕子朝鮮).위만조선으로 나누어 부르나, 최근에는 이런 구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BC 3세기말에서 2세기초에 연(燕)나라에서 고조선으로 망명한 위만은 준왕(準王)의 신임을 얻어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고, 박사(博士)에 임명되면서 100리의 땅을 받았다. 그러나 유이민을 모아 자신의 세력을 기른 뒤 준왕을 내쫓고 정권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이를 계기로 기자 이래의 고조선이 위씨(衛氏)에 의해 교체된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위만조선, 위씨조선이라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만의 집권을 고조선 내에서의 단순한 정권교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위만조선은 발달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세력..
기자조선(箕子朝鮮) [내부링크]
은나라가 망한 후 동쪽으로 망명하여온 기자(箕子)와 그 자손들이 40여 대에 이르도록 왕을 지냈다고 하는 고조선의 일부 시기라고 추정했던 국가이다. 전통적인 상고사 인식체계에서는 고조선이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고고학적 발견이 없어 기자조선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설사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고대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아래는 기자동래설에 대한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기자동래설이란 고대 중국 주나라 초기인 BC 1122년에 은나라 왕족 출신인 ‘기자’라는 인물이 주나라 무왕의 책봉을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조선을 문명개화하였다는 설이다. 사대주의에 물젖은 고려와 조선..
단군조선(檀君朝鮮) [내부링크]
단군이 건국한 전설상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다. 보통 고조선을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학문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단군은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곰에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와 결합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조선은 중국의 요(堯)임금과 같은 시대에 건국되었으며(BC 2333) 1,500년간 조선을 통치하다가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마침내 산신이 되었으니 수명은 1,908세였다고 전한다.
고조선(古朝鮮) [내부링크]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국가이다. 1. 명칭 처음 사서에 등장할 때 '조선'이라 하였다. 고조선이란 명칭은 삼국유사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 때 고조선(왕검조선)이라 한 것은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그 뒤 제왕운기에서는 단군조선을 전조선(前朝鮮), 기자조선을 후조선(後朝鮮)이라 하였다. 고조선이란 명칭이 널리 쓰여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이씨조선과 구분되는 고대의 조선이란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고조선이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서기전 2세기 초에 일종의 정변을 통해 등장한 위만조선 이전 시기에 존재한 조선만을 칭하는 경우와, 위만조선까지를 포괄해 고조선이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정치사적인 측면에서는 전자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위만조선의 사회와 문화가 그 ..
단군(檀君) [내부링크]
우리 민족의 시조. 고조선(古朝鮮 : 檀君朝鮮)의 첫 임금이며, 단군(壇君)·단군왕검(壇君王儉)·단웅천왕(檀雄天王)이라고도 한다. 천제(天帝)인 환인(桓因)의 손자이며, 환웅(桓雄)의 아들로 서기전 2333년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정하고 단군조선을 개국하였다. 고조선과 단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의 위서(魏書)와 우리 나라의 고기(古記)를 인용한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정사인 삼국사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대비된다. 한편 고려 시대의 기록으로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가 있으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조선 초기의 기록인 권람(權擥)의 응제시주(應製詩註)와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군에 관한 문제를 논급할 때 일차적으로 ..
웅녀(熊女) [내부링크]
웅녀(熊女) 우리 나라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 나오는 우리 민족의 시조모(始祖母).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檀君王儉)의 어머니이다. 삼국유사 고조선 왕검조선조(古朝鮮王儉朝鮮條)에 의하면 원래 곰이었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桓雄)에게 호랑이 한 마리와 함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환웅으로부터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받아먹으면서 삼칠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자 문득 여자의 몸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호랑이는 이를 참치 못해 실패하였다. 웅녀는 혼인해서 같이 살 사람이 없자 날마다 신단수(神壇樹) 밑에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신한 환웅과 혼인해 단군왕검을 낳았다고 한다.
환웅(桓雄) [내부링크]
환웅(桓雄) 단군(檀君)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화상의 인물. 삼국유사에는 환웅.천왕(天王).신웅(神雄) 등으로, 제왕운기에는 웅.단웅천왕(檀雄天王)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古記)에 의하면, 하느님 환인(桓因)의 서자(庶子 : 여러 아들 중의 하나라는 뜻)로서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 구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 뜻을 알아차린 아버지로부터 천부인(天符印) 3개를 받고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神壇樹) 밑에 내려와, 이곳에 신시(神市)를 열었다. 그리고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과 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교화하였다. 이 때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호랑이 한마리와 곰..
환인(桓因) [내부링크]
환인(桓因) 단군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인용된 고기(古記) 및 후대에 이 두 사서의 영향을 받아 고조선의 역사를 기술한 '동국여지승람'과 '응제시주(應制詩注)' 및 기타 사서에 보인다. 이들에 의하면, 환인은 환웅(桓雄)의 아버지이며, 단군(檀君)의 할아버지로 하늘나라의 신(釋帝.天神.上帝)이다. 환인의 의미와 성격은 한자(漢字)의 차용과 불교문화의 융성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환인의 성격과 기능은 단군신화와 그로 대표되는 한민족문화가 태양을 숭배하는 광명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집단의 구체적 의지와 적극적인 실천에 의해 성립된 역사적 사실을 상징한다.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 [내부링크]
풍백(風伯) : 바람의 움직임을 맡은 신(神). 風神 우사(雨師) : 비를 내리게 하거나 그치게 하는 신(神) 운사(雲師) : 구름의 움직임을 맡은 신(神) 환웅이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하강했다는 기록은 이미 고조선 사회가 물에 의존하는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려준다.
신단수(神壇樹)·신시(神市) [내부링크]
삼국유사에 따르면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신단수(神壇樹)는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지상으로 처음 내려온 곳에 있는 나무로 신목(神木) 이다. 신단수가 자라는 지역을 신시(神市)라고 하였다. 신시(神市)는 환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고,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 평양에 수도를 두기까지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부인(天符印) [내부링크]
천부인(天符印) 국조 단군왕검(檀君王儉)이 한웅천왕(桓雄天王)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였다는 세 개의 인(印)을 말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처음 그 기록이 보인다. 대종교의 '한단고사(桓檀古史)'에는 거의 어디에나 천부삼인(天符三印)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으나 그 형태에 관해서는 언급한 곳이 없다. 그러나 옛날 역사를 참작하여 볼 때 단군의 개국이념과 천부삼인과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언급한 바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고찰하건대,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와 원()·방()·각() 삼묘(三妙)와 성(性)·명(命)·정(精) 삼진(三眞)과 인(仁)·지(智)·용(勇) 삼달(三達)의 표상(表象)으로 추정된다.
단군신화(檀君神話) [내부링크]
옛날에 환인(桓因:하느님)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인간세상에 뜻을 두었는데, 환인이 천부인(天符印:신의 권한을 상징하는 부적과 도장)을 주고 인간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에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白山:지금의 묘향산) 꼭대기의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내려왔으니 이곳을 신시(神市)라 했다. 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과 인간의 삼백 예순 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에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으며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라 했다. 곰은 이를 잘 지켜 21일..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내부링크]
1. 명도전(明刀錢) 명도전은 중국 연(燕)나라에서 만든 칼 모양의 청동 화폐로 전국 시대 말기부터 진(秦)나라 때에 걸쳐 사용되었다. 중국의 제(齊, 기원전 1046년~기원전 221년), 연(燕, 기원전 11세기~기원전 222년), 조(趙, 기원전 1046~기원전 487)에서 사용하던 화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지나 나무 상자에 담긴 채 발굴되는 경우가 있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 허베이 성과 한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2. 반량전(半兩錢) 반량전은 진나라 시황제 때 만들 사용하였다.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는 원형이며, 둘레의 테는 없고, ‘반량(半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중국의 진(秦, 기원전 221~기원전 206), 한(漢, 기원전 202년~220년) ..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내부링크]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정착 생활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형성된 원시 신앙이다. 애니미즘(Animism)은 모든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으뜸이었다. 샤머니즘(Shamenism)은 인간과 영혼 또는 하늘을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Shamen)과 그 주술을 믿는 것이다. 토테미즘(Totemism)은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식물과 연결시켜 그것을 숭배하는 신앙이다.
널무덤, 독무덤 [내부링크]
1. 철기 시대에 나타난 널무덤과 독무덤 철기 시대에 이르면 청동기 시대의 거대한 고인돌 같은 것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대신 흙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안에 나무로 된 널을 댄 다음 그 안에 시신을 묻는 널무덤이나 항아리를 관으로 이용한 독무덤이 새롭게 나타났다. 2. 사각형 벽을 만들어 시신을 넣는 널무덤 한반도 전역에서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한창 만들어지고 있을 때 큰 강 유역의 일부지역에서는 새로이 널무덤(木棺墓)이라는 묘제가 등장하게 된다. 당시까지의 무덤 구조가 주로 돌로 이루어진 石墓였다고 한다면 이 때부터 무덤에 본격적으로 나무가 사용되어 이후 역사시대에 이르러서는 무덤의 주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다. 사용된 장구에 따라 널무덤(木棺墓)과 덧널무덤(木槨墓)로 나뉜다. 널무덤은 기본적으로 땅에 구..
돌무지무덤, 돌무지덧널무덤, 굴식 돌방무덤 [내부링크]
1. 돌무지무덤 한자로는 석총(石塚), 또는 적석총(積石塚)이라고 한다. 고구려 초기(대체로 5세기 평양 천도 전)의 고분 양식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나타나나, 고구려에서 더욱 발달하였다. 돌무지무덤은 고구려에서 주로 만들었던 무덤 형태이다. 시신 위나 시신을 넣은 석곽(石槨) 위에 흙을 덮지 않고 돌을 쌓아 올린 무덤이다. 선사 시대부터 고구려ㆍ백제 초기에 나타난다. 자연석을 피라미드식으로 쌓아 올리고, 그 안에 목곽을안치하였다. 벽화는 없다. 대표적인 것이 장군총이다. 한성 시대 백제의 초기 고분(서울 석촌동 고분)도 돌무지무덤인데, 이것은 백제 건국의 주체 세력이 고구려의 한 갈래임을 말해 준다. 2. 돌무지덧널무덤 통일 전 신라의 대표적 대표적인 무덤형식의 하나. 한자로는 적석 목곽분(積石木廓墳)..
선돌(입석, menhir) [내부링크]
길쭉한 자연석 또는 일부만을 가공한 기둥모양의 돌을 땅 위에 하나 또는 몇 개를 똑바로 세워 기념물 또는 신앙대상물 등으로 삼은 선사시대의 거석기념물이다. 입석(立石, menhir)이라고도 한다. 고고학에서 일컫는 선돌이란 선사시대, 특히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유적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 나라는 고인돌에 비해 선돌의 숫자는 극히 적지만, 선돌의 분포는 한반도 전역에 미치고 있다. 형태를 보면 주로 둥근 뿔 모양의 것이 많고 비석모양, 뾰족한 돌기둥 모양 등 다양한 편이다. 남성의 성기를 닮은 것은 생식기능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선돌의 윗부분에 사람 얼굴을 새긴 듯 일부 가공한 것들도 있고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새긴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후에 나..
고인돌(지석묘, dolmen) [내부링크]
선사시대의 돌무덤으로 지석묘(支石墓)와 같은 뜻이며 거석문화에 속한다. 성격은 무덤으로서의 구실이 크다. 우리 나라의 고인돌은 거의 국토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보고되지 않은 함경북도지방뿐만 아니라 강화도(하점면 부근리 지석묘, 사적 제137호) 같은 해안 도서나 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와 흑산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서해 및 남해의 연해지역과 큰 하천의 유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전라도·황해도에 가장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동해지방으로 가면 그 분포가 희박해지며 산악지대에서 가끔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위치는 서해로 흘러가는 강줄기 근처로, 결국 고인돌은 서해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은 무리를 지어 있는 것이..
고령 장기리 암각화[高靈 場基里 岩刻畫] [내부링크]
고령 장기리 암각화 (高靈 場基里 岩刻畫)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경상북도 고령군 아래알터길 15-5)에 있는 청동기시대 암각화(바위그림)이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1976년 8월 6일 보물 제605호로 지정되었고, 지정 당시 명칭은 고령 양전동 암각화였으며, 2010년 10월 고령 장기리 암각화로 문화재 명칭이 변경되었다. 알터 마을 입구에 있는 높이 3m, 너비 6m의 암벽에 새겨진 바위그림이다. 바위그림은 암각화라고도 하는데, 암각화란 선사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바람을 커다란 바위 등 성스러운 장소에 새긴 것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암각화는 북방문화권과 관련된 유적으로, 우리민족의 기원과 이동을 알려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바위그림은 동심원, 십자형, 가면모양 등이 있는데, 동심..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蔚州 大谷里 盤龜臺 岩刻畫) [내부링크]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蔚州 大谷里 盤龜臺 岩刻畫) 우리나라에는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바위 그림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울주 반구대 암각화)는 국보 285호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유적이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바위그림(울주 반구대 암각화)은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이다. 높이 4m, 너비 10m의 ‘ㄱ’자 모양으로 꺾인 절벽 바위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긴 바위그림으로 200여점 이상이 있다. 배, 그물, 작살, 방패 등 사냥과 물고기 잡이에 필요한 도구를 비롯해 개, 호랑이, 표범, 사슴, 멧돼지, 여우, 늑대 등의 뭍짐승과 물개, 상어, 거북, 고래 등의 바다짐승이 새겨져 있다. 또한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 바다에서 물고기를..
마형대구(馬形帶鉤) 호형대구(虎形帶鉤) [내부링크]
대구(帶띠 대, 鉤갈고리 구)는 허리띠를 죄는 고리쇠 정도로 직역되고, 일반적으로 허리띠 장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구(帶鉤)는 청동기시대 말기에 출현해서 초기 철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 초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청동제도 있고, 철제도 있다. 동물 모양에 따라 마형(馬形)과 호형(虎形)이 있는데, 마형대구(馬形帶鉤)는 말 모양으로 된 허리띠를 죄는 쇠이고, 호형대구(虎形帶鉤)는 호랑이 모양으로된 허리띠는 죄는 쇠를 말하며, 모두 일종의 장식물이다. [마형대구(馬形帶鉤)] 청동기시대 말기부터 삼국시대까지 사용한 말모양의 허리띠 고리이다. 허리에 차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장식물이다. 원형 또는 타원형의 금구(金具) 한쪽에 고리를 만들어 혁대에 부착시킨 것으로 맞은편의 둥근 고리에 걸도록 하였다...
거석문화(巨石文化) [내부링크]
거석문화(巨石文化.megalithic culture)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돌을 이용하여 선사시대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 인류 초기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청동기시대에 여러 유형의 기념물로 거대한 돌을 사용한 문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거석기념물로는 고인돌 · 선돌 · 돌무지무덤 · 돌널무덤 · 열석 · 환상열석 · 석상 등이 있다. 열석은 선돌이 한 줄이나 여러 줄이 평행으로 세워진 석열(石列) 형태이다. 환상열석은 선돌을 원형으로 배열한 형태로, 한 열 또는 이중으로 배열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스톤헨지이다. 석상은 돌에 사람의 얼굴 등 형상을 묘사하여 세워놓은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흔한 장승이나 제주도 돌 하루방, 묘 앞에 세워진 문· 무인석 같은 형태를 말한다. 그 ..
단양 수양개 유적(丹陽 垂楊介 遺蹟) [내부링크]
단양 수양개 유적(丹陽 垂楊介 遺蹟)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수양개에 있는 우리나라 후기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사적 제398호이다. 이곳에서 석기들과 사람의 뼈, 동물의 뼈 화석, 동물 뼈로 만든 도구 등이 출토되어 구석기시대의 생활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다른 구석기유적으로는 평남 상원 검은모루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 등이 있으며 중기 유적으로는 함북 빗살무늬토기·주먹도끼 등이 출토된 생활유적. 사적.웅기 굴포리, 강원도 양구 상무룡리유적 등이 있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서 중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지나 초기철기시대까지 걸친 유적이다. 단양 수양개 유적의 위치는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82-2이며, 단양역에서 4.7Km 거리에 있다.
세형동검 [내부링크]
청동기시대의 동검.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의 동검은 전기의 요령식 동검(遼寧式銅劍, 또는 비파형·만주식 동검)과 후기(또는 초기철기시대)의 세형동검(細形銅劍)으로 대별된다.세형동검은 평양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동검으로 불린다. 그런데 세형동검은 요령식 동검의 하반부가 길어지고 칼자루가 없으며 허리 양쪽의 팸이 형식상으로 남아 있어 요령식 동검의 영향을 시사해준다. 세형동검은 남한 전역에 걸쳐 고루 분포한다. 그러나 최근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요하(遼河)유역의 심양현(瀋陽縣) 정가와자(鄭家窪子)에도 그 존재가 알려지고 있다. 한국식동검이 사용된 연대는 대체로 BC 300년부터라고 추정된다. 즉 서기전 300년경부터 서기전후까지에 해당되는 청동기 후기에는 요령식 동검과..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 [내부링크]
청동기시대에 청동으로 만든 무기이다. 동검의 모양이 비파와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요하(遼河)를 중심으로 한 요령지방(遼寧地方)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요령식 동검이라고도 하며, 광복 전에는 ‘만주식 동검’으로 불렸다. 학자에 따라서는 부여 송국리에서 출토된 예에 따라 ‘부여식 동검’이라고도 하며, 형태에 따라 ‘곡인청동단검(曲刃靑銅短劍)’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반도 내에서는 현재까지 약 30여 자루가 알려져 있다. 함경도지방을 제외하고 거의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주로 서부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비파형동검문화는 고조선 전기의 역사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한국식 동검(細形銅劍)문화는 이 동검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 부여의 송국리 석관묘에서는 마제석..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 (驪州 欣岩里 先史遺蹟) [내부링크]
청동기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마을 유적이다. 서울대학교박물관과 고고인류학과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7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집자리 16기가 발굴된 유적지이다. 유적 연대는 출토된 유물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 결과 기원전 8~6세기 무렵의 주거지이다. 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산2-1번지이고, 1995.8.7에 경기도기념물 제155호로 지정되었다. 집자리는 긴 네모꼴이며, 규모는 11.6~42 평방미터로 다양하다. 집자리 내부에서는 화덕 자리와 기둥 구멍, 저장 구덩이가 조사되었다. 화덕 자리는 집자리 중앙에 놓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 있다. 남성과 여성의 작업 공간이 나뉘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화덕 자리에 가까운 공간에서 여성들은 주로 요리와 방직 ..
부여 송국리 유적 [내부링크]
충남 부여군 송국리에 있는 청동기시대 집터 유적이다. 197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발굴조사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1997년까지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다수의 집터와 무덤들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으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금강 유역 낮은 구릉 지대로 주변에는 넓은 평야 지대가 펼쳐져 있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집터는 평평하고 동그란 모양의 깊은 움집(둥근집터)과 평평하고 네모난 모양의 얕은 움집(네모난집터)이었다. 또 이곳은 나무 울타리나 도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이곳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하였던 비교적 규모가 큰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둥근 집터는 30∼150cm 깊이로 땅을 파서(수혈식주거지) 만들었으며, 한쪽 벽을 얕게 파서 문을..
가락동 유적 [내부링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일원에 위치한다. 1963년 고려대학교 인류·고고회가 학술 조사의 일환으로 발굴조사하였다. 한강 유역에서 2∼2.5 떨어진 한강 지류 변의 구릉지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대부분 개발되어 원지형은 남아 있지 않다. 유적 주변으로는 신석기∼원삼국시대의 미사리유적과 암사동·일원동·명일동 유적이 있다. 집자리〔住居址〕는 1기가 조사되었는데, 동서 방향을 장축으로 하고,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크기는 10×7m로 조사자는 긴 쪽을 둘로 나누어 원래 연접 축조한 2기로 추정한 바 있다. 내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 유물은 화분형토기(花盆形土器), 항아리모양토기〔壺形土器〕 등의 토기류와 돌낫〔石鎌〕, 돌화살촉〔石鏃〕, 송곳〔錐〕, 숫돌〔砥石〕, 가락바퀴〔紡錘車〕등의 석기류가 있다. 출..
서울 암사동 유적 [내부링크]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유적지이다. 신석기시대 대표적인 유적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중 최대의 마을단위 유적이다.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20여 기의 집터와 딸린시설, 돌무지시설이 드러났다. 서울 암사동 유적은 한강이 곡류하는 지점에 있으며, 강 건너에 아차산이 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고, 여러 차례 불굴 조사를 거쳐 약 50여 기의 신석기 시대 집터와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방사선탄소측정에 따르면 B·C 4,000∼3,000년기에 걸친 유적이다. 지금으로 부터 약 6,000년 전의 유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반도의 중서부 지방을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해 갈돌과 갈판, 그물추, 불에 탄 도토리 등이 출토되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미송리식 토기 [내부링크]
미송리식 토기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의 한 형태이다. 1959년 평북 의주군 미송리 동굴 유적에서 발견되어 이름을 미송리식 토기라고 한다. 손잡이가 있고 적갈색인 것이 특징이다. 밑이 납작하고, 항아리 양쪽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集線)무늬가 있다. 형태는 밖으로 벌어진 긴 목을 가진 항아리이다. 주로 한반도 북부 즉 청천강 이북,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 분포한다. 이 토기는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로 간주된다. 특히 미송리식 토기와 비파형 동검의 분포 지역은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한다. 미송리식 토기는 라오둥 지역에서는 무덤에서 출토되고, 압록강과 청천강 유역에서는 주거지와 무덤에서 출토되며, ..
중부지방의 토기 [내부링크]
중부지방의 토기는 출현 시대에 따라 가락식 토기, 역삼동식 토기, 흔암리식 토기, 송국리식 토기가 있다. 좌로부터 가락식 토기, 구멍무늬 토기(역삼동식 토기), 송국리식 토기이다. 1. 가락식 토기 신석기시대 말엽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금강 유역(호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민무늬토기이다. 토기의 입술을 겹아가리로 만들고 그 위에 짧은빗금무늬, 격자무늬, 거치무늬를 새긴 것이 특징이다. 1963년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한 서울가락동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적갈색을 띠고 있는 낮은 火度에서 구운 토기이다. 2. 구멍무늬 토기(역삼동식, 흔암리식 토기) 역삼동 주거지 유적에서 구멍무늬 토기, 즉 공렬문토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역삼동식 토기라고 부른다. 구멍무늬토기는 아가리 아래쪽에 구명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붉은 간토기 · 검은 간토기 [내부링크]
붉은 간토기 그릇 형태가 완료된 뒤 토기의 표면에 산화철(酸化鐵)의 붉은 안료를 바르고 매끄러운 도구로써 문질러 소성한 토기를 말한다. 홍도(紅陶), 단도마연토기(丹塗磨硏土器), 적색마연토기(赤色磨硏土器)라고도 한다. 민무늬토기 형식의 하나로 무덤의 껴묻거리(副葬品)로서 출토되는 예가 많아 의례용기(儀禮容器)등 특수 용기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청동기시대 전 시기에 걸쳐 출토되며, 특히 송국리문화로 대표되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가장 성행하였다. 붉은간토기로 출토지는 알 수 없다. 고운 바탕흙을 사용하여 만든 후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잘 문질러 구웠기 때문에 붉은 광택이 돈다. 청동기시대 붉은간토기는 바리, 대접, 항아리, 굽다리접시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유물은 바닥이 둥근 항아리 형태로 청..
덧띠토기 [내부링크]
그릇 입구 테두리(아가리)의 바깥부분 단면에 원형 또는 타원형, 삼각형의 점토 띠를 덧붙인 민무늬 토기이다. 점토로 띠를 만들어 입구에 붙였기 때문에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라고도 한다. 청동기 시대 후기에서 철기시대 초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중국 동북 지방에 기원을 두고 있는 토기이다. 덧띠 단면 형태에 따라 원형덧띠토기와 삼각형덧띠토기가 있다. 원형덧띠토기는 점토 띠의 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원형에 가까운 덧띠를 아가리 바깥에 돌려제작한 것이고, 삼각형덧띠토기는 점토 띠의 단면이 삼각형인 것으로 덧띠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덧띠를 삼각형 모양으로 눌러 덧띠를 만든 것이다. 원형덧띠토기가 먼저 등장하고 삼각형덧띠토기가 나중에 등장한다. 단면 원형의 덧띠토기는 검은간토기 긴목항아리와 함께 무덤에 부..
무늬없는 토기(무문토기.無文土器) [내부링크]
청동기시대의 무늬가 없는 토기이다. 일명 ‘무문토기(無文土器)’·‘무늬없는 토기’라고도 한다. 신석기시대 널리 사용되었던 무늬가 있는 토기인 빗살무늬토기에 상대되는 말로 사용된다. 대체로 서기전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종전의 빗살무늬토기에 외부로부터 새로 들어온 민무늬토기의 제작수법이 더해져 만들어지게 되었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가마에서 높은 열로 구웠기 때문에 갈라질 염려가 없고 표면이 매끄러웠으며, 빗살무늬 토기보다 훨씬 단단하다. 끓이는 용도, 저장하는 용도, 음식을 담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민무늬 토기는 지역에 따라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 밑바닥이 편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과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이 기본적인 모양이며, 빛깔은 적갈색이다. 한반도 북부에는 ..
덧띠새김무늬토기 [내부링크]
덧띠무늬〔突帶文〕토기가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이에는 새김덧띠무늬 토기(刻目突帶文土器), 새김없는덧띠무늬토기(無刻目突帶文土器), 덧띠새김무늬토기(突帶刻目文土器), 마디모양덧띠무늬토기(節狀突帶文土器) 등이 있다. 신석기 시대 끝 무렵 청동기 시대 초기에 나타난 토기이다. 신석기 시대 말인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의 요령(랴오닝), 길림(지린성), 러시아의 아무르 강과 연해주 지역에서 들어온 덧띠새김무늬 토기 문화가 앞선 빗살무늬 토기 문화와 약 500년간 공존하다가 점차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다. 이 때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으로, 한반도 청동기 시대가 본격화된다. 고인돌도 이 무렵 나타나 한반도의 토착 사회를 이루게 된다. 덧띠새김무늬토기는 새로운 양식의 토기로서 청동기 시대 가장 이..
빗살무늬토기 [내부링크]
그릇 표면을 빗살같이 길게 이어진 무늬새기개로 누르거나 그어서 점·금·동그라미 등의 기하학무늬를 나타낸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즐목문토기(櫛目文土器)’라고도 한다. 또한 겉면에 무늬를 새기고 있기 때문에 ‘유문토기(有文土器)’라고도 하며, 무늬 모양의 특징을 따서 ‘어골문토기(魚骨文土器)’ 또는 ‘기하학문토기(幾何學文土器)’라고도 부른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된 유적의 수는 135개에 달한다. 이들은 한반도 전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고 주로 해안가·강가 그리고 도서지방에서 발견된다. 크게는 대동강·한강을 포함한 서해안지역, 낙동강을 포함한 남해안지역, 두만강을 포함한 동해안지역의 3개 지역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지역군 사이에는 뚜렷한 지역차가 있다. 서..
덧무늬토기 [내부링크]
신석기시대 초기에 사용한 토기로 융기문토기(隆起紋土器)라고도 한다. 덧무늬토기는 토기를 만든 다음 그 위에 또다시 그릇의 표면을 약간 돋아나오게 띠 모양의 흙을 덧붙인 토기를 말한다. 부산동삼동, 양산 신암리, 양양 오산리, 춘성 내평리 등지에서 발굴된바 있다. 특히 부산 동삼동 유적을 발굴하면서부터 알려졌는데, 덧무늬토기는 이곳의 빗살무늬토기층보다 앞서는 가장 아래층에서 무늬없는 토기들과 함께 발굴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 토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덧무늬는 신석기 이른 시기뿐만 아니라 신석기 늦은 시기에서 청동기 이른 시기에 걸치는 민무늬토기에도 베풀어졌는데 이때의 덧무늬는 대개 굵은 편이다. 그리고 남해안지역에서 가장 성행했으며, 전국 각지에 걸쳐 조금씩 만들어 썼던 것..
이른 민무늬 토기 [내부링크]
이른 민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최초의 토기로서 원시무문토기라고도 하는데, 이는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민무늬토기)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른민무늬토기라 한다. 제작 기술이 거칠고 크기가 작다. 운모, 석영 따위의 모래가 섞여 있어 표면이 거칠고 흡수성이 강하다. 주둥이 부분은 대개 직선으로 올라간 것이 많으나 밖으로 벌어진 것도 있다. 함북 웅기, 평북 만포진, 부산시 동삼동 등에서 출토되었다.
선사시대 시대별 요약 정리 [내부링크]
[1] 구석기시대 요약 1. 불의 사용 2. 주거지 : 동굴, 막집 3. 무리생활(군집생활) · 이동 생활 4. 수렵, 어로, 채집 경제 5. 도구의 사용 : 뗀석기, 골각기 1) 주먹도끼 : 구석기시대 대표하는 뗀석기. 사냥할 때, 털이나 가죽을 벗길 때, 고기를 자를 때. 땅을 팔 때 사용 2) 긁개 : 동물의 가죽을 벗겨 손질할 때 사용 3) 찌르개 : 사냥할 떼 찌르거나 가죽에 구멍을 낼 때 사용 4) 슴베찌르개 : 후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로 주로 사냥에 사용. 5) 찍개 : 사냥이나 나무를 다듬는 데 사용 6) 자르개 : 물건을 자를 때 사용 7) 뚜르개 : 사물을 뚫을 때 사용 8) 밀개 : 조리 시 밀 때 사용 9) 골각기 : 동물의 뼈와 뿔, 이빨 등을 이용하여 칼, 바늘, 도끼,..
연맹왕국(聯盟王國) [내부링크]
중앙 집권 국가(고대국가) 바로 이전의 국가 형태로서, 초기 철기시대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연맹왕국이 성립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등장한 국가 형태이다. 종래 역사학계에서는 최초의 국가 형태를 부족국가(部族國家라고 하였고, 이 부족국가가 몇 개 모여 연맹체를 이룬 것을 부족연맹체라고 하였으나, 그 뒤 부족국가라는 용어 대신에 일반적으로 성읍국가(城邑國家) 혹은 군장국가(君長國家)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연맹체라는 용어도 연맹왕국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이 연맹왕국은 여러 부족(성읍, 군장)국가들이 하나의 맹주국을 중심으로 좀 느슨한 연맹체를 이룬 형태의 국가이다. 즉 여러 부족(성읍, 군장)국가들의 부족장 중에서 왕을 선출하여 느슨한 연맹체를 이루었다. 따라서 각 부족(성..
부족국가(部族國家)·성읍국가(城邑國家)·군장국가(君長國家)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계급이 분화되고 지배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시대이다.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벼농사가 시작되고,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농경(밭농사 중심)이 더욱 발전하여 농업에서의 생산력이 증대되었다. 그에 따라 잉여농산물이 생기고, 사유재산제도가 발생하며,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를 가진 자들이 경제적 활동영역을 더욱 넓히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사회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족장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면서 여러 부족들을 거느리며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부족국가 (部族國家) 또는 성읍국가(城邑國家), 군장국가(君長國家)라고 부른다. 이들은 모두 같은 개념이며, 학자에 따라 달리..
부족사회(部族社會) [내부링크]
씨족사회였던 신석기 시대의 말엽에는 다른 씨족과 교류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2개 이상의 씨족이 합치는 경우가 생겨났다. 씨족과 씨족이 합치면 농사를 짓기도 편하고, 다른 씨족의 공격을 막아 내는 일도 쉬웠졌다. 이렇게 씨족이 합쳐지면서 여러 씨족의 연합체인 부족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런 제도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청동기 시대에는 국가가 생겨났다.
씨족사회 [내부링크]
씨족이란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모두가 친척이나 친족이 된다. 씨족사회는 이러한 씨족 제도가 사회 전체의 지배적인 구성원리로 되어있는 사회다. 결혼은 같은 씨족끼리는 안하고, 다른 씨족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씨족사회는 아버지를 계통으로 구성되는 부계 사회와 어머니를 계통으로 구성되는 모계 사회로 나눌 수 있다. 부계 사회나 모계 사회나 모두 구성원들끼리 함께 살아가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생활했으며, 씨족의 구성원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도 없었다. 씨족 사회는 농업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
시대별 토기 정리 [내부링크]
1. 이른민무늬토기 ① 신석기시대 토기 출현 초기 형태 ② 표면 거칠, 무늬가 없고 두꺼움. ③ 원시무문토기라고도 함. ④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투기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른민무늬토기라 함. 2. 덧무늬토기 ① 신석기 시대의 초기 토기 ② 그릇표면에 띠모양의 점토를 덧붙여 무늬를 냄. ③ 융기문토기라고도 함. 3. 빗살무늬토기 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신석기 시대 가장 널리, 가장 오래 지속된 토기) ② 덧무늬토기 이후 등장 ③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 ④ 그릇 표면에 빗 모양의 무늬 ⑤ 그릇 밑이 뾰쪽 ⑥ 강가나 바닷가에서 많이 발견 ⑦ 즐문토기라고도 함. 4. 덧띠새김무늬토기 ① 신석기 말, 청동기 시대 초기에 나타난 토기 5. 민무늬토기 ①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② 팽이형, 화분형 토기 ③ 가락..
뗀석기 · 간석기 [내부링크]
뗀석기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이 주로 만들어 쓰던 석기로 예전에는 타제석기라 했다. 이석기는 구석기인들이 강가나 들에서 적절한 석재를 구한 다음, 사람들이 돌을 의도적으로 깨서 만든 것으로 사냥에 필요한 무기와 일상용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뗀석기로는 주먹도끼, 찍개, 몸돌긁개, 돌도끼, 긁개, 뚜르개, 찌르개 등이 있다. 간석기 신석기시대의 인류가 돌을 갈고 다듬어서 만든 일상생활용 도구나 무기를 말하며, 그전에는 마제석기라고 했다. 간석기는 돌을 깨고 두들겨서 대략의 형태를 만든 다음, 전체의 면 또는 날이 서는 부분을 반들반들하게 갈고 다듬는 마연법으로 제작하였다. 간석기로는 돌화살촉, 돌창, 그물추, 가락바퀴, 갈판과 갈돌, 반달돌칼, 돌보습, 돌괭이, 돌삽, 돌도끼, 돌낫, 뒤지개 등이 있다.
신석기 혁명 [내부링크]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농경, 목축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단계에서 자연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단계로 전진한 것이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게 됨으로써 구석기 시대처럼 떼를 지어 이동하던 생활 대신에 한 곳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넉넉해지고 인구도 늘게 됨으로써 생활도 여러 모로 향상되었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의식주 등 인류 생활에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
중석기 시대, 잔석기 [내부링크]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석기 시대 말기, 즉, 약 1만 2천년 전에서 약 8천년 전까지를 특별히 중석기 시대로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약 1만 년 전에서 약 8천 년 전까지이다. 이 시대는 빙하기가 끝나가면서 다시 기후가 따뜻해지는 등 자연 환경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 시기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자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큰 짐승 대신에 토끼, 여우, 새 등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 활, 창 등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석기들은 더욱 작고 섬세하게 가공하였고(잔석기),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북한의 웅기 부포리와 만달리 유적, 남한의 통영 상노대도 조개더..
지질시대(地質時代) [내부링크]
지질시대(地質時代) 오랜 지구의 발전 과정 중, 지구의 표면 부근에 지각(地殼 - 주로 각종 암석으로 구성된 지구의 껍데기)이 형성된 이후부터 현세에 이르기까지의 약 40억년 간의 시대를 지질시대라 한다. 크게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고, 신생대는 다시 제3기와 제4기로 나눈다. 제4기는 또 홍적세와 충적세로 나눈다. 홍적세는 빙하기로서 약 3~5백만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 시대에 인류가 출현하였다. 약 1만년 전부터 시작되는 충적세는 지구가 점차 따뜻해지고 빙하가 물러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오늘날과 같은 지구 환경이 형성된 시대 즉, 후빙기를 말한다. 결국 우리는 지질 시대로 말하면 신생대 제4기 충적세에 살고 있는 셈이 된다.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의 생활 [내부링크]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의 생활 1. 농업 기술의 발달 - 벼농사 실시 ① 저습지(낮고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벼농사 시작 ② 사냥, 물고기잡이보다 농경의 비중이 높아짐(※농경무늬 청동기) →주거지가 주로 산간, 구릉지에 위치. 가축 사육 증가 2. 주거 생활의 변화 ① 집터 유적 : 배산 임수(背山臨水)의 취락 형성 ② 집터 형태 : 직사각형 움집(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원형이 많음)에서 점차 지상 가옥화 ③ 집터 크기 : 부부 중심의 일부일처제로의 전환 3. 남녀 분업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농경, 전쟁 등 바깥일 담당 4. 사회의 변화 (1) 사유 재산과 계급의 발생 ① 농업 생산력의 증가 ② 잉여 생산물의 축적과 사적 소유 결과 (2) 고인돌의 등장 지배층의 무덤으로 당시 지배층의 정치권력과 경제력..
초기철기시대 [내부링크]
초기철기시대 청동기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로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기원 전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고학 편년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 용어로서, 이 시기에 세형 동검이나 잔무늬 거울 등 우리나라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의 발달을 들어 제2차 청동기 시대라고도 한다. 그러나 철기가 처음 등장하고 있으므로 보통 초기 철기 시대라고 부른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이 발달하였고, 철제 무기와 철제 연모를 씀에 따라 그때까지 사용해 오던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하였다. 1) 시기 ; B.C. 5세기경 ~ 기원 전후까지 2) 철제 농기구의 사용(경제 기반 확대), 철제 무기, 철제 연모 사용 → 청동기는 의기(儀器)化(청동제 농기구는 없음) 3) 토기 ① 덧띠토기 : 덧무늬 토기(신석기시대 초기), 덧..
한반도 청동기 시대 [내부링크]
1. 청동기의 보급 한반도에는 신석기 시대 말엽에 중국의 요령(랴오닝), 길림(지린),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서 덧띠새김무늬 토기 문화가 들어왔다. 이는 빗살무늬 토기 문화와 약 500년 동안 공존하다가 점차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다. 이때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으로 한반도 청동기 시대가 본격화된다. 청동기시대에는 무기, 의기(제기), 장신구 등은 청동을 사용하였으나, 농사짓는 기구는 청동기가 아닌 간석기를 사용하고 있다. ※ 청동=구리(Cu)와 주석(Sn)의 합금 참고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에는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 · 15 광복 후 한반도 곳곳에서 청동기 유적이 발견되면서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도 청동기를 널리 사용했음이 확인되었다. 2. 청동기..
한반도 신석기 시대 [내부링크]
1. 한반도의 신석기 약 1만 년 전에 오랜 빙하기(홍적세)가 끝나고 후빙기(충적세)가 시작되자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B.C.5500년경부터 B.C.3000년경까지 기후가 따뜻해져 산에는 활엽수가 생기고, 강이나 바다는 넓어지고, 물이 풍부해 생물체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여 현재와 비슷한 지구환경이 되었다. 그리고 동물들도 추운 날씨에 적응해 살아왔던 몸집이 큰 동물들은 점차 사라지고, 토끼, 사슴, 노루 같은 작은 동물들이 늘어났다. 강이나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이 생겼다. 따라서 먹거리가 풍부해졌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B.C.8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2. 한반도의 신석기인 신석기 시대에 살던 인간은 현생 인류에 속하는 여러 인종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
한반도 구석기 시대 [내부링크]
1. 한반도의 구석기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약 450만 년전이고,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구석기 문화가 나타난 것은 약 70만 년전이다.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나타난 것은 약 4~5만 년 전이며, 동아시아의 지형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갖추어진 것은 약 1만 년 전의 일이다. 2. 한반도의 구석기인 한반도에 살았던 구석기인은 호모 에렉투스(선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인은 아래와 같다. 1) 승리산인 1972년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 동굴에서 사람의 뼈가 출토되었는데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승리산인'이라고 부르며, 대략 35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 역포 아이 1977년 평양시 역포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되어 ‘역포 아이’라 부르고, 7~8세 ..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내부링크]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의 마음처럼 불가사의한 것이 또 있을까?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두루 받아들이다가도 한 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아니꼬운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돌이킬 수 밖에 없다. 남을 미워하면 저쪽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진다. 아니꼬운 생각이나 미운 생각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하루 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 자체가 얼룩지고 만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을 내가 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닦는다...
신석기 시대 [내부링크]
1. 신석기시대 개관 영국의 고고학자 J. 러벅은 그가 쓴 〈선사시대 Prehistoric Times〉에서 석기시대를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처음 나누었다. 구석기시대가 홍적세(빙하기)에 속하는데 반해 신석기시대는 충적세(후빙기)에 속하며, 구석기시대에는 뗀석기(타제석기)만을 사용했고, 신석기시대는 간석기(마제석기)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장신구로서 자연 금을 이용하는 일은 있었지만, 구리·철 등의 금속을 가공하는 지식은 없었다. 한편 영국의 L. 브라운에 의해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사이에 과도적인 단계로서 중석기시대를 두는 것을 주자했으며, 20세기에 와서 중석기시대의 개념이 학계에 널리 쓰이게 되면서, 러벅이 주장한 '신석기시대'의 일부는 중석기시대로 분류되고 있다. 유럽, 아프리카 북부, 서..
구석기 시대 [내부링크]
1. 시대 구분 고고학상에 주요한 이기(利器)의 재료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 3시기법(三時期法)이 있다. 즉 도구의 사용 시기에 따라 구분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가 그것이다. 석기시대는 이중 제1단계이다. 그리고 영국의 고고학자 J. 러벅은 그가 쓴 〈선사시대 Prehistoric Times〉에서 석기시대를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로 처음 나누었다. 그러나 그후 영국의 L. 브라운에 의해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사이에 과도적인 단계로서 중석기시대를 두는 것이 제창되었으며, 20세기에 와서 중석기시대의 개념이 학계에 널리 쓰이게 되면서, 러벅이 주장한 '신석기시대'의 일부는 중석기시대로 분류되어 에르테뵐레 문화 역시 현재는 중석기시대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하여 석기시대는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내부링크]
선사시대(先史時代) · 역사시대(歷史時代) 일반적으로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자 사용의 여부이다. 선사 시대는 문자가 없어서 문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말한다. 따라서 선사 시대는 사료(史料)가 없어서 유물과 유적으로 역사를 연구한다. 그리고 역사 시대는 문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고, 역사 기록도 남아있다. 세계적으로는 청동기 시대 이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문자를 사용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철기 시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하면 문자 사용 시기를 전후하여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로 나누고, 선사 시대는 문자가 없던 시대를 말하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이에 포함되고, 역사 시대는 문자를 사용하던 시대로 청동기 시대 이후라고 볼..
우리 민족의 형성 [내부링크]
우리 민족의 형성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중국 요령(랴오닝) 성, 길림(지린)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넓게 분포하여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다. 즉 우리 민족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우리 민족은 인종상으로는 황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 어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본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민족 단위를 형성하고,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다. 그러나 현생 인류는 약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후기에 출현하였으며, 그 이전의 구석..
인류의 기원 [내부링크]
지구의 탄생은 약 46억년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 차례 기후 변화와 지각 변도을 거쳐서 오늘날의 지구가 되었다한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등장한 것은 약 32억년 전이었다. 그리고 지구에 인류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약 450만년 전(약 500만년 전이라는 주장도 있음)이라고 한다. 인류 진화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립 보행이었다. 인류는 직립 보행으로 자유로워진 두 손을 이용하여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두뇌 용량이 커져 지능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 소통을 하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기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1) 오스트랄로피테쿠스 : 남유인원, 남방원숭이 최초의 인류는 아프리카 남부 지방의 화석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다. 대..
역사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과거 사실 중에서도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이다. 누가 역사가 무어냐고 물어본다면 '과거 사실 중에서도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리고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기록할 수가 없어서 선사시대라고 부르고, 문자가 생겨서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를 역사시대라고 부른다. 역사시대는 글로 기록이 남아있지만, 선사시대는 과거 사람들이 남긴 물건인 유물과 과거 사람들이 남긴 자취와 흔적인 유적으로 역사를 연구한다. 그럼 역사를 왜 배우는 걸까? 역사를 배움으로써 과거를 통해 미래를 이해해가고, 과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때문이다. 과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내가 살고있는 현재의 삶을 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티스토리 커뮤니티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