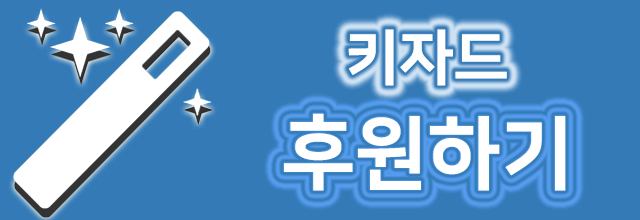어떤 기준으로 서점다운 서점을 구분할 수 있을까. 단지 책을 많이 판다고 서점다운 서점이 되는 걸까. 아니라고 감히 생각한다.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전하는 게 서점의 소임이 아니겠나. 누군가의 고민에 책을 통해 공감하고 위로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서점원에게 허락되는 절정의 성취가 아닐까 싶다. 소규모 서점의 큐레이션은 엄청난 공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종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힘들다. 한 권을 넣으면 한 권을 빼야 하니 어느 책도 허투루 고를 수 없다. 그만큼 손님은 좋은 책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 시바타 신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의 주인공도 같은 지적을 한다. 서점원은 작은 점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독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선에서 소임을 다하라는 조언이다. 가장 큰 만족은 서점 공간 운영의 디테일을 배울 수 있었던 점. 땡스북스는 독서의 기쁨만큼 책을 고르는 즐거움도 중요하다는 철학으로 운영됐다. 하여 서점의 조명과 음악도 부수적인 업무...
원문링크 :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솔직히 책이 정말 팔릴 거라 생각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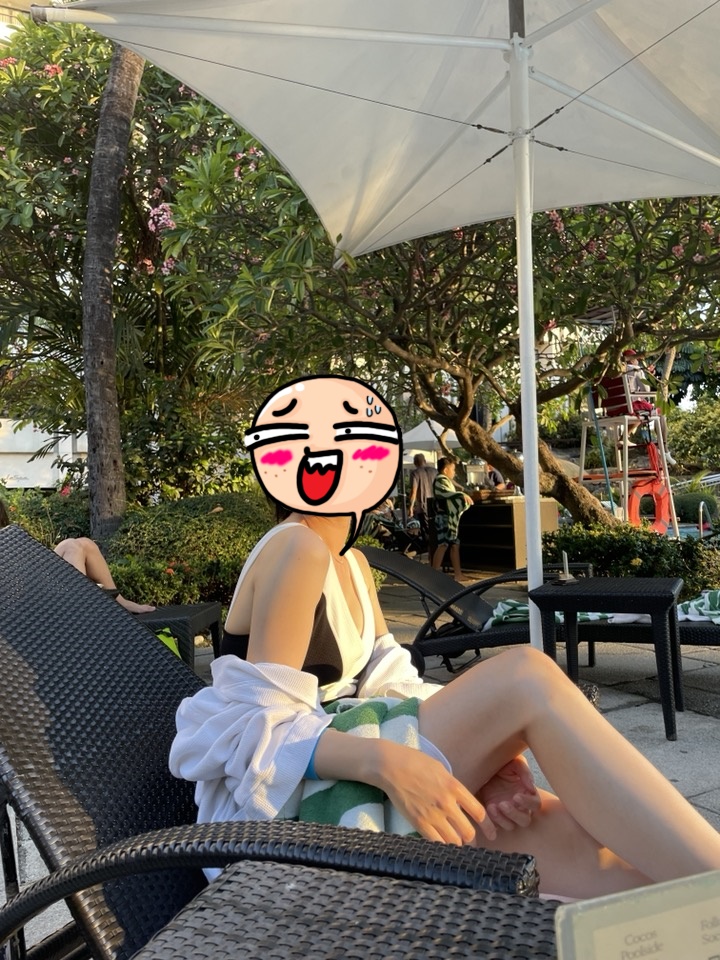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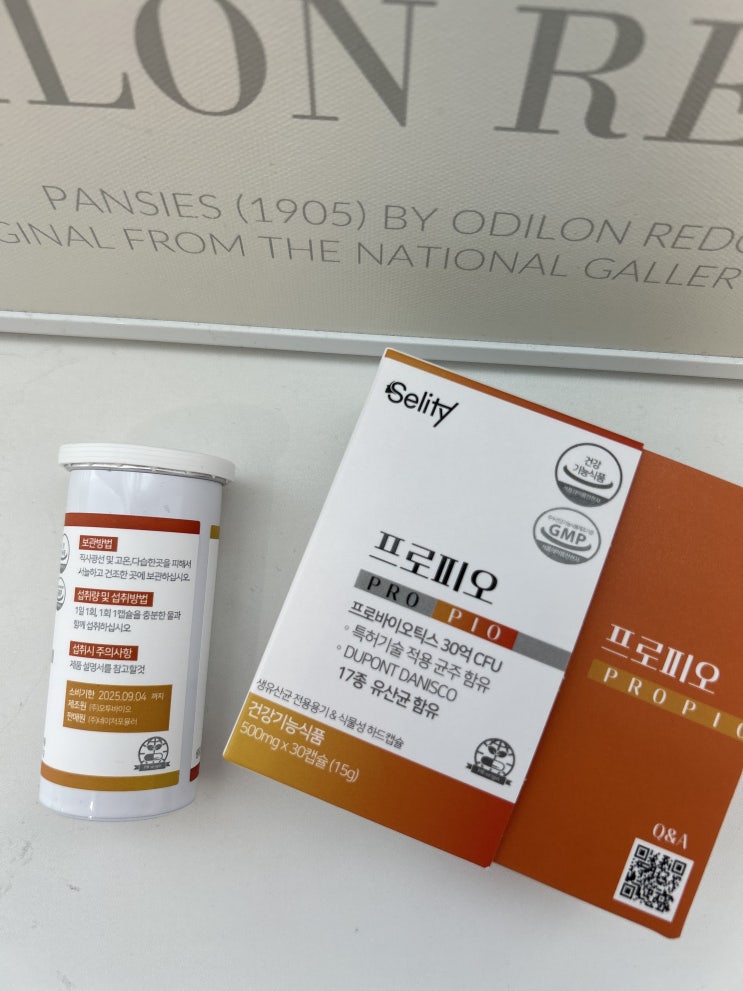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티스토리 커뮤니티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