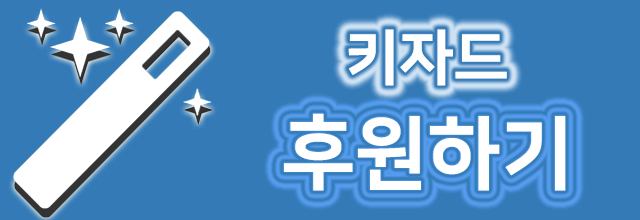무제 - 지나야 보이는 봄에 대해 나는 언제부턴가 차가운 눈밭을, 바스라 지는 낙엽 길을 걷는 것 같았다. 정상 없는 등산길, 목적 잃은 길을 걸으며 내 봄은 언제였더라, 혹 아직 오지 않았나.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봄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며 그 차가운 길을 맨발로 걷듯 살았다. 걸어도 끝이 없는 길 위에서 나는 가만히 서 보았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고, 숨을 크게 쉬고, 뱉었다. 잠시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봄은 없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 눈앞에 서있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나. 그 나무는 이리저리 휘고, 상처가 나고, 바람에 흔들리며 잎을 떨구었다. 그래, 제 자리 가만히 지키고 서있는 나무라고 그 시간들이 순탄키만 하겠나. 나는 길을 걷고 있으니 더 순탄치 않은 거겠지. 바람이 불고, 나무는 꽃잎을 떨구었다. 날리는 꽃잎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아, 내가 걸었던 길에 드디어 꽃이 폈네. 내가 봄을 만들었구나. 내가 봄이구나. 내 맨발...
원문링크 : 제주도에서의 글
![[국내/청주] 청주 외곽 조용한 커피 로스팅 카페 스티즈커피로스터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DVfMTUw/MDAxNzAxNzU4NTQ0MzU5.SoddcB1LTEe7pU5K5zD4TgBX67QhyGM7CR4CJLZncxog.NtE_8Aevy9VFe7IA8sg02VPdMYd969zwie3VZB5B-RIg.JPEG.mingi60502/%3F%94%84%3F%A0%88%3F%A0%A0%3F%85%8C%3F%9D%B4%3F%85%98blog_.jpg?type=w2)
![[국내/강릉] 주문진 도깨비시장 대게 맛집 대영유통](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TlfMTcz/MDAxNjc5MjM2MTI2MzEy.WJRKXSQ7_sAzxKmo5iNXfbJIPwpZ_chfBQsFfjOxDqUg.aLWK52w4f9dPLi4q9OH3fwyp7XpyJy21_O5lP8y00k8g.JPEG.mingi60502/%C7%C1%B7%B9%C1%A8%C5%D7%C0%CC%BC%C7blog.jpg?type=w2)
![[해외/로마]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다리 Ponte Vittorio Emanuele II](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jVfNDQg/MDAxNzA4ODcyMDU1ODM1.Y2MmmikUzSf7_ruGmchw3Z5IImp_wRD8SZP0r0Q_zKwg._eH8opGyBWQ37AJUEYsd101woTj5w9-YU1Q1c5MJHVgg.JPEG/%3F%94%84%3F%A0%88%3F%A0%A0%3F%85%8C%3F%9D%B4%3F%85%98blog_.jpg?type=w2)
![[국내/제주도] 제주도 동쪽 산책하기 좋은 북촌돌하르방미술관 공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DNfNTcg/MDAxNjc3ODIyOTU5NDcx.LmkdWIJSAtvdEx3d3k0Y6mL_vXZGeKuP7VqRpe72rbYg.LIoss_c42Lzkt3vi5JRZ6bdJU2jSSshJAOQel7gyxVkg.JPEG.mingi60502/%C7%C1%B7%B9%C1%A8%C5%D7%C0%CC%BC%C7blog.jpg?type=w2)
![[국내/제주도] 제주 서쪽 애월읍 가볼 만한 곳 새별오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jhfODMg/MDAxNjkzMTg3MjY1NzY3.qnv_pG7g34T5bq9xs4XMZ-GOMfaDIqEZpUneNhGCTeog.nkKJcu0_65gV1dI8w6M0mUxopQ_8mQwSRaFiqbeqOSUg.JPEG.mingi60502/%C7%C1%B7%B9%C1%A8%C5%D7%C0%CC%BC%C7blog_.jpg?type=w2)
![[해외/브리엔츠] 스위스 브리엔츠 식당 호텔 슈타인보크 레스토랑 Hotel Restaurant Steinbocbrienz](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TVfMjQz/MDAxNzAyNjE1Nzg3MjE1.e61r862jLmXP6S3VZ3s2oVfb9azI1rwLr63QL3Ag7JIg.YxuJYQJ4Vq_ZLCIQVmJ4pzxkF47R9OJPKp_fEgCcyLsg.JPEG.mingi60502/%3F%94%84%3F%A0%88%3F%A0%A0%3F%85%8C%3F%9D%B4%3F%85%98blog_.jpg?type=w2)
![[국내/서울] 종로3가역 탑골공원 근처 모텔 호텔스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TJfOCAg/MDAxNjk5Nzk3OTk4MjE5.aTd1WqjqoAyfMLyyL6yv3fwuCevLwEH1vzJMgQRze_Ug.Orex9PqXI2HHv-4AHxHfhvosXeKnyFo1j0kmrT9j-Pog.JPEG.mingi60502/%3F%94%84%3F%A0%88%3F%A0%A0%3F%85%8C%3F%9D%B4%3F%85%98blog_.jpg?type=w2)
![[국내/제주도] 서귀포시 일식당 스시 아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TJfMTk0/MDAxNjk5Nzk5NTAzNTAy._4faHXxjkhugaNFnIIpPnxf73IqrAjLCKh-l1MGnrqsg.bNlYLA04hlFe51BUWo5yhGA9NaOM9we4FAEzVNvCTgAg.JPEG.mingi60502/%3F%94%84%3F%A0%88%3F%A0%A0%3F%85%8C%3F%9D%B4%3F%85%98blog_.jpg?type=w2)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티스토리 커뮤니티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