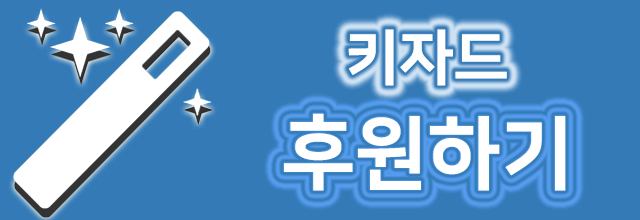kcarpe_diem의 등록된 링크
kcarpe_diem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382건입니다.
형제라면 - 에노시마 섬에서 한국 라면 한 그릇 [내부링크]
일본 여행기를 다 올리고 헛헛한 마음에 TV를 틀었다가 우연히 보게 된 <형제라면>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인 일본에서 한국식 라면을 선보이겠다는 발상은 좀 억지스럽지만, <신서유기> 이후 강호동 스타일 예능에 꽂혀 <강식당>과 <라끼남>까지 죄다 챙겨 보고, 거기다 신서유기 멤버 중 그나마 정상(?)인 이승기도 나오고, 무엇보다 <슈룹>의 완소 세자 배인혁까지 나와서 이 무슨 눈호강인가 싶은데, 촬영지는 무려 <바닷마을 다이어리>와 <슬램덩크>의 배경인 에노시마 섬이다. 비록 가 보지는 않았지만, 애정하는 영화의 배경이고, 마침맞게도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가 일본이라 새삼 반가운데, 현지 식당을 임시로 빌렸다는 저 라면 가게가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다. 심지어 원래 이름은 '분사식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긴...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전갱이 튀김을 팔던 우미네코 식당(海猫食堂)이 아닌가! 영화 속 이름은 '우미네코'지만, 저 식당의 실제 이름은 '분사식당'으로 현재도 영업 중이라
백년 동안의 고독,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1967 [내부링크]
읽고 나서 이토록 성취감에 젖은 책이 있었던가. 근친상간이 난무하는 5대에 걸친 콩가루 집안 이야기에다 결말도 완전 우울한데. 심지어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단순하면서 헷갈린다. 남자는 아르까디오 아니면 아우렐리아노, 여자는 아마란따와 레메디오스 뿐인데, 이 아르까디오가 할아버지인지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그래서 그놈이 고모 아마란따와 썸을 타는지, 증조 할머니와 썸을 타는지 당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에 저렇게 적으면서 읽었더니 콩가루 가계도가 완성되었다. 무엇보다 기가 막힌 건 집안 대대로 우려했던 가설이 5대에 이르러 증명됐고, 그것이 너무도 허무하게 끝났다는 것.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이 고독하게 한다는 것. 이 책은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백 년 동안의 고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월이란 흐르게 마련이잖니. 하지만 그리 빨리 흐르진 않죠. 불운은 빈틈도 없다니까. 개좆같이 태어나서 개좆같이 죽는군. 가문 최초의 인
뭇 산들의 꼭대기, Chi Zi jian, 2015 - 중국판 백 년 동안의 고독 [내부링크]
왜 <백 년 동안의 고독>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으나, 백 년 고독의 몇 배나 어지러운 마을 가계도와 사건들 좀 보라지. 가히 중국판 백 년 고독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후에 들었던 빨책의 DJDJ님도 똑같은 발언을 해서 깜놀) 하지만 백 년 고독에선 같은 이름과 유사한 삶이 대물림된다면, 뭇 산에서는 저마다 사연이 담긴 이름을 가지고 각자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무장한 삶을 충실히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뭇 산들, 그중에서도 꼭대기란 고립되고도 신비로운 그곳에서. 공간적 배경 때문에 영화 <함산>이 떠오르기도 했다.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사연 만큼 소설의 문체도 그에 못지 않게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가령 안핑은 신신라이를 잡지는 못했지만, 독수리가 토끼를 낚아채는 것을, 뱀이 두더지를 집어삼키는 것을, 작은 새가 벌레를 포위해서 섬멸하는 것을, 개미가 소나무 껍질을 갉아먹는 것을, 벌이 들꽃의 심방에 침입해 탐욕스럽게 꽃가루를 빨아먹는 것을 목격했다. 만물 사이에도 학살과
홍루몽, 조설근(1715~1764) - 중국판 백 년 동안의 고독 2 [내부링크]
假作眞時眞亦假 가짜가 진짜가 될 때는 진짜 또한 가짜요, 無爲有處有還無 없음이 있음이 되는 곳엔 있음 또한 없음이로다. 작품 하나에서 '홍학'이라는 학문을 탄생될 정도로 문학적 가치가 대단하다지만, 가계도를 보면 늘 그렇듯 근친상간과 질투와 음모와 방관자들이 고루 배합되어 진부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그럼에도 그 옛날 한시의 깊이와 우주의 진리를 깨친 수준 높은 등장인물들의 대화는 늘 연구의 과제를 던져준다. 이렇게 하나 배우고, 한 권 넘어가고 또 하나 배우고... 하지만 12권은 좀 힘들었다. 그리고 역시나 결론은 지지부진해서 다 끝내고 나니 허무함 대박... 예술 작품이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듯 작품을 대하는 사람의 수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닌 듯.
스타벅스는 진화한다 [내부링크]
어쩌다 스벅 팔공점의 서비스에 대박 감동한 일이 있었다. 리저브 메뉴의 첫 이용이기도 했고. 그제서야 스벅의 볼매를 발견하기 시작한 듯. 그동안 단순 커피 프랜차이즈 1위라는 인식만 있었는데, 스벅은 문화 그 자체란 생각이 든다. 미국 시애틀의 어촌 한구석에 원두 가게로 시작해서 전 세계 굴지의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리저브 매장 도입으로 그야말로 다양한 면모를 선보이는 진화에 놀라울 따름. 그동안 차별화를 추구하겠다며 예쁘게 단장만 해놓은 촌구석 카페만 줄창 돌아다녀서 남는 게 있었던가. 오히려 방구석에 들어앉아 세계 최대 리저브 매장이라는 상하이점과 올해 그 아성을 깬 도쿄점을 찾아보며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는.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https://blog.naver.com/kwoncharm_e/221531638177 도쿄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http://shootar.net/221529547533 커피계의 애플이라는 블루보틀 1호점 https://bl
스노우캣 인 뉴욕 - 카페 의존형 인간 [내부링크]
<스노우캣 인 뉴욕>을 보다가 극 공감한 장면이 있어 올려본다. 2007년도에 나온 책인데,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뉴욕이든 어디든. 코로나 중에도 카페에는 꾸준히 모여드니. 것도 마스크 없이.ㅡㅡ;
이주윤 - 드물게 솔직한 작가 [내부링크]
시작은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의 섬뜩한 일러에서였다. 왠지 이 작가가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든 건. 아니나 다를까, 사실적인 묘사가 아주 그냥 온몸의 세포를 뭉클하게 하네. 그리고 저자가 작가가 되기까지의 몸고생 마음고생이 아주 원색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책 <팔리는 작가가 되겠어>는 세상 가장 서글픈 '아리랑'보다 더 구슬프게 읽었다. 정말 드물게 솔직한 작가. 이분 잘됐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한다. 리듬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다 보면 술술 읽히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만의 문체까지 덤으로 생겨난다고. 언제까지 무뚝뚝한 단문만 쓰며 살 텐가! 난 그런 글은 영 게을러 보여서 싫더라. 블로그에 일기를 씨불인 것 외에는 별다른 습작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다. 소설이나 시를 쓰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으로 써내려간 글만이 글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일기를 소설처럼 쓴다면 그게 소설이 되고, 내 일기를 시처럼 쓴다면 그게 바
라이프 트렌드 2021, 김용섭 - Fight or Flight [내부링크]
기대 이상이다. 올 4월에 나온 <언컨택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쯤으로 생각했는데, 포스트 코로나의 2막을 여는 지금 가장 시의적절하면서도 이만큼 날카로운 분석서는 없는 듯. 매년 습관처럼 보는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가 화려한 용어 대비 내용이 아쉬웠던 것에 비하면, 이 책은 진짜 꿰뚫어봐야 할 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서 좋다. 참고로 내가 이분한테 입덕하게 된 건 2018년도에 나온 <실력보다 안목이다>라는 책인데, 이 한 권만 보더라도 전에 없던 인사이트가 마구 열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커리어를 여러 번 바꾸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대신 그만큼 관심사의 폭이 넓어져서 좋다. 그중 기억에 남는 구절 몇 가지 적어보자면... 인문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담론이 더 필요해진 시대다. 사회과학 범주에 있는 학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관점과 전문성으로 풀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와 담론이 많다는 의미다. 인문학 열풍도 엄밀히 인간에 대한
마스다 미리의 만화 에세이들 [내부링크]
갑자기 붕 뜬 휴일, 오랜만에 도서관으로 향했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겹친 주말이라 한산할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사람 대박이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분명 희망적인 게 틀림없어. 이렇게나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윤 총장님도 복귀하셨으니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지 뭔가. 원래 찾아보려던 책은 생각보다 건질 게 없었고, 오히려 어느 이웃님의 블로그에 소개된 마스다 미리의 책에 푹 빠졌다. 예전에 친구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동작가의 책을 추천했을 땐 귓등으로도 안 들리더니, 책 좀 읽는다는 분이 추천해 주니까 바로 점검 들어가는 나도 참 이중적이란 생각.ㅋ 다행히 동네의 작은 도서관은 마스다 미리의 거의 모든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중 특히 <차의 시간>은 카페 문화를 사랑하는 나에게 거의 대발견이나 마찬가지. 담백한 스토리텔링을 보며 글쓰기의 방향성도 찾은 것 같기도. 참고로 일본책 번역본이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하는 불편함은
김용섭 Vs. 김난도 - 2022년 트렌드를 예측한 두 분석서 [내부링크]
올해는 너무 바빠서 책도 뉴스도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읽었더니 이런 트렌드 서적이 좀 낯설다. 그래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해를 준비하기 위해 점검할 건 해야지. 뭔가 큰 인사이트는 없지만, 그래도 잡지처럼 부담 없이 볼 수 있기에 - 라이프 트렌드는 정말 잡지처럼 나왔다는 -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읽어 본다. 트렌드 코리아 2022, 김난도, 이준영, 이향은, 미래의창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 니체 미증유의 전염병과 현명하게 공생하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있다. 팬데믹 위기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기업보다 더 빠른 소비자들의 니즈 속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거침없이 포효하는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 TIGER OR CAT Transition into a Nano Society - 나노 사회 극도로 파편화된 사회에서 공동체는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생각하고 싶어서 떠난 핀란드 여행, 마스다 미리, 2021 (feat. 카모메 식당) [내부링크]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같다. 카페에서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곧잘 볼 수 있다. 따뜻한 커피와 시나몬 롤을 먹으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본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시간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나 자신을. - 마스다 미리의 <생각하고 싶어서 떠난 핀란드 여행> 서문 중 목적의식에 짓눌려 도장 깨기식 과제 수행이 아니라 여행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여행이 되는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생각으로 이끄는 마스다 미리의 라이프스타일이 좋다. '그나저나 핀란드는 시나몬 롤이다'란 부제와 함께 앞부분을 가득 메우는 시나몬 롤과 커피 샷도 좋았고. 마치 영화 <카모메 식당>의 에세이 버전을 보는 느낌이랄까. 바로 이 정서다. 내가 원하던 게. 목적은 여행인데, 그 물리적 행위가 에세이 같고, 때론 영화 같고, 그러면서도 외국어가 서툴고 대면 관계에 낯설어하는 소시민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솔직함. 이것이 그림체가 예쁘지 않음에도 이 작가가 롱런하는 이유이리라. 오늘은 일단 '
라이프 트렌드 2023 & 트렌드 코리아 2023 [내부링크]
두 작가의 차이는 극명하다. 미시적 디테일함과 거시적 관점의 차이. 그래서 김용섭 분석가는 읽는 재미가 있고, 김난도 교수는 멀리 보는 시야를 제공한다. 라이프 트렌드 2023, 김용섭 1 과시적 비소비 욜로, 플렉스, 오픈 런, 호캉스 등 지금까지 대중은 영끌하듯 소비(플렉스)하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표출해왔는데, 2022년부터 무지출 챌린지, 투자 감소와 저축 증가, 중고 시장 확대, 소식 먹방 등 ‘과시적 비소비’가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이 되던 행동이 아니었기에 이런 비주류 소비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 준다. 욕망의 본질은 과시에 있다. 소비가 과시의 가장 좋은 도구였다면, 이제 비소비가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 소비를 하든 멈추든 그 형태를 바꾸는 모든 것에 과시 욕망이 작용한다. 그 어느 시대보다 자아가 강해졌기에 영리한 소비자는 더 이상 베블런 효과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 -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
Star Wars - SF를 안 좋아하는 나도 빠져들게 만든 별들의 전쟁 [내부링크]
조지 루카스 감독은 천재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에피소드 4~6편을 만들어놓고, 그로부터 20년 후 프리퀄 시리즈로 1~3편을 내놓았다. 이는 한 시리즈로 거의 30년을 우려먹겠다는 그의 곰국 같은 빅픽쳐 스타워즈의 배경은 그냥 터키다. 여긴 이스탄불에 있는 에미노뉴 항구의 모습을 빼다박았다.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 터키 목욕탕 하맘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카파도키아, 동부의 아나톨리아 고원 고즈넉한 호수마을 우준괼 물론 건물 양식은 좀 다르지만 터키가 아닌 것 같은 유일한 배경 여긴 이과수 폭포에 잔디만 CG 처리한 듯 이렇게 이국적인 배경과 SF적인 배경이 번갈아 나오며 사람 혼을 쏙 빼놓는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3은 관능의 대명사 나탈리 포트만이 우아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온 유일한 영화가 아닐까 싶다. 에피소드 4~6에서 캐리 피셔가 뭍 남성들의 성적 환타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할 만큼의 관능미가 강조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대조적인 구도가 명
안경, 2007 - 카모메 식당의 기적 다시 한번 [내부링크]
(포스터 출처: 일본 홈페이지에서 캡처했는데 지금은 폐쇄됨) <카모메 식당>에 매료되어 고바야시 멤버들이 나온다는 이유로 가볍게 봤다가 묵직하게 감동받은 영화 <안경>. 다음 여행지는 일본이라며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래 놓고 결국 못 가게 됐지만) 먹방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90~2000년대 작품만 한 게 없고, 그중에서도 일본 먹방은 역시 고바야시 멤버들이 나온 것만 한 작품이 없다. 여기서 고바야시 멤버란 <카모메 식당>(제일 처음 본 작품이어서 늘 이게 기준이 된다)에 나오는 고바야시 사토미, 모타이 마사코, 카타기리 하이리, 그 외 카세 료와 이치카와 미카코 등인데, 이중 고바야시와 마사코와 카세 료 3인방은 늘 세트로 고정 출연하는 듯하다. 딱 하나 예외인 게 <카모메 식당>에서 카세 료가 빠진 건데, 일본 남자 캐릭터 자체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제목이 <안경>이다. 처음엔 출연진들이 죄다 안경을 쓰고 나오는 매우 단순한
미래를 걷는 소녀(東京少女), 2008 - 시간은 떨어져 있어도 너의 마음은 느낄 수 있어 [내부링크]
촌스런 포스터에 깜빡 속아서 금쪽같은 영화를 놓칠 뻔했다. 감히 포스터를 이 따위로 만들다니ㅡㅡ; 웜홀을 통과 중인 미호의 핸펀 이런 식상한 장면을 보고 영화 끌까? 했는데, 핸펀이 메이지 시대의 토키지로에게 떨어지고, 핸펀을 찾고자 전화를 건 미호와 기적처럼 연결된다. 여기까지 보고 <기묘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끌까? 했는데.. 저 보름달을 중심으로 구성한 촌스러운 화면이라니ㅡㅡ; 그러나 달은 중요한 매개체였다. 달이 떠야만 전화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것.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맞춘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밤마다 통화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 달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 통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둘은 달이 뜬 대낮의 데이트를 약속하는데, 100년을 넘나들며 같은 곳을 돌아다니고, 같은 가게에서 카레를 먹고, 그러다 100년 동안 변함없이 남아있는 가게 '에리젠'에서 토키지로는 거울을 사서 미호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100년 후 다시 그
호타루의 빛, 2007 - 부쪼에 의한, 부쪼를 위한 드라마 [내부링크]
순정 만화 같은 오프닝 그러나 반전 대박 밖에서는 상큼한 OL 호타루(아야세 하루카) 집에서는 추리닝 패션에 머리는 고무줄로 질끈 묶고, 필요한 물건은 반경 1m 내로 세팅해주는 센스 미팅보다는 집에서 맥주 마시고 자는 게 더 좋은 건어물녀 근데 다들 집에서 저러고 있지 않나? 회사에서도 저런 스타일을 허용한다면 지금보다 능률이 200%는 오를 텐데. 아무튼, 바짝 말라버려서 더 이상 물기라곤 없는 건어물녀에게도 사랑은 오는가. 까칠한 부쪼의 저 눈빛을 사랑한다. 완전 일본판 강마에ㅋㅋ 호타루와 동거하면서 까칠함이 점점 해빙되어가는 그 건어물녀와 까칠부장의 알콩달콩 동거 이야기 그러던 중 건어물녀를 짝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났다. 잘생기고 키 크고 유학파에 능력 있는 사내 킹카 마코토꿍 부쪼랑 동거하는 걸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다 술로 보내버리는 두 사람. 얘를 어째쓰까이... 부쪼는 나름 신경 써준다고 둘을 회의실에 가둬버리지만, 이에 대한 호타루의 응징은 욕실에 3시간 동안 부쪼님 가
프로포즈(The Proposal), 2009 - 산드라 블록은 늘 옳다 [내부링크]
간만에 산드라 블록의 로코물로 기분 전환 제대로 했다. 폭력 남발할 때 은근 섹시한 그녀 이번엔 프로페셔널한 역인데, <당신이 잠 든 사이에>의 루시가 자꾸 겹친다. 그래서 더 좋다. 그 영화를 너무나 애정하기에. 또 한 명의 훈남 발견 보스를 무릎 꿇리다니 요거요거 선수 아냐?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알래스카에 가고 싶어진다. 헐리웃 영화는 늘 강렬한 조연이 등장한다. 여기선 이 할매가 그 역할인 듯. 라이언 레이놀즈랑 이 할매 중에 선택하라면 난 이분을 선택할 거다. 인생은 즐거움이야.ㅋㅋ
호타루의 빛 2, 2010 - 부쪼와의 재회 [내부링크]
드디어 호타루의 빛 2탄이 나왔다! 2년 만인가. 심상찮은 오프닝 웬 리우 카니발 복장ㅡㅡ? 심각한 분위기조차 코믹 버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이 드라마의 매력 나오, 당신은 어떤 복장을 해도 멋지구려. 시즌 2의 주제는 '결혼'이다. 3년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호타루를 기다리며 결혼을 결심한 부쪼 덩달아 열심히 노력하는 호타루 그러나 천성이 건어물녀라 하는 일마다 실수 투성이에 설상가상 젊고 탱탱한 경쟁자까지 붙었다. 불혹에 접어든 부쪼, 늘어지기 시작한 피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 마루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ㅋㅋ 기획부 선배의 결혼식 부케는 누가 받았을까? 이번엔 부쪼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고, 건어물녀가 기다리게 되는 반전 저 얼굴에 저 멘트라니 그러니까 드라마다...
신이 맺어준 커플(Rab Ne Bana Di Jodi), 2008 - 아므릿사의 로맨스 [내부링크]
시작은 고요한 암리차르(Amritsar) 현지 발음으로는 '아므릿사' 간만에 보는 인도의 권오중 샤룩칸(1965) 그를 처음 본 건 2002년 인도 여행 당시 개봉했던 <Devdas> 인도 여신 애쉬와 화려한 춤의 향연에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멜로물을 하고 있다니 역시 인도의 국민배우답군. 지도교수의 딸 결혼식에 갔다가 곧 유부녀가 될 그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며 펩시를 빨고 있는 샤룩 갑자기 신랑이 죽는 바람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샤룩이랑 결혼하게 되는 타니 손등의 맨디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남자에게 맡겨지는 그녀의 인생도 참 기구하구나. 거듭된 충격으로 먹지도 자지도 않는 타니 그런 그녀를 어찌할 바 모르며 지켜보다 혼자서 아침 먹고 출근하는데, 그의 하루는 이 한마디로 시작된다. 회사에 결혼했단 소문이 퍼지자 집들이 하라며 볶아대는 동료들 급기야 집까지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아리따운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타니 손님보다
수박, 2003 - 셰어하우스라면 해피니스 산챠처럼 [내부링크]
요즘 전에 없이 드라마에 관심이 생겨 여러 작품을 찾아보다가 역시 1990~2000년대 감성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드라마는 스토리는 쫀쫀해도 너무 자극적이어서 없는 사악함도 생길 지경이니. 그래서인지 힐링 슬로 라이프를 추구하는 고바야시 사단의 작품이 새삼 그리워진 건지도 모르겠지만. 때는 바야흐로 1983년, 시원한 수박이 당기는 한여름 동네 개울가에서 28점짜리 시험지를 몰래 태우던 하야카와는 1999년이 되면 *하루마게돈으로 지구가 멸망할 테니 시험지를 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쌍둥이 자매를 만나는데, *하르마게돈(아마게돈): 신약성서 요한 묵시록 16장 16절에 최후의 날 세상의 선과 악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 예언된 지명으로, 재앙, 종말 등을 의미 그로부터 20년 후인 2003년,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이 무색하게도 지구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고, 소녀 시절 28점을 받은 하야카와(고바야시 사토미)는 커서 신용금고 직원이 되었다. 당시 기준으로
조다악바르(Jodhaa Akbar), 2008 - 리틱 앓이 [내부링크]
우다이푸르까지 포스팅을 마친 시점에서 라자스탄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바로 인도의 광개토 + 세종대왕이라 할 수 있는 악바르 대제와 그의 황후 조다의 러브 스토리 포스터만 보면 지루한 발리우드식 시대극 같지만, 그림 동화를 읽는 듯 편안한 오프닝으로 시작되고, 덤으로 자이푸르의 암베르성과 아그라의 레드포트를 투어하는 것보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점, 특히 여인들만 거주하는 금남의 공간이자 오직 왕만이 출입할 수 있었던 하렘(harem)이 그대로 노출돼서 신기하기도 했다. 또한 무굴 제국과 라지푸트(라자스탄)족의 의상과 음식, 종교와 결혼 풍습이 화려하게 어우러져 지루한 발리우드 춤판이 아닌 화려한 궁중 무예가 펼쳐지고, 노래는 거의 찬팅에 가깝도록 성스러웠다. 정중앙에 있는 저분은 발리우드의 엔니오 모리꼬네라는 A.R. Rahman <슬럼독 밀리네어>의 엔딩곡으로도 유명한 뮤지션이다. 그의 청아한 목소리가 한껏 두드러지는 'Khwaja Mere Khwa
English Vinglish, 2012 - 자존감을 잃어버린 엄마라면 스리데비처럼 [내부링크]
이름처럼 우아한 그녀 맛난 라두 짜이보단 커피 충분히 비범한데, 여자, 엄마, 아내, 며느리라는 틀에 가둬두려는 답답한 사회 정말 말 그대로 사슴 같은 눈망울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외국으로 떠나게 된 그녀 두려움에 눈물도 흘리지만, 강렬한 카메오로 등장한 아미탑 바찬 할배 Every first experience is special. So enjoy surely, definitely, confidently. All the best. 어눌한 영어로 커피를 주문하다 당황해서 도망친 그녀에게 다가와준 프렌치 훈남 그도 영어가 서툴다. 그러나 따뜻하다. 커피처럼. 지나가던 버스의 영어학원 광고를 보고 즉흥적으로 등록한 샤시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된 프렌치 훈남 로랑 처음엔 어리바리하던 그녀가 영어 좀 배우더니 바로 뉴요커로 변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의 독특한 우정도 볼 만하다. 어느 날 선글라스를 쓰고 출근한 강사 게이 애인과 헤어지고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다는. 이에 늘 침
Home, 2012 - 태국의 금싸라기 감성 영화 [내부링크]
부천영화제의 2번째는 쑤가 추천한 태국 영화 <홈> 그녀의 영화, 드라마 지식은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경이롭다. 내 문화생활에 크나큰 영감을 준 그녀 폴란드에서 쑤를 만난 건 아무래도 운명이었나 보다. 두 소년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첫 번째 이야기 이 동생, 처음엔 교정기 끼고서 바보같이 웃더니 점점 귀여워지려고 한다. 내가 왜 너를 찍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에피소드는 사별한 남편의 추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여자 이야기 아프지만 지나간 사람은 보내주어야 한다. 뒤돌아보지 말 것. 그러면 미련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 실컷 울어요. 그를 보내줄 수만 있다면. 세 번째는 결혼식 전날 심란한 신부 이야기 신부보단 저 친구와 이모님의 표정이 압권이다. 귀요미 남동생도ㅋ 보톡스 때문에 인상을 쓸 수 없는 이모님의 놀란 표정 이 친구 표정도 이모님 못지않다. 완전 맘에 드는 캐릭터들ㅋㅋ 그리고 귀요미 남동생 피치(Pchy)라는 태국의 가수 겸 배우라고 한다. 아, 이모님 끝까지
천리주단기, 2005 - 철도원 아저씨와 장예모 감독의 케미 [내부링크]
리장(麗江)이 나온다고 해서 봤는데, 첫 화면부터 일본 배우들과 일본어가 난무하는 일본 영화 헷갈리기 전에 확인해본 바, 감독은 중국 영화의 거장 장예모 주연 다카쿠라 켄은 <철도원>의 푸근한 그분 여기서도 묵뚝뚝하지만 부성애 쩌는 아버지로 나온다. 간암 말기인 아들이 미처 촬영하지 못한 '천리주단기'를 대신 촬영하러 말도 안 통하는 중국으로 날아가는데, 천리주단기(千里走单骑)는 '단기로 천리를 달리다'라는 뜻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의리를 노래한 가면극이다. 리장 고성의 골목은 거대한 미로라더니 몇 장면 채 나오지 않아서 장소는 리지아춘(李家村)으로 옮겨간다. 난 리장에 더 머물고 싶은데. 영화의 간접 체험은 그래서 늘 목마르다. 실컷 리지아춘으로 갔더니 천리주단기의 거장 리지아민은 그동안 감옥에 갔다는 황당한 설정 2~3년 후에나 출소한다는데, 오늘내일하는 아들을 위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 장면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후에 리지아민의 아들이 사는 깡시골로 배경이
마더워터(Mother water), 2010 - 고바야시 멤버 어게인 [내부링크]
고바야시 사단이 또 총출동했다. 고바야시 사토미, 이치카와 미카코, 카세 료, 모타이 마사코, 미츠이시 켄, 거기다 <수박>의 코이즈미 쿄코까지. 그래서 기대했는데 이건 잔잔해도 너~~무 잔잔해서 지루해 죽을 뻔... 그래도 <빵과 수프, 고양이와 함께 하기 좋은 날>과 같은 마츠모토 카나 감독 작품이라 의리 포스팅 중 참고로 마더 워터(Mother water)는 위스키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 특히 지하수를 의미하며, 극 중 사람들이 단골로 주문하는 미즈와리(水割り)는 '물을 섞음'이란 명사형으로 위스키에 물을 부어 묽게 만든 버전이라는데, 이때 마더 워터를 사용해야 가장 맛이 좋다고 한다. 시작은 아기와 엄마... 근데 엄마가 카나다. 카나가 이 영화에 출연했다더니 첫 장면에 잠깐 나왔었구나. 신비로운 비주얼에 걸맞게 신비주의로 나왔다 사라지는 그녀. 영화에서도 현실에서도... 바를 운영하는 세츠코(고바야시 사토미). 술집이라 당연히 영업은 저녁에만 하고, 파는 것도 위스키 한
런치박스(Dabba), 2013 - 잘못 탄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준다 [내부링크]
남편을 위해 매일 정성을 다해 도시락을 싸는 일라(Nimrat Kaur) 하지만 남편의 입맛이 까다로운지 그녀의 요리 솜씨가 신통찮은지 늘 도시락을 남겨온다. 그래서 도시락 쌀 때마다 신경 쓰고 상처받고... 인도의 가부장들은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ㅡㅡ+ 어느 날 남편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도시락이 배달되고... 도시락 배달부라는 게 진짜 있었구나. 조금이라도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점심 시간에 맞춰서 집집마다 도시락을 수거 후 각 회사로 배달하는 인도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를 영화에서 보다니 신기하네. 참고로 잘못 배달받은 저분은 <파이 이야기>의 엔딩을 강렬하게 마무리해준 연기파 배우 이르판 칸(Irrfan Khan) 이번엔 상처(喪妻)하고 정년을 앞둔 노신사 사잔 역으로 나왔다. 집밥 먹은 지 오래된 사잔은 일라의 도시락을 맛있게 싹싹 긁어먹고, 도시락이 텅텅 비워진 채로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하지만, 곧 도시락이 바뀌었음을 알고, 다 먹어준 이름 모를 그 사람에게 보답으로
Devdas, 2002 - 마살라 무비의 끝판왕 [내부링크]
시작부터 두르가 여신이 나오는 심하게 힌두스러운 영화 삐까뻔쩍한 귀족 데브다스의 집으로 오프닝이 펼쳐진다. - 나의 아들 데브다스가 돌아온대. - 두르가 여신이여, 감사합니다. - 데브는 어딨지? - 오는 도중에 빠로를 보고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데브보다 계급은 낮지만 나름 부자인 대지주 빠로의 집 소름 끼치도록 예쁜 애쉬를 처음 본 순간 홍콩 영화 <백발마녀전> 같은 으스스함을 느꼈다. 확실히 옛날 거라 화질도 별로고, 춤사위는 더욱 화려하고, 음악은 제대로 인도 정통이다. 역시 샤룩은 느끼한 역에 제일 잘 어울려. 반살리 감독 특유의 과장된 디테일 귀족 집안의 아들과 대지주의 딸은 맺어질 수 없다며 결국 두 집안은 원수가 되고, 졸지에 인도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어버린 두 사람 홧김에 데브다스는 빠로에게 이별의 편지를 쓰고, 빠로도 홧김에 부유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린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빠로가 시집가는 날 찾아온 데브다스 부잣집으로 시집갔지만, 남자는 죽은 전
람릴라(Ram-Leela), 2013 - 최고의 영상미, 그러나 남주는 미스 캐스팅 [내부링크]
람릴라, 람과 릴라 조다악바르, 조다와 악바르 중간에 조사가 없으면 제목이 한층 고급진 느낌 산제이 릴라 반살리 감독의 꽤 최신작 이분의 작품에서 스토리는 영상미에 양보해야 한다. 프리앙카 초프라가 중간에 나온 것 같은데, 디피카 파두콘이랑 얼굴이 잠시 헷갈렸다. 그러고 보니 둘의 이미지가 꽤 비슷한 듯. 아름답게 육감적인 것까지 닮았어. 물동이와 매캐한 땡초와 라자스탄 스타일의 수공예 퀼트 하지만 이곳의 배경은 마노즈 아빠와 빠룰 엄마가 살고 있는 구자라트 주 하누만은 람 신의 보좌관이었다. 시바가 아니라. by 라마야나 깜짝이야... 처음 보는 란비르 싱 시크교도답게 완전 펀자비하게 생겼다. 총기가 난무하는 마을의 족장 아들 한마디로 있는 집 자식 뭔가 결단력 있어 보이지만 시종일관 한량으로 나온다. 홀리의 춤판이 벌어지고 있는 릴라의 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만난 두 사람 뭐야? 휴대폰을 쓸 수 있는 시대였어?? 갑자기 반전ㅡㅡ; 암튼 이렇게 원수 가문의 두 자식은 연애질을
피케이(PK), 2014 - 인도판 별에서 온 그대 [내부링크]
김수현 만큼이나 외계인 같은 아미르 칸 PK(Peekay)는 힌디어로 '취했냐, 사기친다' 뭐 이런 뜻으로, '구라쟁이' 정도의 애칭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참고로 저 목걸이 리모콘은 <라원>에서 샤룩의 심장과 비슷해 보인다. 역시 발리우드는 우려먹기의 달인이야. 그 넓은 지구 중 하필 인도의 라자스탄에 내릴 건 또 뭔가. 사기가 판을 치는 이곳에서 내리자마자 리모콘을 도둑맞는 피케이. 저렇게 알몸에다가 보석 같은 걸 보란 듯이 달고 있었으니, 쯧쯧... 여기는 벨기에 브뤼헤 팔자주름이 늘 한결 같은 Anushka Sharma 여자 이름이 '자구'가 뭐람ㅡㅡ; 운명처럼 만난 히두스타니 자구와 파키스타니 사르파라즈(Sushant Singh Rajput) 하지만 잘못 전달된 편지(wrong number)가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 상처 받은 채 델리로 돌아온 자구 그런데 델리의 상징인 꾸뜹미나르나 찬드니촉이 아닌 하누만 신상을 제일 먼저 보여준다. 이 영화는 신과 종교의 메카인 인도의 세
산이 울다(喊山), 2015 - 나도 울었다 [내부링크]
영화를 보는 내내 풍경에 빠져들었다. 저긴 도대체 어디일까. 아름다운 풍경만큼 영화의 사연이 더 슬프게 다가온다. 여운이 참으로 길다... 뭔가 사연이 많아 보이는 어르신 늘 말을 아끼지만 중요한 타이밍에 결정적 역할을 해준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상대를 헤아려주는 그의 삶의 내공에 놀라고,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한없이 즉흥적인 아들의 등장에 두 번 놀란다. 이 고립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홍시아 나이 많은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벙어리 이것이 그녀의 첫인상이다. 남편이 산에 갔다가 사고사를 당했는데도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는 그녀 남편의 무덤을 천천히 돌아보다 밝혀지는 그녀의 무서운 과거 그녀의 표정 연기에 소름 돋았다. 차라리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오히려 미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다. 표정으로 모든 걸 말해주는 홍시아 이 배우 참으로 매력적이야. 아마 목소리가 나왔다면 표정이 이렇게 도드라지진 못했을 것이다. 후에 나온 영화 <상애상친>에서 그걸 느꼈으니.
더 뉴 클래스메이트(Nil Battey Sannata), 2015 - 엄마도 꿈이란 게 있답니다 [내부링크]
이렇게 소녀 같은 엄마가 어딨나요. 비록 학교도 못 나오고 가정부로 근근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성실한 덕분인지 좋은 주인을 만났다. 고령에도 요가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주인 할매가 말씀하셨지.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배움이 늘 아쉬웠던 엄마는 학교에 가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딸이랑 같은 학교, 같은 반. 공부는 재미있는데, 자꾸 의식하는 딸이 신경 쓰인다. 엄마의 이런 고민과 심리 묘사와 잘 어울리는 OST 인도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은 깨알 같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선사한다는 것이다. 저 강이 있는 풍경은 도대체 어디일까 궁금했는데, 야무나 강이었다. 엄마와 딸은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응원하며 OST 한 곡 더 추천해본다.
산의 톰씨, 2015 - 고바야시 멤버들의 리틀 포레스트 [내부링크]
아주 오래전에 봤다고 생각했는데, 고바야시 멤버가 나온 작품 중 그나마 최근에 본 거였다. 그래서인지 특유의 인생철학이나 슬로 라이프 느낌은 여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한물간 듯한 느낌도 드는데, 아마도 비슷한 콘셉트의 <리틀 포레스트>가 2014년에 나온 까닭이리라. 심지어 원작 만화가 이가라시 다이스케가 직접 전원생활을 한 경험을 토대로 <리틀 포레스트>를 썼다는 것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산의 톰씨> 주인공 하나(고바야시)가 되었으니 영락없이 베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끝까지 본 건 극작가가 바로 소설 <카모메 식당>과 <빵과 수프, 고양이와 함께 하기 좋은 날>을 집필한 무레 요코이기 떄문에... 조카와 함께 시골집으로 가는 하나(고바야시 사토미)에게 버스가 방금 지나갔다고 알려주는 동네 슈퍼 주인은 다름 아닌 마사코 할매. 늘 고바야시 작품에 함께 등장하는 단골 배우로, 이번에도 역시 몇 장면 안 나왔지만, 마지막쯤 크게 한 건 하신다.ㅋㅋ 아무렇지 않
천카이거의 요묘전, 2017 [내부링크]
<패왕별희>의 천카이거 작품 오랜만이군. 포스터만 보고 지나치려 했으나, 요즘 대륙의 작품에 푹 빠져 있는 중이기에, 그리고 <홍길동전>처럼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한없이 모호한 얘기가 아니라 당나라의 유명한 두 시인을 등장시켜 30년이란 시간을 넘나드는 시대극이란 최애 장르이기에 유치빤스 포스터를 생까고 감상하기로 한다. 백거이, 당신 사관이었군요. 배우가 이제훈을 좀 닮았다. 황제의 병을 치료하러 온 퇴마사 쿠가이와 궁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친구가 되는 두 사람 이것이 장안의 모습이었던가. 뭔가 1건 할 것 같은 마술사 아저씨 - 단역 치고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함산>의 그 아저씨였다. 사실 영화는 이 검은 고양이로 시작하지만, 백거이에 꽂혀서 요묘는 이제서야 등장ㅡㅡ; 진운초와 아리따운 부인 춘금은 영화 시작을 위한 희생양인데, 희생양치고 춘금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 춘금이 읊은 시가 이백의 시임을 안 백거이 그 시의 주인공은 바로 귀비 양옥환 잘생긴 수박 아저씨 또 등
첨밀밀 3 - 소살리토, 2000 [내부링크]
예전엔 스토리가 완전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소에 가서 다시 보니 제대로 센치해져서 말잇못... 솔직히 스토리는 말도 안 된다. IT 천재이자 잘나가는 기업 대표가 애 딸린 이혼녀 택시 기사랑 사랑에 빠지다니. 이 영화감독이 <무간도> 시리즈도 찍었었는데, 여명이 페르소나인가? 3탄에서 냉동인간 그가 등장해서 심쿵했더랬지. 늙지도 않아요, 저 올바른 오양은. 오프닝에서 장만옥이 바라보는 곳이 샌프란이고, 그녀가 앉아 있는 여기가 바로 소살리토. 예술가지만 생업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장만옥이 동경하는 곳이기도 하다. 택시 기사라는 직업을 빌미로 금문교를 뻔질나게 들락거리는데... 여명은 정말 오양이 반듯해. 영화 제목인 소살리토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온 카스트로 지역. 저 건물 주의 깊게 봐뒀었는데, 카스트로 입구에 떡하니 서 있을 줄이야. 장만옥도 참 오묘한 매력을 지녔어. 영화 속 여명의 집 대박이군. 이집 옥상이 영화 포스터에 나온 거기이고, 여기가 바로 소살리토다. 하지
카모메 식당, 2006 - 지금 잘 살고 있나요? [내부링크]
시작부터 뚱뚱하고 못생긴 갈매기가 나오는 이 영화의 배경은 놀랍게도 핀란드. 안 가봤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영화로나마 잠시 둘러보니 유럽의 여느 광장과 골목의 모습에 항구도시의 면모까지 겸비한 수도 헬싱키가 참으로 매력적이다. 그래서 가보고 싶어졌다. 특히 이 식당. 작지만 행복이 깃든 곳, 그 이름 카모메. 카모메는 일본어로 '갈매기'란 뜻이다. 핀란드어로는 lokki. 그 앞에 있는 ruokala는 당연히 식당이란 뜻이겠고. 핀란드 배경에 일본 식당이라... 단아함이 매력인 고바야시 사토미. <카모메 식당>을 보고 나서 이분한테 매료되어 출연한 작품을 싹 다 찾아보니 이분만의 콘셉트와 분위기가 있더라.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도 거의 정해져 있고. 여기서도 그 조합이 나오는데, 나는 그들을 '고바야시 사단'이라 부른다. 출연하는 작품의 제목이나 내용은 달라도 늘 한결같이 등장하는 배우들의 조합이 절대 지루하지 않으면서 이번엔 어떤 명대사와 철학을 던져줄까 기대하게 만드니 그야말로 '
동감, 2000 - 다른 시간 속 같은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부링크]
20년이 지나서 다시 봐도 여전히 명작이다. 이런 스토리, 영상미, 그리고 그때 그 시절 감성까지... 이런 명작은 절대 두 번 나올 수 없어.ㅠㅠ 극 중 신라대학으로 나오는 이곳은 대구의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고등학생 때 서클 모임 때문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예쁘다 싶었던 교정을 영화로 보니 그 아름다움이 배가된 느낌이다. 그리고 공사 중인 저 시계탑은 실제로 보면 그닥 인상적이진 않은데, 영화 속 두 주인공의 서로 다른 시간대를 깨닫게 하는 매개체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풋풋한 김하늘, 참 늙지 않는 배우다. 그녀가 짝사랑하는 선배 역의 박용우 또한 한결같은 꽃미남이군. 선배 보러 왔다고 왜 말을 못 하고... 애꿎은 무전기만 챙겨 들고 나오는 그녀ㅡㅡ; 그렇게 우연히 득템한 무전기가 전혀 다른 인연을 몰고 왔으니 - CALLING CQ CQ CQ. 여기는 DS1AVO. 텔타 시에러 원 알파 빅토르 오스카... 갑자기 시간이 훌쩍 건너뛴 것 같은 미래소년
오늘도 지친 그대, 커피 한잔 할까요 [내부링크]
커피 한 잔이 무지하게 당기던 날, 우연히 제목에 이끌려 보게 된 카카오tv 웹드라마 <커피 한잔 할까요>. 포스터만 보고 예전에 다음 웹툰에서 봤던 <커피와 하루>가 드라마화된 건가 했는데, 이건 허영만 작가의 2016년도판 만화책이 원작이었다. 아마도 동네 귀퉁이에 카페가 붙어 있는 것과 손님들의 사연을 소소하게 엮어가는 설정이 비슷해서 착각한 듯. 알고 보면 카페 사장과 종업원 캐릭터부터 정반대인데 말이지. 공시에 떨어지고 잔뜩 낙심해서 집에 돌아가던 주인공 눈에 띈 이 카페, 조용한 동네 안에 잘도 녹아들어 있어 평소엔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출근 시간, 점심시간엔 웨이팅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었다는. 게다가 깜빡 잠이 든 주인공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새로 한 잔 더 내려주는 센스와 'God shot'을 부르는 극강의 맛에 반한 주인공은 여기서 커피를 배우기로 결심한다. 물론 처음부터 덜컥 직원으로 고용된 건 아니지만. 선생님 커피를 마시고 제 인생 계획이
근대 커피향 가득한 영화 <가비> [내부링크]
대구 근대골목 하니까 생각나는 근대 배경의 커피 영화 <가비>. 하고많은 근대 영화 중 하필 이 영화가 생각난 이유는 암울하면서도 화려하고 낭만적인 '모던 타임즈'를 한 폭의 그림처럼 화면 속에 가장 아름답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두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는 그닥 흥미롭지가 않다. 오히려 박진감 넘치는 시대상과 조선 왕실을 둘러싼 갈등 요소를 방해하는 느낌도 드는데, 넌 기와집 속에 갇혀 살지 말거라. 러시아 말을 배우거라. 세계를 누리며 살거라. 라는 선친의 유언을 받들어 러시아어를 배우고 세계를 누리며 하는 짓이 하필 열차 강도라는ㅡㅡ; 증기기관차 시절의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나와서 <놈놈놈> 같은 분위기인가 싶다가도 갑자기 커피를 따르고 연애질을 하며 앞으로 진중하게 흘러갈 영화를 한없이 가볍게 만드는 두 주인공의 러브 라인은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군다나 혼자서 N:1로 적을 무찌르는 설정은 남녀 불문하고 현실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단 말이지.
인천 개항장으로 다시 보는 <미스터 션샤인> [내부링크]
인천 개항장을 다녀오니 개항기 제물포항(인천항의 옛 이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생각나서 연이어 포스팅해 본다. 엄밀히 말하면 촬영은 논산 세트장(선샤인랜드)에서 진행됐지만, 각 장소에 영감을 준 곳이 바로 인천 개항장이기에 여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드라마를 아니 떠올릴 수가 없더라. 한동안 '션샤인' 대신 '선샤인'으로 알고 있었을 정도로 제목이 요상한 이 드라마는 1871년 신미양요를 기점으로 막 개화기가 시작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일본과의 강화도조약(1876) 이후 미국(1882), 영국/독일(1883), 이탈리아/러시아(1884), 프랑스(1886),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92)에 이르기까지 열강들의 파워게임 속에서 흔들리는 조선에 존재했던 각양각색의 인물을 그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병, 뜨겁고도 의로운 그 이름,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무명의 용사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는 양반도 있고, 중인도
우린폭망했다(WeCrashed) - 애덤 뉴먼보다 레베카 뉴먼 [내부링크]
세계적인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WeWork)의 흥망성쇠를 그린 드라마 <우린폭망했다(WeCrashed)> 이 드라마를 보면서 스타트업과 자영업의 차이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이라 소문난 곳 중에는 허울뿐인 기업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으며, '상장 뒤 주가 부진한 유니콘…벤처투자붐이 만든 거품 탓' 상장 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유니콘(unicorn) 기업들과 관련해 그 원인이 벤처투자 붐이 만든 버블(거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기업 육성을 천명한 한국 정부가 유니콘 수와 같은 양적 지표.. www.sedaily.com 세계 최고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미국이라도 기업 내 성평등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이는 위워크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퇴출당한 우버의 전 CEO 트래비스 캘러닉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드라마 말미에 관련 뉴스를 보여줌으로써 위워크 CEO인 애덤 뉴먼의 행보와 묘하게 일치되어 텐션이 장난 아
나의 해방일지 - 각자의 삶에서 해방되어가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내부링크]
처음엔 제목만 보고 그닥 당기지가 않았었다. 나오는 출연진도 딱히 선호하는 배우가 없었고, 아웃-서울 한 지도 한참 된 마당에 서울도 아닌 경기도 끄트머리에 사는 삼남매 이야기라니. 그런데... - 밝을 때 퇴근했는데 밤이야. 저녁이 없어. - 팔자가 뭐냐. 심보래. 그럼 심보가 뭐냐. 내가 심보가 아주 잠깐 좋을 때가 있어. 월급 들어왔을 때 딱 하루. 돈 있으면 심보는 좋아져. 돈이든 남자든 뭐라도 있으면 심보는 자동으로 좋아져. 근데 내가 돈이 있니 남자가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디서 힘이 솟니. - 왜 나만 건너뛰어? 다 사귀면서 왜 나만 건너뛰어? 나보다 이쁜 여자는 있어도 나보다 매력적인 여자는 없어. 나는 매력자본이 어마어마한 여자야. 라며 금쪽같은 명대사를 매우 찰지게 구사하는 이엘 배우에 이어 - 뉴욕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하필 계란 흰자에 태어나갖고... - 솔직히 전 깃발 꽂고 싶은 데가 없어요. 돈, 여자, 명예 어디에도. 깃발을
우리들의 블루스 - 명대사 말고 명연기 [내부링크]
개인적으로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냥 <그들이 사는 세상>,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디어 마이 프렌즈>가 재미없어서... 그런데 이번엔 제목도 식상하고, 거기다 익숙지 않은 제주도 배경에 제주도 사투리까지 나오는데, 출연진은 <디어 마이 프렌즈>에 버금갈 정도로 화려하다. (하지만 놀라기엔 아직 이르다. 옴니버스식이라 초호화 출연진이 매회 추가된다는.) 유명 연예인들이 제주도 시장에서 저러고 있으니 <삼시세끼>나 <윤식당> 같은 버라이어티 예능을 보는 것도 같은데, 그중에서도 난 이분한테 꽂혔다.ㅋㅋ 보통 잘생긴 배우들이 저런 역을 하면 아무리 없어 보이게 꾸며도 화보인데, 이병헌은 정말 너무 리얼하단 말이지. 저래서 연기의 신이라 불리는 건가.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이후로 최근에 본 지지리궁상 캐릭터 중 최고였다. 이병헌에 이어 지지리궁상 레전드 2탄은 차승원. 순간 <삼시세끼 어촌편> 보는 줄.ㅋㅋㅋ 오랜만에 보는 신민아 배우의 오열
세일즈맨 칸타로의 달콤한 비밀 - 가보지는 않았지만 도쿄 맛집 탐방 [내부링크]
원작 만화 표지(출처: 아마존)와 드라마 포스터(출처: 나무위키) 하기와라 텐세이의 만화 <사보리만 아메타니 칸타로>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세일즈맨 칸타로의 달콤한 비밀>은 <고독한 미식가>의 디저트 버전쯤 될 것 같다. 둘 다 만화가 원작이라 과장되고 유치한 연출, 거기다 일본 특유의 독백과 오바 리액션이 꽤 많이 나오는데, <고독한 미식가>가 매회마다 밥집 한 군데를 소개한다면 이 드라마는 도쿄의 디저트 가게를 아주 맛깔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 칸타로(오노에 마츠야)의 병맛 리액션을 보고 있자면 아무리 맛있는 디저트가 나와도 식욕이 뚝 떨어지는 반전... 그럼에도 "굳이" 끝까지 챙겨보게 된 건 프로그래머에서 출판사 영업직으로 전업한 그의 상황이 비슷한 직군으로의 교차를 겪은 나의 상황과 묘하게 오버랩됐기 때문이다. 주말 없이 사무실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S/W Engineer로서의 고충을 나 역시 겪었고, 차라리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 다른
영화 <암살>의 미쓰코시백화점을 보며 이상의 <날개>를 생각했다 [내부링크]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항저우로 옮겨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암살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암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없이 암울한 시대였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의 근대 문물이 유입되면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기에 단순히 독립역사뿐만 아니라 근대식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었던 건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해당하는 미쓰코시백화점이었다. 1904년 도쿄 니혼바시에 1호점이 세워진 이래 일본의 근대 소비문화를 주도했던 미쓰코시백화점은 1930년 경성에 진출하면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의 부유층까지 사로잡으며 억압과 좌절 속에서도 당대 최고의 핫플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그 화려함의 극치였던 미쓰코시백화점이 바로 천재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이 쓴 <날개>의 배경이며, 일본에 있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 - 여행하는 기분 제대로 [내부링크]
포스터 출처: 넷플릭스 포스터만 보고 chick들이나 보는 거라며 제꼈는데, 가리늦게 꽂힌 이유는 바로 드라마를 보는 내내 여행하는 기분이 제대로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에서 만든 만큼 국뽕의 성향이 다분하여 프랑스인을 비하하고, 프랑스에 사는 이민자를 비하하는 내용도 적잖지만,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에밀리의 여행 패션 같은 출퇴근 복장이나 SNS가 늘 함께하는 일상, 길거리 빵집에서 고른 빵 한 조각에도 감동하는 소확행 같은 에피소드가 모두 여행에서 흔히 겪는 일상이라 맥주 한잔하며 힐링하기 딱 좋은 콘텐츠라는. 무엇보다 파리의 구석구석을 실제 여행하는 것보다 자세하게, 전지적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밤거리를 마구 쏘다닐 수 있는 것도 영화라서, 드라마라서 가능한 일. 에펠탑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에서 파티를 즐겨 본 적이 있는가. (물론 일 때문에 간 거긴 하지만.) 그러니 숙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올라가는 계단이 한없이 길어도 괜찮고, 실연을 당해도 괜찮다. 왜냐
미드 <그 땅에는 신이 없다> - 단순한 배경에 복잡한 서사, 그러나 떡밥 회수는... [내부링크]
오랜만에 서부개척시대 영화를 보니 폴란드 언니가 살고 있는 오클라호마가 생각나서 매핑해 봤는데, 예상대로 로턴과 라스베이거스 사이가 배경이다. 사건의 시작은 콜로라도주의 광산 마을 크리드, 전개는 뉴멕시코주의 폐광촌이자 여초 도시 라벨, 그리고 각 인물의 서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며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가서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ㅡㅡ; 콜로라도주와 뉴멕시코주라는 행정 구역은 다르지만, 어차피 저 동네는 황량한 들판이 대부분이고, 시기상 서부 개척과 골드 러시, 원주민 말살 정책이 맞물려 있는 데다 아직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시절이라 극 전개도 총잡이 무법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 버린 느낌이다. 출처: 나무위키 그럼에도 정주행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강렬한 포스터 한 장 때문에, 심지어 저기 나온 여인이 <다운튼 애비>의 고고하기 이를 데 없는 매리 크로울리 역의 미셸 도커리이기 때문이었다. 영국 유서 깊은 가문의 애기씨가 이런 억센 서부극에 나올 줄이야
모리사키 서점의 하루하루 - 도쿄 헌책방 거리 진보초 여행 [내부링크]
뒤늦게 책방 문화에 꽂혀서 찾아본 <모리사키 서점의 하루하루> 영화 제목은 저렇지만, 원작은 <모리사키 서점의 나날들>이라는 소설이다. 뭐 '하루하루'나 '나날들'이나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나날들'이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2010년도 작품이라 화질은 별로지만, 저 햇볕 따사로운 골목 씬이 너무 좋아서 장면장면 모두 소장하고 싶었던 영화. 참고로 저 장면은 오프닝이 아니라 엔딩이고, 오프닝은 이렇게 남친한테 차이는 장면으로 뜬금없이 시작된다. 정말 뜬금없는 것이, 저 인간이랑은 1년 반이나 사귀어왔고, 회사 동료에 심지어 결혼 상대도 같은 회사 여직원이라는. 그런 이유로 요런 삼자대면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지자 멘털 약한 여주는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데, 때마침 헌책방을 운영하는 삼촌이 허리를 다쳐서 오전에 병원 다녀올 동안 책방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백수 조카한테 콜한 것. 심지어 책방 2층엔 부엌과 욕실 딸린 방도 있단다. 여주 완전 개부럽... 세심한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 2013 [내부링크]
요즘 영상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전에 없이 드라마나 영화에 관심이 생겨 작품을 찾아보다가 역시 1990~2000년대 감성만 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드라마는 스토리는 쫀쫀해도 너무 자극적이어서 없는 사악함도 생길 지경이니. 그래서인지 힐링 슬로 라이프를 추구하는 고바야시 사단의 작품이 새삼 그리워진 건지도 모르겠지만. <카모메 식당>에 이어 무레 요코의 소설을 또 한 번 원작으로 한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은 영화라기보다 편당 50분 길이의 4부작으로 이루어진 초초초 미니 시리즈로, 영화 2편에 해당하는 길이 안에 주인공이 업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소소한 동네 풍경과 멋스러운 상점,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이웃과 직원과 손님을 넘어 가족 같은 인류애를 적절히 버무려 잔잔하지만 울컥하게, 보는 내내 스스로 착해지고 싶게 만드는 최첨단 힐링 휴먼 먹방 드라마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고바야시 사단이 나오니 믿고 볼 수 있으며, 무레 요코
남극의 극한직업 <남극의 쉐프> [내부링크]
이 휑한 설원은 남극의 낮과 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백야와 극야였다. 예전에 남미 여행할 때 파타고니아까지 가면서 남극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 극지방 근처에도 못 갔다는 생각이 드네. 왜냐면 거기엔 완벽한 백야도 극야도 없었으니까. 백야 비슷한 현상은 여름철 러시아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새벽 2가 되어서야 겨우 해가 뉘엿뉘엿하던 장난 같던 그 밤.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러 밤 11시에 나서면서도 전혀 무섭지 않았던 그 밤. 월드컵 경기 본다고 자정 무렵 나섰다가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며 깜놀했던 바로 그 백야에 가까웠던 곳. 그리고 겨울에 여행갔던 동생이 보내준 오후 4시의 풍경 속엔 가로등이 불 밝히던 극야에 가까웠던 그 거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래도 거긴 아주 극지방은 아니었기에 해가 점령하는 지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북극에서는 겨울, 남극에서는 여름이 되면 아예 해가 뜨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도 반년씩이나. 그러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디
러브레터, 1995 - 인생 영화 때문에 오타루가 궁금해졌다 [내부링크]
5번은 넘게 본 것 같은 <러브레터> 저 한없는 설산과 고즈넉한 시골 마을과 예쁜 듯 개성 어린 배우 나카야마 미호와 또한 아리따운 아역들의 풋사랑 연기가 유키 구라모토의 OST와 함께 어우러지던 그날의 감성을 기억한다면 마음이 허할 때나 힐링하고 싶을 때 언제든 꺼내 보기 좋은 영화다. 시작은 장례식... 인 줄 알았는데, 후지이 이츠키의 3주년 추도식, 그러니까 제삿날이었다. 눈이 많이 와서 당연히 홋카이도인 줄 알았는데, 실제 촬영 장소는 긴키(간사이) 지방의 효고현 고베시. 일본 열도 정중앙의 도쿄보다 남쪽에 있는 오사카, 그보다 더 남쪽이니 겨울이 훈훈할 만도 한데, 이렇게 눈이 퍼붓는다면 아마도 여긴 고베 중에서도 꽤 산간지방인 듯. (참고로 고베의 겨울 평균 낮 기온은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라고 한다.) 그나저나 소년 이츠키는 언제 봐도 잘생겼군.ㅋ 하지만 배우 카시와바라 타카시로는 그리 대성하지 못한 것 같다. 2004년 상해에서 일반인과 시비가 붙어 합의까지 오
언어의 정원, 2013 - 도쿄의 비 내리는 공원에서 맥주 한잔 [내부링크]
언젠가부터 비 내리는 날이 좋아졌다. 그게 등굣길이 아니고 출근길이 아니게 된 언젠가부터. 그리고 일본, 특히 도쿄 여행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 내리는 동경의 대도시 풍경은 삭막하기보다 오히려 로망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출근시간대의 이 지옥철 씬도 넘나 좋더라. 물론 한국의 1.5배나 비싼 요금을 생각하면 난 아마도 대부분의 공간을 걸어 다니겠지만. 미국도 해냈는데 일본이라고 못할까ㅡㅡ; - 2달 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야 알게 됐다. 교복을 적시는 누군가의 우산, 누군가의 셔츠에 밴 나프탈렌 냄새, 등 뒤로 느껴지는 타인의 체온, 얼굴에 닿는 불쾌한 에어컨 바람... 이 냄새가 싫어서 남자 주인공 타카오는 비가 오는 날이면 학교를 땡땡이치고 패션의 메카 하라주쿠역과 도쿄 도청이 있는 신주쿠역 사이에 걸친 거대한 공원 신주쿠 교엔으로 향한다. 에도 시대(1603~1867) 번주 나이토 가문의 저택이었던 곳이 메이지 시대(1872) 황실 소유를 거쳐 1949년에 공원으로 조
이몽, 2019 - 이태준 피살부터 윤봉길 의거까지 독립운동 이야기 [내부링크]
3월이라 어딜 가든 독립 이야기가 만발한다. 위 사진은 6.25의 기록이 전시된 부산 40계단문화관에 있는 특별 전시실. 이상화 시인의 시제를 보니 작년 '모던 타임즈'를 테마로 여행하던 게 생각나서 문득 이 드라마가 다시 보고 싶어졌다. 인천 개항장으로 다시 보는 <미스터 션샤인> 인천 개항장을 다녀오니 개항기 제물포항(인천항의 옛 이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blog.naver.com 1898년 미서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 사이 1902년의 조선을 다룬 <미스터 션샤인>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 <이몽> 공교롭게도 두 작품이 경술국치 전과 후를 각각 다루고 있어 그 분위기가 마치 근대와 현대를 가르듯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두 여주인공 모두 금수저로 나오는 까닭에 밑바닥 인생보다는 모던하고도 낭만적인 경성과 상하이의 면면을 볼 수 있어 시각적으로도 꽤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부산현대미술관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 후기 [내부링크]
부산 무료 전시 - 부산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아세안문화원 6월 1일 지방선거, 이틀만 지나면 주말, 그리고 바로 연달아 현충일까지 은근 황금연휴 같은 6월 첫 주를 ... blog.naver.com 지난달에 다녀온 부산현대미술관 전시 중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의 작품 정보가 7월 1일부터 공개된대서 부산까지 다녀올까 하다가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 little-information.xyz 친절하게도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하나하나 공개해줘서 방구석에서 편하게 확인했다. 참고로 여기서는 작가명과 제목만 나오는데, 세부 설명은 인스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제일 강렬했고 제일 궁금했던 이 정물화와도 같은 그림은 이우성의 <그날 어디에 계셨나요> 왠지 제목을 듣는 순간 '아~' 하고 탄성이 나오지 않나. 저기에는 아직 안주가 안 나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테이블이 너무 깨끗하고, 기본 안주도 아직 몇 개 안 먹었기 때문이다.
부산 개항장과 피란수도의 역사 ② 중앙역~토성역 [내부링크]
부산 차이나타운에서 남쪽 중앙역 방향으로 내려오면 철길이 끝나는 지점에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부산세관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의 pier(부두)가 시작되는 곳이다. 긴가민가한데 아마도 예전에 거제도에서 서울 본사로 가기 위해 쾌속선을 타고 도착했던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2010년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거제선은 없어지고 지금은 제주도만 취항하고 있는 상황. 참고로 일본으로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은 부산역 바로 직전에 있어 기차역을 사이에 두고 국내외터미널이 서로 마주 보는 형국이다. 개항기에 세워진 부산세관과 현재 남아있는 탑 부분(출처: 연합뉴스) 부산세관 얘기하려다 국제터미널까지 나와버렸는데, 아무튼 부산세관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개항되면서 '두모포 해관'이란 이름으로 설치된 관세행정기구였다. 개항과 더불어 수출입 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했기에 부산, 인천, 원산에 차례로 설치됐으며, 뒤늦게 개항된 목포와 군산 역시 '해관'이란 이름으
부산 개항장과 피란수도의 역사 ① 좌천역~부산역 [내부링크]
부산은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나 산업 규모가 큰 데 비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다녀온 개항장 중에서는 가장 근대 모습이 적게 남은 곳이자 관리가 덜 된 곳이었다. 인천이야 수도 서울과 가까우니 온갖 정치적, 문화적 혜택을 누렸다 치더라도 목포와 군산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나. 근데 오히려 저 두 도시는 일본과 한국의 근현대 모습이 오밀조밀하게 융합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느낌. 물론 예전에 왔을 때보다는 근대거리 조성이 늘어나긴 했지만, 같은 항구를 끼고 있는 광역시로서 인천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니 대체 무슨 연유일까? 1863년 고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함과 동시에 흥선대원군의 섭정과 쇄국정치가 시작되면서 거짓말 같이 들이닥친 외세의 침탈(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75년 운요호 사건)로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 가장 먼저 개항된
부산 무료 전시 - 부산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아세안문화원 [내부링크]
6월 1일 지방선거, 이틀만 지나면 주말, 그리고 바로 연달아 현충일까지 은근 황금연휴 같은 6월 첫 주를 그냥 보낼 수 없어 가까운 부산으로 날았다. 원래는 초량이바구길과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오래된 원도심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었으나, 날이 너무 더워서ㅡㅡ; 차선책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무료 전시회가 열리는 부산현대미술관과 시립미술관, 그리고 아세안문화원. 이중 시립미술관과 아세안문화원은 같은 해운대 쪽에 있어 지하철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부산현대미술관이다. 지하철 하단역에서도 한참 떨어진 을숙도 한중간에 콕 박혀 있어 어떻게든 버스로 환승해야 된다는 게 귀차니즘을 불러일으키지만, 수직녹화 전문가 패트릭 블랑이 구현했다는 건물 외벽의 생태계가 너무 궁금해서, 무엇보다 무료 전시라는 말에 마음은 이미 90% 동하고 있어서 불편한 교통편을 감내하고 찾아가 보았다. 부산현대미술관 부산역에서 하단역까지 지하철, 하단역에서 다시
군산 - 개항장과 탁류의 추억 [내부링크]
군산은 항구다. 라고 군산 출신 소설가 채만식은 소설 <탁류>에서 말한다. 군산에 도착한 나의 첫인상도 그러했다. 운전이 익숙지 않음에도 굳이 차를 끌고 3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곳이 바닷가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이어서일까. 대형마트 앞으로 탁 트인 바다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던 군산. 그러고 보니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의 질 좋은 쌀을 일본으로 운송하기 위한 주요 항구이기도 했었지. 그 때문에 이마트가 있는 해변에서 진포해양테마공원에 이르는 구도심에는 일제강점기 관공서나 적산가옥의 흔적이 꽤 많이 남아 있다. 경암동철길마을 우선 이마트에서 길 건너 경암동철길마을부터 들어가 본다. 이곳은 해방 직전인 1944년에 개설된 철도로, 골목길과도 같은 좁은 공간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이를 기차가 용케도 지나다녔다고 한다. 원래는 신문 원료인 제지를 운송하기 위한 용도였으나, 해방 후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폐선이 된 것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관광테마거리로 새롭게 조성해 놓은 공간.
목포 -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너에게 왔다 [내부링크]
목포는 3년 전, 일 때문에 잠깐 갔다가 남는 시간에 구도심 한번 쓱 훑고 온 게 다였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갈 일이 생겨 정보를 찾아보니 부산(1876), 원산(1879), 인천(1883)에 이어 1897년에 4번째로 개항이 이루어진 목포에는 근대의 자취가 허벌나게 많이 남아 있었다. 좀 과장하면 인천의 개항장만큼이나 풍부하다고나 할까. 개항장 중에서도 특히 인천이 겹치는 이유는 바로 지난달에 다녀왔기 때문에ㅡㅡ; 같은 이치로 이다음에 갈 군산에서는 목포가 자꾸 겹치겠지. 참고로 목포 다음으로 개항된 곳이 군산(1899)이어서 의도치 않게 개항 순서대로 다녀온 셈이 됐다는. 그 시작을 목포역에서 해 본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로 철도가 개통된 인천역보다 15년이나 늦은 1914년 호남선 발착지로 개통됐지만, 역 앞 광장은 그 못지않게 진득한 역사를 품고 있다. 1925년 동춘 박동수가 창설한 한국 최초의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단이 시작된 곳이자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광주 모던 타임즈 - 양림역사문화마을 [내부링크]
광주는 5.18 민주화 항쟁의 흔적도 있지만, 근대 기독교가 자리 잡은 전라도 최초의 기독교 성지이기도 하다. 그 모던 타임즈의 역사가 집적된 곳이 바로 양림동에 있는 역사문화마을이다.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에 미국 선교사들이 파송된 것은 대한제국 시대인 1904년의 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이 1882년에 체결됐으니 그로부터 꼬박 20여 년 만이다. 그 사이 조선은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 목포, 군산 등의 항구가 차례로 개항되면서 일본으로부터 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내륙 하고도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광주는 미국 선교사들이 정착한 후에야 근대화가 이루어진 케이스라 일본식 건물보다는 종교 건축물과 한옥, 그리고 현대식 건물이 공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양림역사문화마을이 시작되는 양림오거리에는 투명한 교회 조형물이 겹겹이 쌓여있어 여기가 광주 기독교의 본거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 너머로 아기자기한 조형물 가운데 익숙한 동상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일본군 위
오월의 광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충장로 [내부링크]
광주의 전시문화공간이 몰려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 일대는 5~6 블록에 달하는 방대한 구간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는 생각보다 단출하다.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이곳의 5월 테마는 민주화 항쟁 하나로 족하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에서 가장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옛 전남도청이 있던 자리였다. 중간에 태극기가 꽂힌 건물이 본관이고, 그 옆으로 별관과 회의실, 뒤에는 경찰청이 하나의 건물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청사 보존 여부를 두고 열띤 논의 끝에 5.18 민주화 운동의 최후 항쟁지였던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훼손이 심한 별관에는 철골을 덧씌워 이렇게 모던한 형태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남과 광주의 역사를 모두 품고 있으며, 특히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은 해방 이후 한민족 전체의 민주화 운동으로 상징되기에 내부 공간을 섣불리 공개할 순 없었는지 전시공간은 옛 청사 뒤로 밀려났는데, 주위 경관을 해치
문화역서울284 기획전시 <사물을 대하는 태도> [내부링크]
수원과 인천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잠시 짬을 내어 문화역서울284에 들렀다. 늘 기차 타기에 바빠서 눈팅만 하던 구역사에 한 번쯤 와보고도 싶었고, 마침 '사물을 대하는 태도'라는 주제로 기획전시도 열리고 있어서 기차 시각보다 1시간쯤 일찍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했다. 일제강점기 경인선의 개통과 함께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이곳은 당시 동양에서는 도쿄역 다음으로 큰 역사였기에 전시물 외에도 공간 자체가 또 하나의 볼거리였으니. 커다란 채광창과 열주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지는 중앙홀. 그 암울한 시절에 이렇게나 화려한 역이 적국의 자본과 기술로 만들어졌다니, 그 덕에 철도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고 광복 후에는 산업 발전까지 가져왔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겠나. 1, 2등석 대합실과 부인 대합실. 근대 문물이 들어오고 개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남녀칠세부동석의 가치관은 여전했나 보다. 하지만 이것도 2등석이나 돼야 가능한 얘기이고, 3등석은 남녀고 칠세고 그냥
인천, 차이나타운, 그리고 개항장 [내부링크]
인천역과 동인천역 사이는 꽤 흥미롭다. 자유공원과 제물포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원도심이 형성되어 있어 구불구불 골목을 산책하는 재미가 있고, 언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뷰 또한 인천이라는 도시만의 독특한 매력. 거기다 청일 조계지와 한국전쟁의 역사까지 한데 어우러지니 그야말로 복합문화공간 같은 느낌이랄까. 서울에 10년 넘게 살았는데도 이제서야 인천의 매력을 발견한다. 인천 차이나타운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인천역에 내려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맞은편에 차이나타운의 상징 드래곤 게이트가 보인다. 이미 몇 번이나 다녀온 중국이지만, 청결함과는 거리가 먼 그곳과 달리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꽤 정비가 잘 되어 있다. 딱 봐도 시에도 관광 인프라에 돈 좀 쓴 느낌. 서울에서 불과 1시간 이동했을 뿐인데, 여긴 완전히 딴 세상 같다. 이렇게 유유자적 거닐고 있으니 정말 영락없는 중국의 노가(老街) 같지 뭔가. 차이나타운 중심가에서 선린문으로 이어지는 황제의 계단. 예전에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던 것
수원 신작로 [내부링크]
수원역 7번 출구에서 향교까지 이어지는 향교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그러니까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신문물의 유입이 활발해서 신작로라 불리는 이곳은 현대 문물이 더해져 차가 다니지 않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싶었을 것이다. 서울의 명동처럼, 대구의 동성로처럼. 그런데 대구보다 서울에 훨씬 더 가까운 이곳의 콘텐츠가 왜 이리도 빈약한가요ㅡㅡ;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유서 깊은 향교도 있고, 근대의 모습을 간직한 부국원과 조선중앙무진회사(현 가족여성회관)도 있고, 거기서 화성까지는 소위 'O리단길'이라 불릴 법한 공방길과 성벽길이 장안문까지 이어지는데, 왜 그 맥을 활용 못하고 있나. 참고로 여기는 1918년, 일본인이 설립한 수원인쇄주식회사를 시작으로 인쇄소가 들어서면서 7080년대를 주름잡을 정도로 번성했던 곳이라는데, 그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 과거는 지나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잘만 살리면 현재 모습에 부가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수원 향교로에서 반면
대구 근대골목 모던 타임즈 [내부링크]
'근대사'를 뜻하는 모던 타임즈(modern times). 여기서 'modern'이란 말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모더니즘(modernism) 운동에서 나왔다.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권위와 봉건성을 비판하고 냉철한 이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기계문명과 도회적인 감각을 중시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런 풍조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찰리 채플린 주연의 1937년도 영화 <모던 타임즈>가 아닐까 싶다. 자본주의와 대공황에 잠식되어 가는 암울한 시대상이 영화 속 장면 장면마다 나와서 보는 이로 하여금 한없이 허무하게 만드는데, 한편으로는 그토록 암울했기에 가장 화려하고도 로맨틱한 문화가 꽃 피어날 수 있지 않았는지. 개인적으로는 그 무렵 조선의 개화기가 꽤나 흥미로웠기에 <경성스캔들>, <제중원>, <미스터 션사인>, <이몽> 같은 한국 드라마가 그 어느 작품보다 감명 깊었고, 바다 건너 세계를 한 바퀴 돌 때에도 같은 역사가 겹
구찌 가든 아키타이프 전시회 VR로 보았다 [내부링크]
서울 DDP에서 3월 한 달간 열린다는 '구찌 가든 아키타이프' 전시를 방구석에서 VR로 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고 싶지만, 몸이 귀찮아해서ㅡㅡ; 이런 전시회 소식을 주말 아침에 뉴스레터 한쪽 귀퉁이에서 발견하고 바로 VR 접속한 것도 나로선 엄청난 추진력이었다. 구찌 가든 아키타이프 절대적 전형 전시회 | 구찌 코리아 창의적 비전을 기념하여 선보이는 멀티미디어 전시회 구찌 가든 아키타이프 절대적 전형에 대해 알아보시고 네이버 예약 후 DDP에서 만나보세요. www.gucci.com 패션엔 관심도 없는 내가 굳이 '구찌'라는 명품 전시회를 찾아본 건 단지 '전시회'라는 단어 하나 때문이었다. 일상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시문화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라 굳게 믿기에. 눈에 보이는 미를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지 않나.ㅋㅋ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아키타이프(archetype). 부제 그대로 '절대적 전형'이란 뜻이다. 아마도 구찌
2월 엔딩 @ 김광석다시그리기길 [내부링크]
대구의 중심 동성로와 신천이 맞물리는 곳에 있는 김광석다시그리기길 돈가스와 커피 맛집 때문에 몇 번 오긴 했지만, 작정하고 끝까지 걸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때마침 겨울이 끝나갈 무렵의 날씨도 딱 좋아서. 김광석 거리 초입에 있는 방천시장은 1945년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피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형성된 상권 마을로, 1960년대에는 점포가 무려 천여 개에 달할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다 백화점이 들어서고 대형마트가 인기를 끌면서 시장의 점포는 하나둘씩 폐점하기에 이르렀는데, 존폐의 위기에 놓인 이곳을 대구시와 지역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2009년 '별의별 별시장'이라는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지금의 문화 예술 거리로 재탄생될 수 있었다는. 그래서인지 신천대로를 따라 형성된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은 지금까지 중 가장 다채롭고 화려한 골목길의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자사람인 까닭에 '이등병의 편지'보다는 '사랑이라는 이유로'가 더 좋고,
디자인 싱킹 하고 싶을 땐 대구 수창청춘맨숀 [내부링크]
코시국에 재택근무가 답답하던 어느 날, 디자이너와도 같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서 찾아간 수창청춘맨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나 오는 줄 알았던 달성공원 근처에 이런 신박한 문화공간이 있을 줄이야. (참고로 입장료는 무료임) 수창청춘맨숀은 담배인삼공사가 전매청보다 훨씬 이전인 일제강점기의 전매국 시절, 대구연초제조창 사택이었던 곳을 전시 및 청년 예술가 지원 공간으로 개조해놓은 곳이다. 연식으로 치자면 1921년부터 시작되었으니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품고 있은 셈. 물론 중간에 대구출장소가 폐쇄되면서 20년 가까이 방치되긴 했지만, 그래서 더욱 도시 재생의 가치가 빛나는 곳이기도 하다. 안으로 들어가면 KT&G가 전매국이던 시절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당시 제조했던 담뱃갑 디자인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근대로 순간 이동한 느낌인데, 이곳의 백미는 날것 그대로의 공간에 저마다의 색채로 전시해놓은 동시대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보러 다니는 맛"에 있다
부산 편집숍 & 달맞이고개 한 바퀴 [내부링크]
올해 첫 스타트도 역시 부산행. 언제부턴가 돌아다니는 여행보다 한 곳에 머무는 여행이 좋아져서 줄곧 해운대만 기웃거렸는데, 이번에는 좀 컬러풀하게 보내보고 싶어서 편집숍 위주로 돌아다녔다. 덕분에 루트는 좀 꼬였지만, 대신 삼박한 공간을 여럿 알게 되어 한편으론 뿌듯하네. 어느새 공간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여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내 취향에 맞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어디든 찾아가게 되는, 물건이 아니라 스타일을 사게 되는 그런 시대.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숍 시시호시(SISIHOSI) 서면역 7번 출구 지하에서 바로 연결되는 롯데백화점, 그 지하 1층에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뜻의 시시호시(SISIHOSI)가 있다. 백화점 입점 매장은 자체 분위기 때문에 개성이 없을 거란 나의 예상을 뒤엎고 이번 부산행에서 가장 인상 깊은 아이템과 DP를 선보인 곳. '어떤 날이든 그날을 마음껏 즐기라'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각양각색의 라이프스타일을 뽐내는 아이템이 매장 구석구석 촘촘히 박혀 있
부산행 [내부링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나의 최애 여행지는 부산이 될 것 같다. 한 해 동안 무려 5번이나 갔으니 거의 분기마다 다녀온 셈. 물론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것도 있지만, 부산, 그중에서도 해운대가 그토록 강렬하게 나를 끌어당긴 이유는 뭐였을까. 해운대 부산의 꽤 여러 곳에서 묵어봤지만 여기만큼 멋진 숙소를 본 적이 없다. 방구석에서 이런 뷰를 즐길 수 있다니 대박이지 뭔가. 해운대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동백섬이 아닐까. 바다와 산과 대도시의 앙상블. 여기만 오면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싶어진다. 부산, 그중에서도 해운대, 그중에서도 동백섬, 그중에서도 더베이101은 온갖 추억이 교차하는 장소다. 여기서 먹는 피시 앤 칩스는 마치 영국의 부둣가에서 먹는 것 같은 맛.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위기단계 격상으로 배달만 되는 안타까운 현실ㅠㅠ 사실 해운대는 즐길 거리가 그리 많지 않다. 기껏해야 옛 해운대역 뒤에 있는 조그만 상점거리 해리단길과 겨울밤에 펼쳐지는 빛축제 정도. 하지만 이마트
해리단길과 해운대 빛축제 [내부링크]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걸어오면 폐역된 해운대역이 보이는데, 그 뒤로 난 정갈한 시골길을 지나면 구도심의 좁은 골목 사이로 댄디한 가게들이 들어서 있다. 서울의 경리단길과 망리단길을 벤치마킹한 경주의 황리단길, 그 계보를 이어 부산에도 해리단길이 생겼다. 눈요기 점수로 치자면 아무래도 스케일 면에서 서울의 이태원을 따라갈 수 없으니 경리단길이 1위. 2위는 천 년의 고도라는 타이틀과 한옥을 테마로 했다는 점에서 경주의 황리단길. 밀집성이나 쾌적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거대한 망원시장과 착한 가격 때문에 망리단길이 3위. 이에 비해 해리단길은... (지도 출처: https://blog.naver.com/salon_chaconne/221409830479) 2~3블록 정도의 작은 규모에 상점도 몇 군데 없고, 중소도시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게가 대부분이라 꼴찌로 밀려났지만, 그래도 해운대에서 바다 말고 별미를 찾는다면 아쉬운 대로 가볼 만하다. 이 정도면 시각적
해운대 일주일 살아보기 [내부링크]
갑자기 열흘의 시간이 생겨서 해운대에 내려왔다. 사실 부산으로 정한 건 다른 지역보다 숙소가 저렴하다는 단순한 이유였는데, 와서 보니 없던 명분도 마구마구 생겨난다. 그래서 설렌다. 여기서의 일주일 살이가. 정확히 말하면 5박 6일. 비싼 주말을 피해 하루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겟. 위치는 동백역과 해운대역 사이. 요즘 드라마 <동백이>에 빠져 있는데, 동백역을 오게 되다니ㅋ 바다와 대형마트,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 등 해운대 일대에서는 접근성이 가히 최고다. 이 숙소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전망이 예술이라는 데 있다. 예전에 동백섬 바로 앞에 있는 숙소에도 묵어봤는데, 주위에 마천루가 밀집해 있어 시야가 별로인 것에 비해 여기는 바로 앞에 저 푸른 빌딩 말고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에 빌딩 숲과 바다의 콜라보가 적절했다. 그리고 좀 어둡게 나온 저 침대에 대해 덧붙이자면, 뉴욕에서 한 달 살이 하던 숙소의 침대와 침구랑 똑같은 거여서 깜놀! 그때도 침구
프렌즈의 Central Perk 같은 목포 카페 커피창고로 [내부링크]
일 마치고 목포의 평화광장을 산책하는데, 이 근처가 카페거리인지 거의 한 집 건너 카페가 들어서 있다. 좀 안쓰러운 건 산책로마다 빼곡히 심어놓은 가로수에 가려서 간판이 잘 안 보인다는 거. 요즘에야 SNS 시대이니 알음알음 찾아오기야 하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갑자기 방문해서 우연히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간판과 목의 역할도 무시할 순 없는 일. 그런 가로수의 횡포(?) 속에서 뙈 특이한 카페를 발견했다. 녹색 기둥에 이름까지 특이한 커피창고로. 저 한없는 녹색이 거부감이 들면서도 내부가 궁금해서 살짝 문 열고 들어갔다가 깜놀! 여긴 나의 최애 미드 <프렌즈>에 나오는 Central Perk잖아~~ 한마디로 딱 요런 분위기ㅋㅋㅋ 한쪽에선 로스팅 기계가 돌아가고, 또 한쪽에선 서재 분위기도 나는 게다가 구석구석 현대미술관 같은 아트도 눈에 띈다. 비엔나 4.8, 더치 4.3 외부가 심하게 오묘하지만 분위기도 가격도 너무 좋다. 커피창고로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
광주 티앗 - 밀크티의 정수 [내부링크]
밀크티를 사랑한다. 시작은 인도의 짜이였는데 중국을 오가면서 더욱 애정하게 된 것 같다. 버블 없는 나이차를 매끼니 마실 정도였으니. 한번은 동생이 대만에 다녀오면서 선물로 3점1각과 Mr.Brown을 사 왔는데, 밍밍한 3점1각은 미스테이크였지만, 미스터 브라운은 정말 진국 같은, 한마디로 인생 밀크티였다. 그 맛과 비슷한 곳을 광주에서 발견할 줄이야. 광주 중앙도서관 근처에 있는 티앗 '티앗'은 '사이좋은 자매'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 '띠앗'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한다. 겉모습은 한옥인데 내부는 약간 일본스럽기도 한 것이 2층으로 올라가면 천장이 낮은 다락방 같은 좌석이 나온다. 키가 크거나 평소에 조심성이 없다면 2층은 비추 주문을 하고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MD를 구경해 본다. 밀크티를 좋아하는 지인이 있다면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내 주위엔 죄다 커피 성애자뿐. 정원의 자리가 탐났지만 지금은 한참 더워지려고 하는 5월이라 정원이 바라보이는 창가 자리 픽
하동 평사리의 아침 [내부링크]
하동은 녹차의 고장이지만, 이제 대세는 커피인지라 오랜만에 쌍계명차에 들렀더니 손님도 없고 을씨년스럽다. 예전에는 찻집계의 스벅 같은 곳이었는데. 1층 숍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박물관을 구경하고 나오니 차들이 계속 지리산 쪽으로 줄지어 올라간다.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이런 대형 백화점 같은 카페가... 커피계의 테마파크 같은 더로드101 다양한 화초와 수목이 어우러진 운동장만한 야외 좌석과 온실처럼 통유리로 뒤덮인 내부 한마디로 고급리조트 같은 럭셔리함이 느껴진다. 듣기로는 정원사만 10명 넘게 고용됐다는데, 유지비 뽑아내려면 메뉴는 꽤 비쌀 듯. 음료를 안 사 먹은 건 오늘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화개장터에서 박경리문학관을 지나 한참 더 올라가야 하는, 심지어 내비에서도 길이 끊겨 한참을 헤매야 하는, 그야말로 오지 중의 오지에 있는 평사리의 아침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조기 은퇴한 부부가 고향인 하동에 내려와 남편은 빵을 굽고, 아내는 바느질 공예를 하며 살던 어느 날, 지나
춘천 에티오피아 특선 - 한국전참전기념관과 이디오피아벳 [내부링크]
울산바위가 점점 가까워진다. 설악산을 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대로 미시령을 지나 춘천으로 넘어갔다. <알쓸신잡>에서 인상 깊게 봤던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6.25 전쟁 당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고귀한 희생을 치렀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에티오피아를 기념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파병을 해 준 국가였기 때문이다. 일찍이 에티오피아는 외세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국제연맹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무위로 끝난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에티오피아는 강력한 집단행동이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에 부유한 국가는 아니지만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는 UN의 대의에 따라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 출처: 위키백과 이 공덕으로 1968년 춘천시에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이 설립되었고, 이를 계기로 에티오피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춘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건물 외관이 꽤 독특한 걸 알 수 있는데,
울산바위가 바라보이는 속초 설악산책 [내부링크]
강릉에서 3대 커피를 둘러보고 속초로 넘어가는 길. 바다가 보일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거대한 바위산이 나타났다. 설마 벌써 설악산인가? 한적한 대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이런 댄디한 건물 하나가 눈에 띄어서 들어가 봤다. 2019년에 방문할 당시엔 '설악문화센터'였는데, 2022년 현재 다시 찾아보니 '설악산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여기가 왜 그리도 인상 깊었냐면 들어가자마자 서점 같은 콘셉트의 방대한 도서관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책들이 중고 같지 않고 새책처럼 반들반들하게 놓여 있었다는 얘기. 게다가 전면 유리창 앞에 놓인 푹신한 소파와 저 멀리 보이는 울산바위 전망은 정말이지 대박이지 않나. 건물 한쪽에는 울산바위를 바라보며 커피 한잔할 수 있는 카페소리도 있지만, 단언컨대 여기거는 테이크아웃을 해서 복도의 통유리창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마셔야 한다. 설악산과 울산바위의 위용이 카페보다 복도에서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 나오면서 잠깐 들른 화장실조차
강릉 3대 커피 - 테라로사, 커피커퍼, 보헤미안박이추커피 [내부링크]
커피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커피를 즐기는 1인으로서 자주 카페 탐방을 나간다.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커피의 향과 맛은 언제 어디서나 어울리는 듯. 이른 아침에는 각성의 역할을 하고, 식후에는 텁텁한 입안을 정화시켜주며, 나른한 오후에는 집 나간 정신줄도 돌아오게 만드는 그야말로 마성의 음료. 가끔 늦은 저녁에도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며 마시는 커피는 카페인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기분 좋게 잠들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정말 맛있게 먹는 음식은 0 칼로리인지 맛있게 마시는 커피도 0 카페인인 모양. 그런 내게 있어 대한민국 커피 1세대라는 강원도로의 카페 탐방은 오랜 염원 같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는 진정, 너무나 멀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의외로 철도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자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건가, 가고 싶은 곳도 마음껏 못 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양산 3대 카페 [내부링크]
양산은 어딘가 애매한 도시다. 공장은 있는데 번화한 도시의 면모는 없는, 통도사 말고는 딱히 가 볼 데도 마땅찮은, 그런 곳에 추천받은 카페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난해한 토곡요(土谷窯) 토곡산 자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지어놨으니 단어 그대로 해석해야 하나? 흙(土)과 골짜기(谷)가 있는 곳에 도자기(窯)를 굽는 곳이란 뜻인가. 고리타분한(?) 이름과 달리 벽면의 대부분은 유리로 덮여 있어 한없이 모던해 보이고, 곳곳에 전시된 예술 작품은 현대미술관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진짜 갤러리는 따로 있었으니 정원을 가로질러 연결되는 별관에는 도자기를 비롯한 각종 인테리어 소품이 전시되어 있다. 여긴 한마디로 정원과 갤러리를 모두 품은 카페 커피 한 잔 값으로 몇 가지 문화생활을 누리는 거냐... 토곡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115-1 전화 토곡요 다음으로 경치에 반했던 카페해바라기 믿기지 않겠지만 저 알프스 같은 뷰 아래로는 공장지대다. 경치도 경치지만 건물 내부도 상당히 독
서재가 있는 호텔 지지향 [내부링크]
독서의 계절, 문화 감각 쩌는 동생이 출판의 도시 파주로 초대했다. 간만의 상경에 들떠 합정역에서 탄 광역버스에서 내릴 때 깜빡하고 교통카드를 못 찍었는데, 알고 보니 광역버스는 하차 태그를 안 해도 된다는. 촌년티 제대로 내며 파주에 내렸더니 벌써 단풍이 절정에 달했다. 여긴 선진국의 어느 조용한 마을 같다. 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는 출판사 건물을 구경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아웃렛. 둘 다 샤핑엔 관심이 없어서 아웃렛은 스킵하고 얼른 체크인하러 궈궈~ 파주북시티에서 운영하는 서가를 품은 호텔 지지향 멋져~ 영드에서나 봤던 천장이 높은 고품격 서재를 오늘 하루 전세낼 수 있다니. '종이의 고향'이라는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다.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도 저렇게 운치있는 책장이 군데군데 나타나 심쿵하게 만든다. 개인적으로 함석헌 작가의 방에 당첨되길 바랐는데, 오늘 우리에게 배정된 방은 <마당 깊은 집>의 김원일 작가의 방 읽은 게 달랑 저 한 권뿐이라 실망하려던 찰나, 방문을 열자
봄과 여름 사이 합천 소리길 [내부링크]
합천 대장경테마파크에서 해인사까지 장장 7km에 달하는 소리길 말이 7킬로지, 평탄한 도로도 아니고 산길을 오르는 거라 자연의 소리를 들을 만한 여유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날이 너무 좋아서 햇볕이 적당해서 이 계절엔 한 번쯤 도전해 뵈도 좋을 듯. 한참을 걷다 해인사 입구가 보이면 왠지 모를 성취감에 뿌듯해지곤 한다. 절은 작지만 팔만대장경의 위엄 때문인지 입장료는 3000원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경판전은 정작 입장이 불가능하다. 맨 마지막 사진이 바로 장경판전인데, 건물 외벽의 창살 너머로 유심히 들여다 봐도 잘 안 보인다는 게 함정ㅡㅡ; 아마 오늘처럼 날씨가 좋지 않았다면, 석가탄신일이 다가오는 시즌에 맞춰 색색이 연등을 달아놓지 않았다면 입장료가 좀 아까울 뻔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일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기에 온 건 소리길이 왜 그리도 유명한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나들이 겸 산행으로
궁 [내부링크]
서울에 살면서 경복궁은 그리도 많이 가봤는데, 어찌 창덕궁에 가 볼 생각은 못했을까. 이게 전체 안내도인가 했는데 돈화문 일원에 대한 거였고, 인정전, 선정전 등 각 구획마다 안내도가 따로 붙어 있었다. 정궁인 경복궁의 제2궁이었고, 아관파천 이후에는 제1궁이었던 곳인데, 저리 소소한 규모일리가 없지. 돈화문, 진선문, 숙장문, 인정문을 지나 드디어 인정전에 다다른다. 왕의 즉위식 같은 나라의 큰 행사가 거행된 곳 그래서인지 궁 정면으로 펼쳐진 바닥에는 흙이 아닌 박석(薄石)을 깔아 그 권위를 드높였고, (유사시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한다.) 서열을 중시하는 신분사회인 만큼 품계석도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다. 그 시절에도 과거에 급제해서 맨 끝에 있는 정9품에라도 드는 것이 로망이었겠지. 어째 세월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지. 인정전은 겉에서 보면 2층 건물 같지만, 안에서 보면 천장이 높게 솟은 1층 구조다. 또 몇개의 문을 지나는
제주 기행 ④ 한라산 백록담에는 물이 없다 [내부링크]
드디어 제주도의 중심 한라산으로 향한다. 높이는 무려 1947m. 우리나라에서는 굴지의 최고봉이며, 여전히 화산 활동의 위험이 있는 활화산이다. 분명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에는 활화산이 없다고 배웠는데, 2014년에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한다. 지질 연대 구분인 홀로세(Holocene)에 분출한 이력이 있느냐에 따라 활화산으로 구분한다는데, 한라산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천 년 전인 고려 목종 7년에 화산이 분출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3843105 ) 아무튼 그런 최고봉의 활화산을 오늘 등반할 예정이다. 그것도 등산은 허무한 스포츠라며 등한시했던 내가.ㅡㅡ; 아마 부모님이 안 오셨더라면 꿈도 못 꿨겠지. (지도 출처: 한라산 국립공원 http://www.jeju.go.kr/hallasan ) 한라산을 올라가는 루트는 총 7가지. 이중 서귀포에서 가장 가까운 루트는 돈내코탐방로지만, 대중교통이 없어서 (주말에만
제주 기행 ③ 가족 여행 코스 [내부링크]
아메리카 대륙 한 번 다녀왔더니 마일리지가 제주도 왕복으로 3인분만큼이나 쌓여서 통 크게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물론 숙소와 대부분의 식사는 제주에 파견 나와 있는 언니가 부담했지만. 금날 저녁에 내려와서 일요일 오후에 떠나야 하는 동생 때문에 1박 2일 코스로 쫀쫀하게 짰는데, 확실히 차를 렌트하니 선택지가 넓어지더라. 물론 혼자 올레길 걸을 때의 여유는 포기해야 했지만. 숙소가 이중섭거리 앞에 있으니 당연히 시작은 이중섭거리이고, 거리 끝에 있는 올레시장에 들러 점심으로 먹을 오메기떡과 보리빵을 사서 첫날은 동쪽으로 (올레길 6코스에서 그나마 인상 깊게 보았던) 보목포구와 쇠소깍을 지나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성읍민속마을, 산굼부리,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우도에도 들러보려 했었다. 그 첫 번째 목적지인 섭지코지는 멋들어진 산책로와 외돌개를 연상시키는 각종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전망이 가히 예술이었는데, 제주라는 섬 자체가 그렇듯 여기도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
제주 기행 ② 올레길 6코스와 7코스 사이 [내부링크]
세계는 한 바퀴 돌았어도 그 유명한 히말라야 등정 한 번 못 해봤고, 스페인은 갔어도 산티아고 순례길은 못 걸어본 나. 굳이 말하자면 그런 데를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간 거였다. 걷는 행위야 여행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사유도 자연스레 하게 되는 것이니 걷는 것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더 집중했던 거다. 그러므로 내 여행은 지금까지 걷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는 것과 사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셈. 그런 이유로 제주에서 잠깐 머물게 되었을 때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문화예술적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이중섭거리에서 보냈고, 그래도 제주에 왔는데 안 걷고 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남은 시간을 숙소 일대를 지나가는 올레길 6코스와 7코스를 걷는 데 겨우 할애했다. 그러면서 느낀 건 역시 걷는 행위가 주가 되는 건 내 취향이 아니라는 거다. 목표 지점에서 시간을 두고 머물며 사유하며 그 장소를 소화시켜야 다음 장소로 이동할 맛이 나는데
제주 기행 ① 이중섭거리에서 낭만 산책 [내부링크]
어디서나 한라산이 보이는 매력적인 제주특별자치도. 그중에서도 서귀포시에 머무른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 담벼락을 따라 걷다 보면 올레시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중섭거리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화가 이중섭에 대해서는 학창 시절 미술책에서 본 '황소' 그림 때문에 상당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데, 나는 태어나서 소를 그토록 괴이하게 그린 사람은 처음 보았다. 소는 무릇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도 둔한 동물이 아니었던가. 친가나 외가 모두 시골인 까닭에 어려서부터 소를 꽤 자주 보며 자라왔는데, 그 큰 덩치에도 있는 듯 없는 듯 마당 한구석에서 묵묵히 여물을 씹고 뱉고를 반복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일 나갔는지 그 자리는 텅 비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제 자리를 듬직하게 채워주던 한결같은 모습을. 그런 순둥하고도 한편으로는 개성 없는 모습에 소는 그저 황토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미국 여행 에필로그 [내부링크]
한 나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봤자 3달이지만) 여행한 건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중국도 있었고, 인도도 있었더라. 그러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건만, 미국은 뭔가 아주 오래 아주 많이 경험 수집을 하고 온 느낌이다. 심지어 중국과 인도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며, 몇 배나 깊은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음에도 그에 전혀 뒤지지 않는 농도와 밀도로 대적하고 있으니, 이것이 중국 대륙과 인도 아대륙과 다른 미대륙의 클라스인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포스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싶었다. 때마침 네이버 편집기 새 버전이 나와서 비주얼적으로 업그레이드되기도 했고. 그래서 도시별 포스팅과는 별도로 마무리 차원에서 에필로그도 멋들어지게 한번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페이지를 열고 보니 뭔가 술술 써지지는 않는 아이러니ㅡㅡ; 그래도 이 말은 하고 싶었다. 고마웠다고. 미국 카테고리의 서문에서 쓴 것처럼 당시의 내 영혼은 몹시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한 템포 쉬어갈
Seattle -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내부링크]
시애틀 시내에서 태평양까지 연결되는 Lake Union.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나왔던 톰 행크스의 집도 저기 어디쯤이지 않을까. 톰 행크스의 집에 몰래 찾아간 4차원녀 멕 라이언. 이렇게나 아리따운 그녀가 덕질을 하는 반전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영화. 그런 그녀 덕에 나의 소녀시대는 입시지옥 속에서도 풍요로웠고, 시애틀 또한 로맨틱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젠 어른이 된 내가 그녀가 서 있던 저기서 그녀가 바라보던 곳을 똑같이 바라본다. 한없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 '에메랄드의 도시'를. 오늘은 유니언 호 너머 시애틀 북쪽에 있는 프리몬트(Fremont) 지역으로 건너가 본다. 힙스터들이 모여 '우주의 중심'이라는 콘셉트 아래 조성해놓은 예술 공동체가 있다는데, 프리몬트 다리를 건너자마자 시선 강탈해온 구글 캠퍼스. 시애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시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본사는 레드몬드(Redmond)라는 외곽에 있고, 오히려 샌프란시스코를 본거지로 하는
Seattle - 올림픽 조각 공원 보러 갔다가 케리 파크까지 걸은 날 [내부링크]
SAM 본관에서 올림픽 조각 공원 가는 길. 이 도시는 거리 자체가 살아있는 예술 단지 같다. '공공'이 따로 있나? 굳이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진정한 '공공예술'이지. 한참 걷다 보니 왼쪽으로 바다가 펼쳐지고,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다분한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가 바로 SAM(Seattle Art Museum)의 일부인 Olympic Sculpture Park. 시내에 있는 본관과 달리 탁 트인 바닷가에서 멋진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무료인데다 부대시설까지 훌륭하다. 입구에 이런 쾌적한 휴게실도 있고, 화장실도 완전 깨끗하고, 심지어 와이파이도 잘 터진다. 이런 공간을 무료로 내놓은 이 도시의 시민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참으로 부럽다. 워싱턴 주의 거대한 만 Puget Sound가 인접해 있어 경치도 예술이다. 사진 속의 날씨가 뒤죽박죽인데, 여긴 너무 좋아서 해가 쨍쨍한 날에도 오고, 비가 오는 날에도 왔다. 올림픽 조각 공원에서 스페이스
Seattle - SAM & FAM [내부링크]
시애틀 미술관의 양대산맥 샘(SAM)과 팸(FAM). 그중 샘은 하루 종일 망치를 두드리는 해머링 맨으로 유명한 시애틀 아트 뮤지엄이다. 시애틀을 검색하면 공공도서관 다음으로 뜨는 독특한 건물이기에 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 하지만 팸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나도 몰랐고, 정보를 찾아볼 때조차 검색 결과에서 밀리는 걸 보면 인지도 면에서 한참 떨어지는 듯. 그러다 에어비앤비를 예약하며 호스트에게 인사차 메시지를 보냈다가 시애틀을 소개하는 장문의 답장을 받고 알게 됐는데, Very cool, very small but fun, and it's free. 이토록 멋진 소개글이 세상천지 또 어디 있단 말인가.ㅋㅋ 그리하여 가보았다. 그 이름도 독특한 팸(FAM), Frye Art Museum에. 각시탈 느낌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 심상찮은 포스의 이곳은 시애틀에서 육류 포장업을 했던 Charles Frye 부부의 소장품을 전시해놓은 곳이다. 육류 포장업이라고
Seattle - 모두를 위한 도서관 [내부링크]
도심 한가운데에서 유리와 철골로 온통 뒤덮인 이 난해하면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건물, 여기가 바로 시애틀 공공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 Central)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건물 외벽이 사방으로 삐져나와 사뭇 불안한데, 어찌 보면 연결선이 분명해서 안정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 심하게 자유분방한 건물은 누가 지었을까? 책이라는 매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공공영역으로서의 복지 공간도 갖춘 도서관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1891년, 강철왕 카네기의 기부로 처음 문을 열었다. 그러다 곧 캐나다 클론다이크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됐고, 소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국경 마을인 시애틀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금을 캐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시애틀에 정착하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 도서관의 규모 또한 확장이 불가피해졌다. 그리하여 새로운 부지로의 이전을 고민하던 중 '효율적인 서재 배치와 공공의 기능을 모두 고려한 도서관(Librarie
Seattle - 커피 성지 순례 [내부링크]
드디어 시애틀 존재의 이유, 스타벅스를 만나러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으로 향한다. 한국에선 그리 즐겨 찾지도 않았는데, 기프티콘 때문에 거저 갔던 스벅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리도 떨리냐... 가는 길에 숙소 근처에 있는 시애틀 대학가에 커피 맛집이 있다고 하여 잠시 들렀다. 이름하여 스텀프타운 커피 로스터스(Stumptown Coffee Roasters). 시애틀에서 가까운 포틀랜드가 원조이며, 스벅보다 20년쯤 늦게 시작됐지만, 그만큼 최신 트렌드와 고급 원두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순식간에 커피 마니아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전설의 커피. 대로변에 강렬한 붉은색 돌출 간판이라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카운터의 모습은 그냥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는데, 대학가라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활기차다. (비록 역광 때문에 사진은 우울하게 나왔지만ㅡㅡ;) 뭘 시킬지 고민하는 사이 내 앞으로 세 명이나 다녀갔고, 다들 약속이나 한 듯 라테를 시키길래 시그니처 메뉴 같아 나도 똑같이 주문했다. 달지
Seattle - 시애틀 추장님의 도시 [내부링크]
숙소가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파이어니어 광장(Pioneer Square)으로 가는 길. 여지없이 중국을 대표하는 용이 난무하는 가운데, 자세히 보니 장거리 버스가 발착하는 Union Station과 미국 여객 철도 Amtrek이 지나가는 King Street Station과 도시 외곽을 연결하는 Link Light Rail이 교차하는 제대로 역세권 지대다. 숙소 위치 한 번 기똥차네. 그중에서도 유니언 스테이션이 특히 애틋한 이유는 영화 <만추>에서 탕웨이와 현빈의 우연과 인연이 교차한 곳이기 때문이리라. 아마도 그레이하운드를 탔다면 여기서 내렸겠지. 영화 속 탕웨이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지저분함과 불편함을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무엇보다 난 탕웨이가 아니니까ㅡㅡ; 그냥 편하게 비행기로 한 번에 쐈다.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의 버스는 바이, 짜이찌엔... 유니언 스퀘어와 킹 스트리트 스테이션 사이에서 말 그대로 '만추'를 만끽하는데, 건너편에
Seattle - 알래스카 항공과 에어비앤비 [내부링크]
드디어 비와 커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시 시애틀(Seattle)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울컥한 것도 있고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이동도 쿨하게 비행기로 쐈다. 때마침 알래스카 항공 특가가 떠서 샌프란에서 시애틀까지 $50도 안 되는 $48에 겟. 버스보다 저렴한 가격이라 기대도 안 했는데, 정시 출도착에 기내는 메이저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보다 훨씬 깨끗하며, 시애틀로 취항하는 구간이어라 그런지 몰라도 스타벅스 커피가 나왔다. 게다가 승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는 거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버금가는 수준. 내 다음에도 미국에 온다면 반드시 너를 이용하리~ 시애틀 공항에서 시내로 나오는 건 지금까지 중 가장 쉬웠다. 공항에 도착해서 에어 트레인을 타고 종점에 내려 'Link Light Rail' 표지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으니. 심지어 여긴 미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교통카드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돼서 단돈 $3에 저렴하고도 신속하게 공항을 빠져
San Fransisco - 걷고 싶은 도시 feat. 물길 [내부링크]
샌프란의 시내는 킬힐로 가득하지만, 대신 시내 웬만한 곳에서 바다 뷰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시내에서 바닷가로 내려오면 평지가 끝없이 이어지는 워터프런트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가 걷고 싶은 도시인 이유. 대도시에 이런 물길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난 포스트에서 언급했던 페리 빌딩은 워터프런트가 시작되는 Pier 1에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뉴욕의 첼시 마켓을 연상시키는 아케이드 형태의 재래시장이 나오는데, 앉아서 먹을 자리가 마땅찮기에 커피만 테이크아웃해서 해안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해 보기로 한다. 페리 빌딩에서 Pier 넘버를 세며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가장 번화한 Pier 39에 이른다. 예전의 목조 구조물이 그대로 보존된 상점 거리를 보니 골드러시의 호황기에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 느낌. 단 걸 좋아하진 않지만 분위기에 이끌려 초콜릿도 시식해 보고, 'I left my heart in SF' 조형물 앞에서 사진도 찍어 본다. 페리 빌딩에서
San Fransisco - 재팬타운과 차이나타운, 그리고 페리빌딩의 역사 [내부링크]
미국 와서 습관처럼 둘러보게 된 곳이 있다. 바로 코리아타운, 재팬타운, 차이나타운이다. 각 도시마다 이민 사회의 특징이 있지만, 이 세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밀접한 역사 때문에 은근 의식하며 비교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본국인 코리아타운이 제일 관심이 가는 건 당연지사. 그리하여 미국 최대의 코리아타운이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코리아타운에만 포스트 하나를 할애했고, 차이나타운의 경우 뉴욕에서 우연히 그 인근에 숙소를 얻으면서 또 포스트 전체를 할애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재팬타운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샌프란의 재팬타운도 별 기대 없이 왔는데, 지금까지 중 가장 일본스러운 모습에 갑자기 up되는 이 기분은 뭔가. 광장 중심에 우뚝 서있는 저 일본스러운 탑은 Peace Pagoda로, 일본이 샌프란 시에 우정의 선물로 헌정한 것이며, 메인 거리 Post Street에서는 매년 4월 벚꽃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또한 건
San Fransisco - 킬힐과 꽃길 [내부링크]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서도 포스팅했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언덕은 거의 킬힐(kill hill) 수준이다. 시내 자체는 그리 넓진 않으나, (오히려 다른 도시에 비하면 아담한 사이즈라는) 중간중간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언덕 때문에 가끔 걷기 힘들어질 때가 있다. 그럼에도 여기가 뉴욕 다음으로 애정하는 도시가 된 건 바로 아름다운 조경 때문이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집집마다 꽃이 피어있는 것도 모자라 길가에도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꽃길 너머로 펼쳐지는 바다 뷰가 가히 예술이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곳은 세계에서 가장 구불구불한 도로 롬바르드 꽃길(Lombard Street)이다. 단 한 블록에 해당하는 짧은 구간이 27도로 경사가 진 것도 모자라서 무려 8구간의 커브길이 나 있는데, 화단에는 색색의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집집마다 이름 모를 꽃까지 합세해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데, 킬힐의 고통을 견디며 오른 길 끝에서 바라본 바다 뷰는 지금까지 중 최고였다. 정말
San Fransisco - 골드러시와 Financial District [내부링크]
신대륙의 발견이 한창이던 15~16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황금의 땅 엘도라도(El Dorado)에 대한 전설이 퍼지기 시작한다. 지금의 콜롬비아에 있는 구아타비타 호수 인근에 Chibcha라는 부족이 살았는데, 그 추장은 중요한 의식마다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호수에 들어가서 씻어냈다는 얘기.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물을 호수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전설은 유럽에서 온 정복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고, 그리하여 시작된 골드러시는 남미 대륙을 초토화시켰지만 정작 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대항해 시대가 끝나고 콜롬비아가 독립하면서 칩차족의 유물이 대거 발견됐는데, 이것이 바로 골드러시의 원조가 되는 사건이다. 그 후 다시 시간이 흘러 19세기 중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한번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때는 1848년,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 강 유역에 있는 한 제재소에서 일하던 목수가 금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San Fransisco - 다운타운의 빛과 그림자 [내부링크]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심 Union Square 뉴욕에도 워싱턴에도 같은 이름의 광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샌프란의 여기가 특별한 이유는 여행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눈에 봐도 알겠지만, 유명 백화점부터 온갖 명품샵으로 둘러싸인 이 광장은 주위로 나있는 골목마다 중저가에서 5성급에 이르는 다양한 숙소가 몰려 있으며, 버스, 지하철, 공항철도 등 거의 모든 교통수단이 집결된 핫플 중의 핫플이어서 보통 다운타운이라고 하면 시청이 있는 시빅 센터보다 유니언 스퀘어를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이유로 이전 포스트에서는 "사기"라며 숙소에 대한 악담을 잔뜩 늘어놓았는데, 그래도 유니언 스퀘어 근처에 있어서 역세권과 맛집, 멋집의 혜택을, 그것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었으니 이 점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유니언 스퀘어가 마음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광장 주위에 로맨틱하게 세워진 하트 조형물 때문이었다. 이 하트는 Tony
San Fransisco - 스타트업의 도시 [내부링크]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메가버스를 탔다. 어쩌다 보니 동부는 그레이하운드, 서부는 메가버스를 이용하게 됐는데, 이유는 그때그때 가격이 싸서.ㅡㅡ; Las Vegas - Los Angeles: 07:15~12:40 $14.99 Los Angeles - San Fransisco: 23:00~07:05(+1) $14.99 여기다 예약비 $2.5까지 합하면 총 $32.48. 이 정도면 한국의 고속버스보다 훨 저렴하지 않은지. 물론 시설은 그보다 몇 배나 열악하지만ㅡㅡ; 그래도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 구간은 꽤 탈 만했다. 이티켓 맨 아래에 보면 같은 메가버스라도 운행하는 버스 이름이 각각 다른데, 사진 출처: 메가버스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를 운행하는 버스는 Windstar Lines라는 버스 렌털 업체를 통해 대여한 버스여서 정통(?) 메가버스보다 훨씬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다. 사진 출처: 메가버스 반면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구간은 2층짜리 정통 메가버스가 와서 그레
Los Angeles - 드디어 할리우드 [내부링크]
드디어 할리우드로 가는 길, 저 멀리 하얀색의 'Hollywood' 사인이 보이자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 중간에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발견하고 또 한 번 심쿵한다. 정녕 내가 할리우드에 온 것인가... 나의 소녀시대는 바로 이 파라마운트와 유니버설픽처스 로 대표되는 할리우드의 영화사들과 함께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기가 애틋하게 느껴진다. 정확히는 톰 크루즈로 시작해서 멕 라이언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또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 그녀의 영화가 떠오른다. 세상 가장 감미로룽 OST와 함께. 영화는 어이없게도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가 인생 영화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건 두 배우의 애절한 연기와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감미로운 배경 음악이라는 3 요소가 잘 버무려졌기 때문이리라. 나는 이것을 '할리우드의 마법'이라 부르고 싶다. 그리고 이것이 로스앤젤레스가 설레는 가장 큰 이유다. 바로 여기에 영화 산업의 성지, 할리우드가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
Los Angeles - 미라클 마일에서 로데오 드라이브까지 [내부링크]
숙소가 있는 윌셔 대로에서 서쪽의 산타모니카 방향으로 직진하면 박물관이 몰려 있는 Miracle Mile이 나온다. 박물관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이미 실컷 보고 왔기에 웬만한 전시 관람은 스킵하고, 여기서는 공연장 위주의 뮤직 센터(Music Center)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LACMA의 이 가로등 조형물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먼 데까지 출타하게 되었다는. LACMA는 LA County Museum of Art의 약자로, 현대미술관을 MoMA(Museum of Modern Art) 그대로 '모마'라고 발음하듯 여기도 간편하게 '라크마' 혹은 '락마'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를 설레게 한 이 조형물로 말할 것 같으면 1920~30년대의 가로등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으로, 작품명은 '어반 라이트(Urban Light)'이다. 언뜻 보면 같은 종류의 가로등을 모아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나 모양이 모두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두 16
Los Angeles - 시티 오브 앤젤 [내부링크]
시청에서 홈리스 텐트촌을 건너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으로 가는 길 공공의 도로를 불법으로 점령한 건 그들인데, 왜 난 남의 집 안마당을 침범한 듯 죄책감이 드는 걸까ㅡㅡ? 다행히 그들은 자신들의 구역만 침범하지 않으면 별다른 해코지를 하지 않았지만, 이 참을 수 없는 역한 냄새는 또 어쩔 것인가ㅡㅡ; 로스앤젤레스는 도시 자체도 낙후됐지만, 홈리스 텐트촌과 악취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여행하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노숙 텐트촌을 지나니 곧 예스러운 건물이 어우러진 광장이 나왔는데, 여기가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기원이 되는 엘 푸에블로 역사 공원이다. 풀네임은 El Pueblo de Los Angeles State Historic Park로, 공원 안에는 1781년에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시를 창건하라고 명한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3세의 동상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도시 이름은 'El Pueblo de Nuestra Senora la Reina de los Angeles del R
Los Angeles - 다운타운 가는 길 [내부링크]
로스앤젤레스의 흔한 거리 풍경 이름부터 에스빠뇰이라 설마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정말 남미 feel이 완연하다. 그래서 더 궁금해진다. 이 도시의 역사가. 도시의 역사를 찾으러 다운타운으로 가는 길 초입에서 반갑게도 중앙도서관을 발견했다. 언뜻 보면 겨우 2~3층 높이의 허름한 건물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지성과 감성의 내공이 들어 있었으니, 1층으로 들어가면 로비에서 지하로 향하는 거대한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지하로 내려가면서 분야별 열람실이 4~5층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체감상 뉴욕의 공공도서관보다 훨씬 방대하게 느껴지는데, 독서 공간이나 노트북 작업 공간 하나하나마다 파티션이 되어 있는 걸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공공 장소에서 프라이버시를 이토록 존중받을 수 있다니 역시 미국답다는 생각이 든다. 1층 로비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우아한 돔형의 로툰다가 나오는데, 그 주위로 빽빽하게 그려진 종교화를 구경하며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이런 크고
Los Angeles - 코리아타운과 도산 안창호 루트 [내부링크]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궁금하여 일부러 한인민박에 묵었는데, 막상 와보니 한국어 간판만 난무할 뿐, 동네 분위기는 상당히 낡아 있어 마치 한국의 7080년대를 연상시킨다. 이는 뉴욕의 마천루 한가운데 코리아타운이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인데, 도시가 이렇게 낙후된 데에는 LA 특유의 어번 스프롤(Urban sprawl) 현상이 한몫한 듯하다. 로스앤젤레스는 뉴욕 다음가는 미국 제2의 도시이지만, 뉴욕처럼 독립 이전부터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독립 이후 전쟁으로 점령한 곳이어서 원래부터 히스패닉계 주민이 많았고, 20세기 이후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과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 등에서 이민 노동자를 받으며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 이루어진 케이스이다. 그래서 마천루가 빽빽한 뉴욕에 비하면 스카이라인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도시 인프라 또한 열악해서 처음에 도착하면 당황하기 십상인데, 나 역시 그런 이유
Las Vegas - 카지노보다 호텔 투어 [내부링크]
스나이더에서의 태평성대는 가고, 어느덧 나는 사막 위의 오아시스 같은 유흥과 환락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와 있었다. 게임 알못인 내가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중간에 "굳이" 이곳에 들른 이유는 예전에 했던 게임 관련 프로젝트가 문득 생각나서.ㅡㅡ; 게임이라고는 하나 개발이 아닌 컨설팅이고, 사업 중간에 갑자기 법제도가 바뀌면서 멘붕에 빠지기도 했던지라 세월이 지나도 당최 잊히지를 않네. 한편으로는 몰랐던 분야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덩달아 새로운 인연도 얻을 수 있었으니 이번 미국 여행에서 문득 생각난 연유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니 그때 프로젝트를 하는 내내 생각했던 화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게임의 건전성에 관한 것이었다. 어찌 됐든 유희라는 것은 적당히 즐기기가 힘든 부분이라. 그게 게임이든 술이든 영화든 뭐든 말이다.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란 말도 있지만, 한번 즐기기 시작하면 중독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가 아닐는지. 하지만 당시 벤치마킹 대상으로 물망에
Snyder - 소울메이트 만나러 가는 길 [내부링크]
드디어 폴란드 언니가 사는 로턴(Lawton)으로 가는 날. 미국 입문 편에서도 썼지만 폴란드 언니는 폴란드에서 만난 한국 사람이다. 그땐 동유럽에서 한국인을 만나는 게 마냥 신기했던 시절이라 단 하루의 인연이 한국까지 이어졌고, 더욱이 같은 도시에 살던 우리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만나며 우정을 다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잘생긴 아메리칸 남친을 만난 언니는 결혼을 하고 주니어를 낳더니 훌쩍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그때서야 알았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언니한테 꽤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걸. 그로부터 꼬박 2년 만에 언니를 다시 만나러 가는 것이다. 미국행이 결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언니에게 보이스톡을 했다. 육성을 들으니 예전의 담대했던 언니가 떠올랐고, 우린 금세 '폴란드' 시절로 돌아가서 긴긴 통화를 했다. 언니가 계신 곳은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로턴(Lawton). 지도를 보니 동부와 서부 사이에 딱 중간쯤 쉬어가기 좋은 위치다. 마침 남편이 연수 중이라 집에는 주니어랑
Washington, D.C. - 전쟁과 평화 [내부링크]
숙소에서 내셔널 몰 가는 길에 발견한 상당히 앤틱해 보이는 붉은 건물, 여기가 바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포드 극장(Ford's Theatre)이다. 개척 시대에 몸으로 노동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수많은 사업 실패와 낙선 끝에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이브러햄 링컨. 그런 그가 동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출신 배경도 다른 일명 '엄친아' 존 F. 케네디와 자주 함께 거론되는 이유는 아마도 '암살당한 대통령'이 주는 강렬함 때문일 것이다. 둘 다 100년이란 간극을 두고 하원 의원에서 시작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점, 그리고 흑인 인권을 위해 애쓴 점이 그러한데, 암살 당시 총에 맞은 것과 장소 이름에 '포드'가 들어가는 것까지 똑같았다고 한다. 링컨은 바로 이 '포드' 극장에서 공연을 보던 중 총에 맞았고, 케네디는 재선을 위한 퍼레이드 중 '포드' 차에서 암살당했다는. 그래서 포드 극장이 더욱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박물관 일정에 쫓겨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매일 아침
Washington, D.C. - 박물관 투어 [내부링크]
인류의 지식 증진과 보급을 위한 시설을 미국 워싱턴에 짓는 데 전 재산을 기증하겠다. - 출처: Smithsonian Institution Archives 18세기 후반, 영국의 과학자 중에 제임스 스미스슨(James Smithson)이란 사람이 있었다. 부유한 귀족이면서 광물학자였던 그는 독신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영국이 아닌 미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전 재산을 기증했는데, 그 액수가 무려 50만 달러였다고 한다. 지금 환율로 환산해도 6억에 가까운 돈인데,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터.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그가 죽기 전에 굳이 신대륙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이 장차 세계 인류의 전시장이 되리라는 걸 예측이라도 한 것일까? 아무튼, 그런 그의 이념을 기리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스미스소니언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를 만들고 각 분야별 박물관을 설립했다. 그리고 무료 개방이란 원칙 하에 지금
Washington, D.C. - 국회의사당과 워싱턴의 이념 [내부링크]
어느새 뉴욕에서의 한 달이 지나가고, 이렇게 쾌적하고 녹음이 짙은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미국이 독립과 함께 뉴욕을 임시 수도로 정하고, 그 후 필라델피아로 천도했다가 다시 새로운 행정수도를 개척하기 위해 장장 10년에 걸친 계획 끝에 탄생한 세 번째 수도 워싱턴 D.C. 정식 이름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이며, 여기서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컬럼비아는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서 각각 따온 이름이다. (참고로 같은 뜻의 남미 국가 Colombia와는 철자 하나 차이) 하지만 미국 경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뉴욕이고, 한때 임시 수도이기도 했던 곳에서 이미 한 달이나 있었기에 오직 수도로서의 기능만 담당하는 계획도시를 굳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히 고민했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신행정 수도가 건설된 사례는 여럿 보았지만, 기존 수도의 역할이 분산되기만 했을 뿐, 여전히 사람들은 오랜 역사가 깃든
뉴욕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당일치기 [내부링크]
뉴욕에 있는 동안 하루는 시간을 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다녀왔다. 물길을 좋아하는 내게 있어 '세계 3대 폭포'라는 명성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므로. 동시에 나이아가라강을 경계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고. 10년 전엔 반대쪽에 있는 밴쿠버에 갔었는데, 동쪽은 또 어떤 분위기일까. 그리하여 알아본 뉴욕-나이아가라 폭포 구간은 직행이 없고, 버스든 비행기든 버펄로(Buffalo)라는 도시를 경유해야 했다. 물론 투어를 이용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겠지만, 3대 폭포 중 가장 규모가 협소한 그곳에서 굳이 1박을 하고 싶진 않아서 좀 귀찮지만 밤 버스로 다녀오기로 했다. 사진 출처: usatoday.com 그리하여 예약한 버스는 그 이름도 악명 높은 그레이하운드. 이 외에도 메가버스, 플릭스버스, 피터팬버스, 볼트버스 등 회사는 많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일정에는 그레이하운드가 제일 저렴했다. New York - Buffalo: 12:15 AM
New York - 뮤지컬 로또 당첨 [내부링크]
뉴욕에서 한 달 살이를 하던 어느 날, 우연히 '뉴욕 뮤지컬'로 검색했다가 '로터리 응모'라는 걸 발견했다. 브로드웨이 다이렉트( https://lottery.broadwaydirect.com )라는 사이트에서 'Lottery' 메뉴에 들어가면 그날 응모할 수 있는 공연 목록이 뜨는데, 그중에서도 내 시선을 강탈한 건 다름 아닌 <The Cher Show>. 뮤지컬을 본다면 <오페라의 유령>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래전 영국에서 못다 이룬 아쉬움도 있었고, 그 뒤에 접한 영화와 책도 충분히 강렬했으며, 심지어 한때 노래방 18번도 메인 테마곡인 'The Phantom Of The Opera'였으니.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목록에 없고, 대신 <더 셰어 쇼>의 강렬한 포스터에 꽂혀버리고 만 거다. Cher라는 가수는 영화 <맘마미아 2>의 엔딩 장면에서 처음 봤었다. 성형 중독 같은 외모에 왠지 게이일 것 같은 등발과 묵직한 보이스가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 아바의 'Fernando'
New York - 소호에서 하이라인까지 내가 사랑한 커피 로드 [내부링크]
숙소가 있는 로어 이스트에서 뜻하지 않게 블루보틀을 발견했다. 때마침 한국에도 블루보틀이 상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입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난 이런 한가한 동네 카페 같은 데서 드립의 고급짐과 믹스의 달달함이 적당히 버무려진 뉴올리언스를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시고 있으니 감읍할 따름. 가격은 택스 포함 $4.63로, 5300원 정도이니 한국보다 500원이 더 싼 셈이다. 하지만 가격과 브랜드 밸류를 차치하고라도 여길 자주 찾은 이유는 로어 맨해튼의 거리가 훤히 보이는 뷰 맛집에 좌석도 편하고 무엇보다 붐비지 않아서 좋았다. 이 동네는 워낙 빈티지스럽고 개성 강한 가게가 많아서 이런 심플한 곳은 잘 안 찾는가 본데, 개인적으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인테리어를 선호해서 웬만하면 빈티지샵은 피하게 되더라는.ㅡㅡ; 그렇게 블루보틀에서 1잔하고 대로변으로 나오면 거대한 Houston Street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서쪽의 허드슨강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그
New York - 드디어 브루클린 [내부링크]
드디어 브루클린 브리지를 건너 브루클린으로 넘어가 본다.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뉴욕 시가 세워진 이래 건설된 최초의 다리로, 미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만큼 고풍스러운 외관인데, 강철 케이블로 다리를 지탱하는 방식의 현수교로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140여 년이라는 세월만큼이나 오래된 석조 타워는 한없이 견고해 보이나, 삐걱거리는 나무다리가 사뭇 불안한데, 자세히 보니 인도만 나무로 되어 있고, 좌우로 연결된 차도와 그 중간에 지나가는 지하철은 모두 현대식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각 연결 부위는 강철 케이블로 단단하게 엮어놓아서 생각보다 견고한 느낌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 다리는 정중앙에 사람이 있고 차들은 그 아래로 밀려난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구조. 역시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미국다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다리다. 옆으로는 현대적인 모습의 맨해튼 브리지가 보이고, 다리가 끝날 무렵 왼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오는데, 이 계단을 통과해서 다시 왼쪽으로
New York - 월스트리트의 이민 역사 [내부링크]
숙소가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서쪽의 허드슨 강 쪽으로 걷다 보면 뉴욕 시청과 가정법원이 있는 시빅 센터가 나온다. 시청이라면 으레 시내 중심에 있을 줄 알았는데, 뉴욕은 특이하게도 맨해튼 남쪽 끝에 정부 기관이 몰린 형태. 이는 아마도 유럽인들이 처음 뉴욕에 정착할 때 남서쪽 끝에서부터 터전을 잡기 시작해서일 것이다. 시청 앞으로는 브루클린 브리지로 갈 수 있는 고가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나, 지금 같은 불볕더위에 그늘 한 점 없는 저기를 도저히 건널 자신이 없어서 이따 해질녘으로 미뤄두고 가던 방향으로 계속 궈궈~ 시빅 센터를 지나면 갑자기 빈약하던 로어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바로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시작점이다. 빌딩 사이로 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리미처럼 생긴 플랫아이언 빌딩(Flatiron Building)도 나오고, 골목 중간에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건물도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미국 독립의 역사와
New York - 로어맨해튼의 중심 차이나타운 [내부링크]
뉴욕에서 처음으로 집을 보러 가던 날, 타임스퀘어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이 사뭇 불안한 건 사실이었다. 시내에서 너무 떨어진 건 아닐까. 우범지대는 아닐까... 그러다 이내 고풍스러운 바워리 은행이 눈에 들어왔고, 건너편으로는 한자가 난무하는 차이나타운이 보이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이상하게 이 동네가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든 건. 저 바워리 은행을 기점으로 로어맨해튼은 서쪽의 소호와 동쪽의 로어이스트, 남쪽의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로 나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차이나타운이 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차이나타운은 남부 맨해튼의 정중앙에 V자로 분포하고 있어서 이 일대를 지나다 보면 어떻게든 마주치게 되어 있으며, 숙소 또한 그 경계에 있었기에 차이나타운의 일상이 곧 나의 일상이 되었다. 커다란 공자 동상도 있고, 싸디 싼 중국식당도 많은 활기찬 차이나타운. 중국 여행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런 입지가 상당히 장점으로
New York - 더없이 미국적인 센트럴 파크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내부링크]
맨해튼의 블링블링한 5번가는 삐까뻔쩍한 황금 동상과 플라자 호텔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그다음부터는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의 푸르른 녹지가 펼쳐진다. 그것도 무려 51블록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구간에 걸쳐서. 이는 도시공원의 선구자였던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와 칼베르 보의 'Greensward plan'에 의한 결과물이다. 지금 여기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칼베르와 옴스테드는 공원이 인종과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들의 이념 하에 1858년 약 1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원이 조성됐는데, 사실 뉴욕만큼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이만한 규모의 그린벨트를 할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터. 그럼에도 완공 이래 지금까지 160여 년의 세월 동안 뉴욕시는 이 거대한 녹지를 꿋꿋이 지켜왔고, 심지어 마음껏 활용하고 있었다. 공원 아래에는 호텔 존을 형성하여 도심 속
New York - 공공도서관과 브라이언트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내부링크]
5번가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록펠러 센터 사이에 뉴욕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던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과 브라이언트 공원(Bryant Park)이 있다. 이 '공공도서관'이란 이름에는 꽤 재미있는 사연이 들어있는데, 뉴욕의 공공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기관이 아니다. 19세기 이 지역의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하나로 합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사설 도서관으로, 맨해튼의 5번가에 있는 여기가 본점이며, 그 외 지점이 무려 80여 군데나 되는 도서관 계의 대기업인 셈. 그러므로 이름에 들어가는 'Public'은 공공시설이 아닌 '대중을 위해 열려 있다'라는 의미이며,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그러니 쫄지 말고 마음껏 들어가시라. 뉴욕에 있는 동안 뽕을 뽑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테니. 1911년 강철왕 카네기를 비롯한 대부호들의 기부로 지어져서 웅장한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화려한데, 이곳의 백미는 뭐니 뭐
New York - 5번가와 마천루의 전설 [내부링크]
타임스퀘어에서 5번가로 가는 길에 투박하면서도 거대한 빌딩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이게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석유왕 록펠러의 아들이 지었다는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의 GE(General Eletrics) Building. 19세기 중반 2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국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일찍이 석유 사업에 뛰어든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당시 미국의 정유산업을 95%나 장악하면서 일명 '석유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평범한 서민 집안 출신이었던 그가 이토록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건 영세한 기업의 경영권을 헐값에 매입하면서 서서히 독점해가는 트러스트(trust) 형태의 경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런 이유로 연방재판소로부터 트러스트법 위반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돈'이란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의 석유 재벌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 '더러운 돈'을 사회에 아낌없이 환원했다. 그는 가
New York - 브로드웨이와 타임스퀘어의 광장 문화 [내부링크]
미국 오자마자 숙소 구하는 문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차이나타운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됐는데, 사실 뉴욕에서 제일 처음 맞닥뜨린 풍경은 바로 타임스퀘어(Times Square)였다. 뉴욕의 중심이자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앞다투어 광고를 게재하는 곳이며, 스퀘어가 정방형이 아닌 세모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준 곳. 유럽인들이 정착하여 일군 나라이기에 미국 역시 유럽의 도로 체계처럼 가로 세로 구획이 나누어진 Street와 Avenue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해튼에는 특이하게 대각선으로 뻗은 도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브로드웨이(Broadway)이다. 이 브로드웨이가 지나가면서 사각형의 블록이 조금씩 어그러지다가 7번 애비뉴와 만나는 순간 꼭짓점을 이루며 삼각 구도를 형성하는데, 여기서부터 아래로 42번 스트리트까지 이르는 광장이 바로 타임스퀘어다. 원래는 롱에이커 스퀘어(Longacre Square)로 불렸으나, 미국 굴지의 신문사 '뉴욕 타임스'가 들어서면서 지
뉴욕 한 달 살기 [내부링크]
인아웃 도시를 어디로 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세계 최고의 멜팅팟에서 한 달을 먼저 살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뉴욕으로 결정하고 보니 취항하는 항공편도 제일 많고, 숙소 매물도 넘쳐난다. 너무 옵션이 다양해서 결정 장애가 온 게 문제긴 하지만.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봉답다는. 항공편은 때마침 아시아나 여름 프로모션이 떠서 뉴욕 인, 시애틀 아웃 일정을 단돈 90만 원에 겟하고, 숙소는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헤이코리안'이란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HeyKorean > 미주 부동산 > 렌트, 룸메이트, 서블릿, 방쉐어, 하숙/민박, 스튜디오 등 rent.heykorean.com 여기서 부동산 메뉴에 들어가면 지역별, 유형별로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 뉴욕, 그중에서도 맨해튼은 물량이나 가격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가격이 비싼 거야 어차피 각오한 일이니 단기 숙박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 생각했는데, 고맙게도 연락을 보낸 곳 중 2군데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미국은 처음이라 [내부링크]
또 슬럼프가 찾아왔다. 이대로 전진할 힘 제로. 그래서 또 늘 그렇듯 여행을 떠난다. 이번에는 무려 세계 최강 경제대국, 그 이름도 아름다운 나라, 美國이다. 지금까지 내 여행 패턴은 유럽을 제외하면 철저히 미지의 세계로 무장된 나라들이었고, 그래서 내 주변 지인들은 '그런 데'만 가냐고 만날 때마다 한 소리씩 해댔지만, 그 미지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문명이 마지막으로 수렴된 곳이 미국이라는 것, 그렇게 각 나라의 자양분을 받고 자란 나라가 세계 굴지의 최강국이 되었다는 것, 고대로부터 그리도 부르짖던 자유와 민주의 개념이 최단 시간 내에 정착한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이다. 사실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는 할리우드 영화나 팝송, 맥도널드 같은 미국 문화를 쉽게 접해왔고, 어른이 되어서는 3차 산업혁명과 함께 IT를 주도하는 그들의 제품을 써왔기에 어느새 미국은 안 가봐도 아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여행을 준
India - Kolkata - 세 번째 시티 오브 조이 [내부링크]
드디어 이번 여행의 마지막 도시 캘커타로 왔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반 세기가 지났고, 캘커타는 콜카타로 개명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내겐 여전히 캘커타로 남아 있는 곳. 정확히 말하면 캘커타보다는 영화 <시티 오브 조이>로 더 기억되는 곳이다. 내가 인도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이 영화에서 비롯됐으니. 그때도 지금도 인력거는 여전하지만, 이젠 아저씨들도 힘든지 탈 것을 굳이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4차 산업혁명이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도 저 인력거꾼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캘커타 시절을 추억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캘커타답고, 그래야 인도다우니까. 인도는 벌써 세 번째지만, 올 때마다 들른 곳은 바라나시와 캘커타 단 두 도시뿐인데, 이번에 바라나시에서 말도 안 되는 점성술사를 만나는 바람에 순위가 역전되어 여전히 좋은 도시는 이제 캘커타 하나만 남게 됐다. 역시 캘커타는 그래서 '시티 오브 조이'. 처음 왔을 땐 인도답지
India - Shantiniketan - 타고르 스피릿 [내부링크]
볼푸르(Bolpur) 하고도 샨티니케탄(Shantiniketan). 바라나시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꼬박 24시간이 걸렸다. 여기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캘커타까지는 12시간밖에 안 걸렸으면서. 그만큼 깡시골이란 얘기다. 기차가 거의 30분 단위로 서는 진정한 로컬 노선을 타야만 올 수 있는 곳. 이런 오지(?) 마을까지 굳이 들어온 이유는 인도의 시성(詩聖)이자 아시아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타고르가 자연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실현하고자 조성해놓는 대학 마을을 보기 위해서였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 타고르는 일제 치하의 조선을 격려하기 위해 지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도 유명한데, 나는 그보다 만해 한용운의 작품세계를 통해 그를 먼저 접했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India - Varanasi - 카초리 가게에서 만난 점성술사 [내부링크]
리시케시에서 바라나시로 가는 기차에서 사 먹은 런치 박스 이것이 시작이었다. 푸리보다 더 맛난 카초리(Kachori)의 매력을 발견한 것이. 카초리는 두 번째 사진에서 비닐에 싸여 있는 납작한 빵으로, 언뜻 보기엔 차파티처럼 생겼지만, 맛과 질감이 전혀 다르다. 차파티는 밀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한 것을 프라이팬에 구운 것이고, 카초리는 그 반죽을 튀겨낸 것인데, 같은 튀김빵인 푸리와 달리 반죽할 때 기름을 섞기 때문에 그 풍미가 한층 더 진해진 느낌이다. 차파티를 작게 만들어 튀긴 푸리(Poori 또는 Puri)와 반죽 과정에서 기(ghee)를 넣어 더욱 쫀쫀해진 카초리(Kachori) 사실 뻥튀기처럼 부풀려진 푸리도 직접 뜯어먹어 보면 속은 쫄깃한데, 물과 밀가루로만 반죽했기 때문에 겉이 너무 바삭해서 자칫 잘못하면 입천장이 까질 우려가 있다. 이에 비해 카초리는 정제 버터로 단단히 무장된 반죽을 튀겨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모두 쫄깃 촉촉하기 이를 데 없다는. 이런 깨알 같은 지식
India - Rishikesh - 사두, 요기 니튼 그리고 화폐 개혁 [내부링크]
종교와 사상과 인종 문제로 다사다난했던 스리나가르에서의 나날은 가고, 어느새 이런 한없이 힌두스러운 리시케시(Rishikesh)로 오니 시간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이다. 그땐 나도 초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뭐든지 흡수하려고 눈이 빛나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그 현장에 다시 와보니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더라. 이제 요가와 명상은 그저 일개 강의에 불과할 뿐, 여기에 온 명분이 되지는 못하였으니.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나만의 요가 철학을 정립할 수 있게 해 준 시바난다 아슈람의 요가 강좌가 없어졌다는 거였다.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건지 아니면 영영 운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가 살라가 있던 곳은 자물쇠로 굳게 채워져 있었다. 수줍고도 오묘한 발음으로 잔잔하게 수업을 리드하던 일본 선생님은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또한, 아엥가 요가의 매력을 알게 해 준 수리얀시 선생님은 라즈팰리스의 요가홀에서 기타 아슈람으로 옮겨갔다는
India - Srinagar - 자유라는 빛과 그림자 [내부링크]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넘어오던 날, 시간을 맞추려고 휴대폰을 껐다 켰더니 외교부에서 이런 문자가 와 있었다. 카슈미르 철수권고 무력분쟁 격화 테러 위험 증가 ... 아놔, 곧 카슈미르 가야 되는데... 달 레이크도 꼭 봐야 되는데... 내가 카슈미르를 꿈꾸게 된 건 수많은 인도 영화에 나왔던 알프스보다 아름다운 풍경과 인도 가이드북의 엄청난 소개글 '인류의 잃어버린 파라다이스'에 대한 철없는 로망 때문이었다. 영화 <한밤의 아이들> 오프닝에서 시카라가 유유히 가로지르던 몽환적인 달 레이크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Fanaa>와 <카슈미르의 소녀>에 나왔던 스위스보다 아름다운 그곳은 대체 어디쯤일까...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무려 세 나라로 쪼개진 인도. 그중에서도 카슈미르(Kashmir)는 특히나 그 역사가 기구한 곳이다. 인도가 종교 문제로 분리되면서 힌두교도가 많은 곳은 인도령, 이슬람교도가 많은 곳은 파키스탄령이 됐는데, (파키스탄은 다시 거리 문제로 파키스탄과
India - Amritsar - 시크교 성지에서 만난 크리스천 [내부링크]
라호르에서 인도의 암리차르까지는 국제 버스를 이용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라호르 백패커스에서 만난 중국인 한이 이걸 타고 넘어갈 거래서 얼떨결에 동행하기로 결심, 그를 따라 버스 사무실에 표를 사러 갔더니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다. 1500루피에 심지어 체크인 시간은 새벽 5시. 그럼 적어도 4:30까지는 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숙소에서 4시쯤엔 출발해야 한단 얘기. 저걸 과연 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다가도 한편으로는 꼼꼼한 성격의 그를 따라가고 싶어진다. 난 그저 블로그 몇 군데 찾아보고 릭샤나 대충 네고해서 국경까지 가려고 했는데, 준비성 철저한 그는 인터넷 정보를 싹 다 뒤져서 국경 절차부터 교통편까지 완벽하게 숙지해놓은 것이다. 게다가 알고 보니 아프가니스탄까지 다녀온 여행계의 찐만렙이라는. 아무튼, 그런 그 덕분에 버스표도 무사히 사고, (참고로 티켓 예매 시 여권과 양국의 비자 복사본이 필요하다.) 다음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워줘서 늦지 않게 올 수 있었
Pakistan - Lahore - 아직 파키스탄이라서 괜찮아 [내부링크]
라왈핀디에서 라호르까지는 그 유명한 대우버스를 탔다. 대우가 대기업이던 시절, 파키스탄에 최초로 고속도로를 놓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대가로 버스를 운행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전설의 버스. 대우가 공중분해된 후에는 삼미건설이 인수하면서 '삼미대우버스'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파키스탄 최고의 버스회사로 거듭났다는 전설의 그 버스. 그 명성에 걸맞게 전용터미널부터 버스 시설, 그리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과연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시설은 우리나라의 우등버스 수준인데, 기내식도 나오고, 비행기처럼 승무원도 돌아다니니 이만하면 전 세계를 통틀어 손에 꼽을 할 만하지 않은지. * Rawalpindi - Lahore: Daewoo Express 00:00~04:30, 1550루피 훈자-이슬라마바드 구간의 나트코 버스가 16시간에 2천 루피 조금 넘었던 걸 생각하면 겨우 4시간에 저 가격이니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만큼 서비스가 커버한다. 꼭두새벽에 도착해도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안전한 터미널에서
Pakistan - Islamabad -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내부링크]
훈자를 빠져나오는 길은 무던히도 힘들었다. 동화 같은 거기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서 힘들었고, 카리마바드에서 길깃을 지나 이슬라마바드로 이어지는 거친 산악길 때문에 몸이 지쳐서 힘들었다. 훈자 밸리에서 그토록 경이해 마지않던 카라코람 산맥의 위용은 수도인 이슬라마바드까지 죽 뻗어 있었으므로. 특히 훈자가 있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는 인도의 카슈미르주와 인접해 있어서 두 나라의 분리 독립 이후 끊임없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며, 탈레반의 근거지인 카이베르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주와도 가까워서 사실상 여행경보 3단계인 철수권고 지역에 해당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나가려면 수많은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여권과 비자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가끔은 심문을 당하기도 한다. 물론 여행자, 그중에서도 여성 여행자는 별로 심문당할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5군데나 되는 체크 포인트마다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는 건 상당
Pakistan - Karimabad - 여행자들의 블랙홀, 훈자 [내부링크]
훈자 계곡의 라이프는 카리마바드(Karimabad)에서 시작되고, 카리마바드는 바로 이 제로 포인트(Zero Point)에서 시작된다. 이곳을 지나는 거의 모든 차가 여기서 발착하기에 카리마바드를 들어오거나 나가려면 반드시 이 제로 포인트를 거쳐야 한다. 여행자 숙소 또한 이곳을 중심으로 몰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내가 묵은 곳은 제로 포인트 바로 앞에 있는 Haider Inn이다. 여길 픽한 이유는 이전 포스트에서도 썼듯이 친절 대마왕 악바르 아저씨가 데려다주셔서.ㅋ 얼떨결에 따라왔지만 오고 나서 더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창이 발달한 리셉션 때문이었다. 마침 묵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거의 독채처럼 사용했는데, 이 일대에서 가장 빵빵한 와이파이를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건 훈자에는 워낙 볼 게 많아서 도저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가 없더란 말이지. 방은 리셉션 바로 아래에 있는데, 여기가 1층이다. 어차피 지대 자체가 울퉁불퉁한 깡시
Tashkurgan(China) - Sost(Pakistan) - 드디어 카라코람 하이웨이 [내부링크]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하고 쿤제랍 포트로 걸어가는데 서서히 미명이 밝아온다. 참고로 지금 시각은 아침 08:30. 어제 버스터미널에서 분명 10:30이랬는데, 이렇게 일찍 나온 이유는 숙소 직원이나 파키스탄 상점 직원 모두 버스 시간이 8:30이라고 정정해줘서, 하지만 쿤제랍 포트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굳게 닫힌 문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신장 타임이란 것을. 중국도 러시아나 미국처럼 동서로 거대한 대륙을 물고 있기에 각 경도에 따른 시차가 발생하는데, 기준은 무조건 베이징 타임이고, 공식적인 스케줄도 베이징 타임으로 표기하므로 크게 헷갈릴 일은 없다. 다만 이렇게 현지인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을 경우 그 지역의 시차를 모르면 지금과 같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신장은 동쪽에 있는 베이징으로부터 가장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2시간의 시차가 있다. 그래서 기차 스케줄 같은 공식적인 표기는 베이징 타임이 적용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는 로
China - 塔什库尔干(Tashkurgan) - 국경의 밤 [내부링크]
카스에는 국제버스터미널(喀什国际汽车站)이 있다. 이름에 '국제'가 들어가니 당연히 파키스탄도 여기서 가면 되는 줄 알았다.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숙소 직원들도 비슷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니까. (다만 확신이 없다는 게 함정ㅡㅡ; 이때 의심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리하여 카스에서의 마지막 날, 호기롭게 남은 돈을 싹 다 긁어 쓰고, 마지막 버스비만 남겨둔 채 국제버스터미널로 갔더니 중국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환영이라도 하듯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오른다. 오늘은 시작부터 순조롭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Tashkurgan, Sost, 今天, no bus." 위구르어, 우르드어, 중국어, 영어가 마구 뒤섞인 절망적인 말을 내뱉는 매표소 직원.ㅠㅠ 오늘만 안 가는 건가 싶어 내일은 버스가 있냐니까 모르겠다며 어깨를 으쓱 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시내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서 타슈쿠르간만이라도 갈 방법이 없겠냐니까 대답하기 귀찮은지 창구를 아예 닫아버린다. 헐... 황당해하고
China - 喀什(Kashi) - 위구르의 매력 [내부링크]
드디어 신장위구르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카스(喀什)까지 와버렸다. 위구르어로는 카슈가르(Kashgar).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주도는 우루무치지만, 한족이 대부분인 거기보다 오히려 변방의 여기가 훨씬 위구르의 본거지 같은 느낌이다. 비록 대로변에는 마오 동상과 홍등이 난무하지만, 골목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위구르 양식의 옛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중국의 다른 도시처럼 번화하지만 번잡하지 않으며, 중국어보다 위구르어의 사용률이 훨씬 높아서 성조로 인해 목소리가 격해지지도 않으니 상대적으로 차분한 느낌. 바로 우루무치의 그랜드 바자르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다. 중동과 아시아 사이에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기에 지켜낼 수 있었던 위구르만의 품격. 골목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위구르 음식 3종 세트 튀긴 밀가루 과자에 설탕을 뿌려놓은 상사는 모두가 다 아는 그 맛이고, 묵을 가늘게 썰어서 양념을 뿌려주는 묵 국수는 예전에 티베트 망명 마을이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먹은 적
China - 乌鲁木齐(Wulumuqi) - 서역으로 한 걸음 [내부링크]
중국에서도 서쪽 끝에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서역'이라 불렸던 신장위구르자치구. 이곳은 원래 돌궐(突厥)로 알려진 튀르크계 민족이 살던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북방의 넘사벽 유목민인 흉노족의 침략과 이를 견제하려는 한나라의 간섭, 그리고 선비족, 유연족 등 이 일대에 분포하던 여러 유목민족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돌궐족의 일부는 서쪽으로 건너가 훗날 오스만 제국을 세우고, 나머지는 이곳에 남아 위구르 제국을 세웠는데, 이때가 당 현종 때인 744년의 일. 당시 중국은 양귀비에 푹 빠진 황제 때문에 조정이 혼란한 상태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민란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그중 황제의 총애를 받던 안녹산과 사사명이 난을 일으키자 이 기회를 틈 타 위구르 제국이 '안사의 난'을 진압하고, 당나라의 원조국으로서 당당히 조공을 받으며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된다. 이후 토번국(현재의 티베트)을 제외한 중국의 북부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며 실크로드의 요지에서 어마어마한
China - 敦煌(Dunhuang) - 천불동의 전설 [내부링크]
조행덕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지금의 자신이 예전의 자신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자신이 마음속으로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이 다른 것과 통째로 바뀌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적어도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아울러 조행덕이 지금까지 고수해온 사고방식이나 인생의 대처방법 등을 근본부터 흔들어대는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 이노우에 야스시의 <둔황> 중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저럴 때가 있을 것이다. 강렬함과 짜릿함, 그리고 상식이 무너지는 걸 느낄 때가. 나 역시 소설 속의 조행덕처럼 과거 급제만이 입신양명의 길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 길이 그 길이 아닌 것 같은, 이 길 말고 어딘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다. 그럴 때마다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끊고 휴식기를 가질 것인가 하는 양가적인 감정에 시달렸는데, 살면서 딱 두
China - 西安(Xi'an) - 서안과 장안 그 어디쯤엔가 [내부링크]
여기는 곤명에서 서안으로 가는 기차 안 중국에서 이틀 연속으로 기차를 타는 건 처음이라 오랜만에 여유를 갖고 기차 풍경도 한번 찍어본다. 지금 타고 가는 이 기차는 우리나라의 무궁화호에 해당하는 K등급의 일반 열차로, G등급의 고속열차보다 2배 가까이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사실 시간을 절약하는 편이 여행에서 이득이긴 하나, 때로는 밤차를 타고 아침에 내려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게 나을 때도 있다. 지금 가고 있는 곤명-서안 구간이 그런 케이스인데, 고속 열차의 경우 대부분 밤 도착이라 안전을 위해 그냥 하루를 더 쓰고 아침 일찍 도착하는 편을 택하기로 한다. 중국의 침대칸은 인도의 SL이나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3등석보다 훨씬 시설이 좋아서 기차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참고로 내가 예약한 좌석은 딱딱한 침대(硬臥)였는데, 쿠션감도 있고, 무엇보다 깨끗해서 좋더라. 다만 3층까지 높이가 어마무시해서 오르내리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뿐. 그리
China - 丽江(Lijiang) - 지극히 아름다웠던 리장 [내부링크]
리장(丽江)은 앞서도 말했지만, <신서유기 시즌2>를 보며 이번 여행을 꿈꿀 만큼 가장 기대되고 가장 아껴둔 곳이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까 봐, 곤명을 통해 운남성으로 들어오던 날 루트를 잠시 수정하여 대리와 샹그릴라를 먼저 다녀옴으로써 평정심을 좀 찾은 후에 가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해도 될 만큼 리장은 운남성의 최고봉이었으니. 이곳에서는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구분이 서지 않는다. 이곳을 걷는 이들은 누구나 시간의 감각과 함께 아주 자주 길을 잃게 될 것이다. - 유성용의 <여행생활자> 중 처음에는 대리의 확장판인가 싶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생각난다. 아무리 걸어도 그 길이 그 길 같은데 알고 보면 다른 길이고, 전혀 다른 길 같은데 아까 왔던 그 길이고, 그렇게 몽롱한 꿈속을 헤매듯 아무런 방향 감각 없이 걷다 보면 어느덧 길을 개척해가고 있는 느낌... 곳곳에 비치된 지도와 현재 위치, 그리고 표
China - 香格裏拉(Shangri-La) - 티베트 대신 샹그릴라 [내부링크]
대리에서 샹그릴라로 가는 길의 풍경 펄럭이는 오색기를 보니 인도의 다람살라가 떠오른다. 거기서 본 건 망명한 티베트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가는 샹그릴라는 원래부터 티베트 고원 일대에 살던 장족(티베트인)의 마을. 그래서 더 설렌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런데... 막상 샹그릴라에 도착하고 보니 티베트보다는 몽골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하긴 몽골제국과 중국의 등쌀에 한시도 바람 잘 날 없던 티베트였으니 이런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도 영 이상한 일은 아닌 듯. 엄밀히 말하면 아직 티베트 자치구는 아니지만, 샹그릴라는 적경장족자치주에 속하는 현으로, 여기서 장족(藏族)이란 티베트인을 말한다. 자치주이기에 중국어와 티베트어가 병용된 간판이 달려 있고, 거리에는 전통복장을 한 사람도 꽤 보이기에 여기부터 티베트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터미널 앞에서 탄 버스가 고성 주차장에 들어서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내린다. 도로도 여기서 끝나는 걸 보면 여기가 이 마을의 끝
China - 大理(Dali) - 대리의 품격 [내부링크]
운남성은 중국의 굵직한 왕조와는 조금 다른 역사를 가진 곳이다.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와 맞물려 동아시아보다는 동남아시아에 가깝고, 운남성 중에서도 제법 북쪽에 있는 리장과 샹그릴라는 인도의 아쌈 주와 맞물려 예로부터 차를 생산하고 운반하는 루트인 차마고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과 지형으로 둘러싸였기에 타이족, 묘족, 바이족, 나시족 등 수많은 민족들이 저마다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데, 위키백과에 따르면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 무려 25개의 민족이 이 일대에 분포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신서유기>에 나온 리장은 낭만적인 고성과 이색적인 먹거리 때문에 무조건 가야 할 곳이 되었고, 티베트 자치구까지 들어갈 여력이 없어서 그 비슷한 문화를 볼 수 있는 샹그릴라 또한 마찬가지, 그러고 나니 다음 순위는 한때 운남성을 평정했던 대리국의 도읍인 대리(大理)로 자연스레 정해졌다. 사실은 하루빨리 리장을 가보고 싶었
China - 昆明(Kunming) - 드디어 운남성으로 [내부링크]
여기는 계림북역 2층 미식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눈에 띄는 이소룡을 보니 역시 <소림사>의 무대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저 음식점은 '전쿵푸(真功夫)'라는 유명 체인점이지만, 계림만큼 저 집이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ㅋ 식당가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착해 보이는 부부가 열심히 만두를 빚고 있는 식당에서 훈뚠면을 시켰는데, 그 과정이 좀 웃겼다. 아직은 성조가 익숙지 않아서 웬만하면 주문할 때 메뉴판의 사진을 가리키는 게 버릇이 됐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했더니 아까부터 서성이던 청년이 따라 들어와서는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주문하고 옆에 앉는 거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랑 같은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웬걸, 좀 이따 청년 두 명이 더 나타나더니 이 청년이랑 수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 그 국수 어떻게 주문했어? - 메뉴판 사진을 가리켰지. - 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마도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곧이어 다른 두 청년의 음식이 나오자 훅훅 불어가며 맛있게 먹는
China - 桂林(Guilin) - 양삭보다 계림 [내부링크]
두둥~ 이 <아바타>에나 나올 법한 오묘한 자태의 풍경은 '계림 산수 갑천하(桂林山水甲天下)'라고 노래했던 왕정공의 시에 대구를 이루는 절, '양삭 산수 갑계림(阳朔山水甲桂林)'에 나오는 바로 그 전설의 양삭(阳朔)이다. 전설이라고는 하나, 중국에는 장가계부터 황산, 구채구 등 워낙에 빼어난 자연경관이 많아서 순위로는 뒤로 밀릴지 모르지만, 대신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고, 어차피 윈난성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으니 겸사겸사 들렀는데, 소문대로 기이하고도 수려한 산세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하다. 양삭을 가려면 일단 계림을 거쳐야 하는데, 광서장족자치구의 주도인 계림은 중국의 웬만한 곳에서 기차가 연결되지만, 그보다 작은 현 단위의 양삭은 버스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나마 편한 건 계림 기차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기차역 바로 앞에서 호객하는 미니버스를 바로 탈 수 있다는 게 장점. 거리도 2시간밖에 안 걸려서 눈 깜짝할 사이에 양삭까지 왔는데, 이리도 시간이
China - 绍兴(Shaoxing) - 루쉰을 찾아서 [내부링크]
수향 마을인 줄도 모르고 오직 루쉰의 흔적을 좇기 위해 왔다가 멋들어진 옛 거리에 반하고, 한없이 서민적인 운하에 두 번 반한 소흥(绍兴). 여기가 바로 중국 근대문학의 대가라는 루쉰(魯迅)이 태어나고, 문학가와 혁명가로서의 삶을 불태우고 간 곳이다. 하지만 유명세에서는 좀 뒤처지는지 쑤저우나 항저우보다 물길이 훨씬 발달해 있음에도 관광지다운 면모가 그다지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더 좋았다. 소흥 기차역 앞으로 나 있는 중흥중로(中兴中路)를 따라 죽죽죽 내려오면 오른쪽에 성시광장(城市广场)으로 향하는 팻말이 보이는데, 광장을 지나면 이런 운하와 다리가 발달한 옛 거리 창교직가(仓桥直街)가 나온다. 베이징의 전문대가와 대책란가, 상하이의 남경동로와 쑤저우의 평강로, 그리고 항저우의 남송어가처럼 도시마다 고풍스러운 옛 거리를 잘 간직하고 있는 중국. 그래서인지 소흥에도 어김없이 옛 거리가 등장하는데, 이 고즈넉한 거리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물길이 비 오는 절강성의 날씨와 어우러져
China - 杭州(Hangzhou) - 과거의 화양연화와 현대판 서호십경 [내부링크]
항저우는 여러모로 쑤저우가 생각나는 곳이다. 시내 중심부를 흐르는 물길이 그러하고, 가끔 보이는 하얀색 옛 건물의 센치한 벽화가 그러하며,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의 수도였던 쑤저우와 함께 그 유명한 고사성어 오월동주와 와신상담의 배경인 월나라가 있던 곳이기에 같은 듯 다른 강남 문화가 곳곳에 배어있는 까닭이리라. 하지만 물길을 제외하면 서민적이었던 쑤저우의 옛 거리와는 다른 럭셔리함이 느껴지기도 한데, 아마도 황제만이 출입했던 남송어가(南宋御街)의 화려한 성벽과 한자가 수놓인 고풍스러운 석판길이 구시가지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항저우는 수, 당을 거쳐 5대 10국으로 분열된 중국을 겨우 통일한 송나라가 북방의 금나라에 쫓겨 장강(양쯔강) 이남으로 이주하여 세운 남송의 수도였다. 그전에도 당나라의 대문호 백거이가 지방관으로 있을 때 수로를 정비하면서 쑤저우와 함께 '천상천당 지하소항(天上天堂 地下苏杭)'이라 칭송받을 정도로 경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강남을 대표하는 곳이었지만
China - 上海(Shanghai) - 다시 상하이, 이번엔 임시정부 [내부링크]
1년 전에 기약했던 대로 다시 돌아왔다. 나의 최애 도시 상하이에. 이번엔 좀 더 긴 여행으로. 이 나라는 벌써 5번째지만, 이제서야 반 바퀴 돌아보네.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오래 머물 수 없는 건 앞으로 이어질 중국이 너무나 설레기에, 상하이에서는 그저 기차표를 사고,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하며 쉬는 것에 집중했다. 한국을 떠나오는 그날까지 너무 숨 가쁘게 달려와서 막판에 몸살이 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상하이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이런 카페에서 시작해서 카페로 마무리됐다.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저기가 분위기도 좋고 자리도 편해서, 그리고 중국 폰 번호에만 허용되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잘생긴 직원이 친히 비번도 설정해줘서 한국에서 못 다해온 여행 준비를 마저 할 수 있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물론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미 작년에 한 번 와서 4일이나마 이 도시를 샅샅이 훑었기에, 어디에 가면 뭐가 있
드디어 카라코람 하이웨이 [내부링크]
나에겐 3년이 고비인가 보다. 회사든 요가든 뭐든, 처음 시작할 때의 마구 설레던 그 느낌은 어디로 가고, 하루하루 일 년 일 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렇게 고갈된 영혼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기엔 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던 걸 잠시 멈추고 휴식기를 가져보기로 했다. 3년보다 1년 더 버틴 4년,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나름 고생했으니 우선은 상을 주기로 한다. 그리도 고대하던 카라코람 하이웨이와 훈자를. 1. 또 남방항공 시작은 무조건 중국. 작년 상하이 여행 이후 이 도시에 푹 빠져서 관련 영화와 책을 파본 지 어언 1년. 그 시간 동안 쌓인 내공이 나를 자연스레 중국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상하이는 인터파크 남방항공이 가장 저렴해서 인천-상해(푸동) 편도 172,500₩에 겟. 그러다 문득 편도 티켓에 대한 태클이 들어오지 않
上海(Shanghai) 4 프랑스 조계지에서 아쉬운 바이바이 [내부링크]
드디어 마지막 숙소로 옮겼다. 이번 여행은 일주일 일정에 단 두 도시를 여행하면서 어떻게 된 게 숙소는 네 번이나 옮기게 됐다는. (성수기에 미리 예약 안 하면 이런 꼴 납니다.ㅡㅡ;) * Mingtown People's Square Youth Hostel, 明堂人民广场青年旅舍: Double 120*2, 디파짓 100 궁금했던 밍타운 인민광장점은 남경동로점보다 위치는 후미지지만, 그만큼 운치 있어서 좋았다. 건물은 비록 낡았으나, 휴게 공간이 남경동로점보다 훨씬 잘 되어 있고, 기대도 안 했는데 저렇게 넓은 창이 나 있어서 더없이 반가웠던 곳. 저 창 너머로 보이는 상하이의 뒷골목 풍경이 너무 좋아서 밤마다 낭만을 즐겼더랬지. 아무래도 난 전생에 상하이와 뭔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자마자 좋을 수가 있냐고. 지금까지 이런 도시는 처음이야. 오늘의 루트는 신천지부터 프랑스 조계지를 지나 태강로전자방까지 다녀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신천지는 프랑스 조계지
上海(Shanghai) 3 다시 상하이, 졸정원 대신 예원 [내부링크]
다시 돌아온 상하이 철제 빨래다이가 즐비한 대도시의 뒷골목이 새삼 반갑다. 쑤저우의 운치 있는 옛 거리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도회적인 분위기에 더 안정을 느끼는 걸 보면 난 어쩔 수 없는 차도녀인 듯.ㅡㅡ; 이번엔 다른 호스텔에서 묵었다. 지난번에 갔던 밍타운은 인기가 어찌나 좋은지 전 지점의 예약이 꽉 차서 오늘 하루만 여기서 묵고, 내일은 다시 밍타운 인민광장점으로 옮길 예정이다. 밍타운에 이리도 집착하는 이유는 같은 성급에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위치가 좋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데, 이번에 묵은 Phoenix Hostel(老陕客栈)도 나쁘지 않았다. 밍타운보다 공간도 넓고, 와이파이 신호도 잘 잡히고, 밤이 되면 이렇게 양꼬치 거리로 변신하는 먹자골목도 바로 앞에 있으니. 몰랐는데 여기가 바로 운남남로미식가(云南南路美食街)였다. 그동안 눈팅만 하던 양꼬치를 여기서 시도해 봤는데, 이 맛있는 걸 갈 때가 다 돼서야 알게 된 게 너무 원통할 정도로 맛있었다. 역시 양꼬치엔 칭따
苏州(Suzhou) 3 쑤저우 야경의 갑, 칠리산당 [내부링크]
도심 곳곳에 물길이 흐르는 낭만적인 쑤저우.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물길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개척했다는 칠리산당(七里山塘)일 것이다. 가난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황실에서 근무하다가 고위 관리의 반감을 사는 바람에 지방으로 좌천되었는데, 칠리산당은 그가 쑤저우에서 지방관으로 있을 때 뚫은 수중로이다. 내성 근처의 산당가(山塘街)에서 북서쪽의 호구(虎丘, 호랑이 언덕)까지 물길을 끌어와 당시 운하를 통해 거래하던 상인들이 이동하는 데 막힘이 없도록 설계하였는데, 그 길이가 약 7리에 달한다고 해서 거리명인 '산당'에 '칠리'가 붙었다고 한다. 쑤저우 시내에서 산당가까지는 충분히 도보로 가능하다. 북사탑에서 도화오대가(桃花塢大街)로 끝까지 걸어가면 시내를 감싸고 있는 굵은 물줄기인 외성강(外城河)이 나오는데, 거기서 강 건너 북쪽으로 나 있는 운하가 바로 산당하(山塘河)이다. 이백과 두보의 계를 잇는 당대의 대문호가 건설한 곳이어서인지 마을 입구는 그
苏州(Suzhou) 2 여행자와 생활자 사이 @ 평강로 [내부링크]
쑤저우는 그 유명한 <삼국지>의 배경 중 손권이 통치했다는 오(吳) 나라가 있던 곳이다. 그 전에는 춘추전국시대의 오나라 수도가 있던 곳이었고.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고사성어 오월동주와 와신상담의 배경인 바로 그 오나라가 오늘날 쑤저우가 있는 강소성 지역이었다. 그리고 오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월나라는 사오싱이 있는 절강성 지역이었는데, 이 둘은 양쯔강 이남을 지칭하는 '강남' 지역의 내로라하는 문화 도시였다. 그중에서도 쑤저우는 비옥한 양쯔강 유역에서 벼농사가 발달하여 물길을 이용한 교역이 일찍부터 번성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수군을 양성하여 민생이 안정된 까닭에 도시 문화 또한 발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쑤저우에는 정원을 꾸미고 정갈한 건물을 짓는 이곳만의 지주 문화가 잘 나타나 있다. 모던함과 예스러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쑤저우 박물관 여기는 쑤저우 스타일의 새하얀 건물이 사합원 방식으로 연결된 가운데 자연의 빛을 머금은 유리 구조가 가미되어 있어 건물 자체로도 흥미
苏州(Suzhou) 1 드디어 수향 마을 [내부링크]
드디어 물의 도시 쑤저우(苏州)로 간다. 1년 전 베이징의 이화원에서 봤던 소주가(苏州街), 그 작지만 고즈넉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한 번쯤 꼭 가 보고 싶었는데, 이리도 기회가 빨리 올 줄이야. * 남경동로 - 상해기차역: 지하철 2호선 타고 人民广场에서 1호선 환승, 3元, 10분 소요 역시 대륙의 기차역은 따그... 입구에서 기차표와 신분증, 짐 검사를 하고 들어가서 KFC에서 아침을 먹었다. 죽과 요우티아오로 구성된 중국식 모닝 메뉴 15元 커피도 필요해서 맥모닝 같은 버거+커피 세트 30元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다. KFC나 스벅은 오히려 한국보다 비싼 것 같다. 2층으로 올라가니 열차마다 대기실이 따로 있다. 마치 게이트가 여러 개인 공항처럼. 출발 10~20분 전쯤에 플랫폼으로 들어가듯 철문을 열어주는데, 여기서 표랑 신분증을 다시 한번 검사하고, 기차에 타면서 또 한 번 검사해서 총 3번의 검사가 이루어지니 잘못 타거나 무임승차할 일은 절대 없을 듯하다. * 上海 -
上海(Shanghai) 2 상하이의 모든 것, 와이탄 [내부링크]
어제 너무 피곤해서 저녁 먹고 바로 뻗었더니 오늘 아침은 6시도 안 돼서 눈이 떠진다. 설레서 더 이상 잠도 안 올 것 같고 어쩔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중국의 아침은 일찍 시작되니 전병이라도 팔지 않을까 싶어 채비를 하고 나섰는데, 역시 중국의 아침은 부지런해. 숙소 바로 뒷골목부터 시작되는 전병 행렬에 신나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제일 깨끗해 보이는 곳에서 기본 전병 1元, 매운 거 1元, 또우장 1.5元어치 샀다. 전병은 뭐든 맛있지만, 그래도 기본이 제일 낫다. 매운 건 맛있긴 한데 금방 질리네. 그리고 또우장(豆浆)은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콩과 우유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적당히 따뜻하고 달달해서 좋더라.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다 그만 아메리만큼이나 중독되고 말았지. 나의 몹쓸 방향 감각을 믿다가 또 길을 잘못 들어서 이리저리 헤매다 어제와는 다른 근대 골목의 면모를 발견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의 이국적인 풍경이 이리도 설렐 줄이야. 상하이는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덩어릴세.
上海(Shanghai) 1 나는 상하이가 좋다 [내부링크]
작년에 탔던 남방항공은 이번에도 무난했다. 가볍게 30분쯤 연착하고, 기내식도 쏘쏘. 이 정도면 저가항공도 탈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귀국할 땐 무려 4시간 연착에 게이트도 4번이나 바뀌었다는. 역시 중국은 뭐든 하나는 터져줘야 제맛인가.ㅡㅡ; 아무튼, 무사히 푸동공항에 도착해서 별지비자로 무난하게 입국심사 받고, 안내 표지판을 따라 지하철을 타러 나오니 무인발급기에 영어가 지원된다. 대박~ 확실히 내륙에 있는 베이징보단 바다 쪽이 훨씬 인터내셔널한지 상하이의 푸동 공항은 어디든 영어가 잘 통한다. * 푸동공항 - 남경동로(南京东路): 지하철 2호선, 1시간 소요, 7元 푸동공항에는 지하철 말고도 Maglev라고 하는 자기부상열차가 있어서 시내까지 단 7분 만에 닿을 수 있지만, 차비가 무려 40元(항공권 미소지 시 50元)이나 하고, 어차피 종점에서 한 번 더 갈아타는 건 똑같기에 그냥 일반 지하철을 탔다. 그래봤자 10~20분 차이에 차비는 거의 6배나 저렴하니 안 탈 이유
India - Delhi 2 두 번째 인도 마무리 [내부링크]
보드가야를 마지막으로 나의 두 번째 인도 여행도 끝이 났다. 귀국일을 딱 하루 남겨놓고 간당간당하게 도착한 델리는 여전히 카오스였지만, 그 속에서 왠지 모를 코스모스가 느껴지는 걸 보면 아마도 숙제를 마친 데서 오는 여유와 그 과정에서 만난 선물과도 같은 인연들로부터 오는 뿌듯함 때문이리라. 인도로 오는 비행기에서 만난 뮤지션과 그 일행이 이끌어준 비틀즈로의 여정, 리시케시의 요가와 명상 정보를 알려준 어느 일본 요가 강사와 몸으로 하는 요가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요가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해 준 한국 아저씨, 마날리에서 우연히 만나 바도다라에서 진정한 브라만 라이프를 경험하게 해 준 마노즈 가족들, 다람살라의 아엥가 맛집을 알려주고 그 인연을 한국까지 이어준 소울 메이트 쌩큐, 바라나시에서 보드가야까지 짧지만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해준 착한 쑤, 그리고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친절한 인도인들까지, 요가하러 왔다가 예기치 않게 좋은 인연을 참 많이도 만났던
India - Bodh Gaya -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성지 순례 [내부링크]
이 사진은 인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은 호텔 정식이다. 맨날 노점상이나 동네 식당만 전전하던 내가 이런 데를 다 오다니 아주 마음 맞는 일행이 생겼거나 아니면 매우 긴 시간을 삐댈 공간이 필요한단 얘기다. 원래는 지금쯤 바라나시에서 가야(Gaya)로 가는 기차를 탔어야 했는데... 바라나시에 온 첫날 숙소 주인한테 분명 가야로 가는 기차가 아침 10시에 있다고 들었으나, 막상 가보니 오후 4시 한 대뿐이다. 기차는 몇 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지만, 문제는 도착 시간이 밤 10시가 넘는다는 거. 안 그래도 위험한 인도, 그중에서도 가장 험블하다는 비하르(Bihar) 주에서 한밤중에 떨어진다는 건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에 일단 기차역을 나와서 근처 버스정류장과 여행사를 전전하며 버스 편을 알아봤는데, 하나같이 사르나트는 가도 가야(또는 보드가야)로는 안 간단다. 아마 그때 나 혼자였다면 그냥 보드가야를 포기하고 바로 델리로 갔을 것이다. 불교 신자도 아닌데 굳이 여행 막바지에 밤
India - Varanasi - 인도의 블랙홀 [내부링크]
델리, 캘커타에 이어 2번째로 방문한 바라나시 여긴 위치도 델리와 캘커타의 중간쯤인데, 느낌도 딱 그렇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오묘한 기분, 느낌, 이 분위기... 원래는 다르질링에서 네팔로 넘어가려고 했었다. 그래서 비자도 더블로 받아왔는데, 이번 여행은 중간에 변수가 여러 번 생기는 바람에 일정이 빡빡해져서 결국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럼에도 바라나시는 들러줘야 할 것 같아서 네팔을 포기하고 왔는데, 역시 오길 잘했다. 춥고 물도 부족한 윗지방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후끈거리는 날씨에 물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바라나시로 오니 살 것 같구나. 미로 같은 골목길은 여전하고, 그때 갔던 라씨 가게도 여전하고, 무엇보다 물가가 10년 전과 똑같아서 시간을 거슬러 온 것 같은 느낌이다. 여전히 정신없는 강가(Ganga)와 가트(Ghat) 가트는 강변을 따라 설치해놓은 계단으로, 사람들은 여기를 발판 삼아 목욕을 하고, 빨래도 하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도 한다. 갠지스강이 워낙
India - Darjeeling 2 토이 트레인 타고 홍차 한 잔 [내부링크]
떨떠름한 녹차보다는 푹 삭은 홍차가 좋고, 그냥 홍차보다는 우유 섞은 진득한 짜이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짜이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홍차의 고장에 왔으니 차밭도 보고, 질 좋은 홍차도 한잔하고 가야 안 되겠나. 다르질링은 스리랑카의 우바(Uva), 중국의 기문(祁門)과 함께 세계 3대 홍차 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인도에 홍차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세기 무렵의 일. 처음에는 중국의 차 품종을 들여와 아삼 주를 비롯한 동북부 지역에서 재배했는데, 풍토가 안 맞아서인지 결과는 대실패.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의 동인도 회사 직원이 아삼 주로 파견갔다가 주민들이 찻잎 같은 걸 씹는 것을 보고 인도 자체의 묘목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홍차 재배가 시작된다. 그 후 영국은 빅토리아 시절의 중심지인 캘커타와 가깝다는 이유로 시원한 다르질링에 여름 본부를 두었는데, 아삼 지역보다 월등히 좋은 품종이 생산되면서 '다르질링'이라는
India - Darjeeling 1 티베트, 네팔, 유럽 그리고 히말라야 [내부링크]
이 첩첩산중에 간이역이 있는 아기자기한 마을은 바로 홍차 중에서도 최상급이 생산된다는 다르질링(Darjeeling). 평균 해발 2천 미터가 넘는 여기까지 오려면 인도보다는 방글라데시에 더 가까운 북동부와 인도 본토를 연결하는 분기점인 뉴잘패구리에서 토이 트레인(Toy Train)을 타거나 합승 지프를 타고 꼬부랑 산길을 올라와야 한다. 캘커타에서 뉴잘패구리까지는 기차가 수시로 연결되므로 어렵지 않게 올 수 있지만, 협궤열차라고도 불리는 토이 트레인은 19세기에 영국 식민지 시절,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구축된 증기 기관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올드한 감성과 수려한 산세를 즐기며 이동할 수 있는 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합승 지프가 3~4시간이 걸린다면 토이 트레인은 최소 7시간에서 운 나쁘면 9시간까지도 걸린다는. 그래서 뉴잘패구리에 도착하기 전부터 살짝 고민했는데, 막상 내리고 보니 토이 트레인은 공사 중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India - Kolkata - 두 번째 시티 오브 조이 [내부링크]
그냥 좋은 도시가 있다. 인도에도 그런 데가 있다. 캘커타, 시티 오브 조이. 10년 전에 가보고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인데, 이상하게 델리는 두려운 반면, 캘커타는 한없이 설렌다. 같은 메트로폴리탄임에도 온갖 사기로 그득했던 델리와 달리 캘커타는 확실히 인간적이었다고나 할까. 인도에서 처음 묵었던 도미토리의 친절한 주인과 룸메이트들, 그 길 모퉁이에 있던 샌드위치 가게의 푸짐한 인심, 직접 발로 뛰는 탓에 힘들어서인지 탈것을 강요하지 않았던 인력거꾼들, 영국 식민지 시절의 분위기를 그대로 머금은 인도스럽지 않았던 인프라까지 모든 게 좋았던 마이 소울 시티, 캘커타. (원래 이름은 '콜카타'지만, 학교에서 '캘커타'로 배워서 영어식 지명이 더 익숙한 건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비록 다르질링으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경유지일 뿐이지만, 그래도 역시 설렌다. 거기 가면 KFC에서 육식도 할 수 있고, 극장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남대문 시장 같은 거대한 마켓에서 쪼리랑 영양크
India - Hampi - 그들에게 힌두이즘은 뭐였을까 [내부링크]
함피(Hampi)는 어쩌면 지금까지 중 가장 인더스 문명에 가까운 곳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놓고 힌두교 건축 양식이 빽빽한 곳은 10년 전 카주라호를 제외하고는 본 적이 없었으니. 카주라호도 고작 2군데의 유적지에 종교 사원만 모여있을 뿐, 함피처럼 도시 전체를 구성하는 구조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니 스케일로는 그 어떤 곳도 함피에 비할 곳은 없으리라. 그래서 함피는 마치 동남아로 치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도 같고, 유럽으로 치면 터키의 에페소스와 같으며, 중동으로 치면 요르단의 페트라, 남미로 치면 마야와 잉카 문명의 잃어버린 도시들과 같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화려하게 꽃피었다가 차기 문명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그럼에도 그때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비밀의 도시처럼. * Vadodara - Guntakal: Train No.16501, 19:45~21:35(+1), 402루피 * Guntakal - Hospet: Train No.180
India - Vadodara - 인도에 가족이 생겼다 [내부링크]
우다이푸르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바도다라(Vadodara) 행 버스 저 수많은 행선지 중에서 하필 맨 끝에 있는 저기가 눈에 띄었을까. 그래서 마날리에서 잠깐 만났던 마노즈 아저씨네 가족을 추억했다. 구자라트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라더니 과연 유명 관광지가 아닌데도 저렇게 직행 버스가 막 다니는구나. (관련 포스트 https://blog.naver.com/kcarpe_diem/50143456328 ) 물론 이걸 보면서도 진짜로 찾아갈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다. 지나는 길에 들르라는 그런 인사성 발언을 곧이곧대로 들을 나이도 아니고, 요가 때문에 일정이 지체되기도 해서 까딱하다간 네팔을 못 갈 것 같은 조바심에 이제는 좀 달려볼까도 싶었는데... 물과 예술의 도시 우다이푸르에서 나도 모르게 정신줄을 놓은 모양이다. 실컷 노닥거리다 뒤늦게 기차표 예매하러 갔더니 뭄바이로 가는 기차는 모두 매진.ㅜㅜ 원래 목적지는 함피 근교에 있는 호스펫이지만, 어찌 됐든 거기까지 가려면 중간에 뭄
India - Jaisalmer, Jodhpur, Udaipur - 색계 [내부링크]
핑크 시티 자이푸르, 블루 시티 조드푸르, 골든 시티 자이살메르 등 각종 컬러풀한 도시로 유명한 라자스탄(Rajasthan) 주. 이곳의 이름은 고대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던 드라비다족이 아닌 5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와 이 일대에 정착한 라지푸트(Rajput)족에서 유래한다. 그들은 인도의 북서쪽 끝에서 거대한 사막과 맞물린 이곳에 그들만의 케렌시아를 만들고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했는데, 그래서 라자스탄 주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부족의 권위를 상징하는 웅장한 성채가 있고, 마을 중심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 있으며, 사막의 메마른 분위기를 커버하려는 듯 화려한 색상의 자수와 염색, 가죽 공예 등 각종 수공예 문화가 발달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오감을 한껏 자극시켜준다는 점이다. 바로 직전에 포스팅한 비카네르에서도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는 아직 오프닝에 불과하다. 앞으로 가게 될 세 도시 자이살메르, 조드푸르, 우
India - Bikaner - 라자스탄의 재발견 [내부링크]
예전에 인도에 왔을 때 '핑크 시티'라 불리는 자이푸르(Jaipur)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땐 너무 어렸고, 정보가 없던 시절이기도 해서 고색창연한 분홍빛 도시를 그저 국밥 말아먹듯 후루룩 훑어보고 지나쳤던 기억. 그중에서도 특히 기념품 가게에 들러 커미션을 챙겨 먹으려는 릭샤왈라의 횡포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자이푸르를 비롯한 라자스탄 주가 화려한 자수 공예로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튀김 덕후인 나조차도 넉다운시킬 정도로 매캐했던 사모사의 향도 꽤나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번 라자스탄 행이 망설여진 건 사실이었다. 릭샤야 안 탄다 치더라도 유난히도 들이댔던 각종 왈라들은 어쩔 것이며, 목이 타들어갈 것처럼 매운 음식들은 또 어찌 감당할 것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나도 나이를 먹었고, 여행의 노하우도 나름 축적했으며, 내 몸은 그동안 각종 msg로 더욱 단련되어 있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라자스탄
India - Amritsar - 시크교의 성지 [내부링크]
리시케시의 요가 라이프, 마날리의 티베탄 라이프, 이 둘을 합친 후속편이자 본편이기도 한 맥그로드 간지의 티베트 망명정부와 아엥가 요가 라이프를 무사히 마치고, 이번에는 시크교의 총본산이라는 암리차르(Amritsar)로 향한다. 시크교에 대해 알게 된 건 인도에 오기 전,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창 요가 자격증을 따고 강사로 일할 무렵, 수업에 쓸 음악을 찾다가 우연히 스나탐 카우르(Snatam Kaur)라는 가수를 알게 되면서부터다. (사진 출처 https://www.snatamkaur.com ) 그녀는 미국의 시크교도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미국과 인도를 오가며 시크교와 종교 음악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사진에서 항상 단아하게 하얀 천을 터번처럼 두르고 있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다. 이때만 해도 시크교가 정확히 어떤 종교인지는 몰랐고, 그저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와 멜로디가 좋아서 수업시간에 즐겨 들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가사 안에는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India - Dharamkot - 히말라얀 아엥가 요가 센터 [내부링크]
맥간에 온 첫날, 겨우 숙소를 구하고, 여장을 풀고, 이제 좀 마을을 둘러보러 나서려는데, "언니, 짐 좀 맡아주시면 안 돼요?" 하며 불쑥 말 걸어온 쌩큐. 서양인들이나 메는 어마무시한 배낭, 거기다 묵직한 가방을 2개나 더 양손에 들고 있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랑은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거라고. 미니멀리즘을 최고의 라이프스타일이라 자부하는 내겐 책가방 하나가 전부였으니. 하지만 그녀가 맥간 일대를 돌고 돌아 바로 옆 숙소에 묵게 되면서 우린 자연스레 트래블 메이트가 되었고, 말투가 예사롭지 않아 추궁해보니 동향 사람이었고, 둘 다 요가로 커리어를 전향한 시기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직감했다. 얘랑 소울메이트가 되겠구나 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직감은 현실이 된다.) 한국에서 이미 포레스트, 아엥가 등 여러 스타일을 섭렵하고 온 그녀는 정보 면에서도 나보다 훨씬 빨랐다. 맥간에도 유명한 아엥가 요가 센터가 있다며, 자기는
India - McLeod Ganj 2 맛집 순례기 [내부링크]
티베트 망명정부와 달라이 라마로 좀 무겁게 시작했는데, 맥간은 인도의 그 어디보다도 먹을 게 많아서 행복한 곳이었다. 티베트 특유의 전통 음식과 인도 음식의 조화, 거기다 일본, 한국 여행자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나면서 생겨난 익숙한 맛까지 한데 어우러진 이곳만의 맛집을 소개한다. 버스 스탠드가 있는 메인 광장의 삐까뻔쩍한 호텔 1층에는 저마다 각양각색의 베이커리가 입점해 있는데, 그중 티베트인이 운영하는 티베트 호텔의 제과점이 제일 싸고 맛있어서 단골이 됐다. 이 집 최고의 빵은 뭐니 뭐니 해도 15루피짜리 초코 도넛. 하도 인기가 좋아서 일찍 가지 않으면 금방 솔드아웃 돼버린다는. 조기바라 로드와 템플 로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모와 묵 국수 모모는 티베트식 만두로 구운 건 3개 10루피, 삶은 건 4개 10루피다. 건강이나 위생을 생각하면 삶은 걸 먹어야 하지만, 역시 만두는 군만두가 진리라 계속 구운 것만 사 먹다 결국 탈이 났는데, 아무래도 기름 자체가 안 좋거나 오래된
India - McLeod Ganj 1 티베트 망명정부와 달라이 라마 이야기 [내부링크]
드디어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Dharamsala)로 가는 길. 이 시대의 살아있는 성인이라는 달라이 라마 14세가 있는 곳이다. 그에 대해서는 딱히 아는 바는 없지만, 현대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날카롭게 꼬집어주는 수많은 어록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말이다. 보는 순간 아, 내가 이런 단순한 진리를 잊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어구들. 사실 인도에 오기 전에는 이분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없었음을 실토해야겠다. 하지만 요가하러 떠난 리시케시에서 나는 요가보다 명상을 좇는 분위기에 휩쓸려 수많은 강좌를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인도의 유명한 성자들도 알게 되었으며, 덩달아 인도 독립의 영웅 간디로부터 비폭력 저항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장 달라이 라마 14세와 그의 수많은 어록도 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리시케시 이후 다람살라는 인도에서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가 된 것. 그러니 히말라야 설
India - Manali - 티베트 마을로 한 걸음씩 [내부링크]
원래는 리시케시에서 심라(Shimla)로 가려고 했었다. 히말라야가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영국 식민지 시절의 휴양지라니, 이거야말로 유럽의 아기자기함과 세계 유수의 산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게다가 2500m 고지까지 연결되는 증기기관차 시절의 토이 트레인도 탈 수 있다는 말에 설레서 떠나기 전날은 잠도 설쳤는데... 다음날 아침, 리시케시에 있었던 기간만큼이나 정든 스리베드니케탄을 체크아웃하는데, 김흥국을 쏙 빼닮은 매니저 아저씨가 심라로 가는 교통편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말을 건넨다. 응? 어제 분명히 터미널에 가서 확인 다 하고 왔는데 뭔 소리냐니까 산악지대는 원래 버스 스케줄이 제 멋대로라며.ㅡㅡ; 산악지대만 그런가요? 인도는 전 지역이 다 그렇잖아요.ㅋㅋㅋ 이때까지만 해도 매니저 아저씨의 조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데라둔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다. 심라로 가는 버스는 있다가도 없다는 사실을. * Rishikesh - Dehra Dun: 버
India - Rishikesh 2 요가는 시바난다처럼 [내부링크]
드디어 돌담길의 끝이 보인다. 여기서부터는 람 줄라가 있는 아랫마을. 가트(ghat, 물가에 형성된 계단) 문화를 중시하는 현지인들이 더 많은 곳이어서 그런지 윗마을보다 가트도 훨씬 넓게 형성되어 있고, 더위를 피해 갈 수 있는 아케이드 상가도 훨씬 방대하다. 그만큼 신과 관련된 굿즈도 많고. 이 아케이드 상가 한중간에 뮤즐리(muesli) 맛집이 있다. 가게 이름은 음식점과 전혀 안 어울리는 '오피스' 계절과일과 견과류, 요거트, 시리얼에 꿀이 어우러진 뮤즐리는 안 맛있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가격은 80루피로 거의 하루치 방값에 버금가지만, 맛과 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 인도의 라씨는 진리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얼음이 비위생적이라고 해서 늘 걸렸는데, 뮤즐리는 그나마 얼음이 안 들어가니 뭔가 좀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 위로도 해본다.ㅋ 그리고 여기부터는 주황색 옷을 입은 사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사두(Sadhu)는 산스크리트어로 수행자를 뜻한다. 힌두교에서는 수행
India - Rishikesh 1 락시만 줄라에서 먹고, 요가하고, 삿상 듣고 [내부링크]
인도에 오기 전, 후지와라 신야의 <인도 방랑>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원래 사진작가였던 그는 1969~1972년까지 책의 제목처럼 인도를 방랑하며 느낀 것들을 글로 옮겼는데, 그 3년 동안의 내공이 집대성된 것이 바로 '인도 여행기의 바이블'과도 같은 <인도 방랑>이다. 그래서 책을 보면 인도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를 읽는 듯한 운율이 느껴지는데, 그런 그의 글사위에 매료되어 그가 쓴 에세이를 시리즈로 찾아서 보던 중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도의 리시케시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인도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들이 많은데, 성지로 불리는 리시케시도 그 같은 불가사의 중 하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명상 수행의 고장은 인도에서 가장 비속한 욕망들이 꿈틀대는 곳이다. 인도는 한마디로 종교 지상주의 국가다. 인도인이 생각하는 인간의 이상은 명상 수행, 다시 말해 영적인 삶으로의 귀의다. 바꿔 말하면 영적인 삶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호화로운'
India - Delhi - 빠간, 오랜만이야 [내부링크]
출발 당일은 언제나 정신없다. 전날 밤에 분명히 짐도 다 싸놓고, 집 정리도 대충 끝내 놨는데도 막상 떠나려니 손댈 데가 왜 그리도 많은지... 귀찮고 짜증도 나서 간만에 서울 오신 엄마께 불필요한 신경질까지 부렸다.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해 보지만, 이미 엄마는 상처 받으신 후라는. 이런 찝찝한 기분으로, 한편으로는 10년 만에 다시 만날 인도가 너무 설레서 나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에어인디아에 올랐는데, 역시나 "인도"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국영 항공사인 에어인디아는 메뉴의 선택권이 없더라는. 이코노미석에서도 꽤 앞줄에 앉았는데 인기 메뉴(라고 해봤자 치킨이지만)가 금방 떨어져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fish로 세팅해주고, 커피를 부탁했더니 짜이를 가져다주질 않나, 거기다 알아듣기 힘든 힌디-영어 안내 방송에 지금까지 중 가장 열악한 entertainment set... 그마저도 중간에 고장 나서 포기해야 했다. 목적지로 가는 상공의 그 오묘한 공간에서 누릴 수
Qatar - Doha - 에필로그 [내부링크]
그리도 궁금했던 카타르 항공에서 제공해준 호텔 저 셔틀을 타고 도하(Doha) 시내로 나갈 수도 있지만, 너무 덥고 지쳐서 삼시세끼 뷔페만 챙겨 먹고 방에서 계속 쉬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까지 열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방전될 만도 하지. 그나저나 단 12시간 경유하는 데 이런 고급진 서비스를 제공하다니 카타르는 정말 부자 나라일까? 참고로 카타르 항공은 1994년에 설립된 왕실 소유의 국영 항공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한항공보다 거의 10년이나 늦게 생겼는데, 기종이 최신인 건 차치하고라도 기내식이나 서비스면에서 거의 비교 불가로 카타르가 우위이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나는 이코노미 승객이 아니라 그들의 고귀한 손님이었으니. 그건 마치 멀리서 온 손님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이슬람 유목민의 전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래, 이거지. 이슬람의 교리를 제대로 해석한다면 인종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지나쳐
South Africa - Cape Town - 희망봉을 찾아서 [내부링크]
빅토리아 폭포에서 '파워 오브 원'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 마지막 '자연의 답'을 얻기 위해 희망봉이 있는 남아공으로 향한다. * Victoria Falls - Bulawayo: 기차 19:30~10:30(+1), 1등석 10$, 2등석 7$, 3등석 5$ 작은 시골이라 기대도 안 했는데, 짐바브웨 기차는 탄자니아-잠비아 국경 넘을 때 탔던 타자라(TAZARA)만큼이나 시설이 양호했다. 구조도 1등석은 2단 침대, 2등석은 3단 침대, 3등석은 그냥 일반 좌석으로 동일해서 선택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 2$ 차이에 두 다리 뻗고 눕는 게 낫고, 3$ 차이에 침대 한 단 더 추가될 뿐이니 이래저래 2등석이 이득인 듯. 짐바브웨 제2의 도시 불라와요(Bulawayo)의 기차역과 시청 한 나라를 지나가면서 그 나라의 수도는 웬만하면 거치고 싶지만, 그러면 남아공으로 가는 루트가 대박 꼬이게 되므로 그냥 중간 지점에 있는 불라와요에서 버스를 갈아타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불라와요에 도착해서
Livingstone(Zambia) - Victoria Falls(Zimbabwe) - 파워 오브 원 [내부링크]
탄자니아에서 잠비아까지는 기차가 연결된다. 이름은 타자라(TAZARA). TAnzania ZAmbia RAilway의 약어로,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에서 잠비아의 중부 국경지대에 있는 카피리음포시(Kapiri Mposhi)까지 약 40시간 정도 소요되는 여정이다. 이집트 이후 오랜만에 보는 철도가 마냥 신기한데, 시설도 나름 쾌적하고 괜찮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인프라가 가능하다니, 역시 탄자니아는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 있었다. 타자라 기차의 시작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아프리카의 식민지화를 리드했던 대영제국의 '광산왕' 세실 로즈(Cecil Rhodes)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일찍이 남아공으로 건너갔으며, 다이아몬드의 도시 킴벌리에서 보석을 캐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 그 후 드비어스(De Beers) 광산 회사를 설립하고, 광업뿐만 아니라 철도, 전신 등 남아공의 거의 모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Tanzania - Mafia - 마피아란 섬을 가게 된 사연 [내부링크]
사건의 시작은 잔지바르에서 밥 말리를 표방한 떡진 레게머리의 노군을 만나면서부터다. 당연히 일본인이라 생각했던 그가 유창한 한국말을 하며 다가왔을 때 한 번 놀라고, 산전수전 다 겪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대학생이라는 말에 두 번 놀란 우리는 남아공에서 탄자니아로 오기까지 무려 반년이나 걸렸다는 그의 여행담에 푹 빠져서 자연스레 일행이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남자 일행이 반가워서 그동안 못 갔던 야시장도 가 보고, (안전제일주의였던 하니와 나는 해가 지기 전에 꼬박꼬박 숙소로 들어가는 바른생활 아이들이었던 것) 자칭 절대 미각이라는 그가 추천한 맛집도 돌아다니며 잔지바르에서의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르에스살람으로 돌아오던 날, 갑자기 마피아(Mafia)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섬으로 가자며 꼬셔대는 노군. "우와~ 인도양 최대 마린 파크라네요!" 론리플래닛을 정독하던 그에 의하면, 지금(11~2월)이 고래상어를 보면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데, 이미 다합에서 한 달간 다이
Tanzania - Zanzibar - 탄자니아의 모든 것 [내부링크]
마을 어디서든 킬리만자로(Kilimanjaro)산이 바라보이는 탄자니아 모시(Moshi) 케냐에서 탄자니아의 경제 수도라는 다르에스살람으로 가는 길, 킬리만자로산을 볼 수 있다는 모시에 들렀다. 등산을 좋아하진 않지만 산을 바라보는 건 좋아하기에 세계 명산 중 하나라는 킬리만자로산은 꼭 육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9월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아프리카에서도 만년설이 덮여 있다니 과연 해발 6000m의 위용이 대단하구나. 숙소부터 생수, 맥주까지 온통 킬리만자로로 도배되어 있는 모시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 때문에 유명해진 이 산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최고봉이 거의 6천 미터에 달하며, 천 미터 단위로 다양한 생물군이 분포하고 있어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일대에 '커피의 신사'라 불리는 탄자니아 AA(킬리만자로 커피)가 재배된다. 탄자니아 AA는 녹색보다 회색에 가까운 원두로, 신맛이 강한 아라비카종이며, 커
Kenya - Nairobi - 쉼 [내부링크]
케냐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선진국이라는데, 도로나 버스 상태는 에티오피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국경 쪽은 에티오피아보다 낙후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모얄레에서 나이로비로 가는 버스는 말로만 듣던 '공포의 로리'였던 것. 로리(lorry)는 화물트럭을 개조한 버스로, 일반적인 2X2 좌석이 아니라 2X3 구조인데,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3좌석 중간 자리 당첨.ㅜㅜ 자리도 불편한데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세워서 여권 검사하고, 식사 시간이라며 또 세우고,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데도 무슬림 기도시간이라며 2시간마다 세우고, 그러다 자정 무렵에는 시동을 아예 꺼놓고 새벽 5시까지 그대로 노숙을 시켰다. 아, 정말 이 나라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제목처럼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하고 싶게 만드는 여정이었어. 그리고 다음날, 한참 산길을 오르던 중 드디어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아침 10시 예상이던 도착시간은 점점 뒤로 밀려나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나이로비에 도착
Moyale(Ethiopia) - Moyale(Kenya) - 아프리카에 대한 고찰 [내부링크]
오모 밸리에서 부족 마을도 보고, 커피도 원 없이 마셨으니 이제 케냐를 향해 슬슬 이동해 보기로 한다. * Jinka - Konso: 버스 매일 05:00 매표, 4시간 소요, 81비르 100비르를 냈더니 1짜리 잔돈을 요구해서 당황했는데, 다행히 옆자리에 앉은 Dagim이라는 청년이 빌려준다. NGO에서 간호사로 일한다는 그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예방 접종은 다 하고 왔는지부터 물어본다. 자기도 아프리카 출신이지만 여기는 병균의 온상이라며, 언제 골로 갈지 모른다는.ㅡㅡ; 황열병은 맞고, 말라리아는 약만 가져왔다니까 오늘부터 당장 복용하란다. 케냐부터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니 1~2주 전부터 미리 복용해놓는 게 좋다며. 그의 조언대로 당장 그날부터 약을 복용한 덕분인지 말라리아는 피해 갈 수 있었지만, 대신 불면증과 컨디션 저하로 한동안 고생했다. 그땐 그냥 지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말라리아 약 부작용이었던 것 같다. 1주일에 1번 딱 1알 먹는데도 그날은 아
Ethiopia - Jinka - 부족들 마을엔 부족들이 살고 [내부링크]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꼬박 하루 동안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아마 길이 좋다면 반나절 안에 끊을 수도 있는 곳에) 태초의 인류로 추정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이 발견된 오모 밸리(Omo Valley)가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만 년 전에 그들은 이미 직립 보행을 했고, 양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구도 사용했고, 같은 종끼리 상생하기 위해 공동체도 이루며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때의 라이프스타일에서 그리 진화하지 않은 채 여전히 원시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오모 밸리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수십 종에 달하는 원시 부족 마을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프리카에 오기 전, 인터넷에서 본 입술에 접시 끼운 여인의 모습이 꽤나 강렬하게 남아있던 나는 아디스아바바에 오자마자 오모 밸리로 가는 교통편부터 알아봤었다. 물론 Autobus Terra(버스 터미널)에서 공공버스를 타고 아르바민치로 갔다가 베이스캠프인 진카까지
Ethiopia - Addis Ababa - 뜻밖에 발견한 사랑 [내부링크]
드디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로 가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예사롭잖다. 곤다르가 이리도 고원이었던가. 그러고 보니 에티오피아를 아랍어로 '아비시니아'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아비시니아 고원이란 말인가. * Gondar - Addis Ababa: Selam bus, 05:00~18:00, 260비르, 과자/물 서비스 원래 스케줄은 이렇지만, 버스 티켓에는 departure time에 11시라고 적혀 있고, 날짜도 뭔가 이상하다. 이것이 바로 에티오피아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날짜와 시간 체계.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대신 에티오피아 정교회에 기반을 둔 자체 역법을 사용한다. 참고로 그레고리력은 기원전 1세기경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가 시행한 율리우스력에서 기원한다. 율리우스력은 1년을 365.25일로 계산하고, 여기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365일로 정한 후 남은 0.25일은 4년마다 하루가 더해지는 윤년이 되도
Ethiopia - Gondar - 빈대와 마끼아또, 그리고 레게머리 [내부링크]
수단이 사람으로 기억되는 나라라면, 에티오피아는 사람 때문에 한없이 피곤했던 나라였다고나 할까. 카르툼에서 에티오피아와 인접한 국경 도시 갈라밧(Gallabat)으로 가는 버스는 와디할파에서 카르툼으로 올 때 탔던 버스와는 차원이 달랐다. 지금까지 만났던 수단의 친절 대마왕은 온데간데없고, 지정좌석제임에도 서로 먼저 타려는 몸싸움에 밀려나 멀찌감치 서 있다가 제일 나중에 탔는데, 버스에 오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더랬지. 통로 가득히 들어찬 이민가방과 짐보따리와 이불 보따리는 이삿짐센터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들 아닌가요ㅡㅡ; 그나마 우리 좌석이 맨 앞이었으니 망정이지, 더 안쪽에 있었으면 스트레스 게이지 제대로 오를 뻔했다. 아니, 에티오피아는 이불도 안 파나? 왜 다들 수단에서 이고 지고 가는 건가ㅡㅡ? 참고로 이불은 모두 새 상품이었으며, 'Tiger'라는 마크가 붙어 있었다. 저 이불집 완전 대박 났겠는데. * Khartoum - Gallabat: 버스 08:30~16:30,
Sudan - Khartoum - 사람으로 기억되는 수단 [내부링크]
와디할파에서는 하루도 채 머물지 않았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생선 튀김은 맛있었지만, 아무래도 사방이 사막인 그곳에선 여전히 이집트의 잔상이 남아 있었기에 이젠 좀 수단스러우면서 도시적인 곳으로 가고 싶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카르툼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 Wadi Halfa - Khartoum: 버스 07:00~18:30, 60파운드, 물/빵/음료 서비스 11시간 넘게 이동하는데 우리 돈으로 24000원. 매우 싸다고도 할 수 있고, 수단 물가 치고 비싸다고도 할 수 있는 가격. 하지만 확실히 가성비는 좋았다. 이 불가마 같은 더위를 피해 갈 수 있는 빵빵한 에어컨과 지저분하지만 푹신한 좌석, 거기다 생수 1병과 탄산음료 1캔, 빵 1조각으로 구성된 앙증맞은 기내식도 나왔으니. 단,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mp3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것과 중간에 5번쯤 내려서 여권 검사를 받은 것만 빼면. 뭔 체크 포인트가 그리도 많은지 거의 2시간 간격으로 장총을 멘 군인들이 버스로 들이닥
Aswan(Egypt) - Wadi Halfa(Sudan) - 수단 가는 길 [내부링크]
지난 포스트에서 아스완 예찬론만 잔뜩 늘어놓았는데, 사실 아스완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수단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비자가 나와야 육로로 이동할지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건너뛸지 다음 행보가 결정날 테니. 카이로에 수단대사관이 있다면 아스완에는 수단영사관이 있다. 두 군데 모두 수단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카이로의 대사관은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진과 돈만 있으면 된다는 아스완의 영사관에서 신청하기로 했다. 위치는 아스완 기차역에서 시장 반대 방향으로 걷다가 New Abu Simbel Hotel이 보이면 그 근처에서 수단 국기가 꽂힌 건물을 찾으면 된다. 안으로 들어가면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직원이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참고로 오픈 시각은 오전 10시. 우리나라의 관공서를 생각하고 9시 좀 넘어서 갔다가 업무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다행히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신청서 작성하는 걸 도와주었다. 다 작성하고 나서 여권,
Egypt - Aswan - 꽃보다 아스완 [내부링크]
역시 나일강을 따라 도시가 발달한 아스완(Aswan) 카이로만큼 대도시는 아니지만, 룩소르처럼 적당히 번화가에 조금만 걸어 나와도 언제든 물길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사실 카이로부터 줄곧 이어지는 나일강을 보며 한 번쯤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룩소르의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그만 정신줄을 놓고 기차표를 덜컥 사버렸다는. 이 싸디 싼 이집트에서 호화 유람선이래봤자 4~5만 원선인데, 바보 같이 그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이 미련한 사람... 기차에 올라타서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다 아차 싶었을 땐 이미 때는 늦은 것.ㅜㅜ * Luxor - Aswan: 기차 09:35~13:10, 2등석 25파운드 결국 한국의 무궁화호보다 조금 못한 이집트의 2등석 기차를 타고 단돈 5천 원에 싸게싸게 이동했는데 뭔가 계속 아쉽다. 이집트의 마지막 도시를 이렇게 금방 끊는 것이. 국경을 한두 번 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번엔 뭔가 많이 아쉬워. 도대체 이 감정은 뭘까... 깊게 생
Egypt - Luxor - 드디어 람세스 [내부링크]
"이집트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람세스를 만나게 된다. 그는 자기가 휘하에 거느렸던 거장들이 지었거나 복원한 무수한 건축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 크리스티앙 자크의 <람세스> 중 나를 한때 고대 이집트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소설 <람세스>.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내가 무려 5권이나 되는 이 대하소설을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건 이집트의 태양왕이라는 람세스 2세와 구약성경의 엑소더스 영웅 모세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전혀 새로운 메머드급의 신화를 창조했기 때문이었다. 역사는 역사이고, 성서는 성서일 뿐이라는 꽤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나는 소설 초반부터 등장하는 모세를 보며 설마설마하다가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얘기가 나오자 경악을 금치 못했더랬지. 그럼 이 람세스가 바로 영화 <십계>에서 율 브리너가 연기한 그 못돼 쳐먹은 파라오였단 말인가 하고. 책에서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웅호걸적인 면모도 겸비한 성군으로 나오는데... 물론 소설도 영화
Egypt - Cairo - 입애굽기 [내부링크]
카이로는 어딘지 모르게 인도의 델리를 닮았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굵직굵직한 유적지가 차고 넘치는 수도임에도 전혀 정이 가지 않을 만큼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곳. 길을 걷다 마주친 남자 중 열에 아홉은 느끼한 표정으로 작업을 걸어오고, 정찰제보다는 네고의 미덕을 중시하며, 무엇보다 적도에 가까운 지역 특유의 고온 건조한 기후가 그러했으니. 불가마처럼 델 것 같은 이런 살인 더위에선 도무지 의욕이란 게 생기질 않더라. 그나마 인도를 닮아서 다행인 건 물가가 인도만큼 착하다는 것과 문명의 젖줄 나일강이 도시를 시원하게 관통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여행자 숙소가 몰려 있는 타흐릴 광장(Mydan Tahrir) 바로 옆으로 말이지. (물론 강물은 심각하게 더럽다.) 그런 카이로에서 나는 적당한 가격대의 숙소에 여장을 풀고, 터키 이후로 오랜만에 접해보는 지하철, 인터넷, 카페 등등 대도시의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며 아프리카로 내려갈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다. 가장 먼저 한
중동을 떠나며 feat. 아라비아의 로렌스 [내부링크]
누구나 꿈을 꾼다. 그러나 그 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밤에 꿈을 꾸는 사람은 밝은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 그 꿈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내 깨닫는다. 반면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몹시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눈을 활짝 뜬 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행동한다. 그렇다. 나는 낮에 꿈을 꾸었다. - 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 기둥> 중 이번 유라시아 여행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아시아,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지나가는 대륙만 4군데고, 그중에서도 중동과 아프리카는 1,2차 대전 후에 생겨난 신생국가가 대부분이라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주변의 열강국과 부족 간의 얽히고설킨 관계를 대충은 알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사극이나 영화를 찾아보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물론 작품으로 승화하는 과정에서 msg가 첨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래저래 검색하던 중 얻
Jordan - Petra - 실크로드의 흔적 [내부링크]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버스로 3~4시간 거리에 와디무사(Wadi Musa)란 곳이 있다. 무사는 아랍어로 '모세'를 뜻하고, 와디는 '계곡'이란 뜻이므로 합치면 '모세의 계곡', 즉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샘'이 있는 곳이다. 종교가 없는 관계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릴 적 동화책처럼 읽은 <어린이 성경 이야기>의 기억을 더듬어보자면, 아담-노아-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모세가 이집트에서 핍박받는 동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옛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탈출하던 중 이집트와 중동 사이에 있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낳고, 시나이 반도에 도착해서는 사람들이 물 부족을 호소하자 바위를 쳐서 샘이 솟아나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능력자임에도 정작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죽었다는데, 이런 스토리 텔링 때문인지 와디무사로 가는 길에는 이런 성지 관련 굿즈를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Jordan - Amman - 요르단 후루룩 [내부링크]
요르단은 어딘가 애매하다. 시리아와 같은 레반트 지역에 있으면서도 시리아처럼 강대국이었던 시절은 없고,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시리아와 함께하면서도 1차 대전 이후 영국의 이중 플레이로 어쩌다 독립한 신생국가이기에 주변국에 비해 딱히 가 볼 만한 유적이나 명소가 흔치 않은 까닭이다. 물론 사막 투어나 성지 순례 같은 볼거리를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이미 터키와 시리아에서 실컷 봤기 때문에 이젠 식상해져서 이래저래 건너뛰고 나니 남은 건 수도 암만(Amman)과 바위의 도시 페트라(Petra)뿐. 그래서 시리아에서는 2주나 있었는데, 요르단은 단 3일 만에 후루룩 끊었다. 왜냐면 여기는 크고 멋진 시장도, 세월의 내공을 품은 고즈넉한 구시가도, 낯선 이방인에게 마음 좋은 미소를 지어주는 친절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정말 시리아 같은 나라는 두 번 다시 없을 듯.ㅜㅜ) * Damascus(Syria) - Aman(Jordan): Karaj Al Sumalia에서 Jett
Syria - Damascus - 천국과 지옥 [내부링크]
만일 지상에 낙원이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그곳은 다마스쿠스이고, 만일 천상에 낙원이 있다면 다마스쿠스와 가히 비견될 것이다. - <이븐 바투타 여행기> 중 드디어 다마스쿠스로 향한다. 시리아에 오기 전부터 나를 꿈꾸게 했으며,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극찬했던 곳. 중세 이슬람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착함과 너그러움이 가득한 곳'이라고도 했는데, 나는 이미 시리아의 다른 도시에서 그 넉넉함을 충분히 경험했었다. 그러니 다마스쿠스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 것인가. * Mar Musa - Nabek: 마르무사 수도원에서 콜택시 300파운드 * Nabek - Damascus: 나벡 카라지에서 버스 1시간 소요, 60파운드 이런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마르무사에서 첫날부터 친해진 미키, 마키, 신고, 오지상과 함께 콜택시를 타고 나벡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목적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니 어느새 신고와 나 둘만 남았다. 참고로 그는 이전 포스트에서 언급했다시피 사누키우동대학 석사 출신.ㅋㅋ
Syria - Mar Musa - 문득 지친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부링크]
터키의 트라브존에서 1시간쯤 되는 거리에 산속 절벽 위에 세워진 쉬멜라 수도원(Sümela Manastırı)이란 곳이 있다. 깊은 산속의 암자도 아니고 로마 시대의 정교회 수도원이라니, 이토록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잔뜩 기대를 안고 간 거기에는 과연 명성대로 깎아지른 절벽 위에 고성 같은 수도원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고,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오래된 프레스코화는 비록 훼손도는 심각했지만 ,그 어느 갤러리보다도 강렬했다. 게다가 수도원 주위로 첩첩산중인 절경 또한 예술이어서 한 며칠 머물다 가고 싶을 정도였는데, 안타깝게도 수도원 근처에는 하룻밤 묵어갈 만한 마땅한 숙소가 없었다. 불교의 템플 스테이처럼 여기도 그런 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시리아에 기독교 템플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것도 산속 절벽 위에 짱박힌 수도원에서. 나는 이 얘기를 터키에서 만난 어느 여행자로부터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Syria - Palmyra - 과거의 영광과 폐허, 그리고... [내부링크]
시리아는 지중해와 인접한 지역에 주로 도시가 발달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레포에서 크락 데 슈발리에가 있는 하마를 거쳐 다마스쿠스까지만 갈 예정이었다. 어차피 사막은 몽골에서 질리도록 봤고, 이 더운 중동에서 굳이 사막지대로 가고 싶지도 않아서. 하지만 인생은 예측불허라고 했던가. 하마의 숙소에서 네덜란드 친구 레느를 만나 급 친해지는 바람에 (둘 다 '중동의 4대 천왕'이라는 압둘라한테 왕따 당함) 그가 가고자 하는 팔미라를 내가 같이 가주고,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마르무사도 함께 다녀오기로 했다. * Hama - Palmyra: Pulman Bus Station에서 06:30, 10:30 출발, 4~5시간 소요 원래는 하마에서 출발하는 저 직행버스를 타려고 했으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레느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첫차를 놓치고, 다음 차까지 4시간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일단 홈스에 가보기로 했다. 하마에서 30분밖에
Syria - Crac des Chevaliers - 십자군 전쟁은 과연 끝났을까 [내부링크]
여기는 알레포의 버스터미널 카라지 알 라무세(Karaj Al-Ramuse) 시리아에서는 터미널을 '카라지(Karaj)'라고 한다. (몇몇 도시에서는 영어의 bus station을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터키처럼 여기도 행선지마다 버스회사가 달라서 해당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데, 아라빅이 난무하는 여긴 어디이고 난 누구인가ㅡㅡ? 겨우 사람들한테 물어서 티켓 창구까지 오긴 왔으나, 발권된 표에는 몇 시 출발이고, 좌석은 몇 번인지 당최 읽을 수가 없다.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다 제복 입은 사람들이 보여서 다가가 물어보니 30분 후에 출발이라고, 자기들도 같은 버스 탄다며 승차할 때 알려주겠단다. 그러면서 얘길 해보니 하마에서 근무하는 army officer인데, 라마단 마지막 연휴라 고향에 다녀가는 길이라며, 하마에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준다. 중동에서는 자나 깨나 남자 조심이라지만, 상당히 예의 바른 듯하여 일단 번호는 킵해두는 걸로.ㅋ * Aleppo - Ha
Syria - Aleppo - 지상에 낙원이 있다면 [내부링크]
"지상의 영원한 낙원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다마스쿠스이리라." 어느 여행기에서 읽은 이 시구절 때문이었다. 시리아가 그리도 설레었던 건. 시에서는 수도 다마스쿠스를 노래하고 있지만, 다마스쿠스 대신 그냥 시리아를 넣어도 무방할 정도로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나라를 극찬했었다. 도대체 시리아에 뭐가 있길래 저들은 그토록 이 나라를 기루어하는 걸까. 도대체 시리아에 뭐가 있길래 아직 가 보지 못한 자의 마음을 이리도 흔들어놓는 걸까. * Sanli Urfa - Antakya: 오토가르에서 버스 30리라, 6시간 소요 * Antakya(Turkey) - Aleppo(Syria): 오토가르에서 버스 10리라 또는 합승택시 15리라, 4~5시간 소요 가는 과정을 단 두 줄로 요약해놨지만, 샨르우르파에서 안타키아로 가는 버스가 들쭉날쭉해서 대기 시간이 길었던 탓에 안타키아에 도착하고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간다. 할 수 없이 터미널 근처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알레포로 넘어가는 합승택
Turkey - Sanli Urfa - 성지 순례하고 우르파 케밥 한 접시 [내부링크]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네 이름은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불리리라. 네가 몸 붙여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리라. - <창세기> 제17장 중 종교는 없지만, 어릴 적 공중파에서 본 영화 <십계>를 어렴풋이 기억한다.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빚어내면서 비로소 인류의 시조가 탄생하는데, 그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그만 인류는 숙명과도 같은 노동, 출산, 육아의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그때 그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어도ㅡㅡ;) 그 후 아담 내외는 3대 고통을 감내하며 열심히 자자손손 번창하다가 10대손에 이르렀을 무렵 노아가 태어나는데, 당시 인간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해져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하느님은 가장 양심적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한 후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였고, 그때 노아의 방주가 떠돌다 멈춘 곳이 바로 며칠 전에 다녀온 도우베야즛의 아라라트 산이다
Turkey - Hasankeyf - 메소포타미아의 눈물 [내부링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는 이라크지만, 그 문명을 일으켰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터키로부터 발원한다. 이중 티그리스강은 쿠르드족 분쟁 지역으로 유명한 디야르바크르와 하산케이프 일대에서 시작되며, 유프라테스강은 터키 동부의 고원지대인 에르주룸에서 발원하여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로 흘러들어 간다. (지도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몰랐는데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 터키 동부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역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얼마 전에 다녀온 도우베야즛과 이웃한 아르메니아는 오스만 제국 시절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이유로 터키와 감정이 안 좋고, 반에서 만났던 에산의 2번째 고국인 이란은 이라크와 오랜 숙적이면서 터키와는 쿠르드족 분쟁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두 강이 합류하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웠던 이라크는 악의 축인 사담 후세인을 배출한 나라이니 터키는 독립 후에도 전쟁의 역사에서 벗어날 틈이 없었을 듯. 덧붙이자면, 그나마 별문제 없이 잘 지내던 이웃나라가 시리아였는데,
Turkey - Van -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소년 [내부링크]
가능할지는 몰라도 반고양이를 만나보고, 반호수에서 헤엄을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나의 작은 희망이었다. - 무라카미 하루키의 <우천염천> 중 내가 반(Van)을 찾은 이유도 그러했던 것 같다. 눈에 컬러 렌즈를 낀 것 같은 패셔너블한 오드아이의 반고양이를 보고 싶다는, 그리고 가능하면 터키 최대의 염호라는 반호수에서 온몸을 소독해 보고도 싶다는 꽤 단순한 로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이런 소망들이 꽤나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동행하고 있던 제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는데, 세계적인 작가가 저토록 퍼블리시한 공간에 대놓고 같은 고백을 하니 너무 반가워서 부쩍 용기가 나더란 말이지.ㅋㅋ 평범한 것도 명분 있게 만들어주는 마력, 이것이 하루키의 에세이를 읽게 하는 힘인가 보다. * Doğubeyazıt - Van: İshakpaşa Tur 회사, 07:30, 09:00, 12:00, 14:00 출발, 2~3시간 소요, 15리라 도우베야즛에서 반까지는 불과 2시간 거리. 하지만
Turkey - Dogubeyazit - 변방의 카우치 서핑 [내부링크]
트라브존에서 터키의 극동에 있는 도우베야즛(Doğubeyazıt)으로 가는 방법은 간단하다. 시내에 있는 아무 여행사나 가서 도우베야즛으로 발착하는 버스표를 예매한 다음, 그들이 제공하는 세르비르를 타고 오토가르로 가서 버스를 타면 된다. 지나고 보면 간단한 일인데, 당시엔 여러 이벤트가 얽히고설켜서 꽤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갔다는 게 여행의 다반사지. 원래는 쉬멜라 수도원과 우준굘만 보고 바로 트라브존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필 터키를 방문했을 때가 라마단이어서 버스가 이틀 연속으로 취소된 거다. 평소보다 빡세게 율법을 지키는 이 시기에는 이슬람권에서 주말로 통하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데, 버스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ㅜㅜ 내 평생 종교라고는 1도 모르고 살아왔건만, 이역만리의 낯선 땅에서 종교 때문에 발 묶이게 될 줄이야. 하지만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이라고 했던가. 덕분에 트라브존 숙소에서 뒤늦게 동행을 만나 상대적으로
Turkey - Trabzon - 돌고 돌아 다시 흑해 [내부링크]
사프란볼루의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인 크란쿄이로 가는 길 터키의 3대 천왕이신 데데 할아버지가 태워줄까? 물어보셨지만, 체크아웃하는데 얻어 타려니 죄송해서 그냥 걸어가기로 했다. 숙소에서 만난 어느 여행자도 읍내까지 걸어갔다 왔는데 별로 안 멀다고 해서. 차르시 광장에서 마을 뒤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니 곧 큰 도로와 유네스코 표시가 보인다. 들어올 땐 몰랐는데, 사프란볼루는 예스러운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한다. 저런 네이밍에 혹하지 않기로 했으면서도 괜히 유명한 곳을 다녀왔다는 쓸데없는 자부심이 발동한다. 경험자의 오만, 여행에서 늘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하나뿐인 도로를 따라 걷다 보니 곧 번화한 크란쿄이 읍내가 나오고 메트로 사무실도 보인다. 구시가지로 들어올 때 민증 깠던 직원은 오늘 근무가 아닌지 다른 직원이 있어서 혼자 쓸쓸하게 세르비스를 타고 오토가르로 가니 이스탄불행 버스를 태워준다. 응? 나 트라브존 갈 건데? 했더니 일
Turkey - Safranbolu - 오스만투르크의 진수 속으로 [내부링크]
이스탄불에서 사프란볼루로 가는 버스 오랜만에 스낵 서비스를 받아보니 남미에서 한창 버스 타고 다니던 때가 생각난다. 거기다 개별 터치 스크린까지 있으니 제대로 감동이지 뭔가. 정말 터키의 고속버스 시스템은 세계 최강인 듯. * Istanbul - Safranbolu: Safran 회사, 23:30~05:30(+1), 35리라 터키에서는 버스터미널을 오토가르(Otogar)라고 한다. 대부분의 오토가르는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에 있으며, 버스표는 오토가르나 시내에 위치한 버스회사 사무소에서 살 수 있다. 이때 티켓 판매처에서 오토가르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 차량도 함께 제공되는데, 이 픽업 차량을 터키식 발음으로 '세르비스'라고 부른다. 나는 이 세르비스에서 한국 여행자를 10명이나 만났다.ㅋㅋㅋ 이스탄불에서 사프란볼루로 가는 날, 고맙게도 세르비스가 숙소 앞까지 픽업을 와줬는데, 타고 보니 동양인이 5명이나 타고 있었다. 혹시나 싶어 말을 걸어보니 모두 한국인. 숙소에서 같이 탄 한국인
Turkey - Istanbul - 다시 터키 [내부링크]
5년 전, 터키로 패키지여행을 간 적이 있다. 7박 8일이라는 빡빡한 일정 탓에 첫날과 마지막 날 스치듯 지나가야 했던 이스탄불.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후루룩 눈도장만 찍고 떠나는 게 못내 아쉬워서 버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한 낡은 건물 앞에 잠시 정차하더니 가이드가 활기차게 말했다. "여기가 바로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종착지인 시르케지(Sirkeci) 역입니다." 응? 오리엔트 특급 열차? 에르큘 포와로? 애거서 크리스티? 이름만 들어도 아련한 거기가 바로 이곳, 이스탄불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여행의 끝에서 나는 다시 가슴이 벅차올랐다. 또 다른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건 바로 오리엔트 특급열차를 타보는 것. 그리하여 유라시아를 횡단하고 세계 일주를 해 보는 것. 그래서 이스탄불이 그토록 설레었던 거다. 5년 전 세계 여행을 꿈꾸었던 시르케지 기차역 때문에. 비록 선로 공사로 인해 기차 대신 버스를 타고 오긴 했지만, 스산한 겨울이던 그때와 달리 한여름의 햇살을 한껏
Bulgaria - Plovdiv - 오스만이 시작되는 소리 [내부링크]
소피아에서의 태평성대는 가고, 동유럽 일정이 남은 쑤는 산속 수도원이 있는 벨리코로, 터키로 내려가야 하는 난 오스만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플로프디프로 향했다. * Sofia - Plovdiv: 기차 30분 간격, 2:30 소요, 8.6레바(1$ = 1.6레바) 예상 시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허겁지겁 내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오렌지색 피켓을 들고 있는 닉. 설마 플랫폼까지 마중나와주리라곤 생각도 못 했는데, 호스텔모스텔의 무료 픽업 서비스는 자가용까지 대절해서 숙소까지 모셔주더라는. 정말 서비스 정신 대박이야~ 친절한 닉은 중간에 버스터미널에 들러 이스탄불 버스표를 사는 것도 도와주었다. * Plovdiv(Bulgaria) - Istanbul(Turkey): Yug Bus Station에서 Matpu-96 회사, 22:30~05:30(+1), 30레바 기차도 있지만, 지금 이스탄불 일대는 선로 공사 중이라 아쉽지만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의 로망은 다음
Bulgaria - Sofia - 동유럽 끝에서 한 템포 쉬어가기 [내부링크]
불가리아. 발칸반도의 끝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중동으로 내려가는 관문. 여기만 지나면 유럽 어디든 갈 수 있기에 국경에서의 절차가 제법 까다롭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탄 기차가 자정쯤 국경에 도착하자 총을 멘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한 명씩 한 명씩 심문을 하기 시작한다. 마침 나는 맨 끝자리에 앉아 있어서 한참 걸릴 줄 알고 천천히 잠을 깨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 몇 명이 다가오더니 한 명은 여권을 요구하고, 다른 한 명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본다. 그런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다. 여행이 4달째로 접어드니 만만해져서 그만 정신줄을 놓았던 모양. "어... (표를 꺼내어 보고)... 소피아." 그런 내 행동이 수상했는지 무전기를 꺼내 들고 한참을 뭔가 얘기하더니 무전기에서 "Da(Yes)"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스탬프를 찍어준다. 앞으로는 국경 넘을 때 정신 바짝 차
Romania - Bucuresti - 가장 쓸쓸한 수도 [내부링크]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București)의 상징은 뭐니 뭐니 해도 인민궁전(Palatul Parlamentului)일 것이다. 전체 면적 34만, 높이 14층, 내부는 무려 1100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곳은 미국의 펜타곤과 중국의 지난시청에 이어 행정시설 중에서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건물이라고 한다. 저렇게 수치로만 봐서는 당장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데, 단적인 예로, 하루 전기 사용량이 관광의 허브인 브라쇼브 시 전체와 맞먹을 정도라는. 게다가 워낙 넓어서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길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가이드 투어로만 방문이 가능하며, 지하에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트랙까지 있다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은 인물은 바로 루마니아의 김일성이라는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그는 2차 대전 후 수립된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의 마지막 서기장이자 1965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출범한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그 후 24년에 이르는 장기 집권(이라 쓰고 독재라
Romania - Sighisoara, Brasov, Bran, Sibiu - 스토리텔링의 도시들 [내부링크]
루마니아 여행은 드라큘라로 시작해서 드라큘라로 끝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행지가 트란실바니아(Transylvania)라는 산악지대에 몰려있는데, 이 일대가 바로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19세기에 쓰여진 소설을 읽은 적이 없고, 거기서 파생된 수많은 영화를 통해 어떤 스토리인지 대충 짐작만 할 뿐인데, 그중 개인적으로 게리 올드만이 나왔던 1992년도의 영화 <드라큐라>를 애정한다. 세상 가장 섬뜩하게 생긴 할아버지에서 훈훈한 중년의 신사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낸 게리 올드만의 애절한 눈빛 연기를 나는 일찍이 <주홍글씨> 때부터 사랑했으니. 사실 원작과 비교하자면 괴기스러운 결말과는 영 딴판으로 전개되지만, 그래서 더 좋았고, 잘생긴 키아누 리브스의 연기가 사뭇 밋밋해도 <가위손>의 청순녀 위노나 라이더와 <양들의 침묵>의 거장 안소니 홉킨스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작품이었다. 거기
Ukraine - Kamianets-Podilskyi - 우크라이나의 끝에서 루마니아를 만난다 [내부링크]
오데사에서 카미아네츠포딜스키(Kamianets-Podilskyi)까지는 버스를 이용했다. 마지막까지 저렴한 기차를 이용하고 싶었으나, 이 구간은 도저히 빈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ㅜㅜ 뒤로 잘 넘어가지도 않는 좌석에 두 다리 퉁퉁 부어가며 겨우 밤 버스를 견뎠는데,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비싸게 이동한 꼴이 됐다. 키이우-심페로폴 기차가 16시간에 만 원인데, 오데사-카미아네츠 버스가 12시간에 2만 원이니 정말 기차와 버스의 가성비 차이가 엄청나다는. 물론 저 싸디 싼 기차표는 3등석에 해당되지만,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러니 우크라이나에선 웬만하면 기차를 이용하시길. 나는... 여기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 Odessa - Kamianets-Podilskyi: 버스 17:00~05:45(+1), 145흐리브냐 드디어 국경 지대까지 와버렸다. 고로 우크라이나 여행도 끝나간다는 얘기. 때론 힘들고 지쳤어도, 때론 그 어느 유럽보다도 찬란하고 화
Ukraine - Odessa feat. Bee Gees [내부링크]
비지스의 노래 중 'Odessa(City on the Black Sea)'란 곡이 있다. 기존의 컨트리했던 그들의 노래와 달리 장송곡처럼 장엄하기도 하고 오페라처럼 웅장하기도 해서 듣자마자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마치 퀸의 'Bohemian Rhapsody'와도 같았고, 해당 앨범의 마지막쯤에 실린 'First of May'로 달달하게 마무리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좋았다. 원래는 앨범 제목을 'masterpiece'에 언어유희를 가미한 'masterpeace'로 하려고 했다는데, 정말 진심 단연코 내게는 마스터피스였다. 이 노래는 비지스의 고향인 맨섬(Isle Of Man)과 영국 본토 사이의 아일랜드해에서 배가 침몰한 사건을 모티브 삼아, 흑해의 오데사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한 남자가 발트해에서 난파당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출발지가 흑해의 오데사일까? 왜 하필 배가 난파되는 지점이 발트해여야 했을까? 아무리 구글링을 해봐도 비지스가 오데사를 직접 다
Ukraine - Crim - 인류 전쟁의 격전지, 그리고 잔해 [내부링크]
키이우에서 기차로 16시간을 달려 도착한 심페로폴(Simferopol)은 우크라이나령 내 크림자치공화국의 수도이자 크림반도 여행의 시작점이다. 사실 심페로폴 자체는 딱히 볼 게 없지만, 우크라이나 대륙에서 출발한 기차의 종착지이고, 인류 전쟁의 격전지였던 세바스토폴이나 2차 세계대전을 논의했던 얄타로 가는 버스가 발착하는 곳이라 크림반도를 여행하려면 무조건 여길 통과해야 한다. 물론 키이우에서 얄타로 가는 직행버스도 있으나, 요금은 무려 기차의 3배. 우크라이나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버스가 기차보다 평균 2~3배 가까이 비싸다. 기차는 누워서라도 갈 수 있지만, 버스는 좌석도 불편한데 왜 그렇게 비싼 건지 당최 이해가 안 된다는. 키이우-얄타 구간만 하더라도 기차와 중간에 갈아타는 미니버스를 합치면 15000원 정도가 드는데, 직행버스는 3만 원이 넘으니 우크라이나에서는 기차만 한 가성비를 따라올 교통수단이 없다. 그런 이유로 얄타까지 직행 버스가 있음에도 굳이 기차를 타고 심페로
Ukraine - Kyiv - 드네프르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내부링크]
나 죽거든 부디 그리운 우크라이나 넓은 벌판 위에 나를 묻어 주오 그 무덤에 누워 끝없이 펼쳐진 고향의 전원과 드네프르 강기슭 험한 벼랑을 바라보며 거친 파도 소리 듣고 싶네 - 타라스 셰브첸코의 '유언' 중 리비우처럼 키이우도 셰브첸코의 시로 시작해 본다. 물길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의 시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드네프르(Dnepr)강이 어디쯤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기에. (지도 출처: 위키백과) 유럽연합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자랑하는 나라, 우크라이나. 그 대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거대한 강줄기가 바로 그의 시에 등장하는 드네프르강이다. 그중에서도 수도 키이우는 우크라이나의 북쪽 한가운데에서 하트 모양으로 심장처럼 박혀 있는데, 드네프르강은 이 도시의 중심을 정확히 관통한다. 그래서 시내 웬만한 곳에서는 저런 멋진 물길을 조망해 볼 수 있다. 키이우는 러시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키예프 공국 시절부터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다. ('키예프'는 러시아식 발음이고, 우크라
Ukraine - Lviv - 러시아인가 유럽인가 [내부링크]
솅겐조약은 폴란드까지만 허용됐다. 크라쿠프에서 탄 버스가 한밤중(정확히는 새벽 3시경) 우크라이나 국경에 도착한 순간, 지리멸렬한 출입국 절차가 시작되는 걸 보고서야 깨달았다. 유럽에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EU 멤버가 아니며, EU 멤버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솅겐 협정국이 아니라는 걸. 것도 모르고 러시아를 탈출하던 날, 드디어 이민국 절차에서 벗어났다며 기뻐한 꼴이라니.ㅡㅡ; 심지어 뒤에 가게 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유럽연합 멤버이긴 하나, 솅겐 가입국은 아니었다. 다만 한국과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90일에 한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할 뿐. 하지만 국경 절차가 아예 없는 것과 무비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었으니, 특히나 오늘처럼 한밤중에 국경을 지나는 날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논스톱으로 지나갈 수 있는 솅겐 조약의 나라들이 어찌나 그립던지. * Krakow(Poland) - Lviv(Ukraine): 유로라인 21:50~09:00(+1), 90즐로티(28$) 아
Poland - Krakow - 다크 투어리즘에 대하여 [내부링크]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중국의 문화혁명과 하얼빈의 731부대, 그리고 나치 독일군의 노동수용소와 절멸수용소... 끔찍하지만 알아야 할 역사가 있는 다크 투어리즘은 늘 양가적인 감정이 들게 한다. 여기까지 왔으니 보고 갈 것인가 아니면 우울해질 게 뻔하니 그냥 건너뛸 것인가... 물론 나의 선택은 늘 가는 쪽이었지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는 왜 이리도 선뜻 찾아가기가 망설여지는 걸까. 그동안 관련 영화나 책을 너무 많이 본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닌지. 그중에서도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던 아트 슈피겔만의 <쥐> (이미지 출처: 위키백과) 이 책의 저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직접 겪은 아버지의 경험담을 동물로 의인화하여 표현해놓았는데, 독일인은 고양이, 유대인은 쥐, 폴란드인은 돼지 등의 탈을 씌워 감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덤덤하게 대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용은 그 어느 시각 자료보다도 충격적이었다.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방에 갇혀 보면 친구란 게 뭔지 알게 될 거다.
Poland - Gdansk 2 중세로의 귀환 [내부링크]
바르샤바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됐던 그단스크(Gdansk). 하지만 그 재건 과정은 바르샤바와 달리 폴란드인들에게 상당히 난제였을 것이다. 북부 발트해 연안에 자리하고 있어 일찍이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려왔던 이 도시는 그 성장의 시작도 12세기 독일에서 건너온 상인에서 기원하고, 멸망 또한 독일의 침공으로 시작된 2차 대전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창 전성기를 누릴 때의 모습도 독일식 이름인 단치히(Danzig) 시절의 일이니, 그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더라도 독일의 모습을 빼놓고 생각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터. 그리하여 전후 처리를 논했던 얄타 회담 결과 '단치히'에서 '그단스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폴란드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현대적인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결국 그들은 바르샤바와 마찬가지로 복원을 선택했다. 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전성기로 돌아가되
Poland - Gdansk 1 평양을 아는 할머니들 [내부링크]
바르샤바 중앙역에서 그단스크로 가는 기차를 예매했는데, 애매하게 생긴 티켓을 2장이나 준다. 하나는 102즐로티(PLN; Polish zloty, 1$ = 3.22PLN) 짜리에 출발역과 도착역만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는 12즐로티에 출도착 스케줄과 좌석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2장으로 나눠서 끊어준 건지, 외국인이라고 덤탱이 씌운 건 아닌지... 별의별 의문이 들 무렵, 아까 내 뒤에 줄 서 있던 아저씨가 표를 끊고 나오더니 도와줄까? 하며 다가온다. 얼른 티켓을 내밀며 이것저것 물어보니 다행히 영어가 가능하다. 날짜, 코치, 좌석번호, 플랫폼을 확인하고, 도착역도 확인차 "Glowny?" 하며 한 번 더 물었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활짝 웃으며 "Good morning~" 하신다. ㅋㅋㅋ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군요. 다시 물으면 아저씨가 무안해하실까 봐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 Warsaw Central - Gdansk Glowny: 09:18~14:34,
Poland - Warsaw - 도시 재건의 Best Practice [내부링크]
옛 연합국이었던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그 경계를 넘는 지금 만감이 교차한다. 한때 사이좋게 동맹을 맺었던 이 두 나라는 독일과 러시아에 의해 양분되기를 여러 번, 그러다 2차 대전에 이르러서는 가장 끔찍한 역사의 현장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빌뉴스 편에서 언급했던 유대인 말살 정책이다. (관련 포스트 https://blog.naver.com/kcarpe_diem/50101198085 ) 예로부터 이민족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친 까닭에 유대인의 비율이 유독 많았던 두 나라는 나치즘의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에 의거, 자연스레 인종 청소의 실험장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폴란드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각별하다. 왜냐하면 독일군과 소련군이 거의 동시에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첫 희생양이 된 나라가 바로 이곳 폴란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곳, 그럼에도 그 상처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곳이 바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Warsa
Lithuania - Trakai - 중세의 성에서 로빈훗 추억하기 [내부링크]
빌뉴스에서 버스로 30분쯤 되는 거리에 리투아니아의 옛 수도 트라카이(Trakai)가 있다. 이 마을은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중세의 성으로 유명한데, 이미 발트3국을 거치며 중세의 앤티크함을 수없이 봐왔기에 그냥 건너뛸까도 싶었지만, 물길을 사랑하는 나로선 호반의 도시를 포기하는 건 좀처럼 쉽지 않은 일. 그리하여 남은 리투아니아 돈을 탈탈 털어 트라카이성에 다녀오기로 했다. 그런데... * Vilnius - Trakai: 빌뉴스 터미널에서 버스 자주 있음, 30~40분 소요, 6리타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작은 트러블이 있었다. 북유럽의 대표 선진국이라는 스웨덴 계열 은행 Swedbank에서 환전한 10리타짜리가 위조지폐라며 빠꾸먹은 것이다. 환전 영수증을 보여주며 은행에서 받은 거라고 했지만 들려온 대답은 "그럼 은행 가서 바꿔." 오늘은 토요일이라 은행이 쉬고, 내일은 내가 떠나는 날인데, 언제 은행까지 가서 바꾼단 말인가.ㅠㅠ 갑자기 4$ 남짓 되는 돈이 날아가버리니 차비랑 입
Lithuania - Vilnius - 어딘가 애잔했던 빌뉴스 [내부링크]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오자마자 문화 충격을 느끼게 해 준 A hostel 이름에서부터 뭔가 A급스러운 스페셜함이 느껴져서 선택한 건 아니고, 도착한 날이 마침 불금이었는데, 깜빡하고 숙소 예약을 안 해서 방황하다가 기차역 내 인포메이션에서 소개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곳이다. 알파벳 'A'라는 단 한 글자로 된 심플한 이름의 이 숙소는 빌뉴스에만 3개 지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인데, 이곳의 특징은 바로 도미토리의 흔한 2층 침대가 아닌 한쪽 벽면에 빌트인된 견고한 2단 목재 침실이었다. 일본엔 안 가봤지만 아마도 캡슐 호텔이 이러하지 않을까. 가격은 하룻밤에 34리타(12.5$). 샤울레이에서 10$에 건물 하나를 통째로 썼던 거에 비하면 순식간에 다운그레이드된 느낌이지만, 이 도시만의 독특한 캡슐 호텔에 묵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오히려 저 견고한 박스 안의 아늑함이 꿀잠 들게 만들더라는. 샤울레이도 그렇고 빌뉴스도 그렇고, 리투아니아는 전반적으로
Lithuania - Siauliai - 의외의 발견 [내부링크]
라트비아에서 리투아니아로 가기 전, 약간의 루트 고민을 했다. 나라 간의 이동을 할 땐 항상 하는 리추얼이지만, 이번에 가는 곳만큼은 후회 없이 돌아보고 싶다는 소망이 다들 있지 않나. 그동안 지나왔던 중국, 몽골, 러시아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놔서 여기저기 들르느라 바빴던 거에 비해 에스토니아부터는 갑자기 수도만 찍고 내려가는 단순한 루트가 되어버려서 뭔가 식상해진 거다. 라트비아까지 그러고 나니 이젠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리투아니아의 수도로 가기 전에 어디를 들를까 고민하다 선택한 곳이 바로 샤울레이(Šiauliai). 에스토니아의 겁나 빠른 인터넷으로 스치듯 지나친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언덕' 사진도 한몫했지만, 그보다 나의 관심을 끈 건 샤울레이주립대학 기숙사에서 묵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엔 호스텔닷컴에 등록된 숙소가 없기도 했지만, 다른 걸 차치하고라도 현지 대학생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그런 이유로 십자가의 언덕 말곤 딱히 볼 것 없는 샤울레이에서
Latvia - Riga - 마라가 준 백만 송이 장미 [내부링크]
에스토니아에서 완연한 유럽의 향기와 중세의 정수를 보고 나니 굳이 라트비아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유대인의 게토가 있는 리투아니아로 갈까 하던 찰나, 운명과도 같은 노래를 들었다. 바로 심수봉이 불렀던 '백만 송이 장미.' 이 노래의 원조가 라트비아였다니!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난 다급히 서둘러 엄마를 찾았지 난 꽉 붙잡았지 엄마의 앞치마를 그러자 엄마는 나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지 주었지, 주었지, 마라는 주었지 소녀에게, 소녀에게, 소녀에게 생명을 잊었네, 잊었네, 한 가지를 잊었네 소녀에게, 소녀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노래 제목은 '마라가 준 인생(Davaja Marina)' 여기서 마라(Mara)는 라트비아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인데, 마라 여신이 라트비아라는 딸을 낳아 생명을 주었으나, 정작 행복은 주지 못했다는 것을 소련 치하의 암울한 현실에 빗대어 노래한 것이다. 이 구슬픈 노래를 소련의 가수 알라 푸가초바가 '백만 송이 장미'로 번안해서
Estonia - Tallinn - 선진스러움과 중세의 콜라보 [내부링크]
푸시킨의 시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을 향한 창'이 맞는가 보다. 이 도시에서는 유럽의 흔한 국제버스인 유로라인과 에코라인이 모두 발착하고 있었으니. 심지어 영문 버전 홈페이지에서 예약도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창구에서 티켓 사느라 러시아어와 씨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 Saint Petersburg(Russia) - Tallinn(Estonia): Euroline 22:30~05:30(+1), 890루블, 학생 10% DC 홈페이지에서 'Student'를 선택했더니 1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됐는데, 버스 탈 때 학생증을 검사하는 구간도 있고, 안 하는 구간도 있었다. (보통 아시아인은 특유의 동안 때문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생 요금을 끊어주더라.) 유로라인을 탈 수 있는 발티스키역 앞 버스정류장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마지막 날 친해진 울자나가 고맙게도 역까지 배웅 나와줬다. 이 밤에 (참고로 지금 시각 밤 10시) 숙소까지 혼자 걸어갈 일이 걱정이라며 어서 들어
발트 3국에서 불가리아까지 - 구소련과 동구권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내부링크]
이번 여행의 시작은 백두산이고, 주요 목적지는 아프리카이기에 그 사이에 거쳐가는 중간 루트는 두 가지 옵션을 두었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서안에서 실크로드를 지나 터키까지 이동하는 것이었다. 이중 실크로드는 신라 승려 혜초와 당나라의 현장 법사가 천축국으로 갈 때 지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었지만, 내 마음은 아무래도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더 끌렸던 것 같다. 뒤늦게 찾아본 영화 <러브 오브 시베리아>와 배경은 다르지만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기차여행에 대한 로망, 그리고 10년 전 유럽에서 7할을 함께했던 유레일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으니. 그리하여 나는 한때 미국과 함께 세계 투톱을 달렸던 거대한 나라 러시아를 선택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 대가로 나는 또한 한자도 알파벳도 아닌 키릴 문자 베이스의 생소한 언어에 시달려야 했고, 영어에도 없는 권설음에 익숙해져야 했으며,
Russia - Petergof - 여름 궁전에서 오해 풀었던 썰 [내부링크]
오늘은 여름 궁전이 있는 페테르고프(Petergof)에 가는 날. 일찌감치 일어나 식당으로 갔더니 오며 가며 인사했던 베트남 아저씨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만 한 달째 여행 중이라는 이분은 내가 일주일만 머무른다니까 미쳤다며, 여기가 얼마나 볼 게 많은데 고작 일주일이냐고, 에스토니아행 버스 취소하고 한 달쯤 더 있다 가란다. 난 비자 기한이 있잖아요. 아저씬 무비자고. 부럽... "그건 그렇고 어제 페테르고프 갔었는데..." "앗, 나도 오늘 거기 갈 건데. 버스 어떻게 타고 갔어요?" "나 기차 타고 갔어. 시간 더럽게 오래 걸리더라. 충고하는데 기차는 절대 타지 마." 그러자 뒤에서 어눌한 영어로 "나도 거기 갈 건데..." 하며 다가와 앉는 Ulzana. 그녀는 내 옆 침대의 아래층을 쓰고 있는 카자흐스탄 여성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온 첫날, 방에 있는 그녀를 보고 막 인사하려는데, 굉장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휙 나가 버리는 바람에 말할 기회를 놓쳤고,
Russia - Saint Petersburg 3 걷고 싶은 도시 feat. 물길 [내부링크]
에르미타주에서 궁전광장을 지나 참모본부의 아치문을 통과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걷고 싶은 거리 넵스키 대로(Nevsky Prospekt)가 나온다. 넵스키란 이 도시를 관통하는 네바(Neva)강의 형용사형인데, 강변에 인접한 것도 아니고 수직으로 뻗어 있는 이 거리에 굳이 '네바강의 거리'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아마도 강에서 뻗어 나온 수많은 운하 줄기가 거리 곳곳을 지나가기 때문일 것이다. 표트르 대제가 발트해로 수렴되는 이 삼각주 지대에 도시를 건설할 무렵, 이 일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늪지대였다고 한다. 하지만 유럽의 곳곳을 시찰하고 온 제정 러시아의 초대 황제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는 바다를 메워 도시를 세우고 운하를 만들어낸 암스테르담과 베네치아를 벤치마킹하여 늪지대를 메우고, 물길은 그대로 살려 수상 교통으로 활용했다. 종교 사원은 대부분 이탈리아의 양식을 따랐는데, 그래서 넵스키 대로변에 웅장하게 서 있는 카잔 대성당(Kazanskiy Kafedralniy Sobor
Russia - Saint Petersburg 2 러시아 방주 [내부링크]
"눈을 뜬다. 아무 것도 없다..." 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시작하는 영화 <러시아 방주>. 에르미타주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단 한 번의 촬영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러시아인도 아닌 (심지어 그 시절의 적국이었던) 프랑스인의 생각과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폐쇄된 것 같으면서도 제3자로서의 중립적인 관점을 허용하는 꽤 독특한 구성의 영화다. 무엇보다 러시아든 프랑스든 아니면 유럽 전체든 잘잘못을 따지고 칭찬할 건 칭찬하는 아주 뜨끔하면서도 속 시원한 대사가 일품인데, 그중 영화 초반에 나오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알아야겠어. 이 방황은 러시아어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 이 대사가 마치 내게 에르미타주를 찾아볼 명분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를 사명감마저 느껴졌다. 과연 나는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어 가게 될까. 겨울 궁전 앞에는 그때 그 시절의 궁중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마차가 제정시대의 러시아라도 되는
Russia - Saint Petersburg 1 유럽의 창 [내부링크]
황량한 물결 일렁이는 강기슭에 서서 그는 위대한 생각을 품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이 정한 이치대로 우리는 이곳에 유럽을 향한 창을 내고 굳건하게 바닷가에 서 있으리.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 표트르 대제와 그의 도시를 노래한 서사시 '청동의 기사'의 한 대목이다. 여기서 '그'는 표트르 대제를, '유럽을 향한 창'은 서구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의미한다. 그의 시구절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첫인상은 영락없는 유럽이었다. 비록 간판은 키릴 문자로 그득하지만, 이곳에서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우면서도 여유로운, 마치 서구에 한 발짝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향기가 느껴졌다. 러시아 최초로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라는 뜻의 '제정 러시아'를 선포한 표트르 대제. 그가 새로이 설계하고, 유럽의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장장 10년에 걸쳐 건설한 신도시가 바로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이다. 도시의 이름은 그가 유럽의 사절단으로 가 있을 때 가장 감명을 받은
Russia - Moscow 2 모스크바 강변에서 낭만 산책 [내부링크]
도시 이름의 기원이 되는 모스크바강 여기서는 크렘린 본궁이 정면으로 보인다. 저길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입장권을 안 끊고 그냥 여기서 여여하게 감상했을 텐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붉은 광장에 비하면 인적이 드문 이곳은 사색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다. 크렘린에서 모스크바강을 따라 걷다 보면 이런 보행자 전용 다리가 나오는데, 그 끝은 금빛 돔이 찬란한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Khram Khristá Spasítelya)으로 이어진다. 로마노프 왕조 시대, 알렉산드르 1세 때 나폴레옹 군의 침략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그 후대인 니콜라이 1세가 터키의 하기아 소피아 성당을 참조해서 지었다는데, 과연 참조하기나 한 걸까ㅡㅡ? 전혀 비슷한지 모르겠다는. 이 성당은 완공된 후에도 내부의 벽화 작업 때문에 무려 20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는데, 그래서인지 입장료는 없으나, 벽화 보호 차원에서 내부 촬영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 웅장하고도 화려함의 극치를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 비
Russia - Moscow 1 붉은 도시 [내부링크]
4박 4일간의 기차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종착지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내가 내린 곳은 야로슬라브스키(Yaroslavsky)역. 하지만 모든 TSR이 이 역에 서는 건 아니다. 이르쿠츠크에서 만난 다른 여행자들은 같은 시베리아 노선을 탔어도 카잔스키역이나 레닌그라드스키역에 내렸으니까. 참고로 이 근처에만 기차역이 세 군데나 있고, 그 외에도 대여섯 군데의 역이 더 있는 걸 보면 모스크바는 진정 방대한 유라시아를 품고 있는 대륙의 수도답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수도라고 해서 당연히 영어가 통하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긴 러시아니까.ㅡㅡ;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행 기차표를 살 때 또 한 번 식겁했다. 여행은 호기심과 열정에 시간과 돈만 보태지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언어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여행자로서 자격미달인 건 아닌가 싶어 심히 위축된다. 남미처럼 대륙 하나가 아예 통째로 스페인어를 써서 일만 시간의 법칙처럼 다니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는 그런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Russia - Trans Siberian Railway - 세상에서 가장 긴 기차 여행 [내부링크]
바이칼 호수에서 이르쿠츠크로 돌아오던 날, 드디어 "정통"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했다. 몽골에서 올라올 때도 이미 타본 적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횡단이 아닌 종단이므로 사진에서 보이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이 열차가 바로 정통 시베리아 횡단 노선인 것이다. * Irkutsk - Moskva: 21:27~11:03(+4), 4217루블 세계 최고의 면적을 자랑하는 러시아는 극동에서 극서까지 무려 10시간의 시차가 있고, 모든 시간은 수도인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기차표에 표기된 시간도 모스크바 타임이고, 이르쿠츠크는 이보다 5시간이 빠르므로 출발 시각은 다음날 새벽 2:27. 백야 현상으로 자정 넘어까지 환한 까닭에 기차역으로 가는 길은 무섭지 않았지만, 꼭두새벽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려니 무엇보다 잠이 쏟아져서 미치겠다. 자칫하다간 기차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독하게 참다가 겨우 승차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뻗었는데
Russia - Khuzhir - 깊고 푸른 바이칼호 [내부링크]
이르쿠츠크에서 바이칼 호수를 보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중앙시장에서 버스를 타고 1~2시간 거리에 있는 리스트뱐카(Listvyanka)에 다녀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를 그저 가에서만 맴돌다 오기엔 뭔가 아쉬워서 호수 안에 있는 알혼(Olkhon)섬까지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베이스캠프는 섬의 유일한 마을인 후지르(Khuzhir)로 정하고, 다행히도 이르쿠츠크의 호스텔에서 교통이랑 숙소까지 예약해줘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 을 줄 알았는데, 역시 오지(?)로 들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은 아침 7:30 예정이던 버스가 1시간이나 연착했고, 그 뒤로 호텔 몇 군데를 더 돌아 중앙시장에 한 번 더 정차해서 사람을 꽉꽉 채운 뒤에야 겨우 출발할 수 있었는데, 가는 길 또한 심하게 비포장 지대여서 장장 4시간 동안 분노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며 도착한 곳은 사휴르타(Sakhyurta) 마을의 선착장 키릴문자로 MPC, 영어로는 MRS 여기서 배를
Russia - Irkutsk -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러시아로 [내부링크]
몽골에서 러시아로 넘어갈 때는 기차를 이용했다. 중국처럼 육로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중국-몽골 국경에서 식겁한 일도 있어서 웬만하면 편하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수단을 택한 것이다. * 울란바토르(몽골) - 이르쿠츠크(러시아): 기차 21:15~07:15(+2), 31시간 소요, 쿠페 79000투그릭 (지도 출처: thetranssiberiantravelcompany.com ) 몰랐는데 지금 내가 타고 가는 이 열차가 바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한 루트인 Trans-Mongolian이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통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가는 루트로, Trans-Siberian Railway, 줄여서 TSR이라고 부르며, 여기서 중간에 바이칼 호수가 있는 곳에서 몽골과 중국으로 내려가는 루트로 각각 나눠지는데, 그중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거쳐 중국의 북경까지 가는 노선이 지금 내가 타고 가는 Trans-Mongoli
Mongolia - Terelj - 지적이고 흥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벌어지는 일 [내부링크]
두둥~~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몽골의 전형적인 초원지대 테렐지 국립공원이다. 울란에서 계속 날씨가 흐리다가 러시아로 떠나기 전전날 극적으로 쨍쨍해져서 번개 같이 달려왔는데, 과연 어디를 찍어도 엽서구나. 자작나무 숲과 거북 모양의 바위산으로 유명한 이곳은 하루 동안 초원에서 말 달리고 게르에서 생활하는 게 전부인 단순한 투어라 가이드는 없다. 투어비는 1박 2일 30$, 국립공원 입장료 3000투그릭은 별도다. 이미 고비사막에서 일주일이나 넘게 게르를 체험했지만, 이렇게 광활한 초원에서 말을 탈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테무진의 스피릿이 마구 느껴지지 않나.ㅋㅋ 오후 2시 점심, 5시 말 타기, 7시 저녁식사 외에는 자유 시간이라 다들 각자 플레이에 여념이 없다. 이번 멤버는 어떻게 된 게 나만 빼고 전부 연인끼리 친구끼리 와서 철저하게 혼자 놀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대박 반전이... 아랫마을 쪽으로 산책하다가 우유통 같은 걸 끌고 가는 여인과 아이
Mongolia - Gobi - 사막, 게르, 그리고 현대판 유목민들 [내부링크]
드디어 고비사막으로 떠나는 날. 무려 7박 8일짜리로 내 생애 가장 긴 투어가 될 것 같다. 그것도 모든 게 부족한 사막으로 떠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면 일주일 동안 수도와 전기는 고사하고, 잠도 이동식 게르에서 자야 한다. 지형 특성상 일교차가 큰 까닭에 여름밤에도 솜이불을 덮고 자야 될 정도로 춥다지만, 다행히 숙소에서 오리털 침낭을 준비해줘서 개인 옷가지랑 8일 동안 씻을 물, 간식 정도만 챙겼다. 참고로 물은 생수 1.5L짜리로 4통을 준비했는데, 원래 물을 잘 안 마시는 체질이라 세수하고 손 씻고 다 해도 1통이 남았고, 걱정돼서 물티슈도 챙겨갔는데 단 한 장도 쓰지 않았으며, 삼시세끼 제공되는 식사가 의외로 맛있고 양도 많아서 비상식량으로 챙겨간 과자랑 초코바는 게르에 사는 아이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왔다. 사람은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걸 이번 고비사막 투어로 또 한 번 깨달았다. 참고로 투어 비용은 하루 38$씩 8일에 304$이며,
Mongolia - Ulaanbaatar - 심심한 도시에서 여행자가 살아남는 법 [내부링크]
한때 몽골제국이라는 대역사가 있었음에도 척박하기 그지없는 환경 탓에 늘 살 만한 곳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했던 유목민의 나라 몽골.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한 곳에 정착해서 문명을 꽃피웠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전쟁하며 떠돌다 정착한 곳이 그때그때 수도가 되었고, 떠나고 나면 그 자리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가 되었기에 상대적으로 도시의 역사가 짧은 울란바토르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 여행의 패턴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걷고 싶은 도시'나 '살아보고 싶은 도시'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으니. 그런 심심하고 무미건조한 도시에서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중 가장 다양한 국적의 가장 멋진 여행자들을 만났다. 둘도 없는 한국인인 걸 알고 매일 밤 맥주병을 기울였던 젠, 우노 게임 하나로 'asshole club'을 결성한 핀란드 또라이 야르꼬, 해리포터 친구 론을 쏙 빼닮은 스위스 젠틀맨 마티아스, 비록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가이드와 여
중국에서 몽골까지 - 길에서 만난 고마운 사람들 [내부링크]
이번 중국 여행은 아쉽지만 북경에서 마무리하려 한다.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감명 깊게 본 영화의 배경을 모두 둘러보고 싶지만, 그러기엔 중국은 너무 넓고 비자는 한정되어 있으니. 그래도 원래 뜻한 바대로 백두산과 고구려의 흔적은 밟아보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북한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았나. 일제의 수탈을 피해 이주한 조선족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가지 않았나. 무엇보다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게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일 터. 지금 당장은 여행을 계속해야 하니 중국에 대한 관심은 일단 여기서 접어두고 이제는 몽골을 향해 조금씩 이동해 본다. * 베이징 - 얼리앤하오터(二连浩特): 육리교터미널(六里桥客运主枢紐)에서 버스 16:30~05:00(+1), 179元 * 자민우드(Zamiin-Uud) - 울란바토르(Ulaanbaatar): 기차 21:45~11:00(+1), 쿠페(2등석) 39200T(1Tugrik = 1\) 단 두 줄로 간단하게 적었지만, 가
China - 北京(Beijing) 2 천안문 광장과 금지된 도시 [내부링크]
드디어 전문 너머에 있는 '금지된 도시' 자금성(紫禁城)으로 들어간다. 그는 또 수많은 뜰을 건너가야 한다. 그 많은 뜰을 다 지났다 해도 새로운 계단을 만나게 되고, 다시 뜰을 지나고 또다시 다른 궁전을 만나게 된다. 끝없이 몇 백 년, 몇 천 년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황제가 파견한 사절은 결코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 - 프란츠 카프카의 <황제의 전갈> 중 자금성에 간다면 꼭 읽고 가기를 추천하는 책이다. 단 두 쪽짜리 단편임에도 그 내용이 참으로 오묘해서 한없이 'kafkaesk'적인 이 소설은 숨통이 끊어져가는 황제의 전갈을 받은 아주 보잘것없는 신하가 자금성을 통과하는 여정을 마치 하나의 소우주를 헤매는 것과도 같이 표현해놔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몽롱함에 빠져든다. 과연 자금성은 그런 곳일까? 평일에도 북적이는 인파를 보니 역시 중국의 심장답다는 생각. 천안문과 단문을 지나 오문(정문)에 도착하니 좌우로 매표소가 기다랗게 늘어서 있다. 그만큼 방문객이 어마어마하단
China - 北京(Beijing) 1 후통의 매력 [내부링크]
연길 - 북경 구간 2층 침대버스 이 좁은 공간에 중간 자리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2층 침대라니. 더 놀라운 건 버스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 버스 탈 때 비닐을 나눠줘서 쓰레기 넣으라고 준 건 줄 알았는데 다들 신발을 벗어 넣더라는. * 연길 - 북경: 침대버스 12:40~06:30(+1), 260元 다음날 아침, 누가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눈 떠보니 벌써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다. "헉... 베이징?" "예~ 북경이에요." 조선족 운전기사의 시원스러운 대답에 겨우 정신 차리고, 내리면서 지하철 방향을 물어보니 한국말로 자세히 알려주신다. 덕분에 전문(前门)까지 헤매지 않고 한 번에 올 수 있었는데, 나는 전문대가(前门大街)가 이렇게 매력적인 곳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치 영화 <마지막 황제>에 나올 법한 배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나. 그 느낌 그대로 여긴 청나라 말기 상점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관광테마거리여서 그때 그 시절 운행했던 전차가 여전
China - 延吉(Yanji) - 독립운동의 자취 [내부링크]
백하에서 연길까지는 바로 가는 버스가 없고 안도를 거쳐야 한다. 물론 기차를 타도 되지만, 하루에 1타임밖에 없어서 그냥 3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버스를 타기로 했다. * 백하 - 안도(安图): 버스 자주 있음, 3시간 소요, 24元 * 안도 - 연길: 버스 내린 곳에서 바로 연결, 1시간 소요, 13元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기차역 보이는가, 저 커다란 한글이! 여기가 바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 연길이다. 버스터미널은 기차역 맞은편에 한글 간판이 난무한 건물 1층에 있었는데, 이름은 연길도로철도분류뻐스역이다. 건물 안에 숙소도 있고 룸살롱도 있으며, 용정이나 도문(두만강)으로 가는 버스도 여기서 탈 수 있다. 다만 북경으로 가는 버스는 연길도로철도분류뻐스역이 아닌 바로 옆 블록에 2층 침대 버스가 모인 곳에서 타야 한다. * 연길 - 북경: 침대버스 12:40~06:30*, 260元 참고로 기차는 더 오래 걸린다. 12:30~11:00(+1) 스케줄에 딱딱한
China - 白河(Baihe) - 백두산 가는 길 [내부링크]
* 집안 - 통화: 버스 1시간 간격 출발, 2시간 소요, 23元 너무 쫄깃해진 심장으로 본의 아니게 광개토대왕릉비를 건너뛰고 통화에 도착하니 점심때가 훌쩍 넘었다. 여기서부터 백두산이 있는 백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용정까지는 기차가 연결되므로 중국 와서 처음으로 기차표를 예매했다. 창구에 목적지랑 날짜, 시간을 적어서 여권이랑 제시하니 좌석 등급은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끊어준다. * 통화 - 백하: 기차 06:28~13:19, 57元 생각보다 상당히 깨끗했던 중국 기차 목욕을 안 해서 땟국물이 흐른다고 '되놈'을 '땐놈'으로 비하해서 부르는 말을 듣고 자란지라 중국에 대해선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웬걸, 청소도 말끔히 되어 있고, 시트와 베개도 새걸로 세팅되어 있고, 보온병에는 따뜻한 물까지 담겨 있었다. 어쩐지 다들 컵라면을 한 보따리씩 들고 타더라니. 자리를 못 찾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역무원이 와서 자리를 안내해주고는 티켓을 플라스틱 카드로 바꿔주고 갔다. 이
China - 集安(Jian) - 고구려 2탄 [내부링크]
* 환인 - 집안: 버스 06:30, 07:40 2대, 4시간 소요, 34元 환인에서 집안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오지 마을... 고개 하나 사이에 두고 다들 어찌 알고 지내는지 사람 하나 탈 때마다 인사를 주고받느라 난리다. 그 와중에 점점점 소외되는 1인... 4시간 동안 입 한 번 열지 않은 사람은 나뿐이었을 듯. 그런 내가 측은해 보였는지 중간에 안내양 언니가 딸기를 사 와서 나눠주기도 했다. 이런 시골 인심 오랜만이야. 험한 산길에도 버스는 예상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고, 늘 그렇듯 터미널 근처 초대소(招待所)에 여장을 푸는데, 주인이 다시 노크를 하더니 공안 때문에 안 되겠다며 빙관으로 가란다. 응? 눈치껏 해석한 바로는 외국인은 저렴한 초대소 말고 좀 더 비싼 빙관으로 보내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정책 같은데, 한 블록 거리에 있는 빙관에서도 퇴짜를 맞으니 뭔가 불안해진다. 宾馆, 旅馆, 旅社, 招待所... 인터넷에서 긁어온 숙소 관련 단어는 다 돌
China - 桓仁(Huanren) - 고구려의 태동지 [내부링크]
단동에서 호산장성에 제대로 실망하고, 고구려의 자취를 찾아가는 행보 따위일랑 집어치우고 바로 백두산으로 뜰까 하다가 어차피 가는 길이니 딱 두 곳만 더 들르기로 했다. * 단동 - 환인: 버스 08:00, 10:10 2대, 5~6시간 소요, 56元 이번엔 환인이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은가? 바로 단군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 '환인'과 같은 환(桓)자다. 이름에서부터 민족적 정기가 훅 느껴지는 이곳에 바로 고구려의 태동지 '졸본성'이 있다. 물론 중국 이름은 '오녀산성'이지만. 단동에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5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환인은 지금까지 가본 대련이나 단동보다는 확실히 낙후된 시골 같은 느낌. 숙소 시설도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물론 가격도 그만큼 저렴하지만. 욕실 포함 싱글 60元. 시내는 한산해서 을씨년스러운데, 마을 주위로 성벽이 둘러싸고 있어 꽤 고풍스러운 분위기다. 시내를 다니면서 보니 '오녀산성'이라 적힌 버스가 심심찮게 돌아다니길래 무턱대고 올라탔더니 정말
China - 丹东(Dandong) - 압록강에서 북한 구경 [내부링크]
적당히 번화하고 적당히 조용한 대련에서 중국 여행에 대한 워밍업을 하고, 드디어 압록강과 가까운 단동으로 이동했다. * 대련 - 단동: 승리광장 근처 터미널에서 버스 09:00~12:30, 91元 주말이라 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예매를 안 해도 자리는 텅텅 비었고, 승차권 외에도 생명보험이란 명목으로 1元을 더 거둬갔다. 생명보험이라니, 단돈 170원에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가ㅡㅡ? 허허벌판을 지나 3시간 만에 도착한 단동은 대련보다 훨씬 번화한 곳이었다. 마오쩌둥 동상이 한 손을 치켜들고 있는 이 기차역 광장만 보면... 맞은편에 있는 버스터미널 주변은 이다지도 후진데, 그 와중에 찜질방과 한국식품 파는 슈퍼를 보고 또 반가워서 울컥한다. 감동해서 짝퉁 새우깡을 2元에 겟하고, 터미널에서 한 블록쯤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주택가니까 당연히 숙박시설은 없을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도 아파트 상가에서 여관을 발견했다. 더블 100, 보증금 200 야
China - 大连(Dalian) - 중국 워밍업 [내부링크]
두 번째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나는데 날씨가 반겨주질 않는다. 이래서야 배가 제대로 뜰까 싶은데, 그래도 매표소는 북적였고, 이코노미 침대칸은 만원이다. 리턴 티켓 없이 편도 배표만 끊었는데도 아무런 검사 없이 통과되는 걸 보면 원래 배가 비행기보다 느슨한 건지 아니면 중국은 원래 리턴 티켓이 필요 없는 건지... (나중에 알고 보니 후자였음)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의 모습도 좀 충격이었다. 그래도 국제선인데 하며 공항에서의 친절과 청결을 기대했건만,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뒹구는 대기실 한쪽에는 소주병이 수북이 쌓여 있고, 한국어보다 더 많이 들리는 중국어와 먼저 줄 섰는데 왜 옆줄부터 들여보내냐며 대드는 사람들과 공권력이 뭔지 당해보라며 권력을 마음껏 남용해주시는 직원 아저씨... 이미 중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승선하자마자 놀란 것 중 또 하나는 직원들이 전부 어설픈 한국말을 쓰는 중국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안내 방송도 잘 들어야 한다. 애매한 발음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까딱하다간
Canada - Vancouver - 별것 아니지만 영화처럼 [내부링크]
"Will you marry me?" 산드라 블록과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오는 <프로포즈>를 올해만 2번이나 봤다. 그것도 비행기에서. 반년 전 인천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길에 한글 자막으로 1번 보고, 반년 후 멕시코시티에서 토론토로 가는 길에 에스빠뇰 자막으로 2번째 보는 중. 굳이 이걸 또 찾아본 이유는 엔터테인먼트에 볼 만한 게 없어서.ㅡㅡ; 그러고 보면 에어캐나다는 반년 동안 업데이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덕분에 내 에스빠뇰 실력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 라틴의 땅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전혀 늘지가 않았더라. 아마도 나는 어학보다는 내가 보고자 했던 것에 집중했거나 아니면 영화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결혼에 관한 내용이어서 어휘가 생소했는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이 영화는 몇 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냐. 역시 산드라 블록의 로코는 옳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때부터 알아봤지만, 썩 예쁘지 않아서 더 찰진 연기가 그녀의 매력인 듯. 그리고 이 영화로 알게 된
Mexico - Ciudad de Mexico 2 멕시코의 기원, 그리고 현재, 어쩌면 미래 [내부링크]
16세기 스페인의 콩키스타도르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신비한 물의 도시가 있는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호수 위에 떠 있는 이 섬은 10km에 달하는 원도심 형태로, 육지까지 6개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거리는 정기적으로 청소가 될 정도로 깔끔했는데, 섬 안에는 방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고 있었다고 한다. 이 섬의 이름은 테노치티틀란(Tenochititlan). 바로 아스텍 제국의 수도이며, 멕시코시티의 중심 광장인 소칼로가 있던 자리이자 이 나라의 기원이 되는 곳이다. 테노치티틀란 지도와 섬의 중심에 있었던 템플로 마요르(Templo Mayor) 유적 템플로 마요르 너머로 보이는 곳이 바로 멕시코시티의 중심 소칼로 광장이며, 광장의 한쪽에 보이는 고풍스러운 건물은 스페인인들이 아스텍 신전을 무너뜨리고 세운 대성당이다. 참고로 호수는 스페인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메워버렸다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죄다 파괴해놔서 옛터만
Mexico - Ciudad de Mexico 1 테오티우아칸의 희생 [내부링크]
마야 유적지 편에서 언급했듯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문명은 중미 일대에서 일어난 마야(Maya) 문명이다.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20세기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후 올멕(Olmec), 사포텍(Zapotec) 등 자잘한(?) 문명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다가 마야 문명이 번성하기 시작한 기원후 1세기경, 멕시코시티 부근에서는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이라는 도시가 탄생했다. 이 도시국가는 4~5세기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하다 사라졌고, 그 후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아스텍(Aztec)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테오티우아칸을 문명으로 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피라미드 규모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고봉이라는 점과 마야 문명보다 훨씬 치밀하게 조성된 도시 구조, 그보다 한술 더 뜬 역대급 인신 공양으로 인해 역사적으로는 충분히 한 획을 그었다고 할 만하다. 이런 이유로 멕시코시티에 도착하자마자 테오티우아칸부터 다녀왔는데, 이미 마야 문명과 잉카
Mexico - Oaxaca - 맛과 멋의 도시 [내부링크]
'Cubana Canceled' 아바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칸쿤의 여행사에서 구매할 때만 해도 리컨펌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캔슬이라니!!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ㅠㅠ 울상을 지으며 쿠바나 항공 사무실로 갔더니 나 말고 2명이 더 있다. 승객이 우리 셋밖에 없어서 캔슬된 거라며, 칸쿤으로 가는 멕시카나 항공편을 연결해주겠다는데, 문제는 16:50 출발. 칸쿤에서 멕시코시티로 가는 17:00 비행기를 타야 해서 사정을 말하니 멕시코시티로 바로 연결해주겠단다. 응? 뭐가 이렇게 쉬워ㅡㅡ? 쿠바 여행이 이렇게 스무스해도 되는 거야?? 만국기가 걸려 있는 아바나 공항과 멕시카나 항공의 기내식 참고로 아바나에서 멕시코시티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다. 완전 가까운 것 같지만, 국제선이기 때문에 입출국 절차를 거쳐야 해서 멕시코시티 공항에서 짐 찾고 나오니 벌써 저녁 9시가 넘었다. 지금 시간에 위험한 소
Cuba - Habana - 아바나에서 모히토 한 잔 [내부링크]
드디어 아바나로 간다. 쿠바의 수도이며, 한때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영광이 무색하게도 초라하게 나이 들어버린 도시. 스페인어로는 Habana, 영어로는 Havana. 어쩌다 중간에 b가 v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좋다. 아바나든 하바나든, 내가 애정해 마지않는 콤파이 세군도의 노래를 들으며 모히토 한잔할 수 있다면. * Santa Clara - Habana: Viazul 08:20~11:40, 18CUC 3시간쯤 걸린다는 비아술 버스가 처음으로 연착을 했다. 역시 수도에서 도로 정체는 필수인가. 늦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산타클라라의 카리 아줌마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로사가 내 이름이 적힌 A4 종이를 들고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쿠바 민박의 자체 연계 시스템. 어쩌다 얻어걸린 산티아고의 숙소 중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카사 파르티쿨라르는 내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예약에서 픽업까지 알아서 척척 진행해주었다. * Sra. Rosa
Cuba - Santa Clara - 체 게바라의 도시 [내부링크]
남미 여행을 처음 시작할 무렵, 아르헨티나에서 체 게바라를 만난 적이 있다. 정확하게는 혁명 전의 에르네스토 게바라가 살았던 집이지만, 거기에는 유년 시절의 그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그, 그리고 혁명가로서 짧은 생을 살다 간 그의 일대기가 모두 담겨 있었다. Argentina - Alta Gracia -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길에서 지내는 동안 무슨 일인가 일어났어요." 23살의 한 의학도는 학위를 마치자마자 남미라는 거대한 대... blog.naver.com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미 여행의 끝무렵, 쿠바에서 그를 다시 만나러 간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가 남미 대륙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기 위해 혁명의 불씨를 태운 곳, 그리하여 쿠바 혁명의 첫 번째 승리를 안겨준 곳 산타클라라(Santa Clara)를 향하여. * Trinidad - Santa Clara: Viazul 15:30~18:20, 8CUC 지금까지 밤차만 타서 그런가, 처음 보는 낮 버스의 풍경이 새삼 낯설다. 쿠바
Cuba - Trinidad - 설탕 계곡의 전설 [내부링크]
쿠바의 설탕 역사는 16세기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됐다. 당시 유럽의 주요 설탕 공급지였던 카나리아 제도에서 사탕수수를 가져간 콜럼버스는 아이티를 비롯한 쿠바, 자메이카 등지에 옮겨 심었고,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강한 번식력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아메리카 대륙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설탕 기지로 거듭나게 된다. 그중에서도 카리브해의 무역 중심을 담당했던 쿠바는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과 함께 무역을 위한 철도와 항만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지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그 중심에 거대한 설탕 계곡을 품은 도시 트리니다드(Trinidad)가 있었다. * Santiago - Trinidad: Viazul 19:30~06:30(+1), 33CUC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산티아고에서 밤 버스를 타고 트리니다드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6:30. 칠흑같이 어두운 새벼녘에 터미널 대기실까지 굳게 잠겨 있어 당황하던 찰나, 다행히 산티아고의 카사 주인으로부터 미리 연락받은
Cuba - Santiago de Cuba - 혁명과 예술과 카리브해의 앙상블 [내부링크]
쿠바는 왠지 이번 남미 여행의 외전 같은 느낌이다. 그건 마치 칠레에서 이스터섬으로 향할 때의 신비로운 설렘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동남아에 있으면서도 동남아스럽지 않은 미얀마의 유니크함을 떠올리는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들. 이 모든 건 혁명과 독재정권이 공존하는 아이러니, 그리고 폐쇄 경제 정책으로 겉보기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은 나라 쿠바만이 가지는 독특한 상징성 때문이리라. 쿠바가 낳은 세기의 뮤지션 콤파이 세군도의 노래를 들으며 아바나로 향한다. 노래 제목처럼 20년 전에 멈춰버린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모를) 이 나라의 스토리텔링을 찾아서. * Cancun(Mexico) - Habana(Cuba): Cubana Airlines 14:40~16:20 멕시코 칸쿤의 국제공항에서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미국인을 보았다. 국가 간의 수교가 단절됐으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는 멕시코의 칸쿤을 거치는 것이리라. 가족 단위로 화려한 휴가 복장을 하고 온
Mexico - Cancun - 쿠바 프리퀄 [내부링크]
드디어 이번 여행의 종착지 멕시코로 가는 길. 이제 산 넘고 물 건너가는 이런 험한 길도 마지막이다. 멕시코는 중미의 선진국일 테니. 도로도 쭉쭉 뻗어있을 것이고, 버스도 아르헨티나만큼 쾌적할 것이다. 그러니 오지(?)에서의 마지막 경험을 즐기자며...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막상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저런 쪽배를 타려니 심히 불안하다. 설상가상 30분을 넘게 달리고 있는데도 선착장은 보이질 않고... "웰컴 투 더 랜드 오브 키드내핑ㅋㅋㅋ" 과테말라에서 함께 출발한 여행자 중 한 명이 던진 말에 순간 빵 터졌다.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다들 심란하긴 마찬가지였는지 그제서야 멕시코 치안에 대해서 봇물 터지듯 한마디씩 쏟아져 나온다. 멕시코시티의 살인율은 세계 몇 위인지, 총기 소지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대낮의 길거리 납치는 여전한지... 어쩌다 이 나라의 키워드가 이런 걸로 점철되어버렸을까. 하지만 그런 염려가 무색하게도 10분쯤 지나서 배는 멕시코 국경인 프론테라 코로살(Fr
남미 문명의 시조, 마야 문명 - 코판, 티칼, 팔렝케 유적을 지나며 [내부링크]
남미 여행을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하다 보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루트가 되어 본의 아니게 잉카 문명부터 먼저 들렀는데, 시기적으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문명은 중미에서 일어난 마야(Maya) 문명이다. 그 뒤를 이어 아스텍(Aztec) 문명이 멕시코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페루를 중심으로 잉카(Inca) 문명이 꽃 피어났으니 시간적 순서로는 마야 -> 아스텍 -> 잉카가 되겠다. 각 문명의 시기는 백과사전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나, 발생 시점은 대체로 연대 미상인 경우가 많아서 각 백과사전의 평균치 또는 가장 많이 나온 연대를 참고했고, 멸망 시점은 일괄적으로 16세기 대항해 시대 스페인의 정복 이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지도 출처 https://courses.lumenlearning.com/suny-ushistory1os2xmaster/chapter/the-americas/ ) 세 문명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다가 전체 영역이 표시된 지도가 있어서
Guatemala - 빛과 그림자 그리고 또띠아 [내부링크]
온두라스에서 과테말라로 넘어온 순간 무슨 선진국에라도 온 줄 알았다. 울창하던 밀림지대가 끝나고, 정갈한 논밭이 이어지더니 도로 상태도 완전 평탄대로. 심지어 이민국은 같은 건물에 있어서 체크아웃과 체크인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남미 국경의 단골 메뉴인 짐 검사도 일절 없었다. 이렇게 빨리 국경을 넘은 건 유럽의 쇵겐 조약 이후 처음인 듯. 그래서 착각했다. 과테말라는 중미에서도 잘 사는 나라일 거라고. 멕시코에서 가까우니 경제도 엇비슷할 거라고. 이런 생각은 콜로니얼 도시의 끝판왕이라는 안티구아(Antigua)에 와서 더욱 확실해졌는데, 듣던 대로 규모나 분위기나 가격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남미의 다른 국가들이 그렇듯 원주민의 역사는 16세기 스페인의 식민 건설로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안티구아는 중미의 식민 정부가 있던 곳이어서 주요 건물이 많이 남아 있었다. 물론 수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훼손되고 복구되기를 반복하면서 심하게 낡은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Costa Rica, Nicaragua, Honduras - 중미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내부링크]
파나마부터 온두라스까지는 중미의 특급(?) 국제버스인 Tica Bus를 이용했다. 국가 간 주요 도시를 한 번에 갈 수 있고, 아르헨티나만큼 쾌적한 시설에 달러로도 계산이 가능하며, 웬만하면 정시 출도착 한다는 후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커미션 명목으로 국경세를 너무 뻥튀기해서 받아먹더라. 어쩐지 중미 물가에 비해 가격이 좀 세더라니. * 파나마시티 - 코스타리카 산호세: Tica Bus, 23:00~14:00(+1), 25.1$, 파나마 출국세 1$ 면세의 나라인 파나마는 입국세가 없는 대신 출국세 1$가 있었고, 중미에서도 생활수준이 괜찮다는 코스타리카는 입출국세가 아예 없었다. 파나마 출국할 때 짐 검사를 좀 세게 한 것만 빼면 티카 부스로 이동한 구간 중 제일 양호했던 듯. * 코스타리카 산호세 - 니카라과 그라나다: Tica Bus, 12:30~20:00, 23$, 니카라과 입국세 8$ 일단 저녁 도착이라는 시간대부터가 쉣이고, (아침
Panama - Ciudad de Panama - 파나마 게이샤보다 파나마 운하 [내부링크]
파나마는 어딘가 미국스러웠다. 미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할리우드 영화에 나올 법한 거리가 곳곳에 펼쳐져 있었으니. 게다가 달러가 공식 화폐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에는 미국이 파나마의 독립과 운하 건설에 일조했기 때문이리라. 물론 그 배후에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권 쟁탈이 있었지만. 숙소는 여행 카페에서 추천된 곳으로 갔는데, 숙소가 있는 Via Argentina 거리 일대는 부촌 느낌이 나는 쾌적한 동네였다. 여기서 두어 블록만 걸어 나가면 Vía España 대로가 펼쳐지는데, 그 길을 따라 대형마트와 버스정류장이 밀집해 있으며, 이 두 도로 사이에는 세계 자유무역의 거점답게 각국의 은행이 몰려 있어 보안 하나는 철저했던 것 같다. 한마디로 여긴 안전지대였단 얘기. * Hostal Voyager, Via Argentina y Cangrejo Edificio, Emilsani Piso 2: 도미/조식/타월 10$ 주인아저씨가 모건 프리먼을 닮아서 영어로 말 걸었더니 역시나 에스
Colombia, Panama - 눈물의 국경 넘기 [내부링크]
오직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온 메데진(Medellin). 그래서인지 딱히 뭘 보겠다는 의욕도 없고, 그냥 가는 날까지 안전하게 잘 있다가 별 탈 없이 파나마로 넘어가면 그만이라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시간을 숙소에서 보냈다. * Hostal La 33, Calle 33 No.80B-39: 도미 17000페소, 조식 포함 여기도 보고타의 태양여관처럼 한국인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널 호스텔이지만,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손님이 별로 없다. 숙박객 입장에서야 깨끗하고 시설 좋은 데서 조용히 쉴 수 있어 좋지만, 이런 좋은 장소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 하긴 나도 비행기만 아니었다면 이 도시에 오지도 않았을 테니 손님이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남은 콜롬비아 페소를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 딱 한 번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갔는데, 콜롬비아 제2의 도시라는 곳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서 깜놀하고, 은행에서 환전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한두 가지가
Colombia - Manizales - 커피 투어 [내부링크]
나는 원래 coffee person이 아니었다. 스벅을 가도 요거트스무디만 시키는 인간이었는데, 그런 내가 남미에 와서 인터내셔널 호스텔 생활 좀 했다고 융드립종이 필터가 아닌 천으로 된 필터로 내려먹는 블랙커피)에 반할 줄이야. 커피 왕국 남미에선 커피 자체 품질뿐만 아니라 도구도 남달라서 웬만한 숙소에선 융드립이 숟가락 수만큼이나 있더라. 그 생김새가 묘하게 호기심을 자극해서 몇 번 타 먹다가 그만 중독되고 말았다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커피 산지를 지나오면서 정작 커피 투어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남미를 떠나기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커피 투어만큼은 꼭 하고 가리라 결심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중미가 남아 있고, 오히려 그쪽에 커피 산지가 더 많이 몰려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엔 콜롬비아만 한 곳이 없다고 하여 온 김에 커피 산지로 유명한 친치나(Chinchina)에 가 보기로 했다. * Bogota - Manizales: Rapido To
Colombia - Zipaquira - 세상에서 가장 깊은 성당 [내부링크]
보고타에서 1시간 거리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금성당(Catedral de Sal)이 있다고 하여 들렀다. 소금성당이 있는 시파키라(Zipaquira) 마을 보고타에서 트란스 밀레니오를 타고, 종점에 내려 "시파, 시파, 시파~~" 외치는 버스를 갈아타면 1시간쯤 후에 이 아담한 마을에 도착하는데, 광장에서 오르막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올라가면 옆으로는 멋진 마을 전경이 펼쳐지고, 곧 거대한 광부 동상이 보이는데, 여기가 소금성당 입구다. 관람은 투어로만 가능하며 입장료는 15000페소. 표를 사서 암염 터널 앞으로 가면 투어팀을 배정해주는데, 대부분 현지인이라 영어 투어는 30분 정도 기다려야 했다. 입구에서 성당까지 장장 2km에 달하는 암염 터널 이곳은 원래 바다였던 곳인데 지각변동으로 육지가 되면서 소금 결정이 남아 지금의 모습처럼 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소금을 캐러 온 광부들은 이보다 더 깊숙한 곳에 성당을 만들고 안전을 기원했는데, 크고 작은 예배당이 무려 14군데나 되
Colombia - Bogota -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 [내부링크]
드디어 남미 대륙의 끝 콜롬비아로 가는 날. 국경을 넘는다는 건 늘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버스는 무사히 탈 수 있을지, 국경에서 험한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지, 환전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경 너머의 저 나라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메트로부스를 타고 터미널 카르셀렌(Terminal Carcelen)으로 향한다. 콜롬비아와 인접한 국경 도시 툴칸(Tulcan)으로 가기 위해. * Quito - Tulcan: 버스 자주 있음, 5시간 소요, 4.5$, 터미널 이용료 0.2$ 키토에 도착하던 날 봤던 삐까뻔쩍한 키툼베 터미널과 달리 시골 버스정류장 같은 터미널 카르셀렌에서 낡디 낡은 버스를 타고, 5시간 동안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 툴칸에 도착하니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다. 밥은 국경 넘어가서 먹기로 하고, 부리나케 아요라 공원으로 움직여본다. 거기 가면 콜롬비아의 국경 이피알레스(Ipiales)로 가는 버스를 탈 수
Ecuador - Quito - 세상의 중심 [내부링크]
드디어 적도로 간다. 지도상에서 위도가 0도인 곳. 그래서 세상의 중심(Mitad del Mundo)이라 불리는 그곳. 나라 이름부터가 적도인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를 향하여. 쿠엥카에서 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또 으슥한 뒷골목이다. 탈 때는 분명 번듯한 터미널이었는데, 왜 늘 내릴 땐 이상한 곳에 세워주는가ㅡㅡ? 키토 터미널이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맞단다. 그러면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건물을 가리키는데, 도대체가 저 우중충한 건물이 한 나라의 수도에 어울리기나 하냐며 들어갔더니 완전 삐까뻔쩍한 건물!! 이 공항 같은 건물은 키토 이남 지역으로 발착하는 키툼베 터미널(Terminal Terestre Quitumbe)이다. 이름을 보아하니 키토에서 페루의 툼베스까지 운행하는 모양. 참고로 북부로 가려면 터미널 카르셀렌(Terminal Carcelen, Terminal Norte라고도 함)으로 가야 한다. 콜롬비아로 넘어가기 위해 툴칸행 버스회사를 찾다가 없어서 경찰한테
Ecuador -Gualaceo - 인디오 시장의 끝판왕 [내부링크]
쿠엥카에 머무는 동안 운 좋게도 일요일에만 열린다는 괄라세오(Gualaceo) 인디오 시장을 볼 수 있었다. * Cuenca - Gualaceo: 버스 자주 있음, 1시간 소요, 0.6$, 터미널 이용료 0.1$ 일요장인 만큼 버스에는 사람들이 미어터졌고, 그중 여행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의외였고, 괄라세오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다들 어디론가 사라져서 또한 난감해졌다. 도대체 인디오 시장은 어디 있는 거야ㅡㅡ?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메르카도 방향을 물으니 오히려 "메르까도? 꼬미다?" 하며 되묻는다. 응? 시장이 하나가 아니었나? 그냥 메르카도라고 하니까 2블록쯤 가서 좌회전하란다. 친절한 시민이 가르쳐준 대로 간 곳엔 아담한 광장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인디오 시장이 열린다는 과야킬 광장(Plaza de Guayaquil)이다. 괄라세오에 있는 광장에 왜 굳이 과야킬이란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내 중심답게 교회도 있고, 인포메이션도 있었다. 별 도움은
Ecuador - Cuenca - 쉼 [내부링크]
리마에서 국경 도시 툼베스로 가는 길 역시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썼지만, 리마는 터미널이 따로 없고 해당 버스회사에서 예매하고 타는 시스템이라 툼베스로 발착하는 시바 플로레스(Civa Flores) 사를 찾아가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는데, 시설도 완전 구려서 중간에 몇 번이나 뛰어내리고 싶었다는. (지금은 Plaza Norte란 곳에 종합터미널이 생겼다고 함) 게다가 툭하면 경찰이 들이닥쳐서 여권 검사, 짐 검사를 하는 바람에 툼베스에 도착할 즈음엔 거의 좀비 상태에 이르렀는데, 내려주는 곳도 하필 한적한 도로가의 구멍가게 앞이다. "뚬베스?" "씨." "터미널은?" "아끼." "에콰도르 버스는?" "시파." 또 욕이냐... 알고 보니 버스에서 내린 곳 바로 앞에 있는 구멍가게가 시바(Civa) 사였고, 그 옆에 에콰도르로 가는 시파(Cifa) 사가 있었다. 시바와 시파라니, 뭔가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입에 착착 달라붙는 이름이지 않나.ㅋㅋ * Tumbes(Peru
Peru - Lima - 콩키스타도르의 도시 [내부링크]
나스카에서 지상화를 볼까, 이카에서 와카치나 사막을 갈까, 피스코에서 피스코 사워를 마실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다녀온 나라와 지형이 많이 겹치고, 나스카 경비행기는 멀미에 약한 사람에겐 쥐약이란 얘길 들어서 포기하고 보니 남은 건 리마밖에 없더라. * Cuzco - Lima: 버스회사 많음, 16:00~14:00(+1), 55솔, 터미널 이용료 1.1솔 밤새 첩첩산중을 넘어 다음날 오전쯤 나스카와 피스코를 지나 점심 무렵 리마에 도착했는데, 버스터미널이 따로 없는지 해당 버스회사 앞에 세워준다. 알고 보니 여긴 대부분의 버스회사가 몰려 있는 아방카이 대로(Av.Abancay). 다음 목적지인 툼베스행 버스를 예매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하나같이 안 간다며 튕겼다. "께 에스 놈브레 데 라 꼼빠냐 아 뚬베스?" "시바." "응ㅡㅡ?" "시바 플로레스." 여기가 아니라 2블록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데, 가르쳐준 대로 가도 안 보여서 한참을 헤맸다. 찾아가는 길도 완전
Peru - Machu Picchu -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서 [내부링크]
드디어 공중도시 마추픽추로 가는 날. 설레서 잠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여행 이래 처음으로 알람 소리를 듣고 깼다. 새벽 4시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골목길을 보니 굳이 5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어 채비를 하고 나섰는데, 버스정류장을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로 들어서자 갑자기 불빛이 끊겨버렸다. 가로등은 마을까지만 허용된 인프라였어... 이제 와서 돌아가긴 싫고 어쩔까 망설이는데, 곧 헤드랜턴을 쓴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의 불빛에 의지하며 구불구불한 돌계단을 무려 13구간이나 올라 마추픽추 입구에 도착하니 그제서야 동이 터온다. 벌써부터 이렇게 힘든데 와이나픽추에 오를 수 있을까? 자신은 없지만, 혹시 몰라서 대기 줄을 섰다가 와이나픽추 번호표를 받아냈다. 34번. 하루에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하니 아직 166명이 더 남았군. 티켓과 여권, 학생증을 꼼꼼히 검사한 후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 마추픽추 스탬프를 찍었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Peru - Aguas Calientes - 잉카 트레일을 따라 [내부링크]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로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지만 비싼 아구아스 칼리엔테스행 기차를 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바로 전 역인 오얀타이탐보까지 버스로 이동했다가 나머지 구간을 기차로 가는 것이며, 세 번째는 오얀타이탐보에서 다시 버스로 산루이스-산타마리아-산타테레사-이드로까지 이동했다가 이드로에서 기찻길을 따라 걸어가는 방법이다. 참고로 걷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린다는. 비용적으로 따진다면야 당연히 세 번째 방법이 절대 우위지만, 일행도 없이 여자 혼자 굳이 무리수를 두고 싶진 않아서 그냥 두 번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런데 쿠스코에 있는 인포메이션에서 오얀타이탐보행 버스를 알아보다가 한 가지 정보를 더 입수했다. 중간에 우루밤바를 거치면 차비가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다. 덕분에 우루밤바강을 따라 형성된 잉카 트레일을 현대판 차스키가 되어 추적해 본다. 참고로 차스키(chaski)는 바퀴가 없던 잉카 시절에 소식을 전하거나 물자를 수
Peru - Cuzco - 잉카의 중심 [내부링크]
콜카 캐년에서 아레키파로 돌아오던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밤차로 쿠스코(Cuzco)로 이동했다. 잉카인의 애환이 담긴 '엘 콘도 파사'를 듣다 보니 그들의 문명이 더욱 궁금해져서, 그리고 가사에 나오는 안데스의 고향인 마추픽추도 하루빨리 가보고 싶어서.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내보기로 했다. * Arequipa - Cuzco: 19:00~06:00(+1), 25솔, 터미널 이용료 1.5솔 쿠스코도 터미널에서 시내까지 거리가 꽤 멀어서 택시를 탔는데, 싱글룸 20이라며 당연한 듯 딜을 해오는 기사 양반ㅋㅋ 이른 아침이라 비몽사몽 간에 따라갔는데, 아레키파와 비슷한 시설에 가격은 2배다. 그래, 잉카의 핵심에 왔으니 그만한 물가는 감수해야지. * Hostal Acosta's, Choquechaca 124: con bano 30, sin bano 20, 조식 포함 조식 포함이래봤자 콜카 캐년 투어 때 먹었던 공갈빵에 버터와 잼이 전부였지만, 식사를 할 수 있는 옥상의 전망이 너무 좋아
Peru - Arequipa - 페루 안의 유럽 feat. 엘 콘도 파사 [내부링크]
칠레와 맞닿아 있는 페루 측 국경 타크나(Tacna)는 생각보다 큰 도시였다.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강렬한 햇살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밝아 보인다. 역시 잉카의 후예는 달라... 감탄하며 터미널로 들어선 순간 우르르 몰려드는 삐끼들. 어디로 가냐고 묻길래 얼떨결에 아레키파(Arequipa)라고 했더니 건너편에 있는 nacional terminal로 가란다. 칠레로 발착하는 이곳은 internacional이라며. * Tacna - Arequipa: 버스회사 많음, 09:15~16:00, 20솔, 터미널 이용료 1솔(약 400원) 공항만큼이나 넓은 타크나의 국내 버스터미널에는 없는 게 없었다. 오히려 1인당 GDP가 남미 상위권이라는 칠레보다 훨씬 고급진 느낌. 버스회사도 다양해서 시간대, 가격대별로 골라 탈 수 있었는데, 시설은 볼리비아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이었다. 정말 볼리비아만 한 곳은 두 번 다시 없을 듯. 하지만 곧 이런 산악지대로 접어
브라질에서 페루까지 [내부링크]
모헤치스에서 쿠리치바로 돌아오던 날, 파라과이로 넘어가는 밤 버스를 탔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끝에서 가로로 놓인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그리고 브라질을 돌아봤으니 이젠 서쪽으로 넘어갈 차례. 사실 브라질에서 비행기를 탈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려면 리우나 상파울루로 가야 하는데, 위험한 곳에 굳이 다시 들르고 싶지 않아서 최단 거리로 육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파라과이에서 만났던 아저씨들로부터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칠레 이키케까지 직행 버스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키케는 페루 국경과 맞닿은 곳이니 이만 한 루트도 없겠다 싶어 열심히 이동해 보기로 한다. * Curitiba(Brasil) - Ciudad del Este(Paraguay): Pluma 21:30~06:00(+1), 90헤알 새벽 5시쯤 포스 두 이과수에 있는 Pluma 사무실에 들렀는데, 국경 문 여는 시간까지 대기하려고 그런 모양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다시 버스를 타고 파라과이 국경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Brasil - Morretes - 가끔 기차 여행 [내부링크]
어제 비가 퍼부어서인지 오늘은 더없이 날씨가 화창하다. 그래서 더욱 설렌다. 남미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기차 여행이. 숙소에서 제공되는 조식을 든든히 챙겨먹고 기차역으로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파라나과행 기차가 아니어서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모헤치스도 꽤 인기 있는 모양이다. 기차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다행히 2 좌석에 혼자 앉을 수 있어서 나름 여유로웠고, 원래는 승무원이 포르투갈어로 설명을 해주지만, 같은 칸에 탄 패키지 그룹의 가이드가 영어로 해석을 해줘서 뷰 포인트를 찍을 수 있었는데, 솔직히 풍경은 그저 그랬다. 아래쪽에서 대박을 너무 많이 봐버려서ㅡㅡ; 풍경보다는 장난감 기차를 타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즐겼다. 쿠리치바 편에서 기차 스케줄에 대해 잠시 포스팅했지만, 이 기차는 모헤치스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산악지대인 마룸비를 경유하기 때문에 가는 데만 3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이걸 탈 생각이라면 그저 그런 풍경을 딱딱한 의자에서 3시간 동안 감내할 준비를 단
Brasil - Curitiba - 환경이라는 화두 [내부링크]
환경에 대한 심각성은 초딩 때부터 숱하게 학습하고 연구해온 과제다. 그러면서 항상 화두에 올랐던 건 '지속 가능한 발전.'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건 없지만, 연구 과제의 끄트머리엔 늘 저 키워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구가 지속 가능해졌는가 생각해보면 그건 또 그렇지가 않은 듯.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여전히 세계 각 지역에선 다양한 환경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 그런데 일찌감치 환경 생태도시를 실현하여 전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브라질 남부의 '드림 시티' 쿠리치바(Curitiba)다. 내가 이 도시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모 지역의 신도시 관련 제안서를 쓰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한창 핫했던 유비쿼터스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사례로 미국과 유럽의 몇몇 도시가 거론됐는데, 그중 생뚱맞게도 브라질의 도시가 껴있는 게 아닌가. 그 당시엔 남미는 다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줄 알았기에 무슨 브라
Brasil - Rio de Janeiro - 친절한 리우씨 [내부링크]
이과수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제대로 달려보기로 했다. 시우다드 델 에스테에서의 태평성대가 한없이 달콤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 나는 갈 길이 멀고, 염치도 있고, 양심도 있어야 하는 여행자니까. 아저씨들은 또 브라질이 세상 최고로 위험하다며 상파울루에 가서 지인 찬스를 쓰라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신세 진 것만으로도 엄청난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다. 혼자서도 잘 해왔고,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조심만 하면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 Foz do Iguaçu - São Paulo: Pluma 19:30~12:00(+1), 250000과라니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넘어가는 건 이과수 갈 때 한 번 해봐서 이젠 식은 죽 먹기. 시내에서 우정의 다리까지는 걸어가서 여권 체크를 하고, 그 앞에서 이과수 갈 때 탔던 Rodoviaria(터미널)행 버스를 탔는데, 국경에서 타면 공짜였다. 참고로 버스표는 시우다드 델 에스테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예매 가능하다. *
Brasil - Foz do Iguacu - 드디어 이과수 [내부링크]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 이과수를 계획에도 없는 파라과이에서 가게 됐다. 파라과이의 Ciudad del Este와 브라질의 Foz do Iguaçu,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Puerto Iguazu 무려 세 나라에 걸쳐 흐르는 이과수강. 그중 아르헨티나만 여권 검사를 하고, 파라과이와 브라질은 여권 검사 없이 다녀올 수 있다. 어차피 이과수는 아르헨티나에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들르려고 했는데, 파라과이 교민분들은 하나같이 브라질 측에서 봐야 한다며, 그래야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수량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다. 굳이 비싼 브라질에서 숙소비까지 들일 게 뭐 있냐며 온 김에 다녀오라는 말에 결국 파라과이에서 브라질 측 이과수를 보러 갔다. 시우다드 델 에스테의 센트로 지구에서 'Rodoviaria(버스터미널)' 팻말이 붙은 브라질행 버스를 타고 우정의 다리(puente de la amistad)를 건너 브라질 세관에서 잠시 정차했는데
Paraguay - Asuncion, Ciudad del Este -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부링크]
"파라과이는 왜 가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라파스의 숙소에서 만난 여행자들은 파라과이로 가려는 나를 하나같이 뜯어말렸다. 나도 알고 있다. 가이드북에 나올 만한 attractiveness가 파라과이에 1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라파스에서 우연히 들른 한국식당의 맛이 너무 강렬해서, 하필 또 그때 고산병으로 시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의 맛이 사무치게 그리워진 거다. 그래서 한국인 가게가 포진해 있다는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한 일주일쯤 요양할 생각으로 열심히 남하하던 중 국경에서 기적처럼 한국인을 만났다. 지난번 포스팅 말미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 이분들은 한국과 남미를 오가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한때 파라과이의 상권을 주름잡기도 하셨으며, 남미는 안 가본 곳이 없는 베테랑이셔서 여행 정보도 꽤 많이 얻었는데, 특히 국경에서 엄처난 짐 검사를 할 때마다 조카라고 챙겨주시며 에스빠뇰 인터뷰를 모두 소화해내시는 모습에 제대로 반했다. 심지어 그중 한 분은 브라질에 사신
Bolivia - Sucre, Santa Cruz - 남쪽으로 튀어 [내부링크]
코파카바나에서 다시 라파스로 돌아와 그날 저녁 바로 출발하는 수크레행 버스를 탔다. 터미널 이용료를 요구하길래 전날 코파카바나 갈 때 냈던 영수증을 내밀었더니 그냥 통과. 날짜도 다른데 이래도 되나 싶다.ㅡㅡ; * Copacabana - La Paz: Titicaca Tour 13:30~17:00, 25볼 * La Paz - Sucre: 10 de Noviembre 18:30~07:00(+1), 50볼 예약을 안 했는데도 버스가 텅텅 빈 걸 보면 수크레는 잘 안 가는가 보다... 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사람을 태우더니 통로까지 꽉 들어찼다. 그럼 그렇지ㅡㅡ; 그렇게 밤새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도착한 수크레(Sucre)는 볼리비아 최초로 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이자 독립 이후에는 정식 수도가 된 곳이며, 라파스로 대통령궁이 옮겨가면서 비록 그 역할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법적인 수도로 남아 있는 곳.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진보적인 볼리비아의 면모를 볼 수 있을 줄 알
Bolivia - Copacabana - 하늘호수로 가는 길 [내부링크]
아침 6시 알람이 울리자 하나둘씩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여행자의 숙명. 목적지도 다들 천차만별이다. 각자 왔으니 각자 갈길로 가는 게 당연한데 괜히 또 서글퍼진다. 뒤늦게 고산병이 덮친 오스카는 오늘 쉬고 내일 코파카바나로 가겠다며 기다리라 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우유니에서 라파스까지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나는 해준 게 없구나. 어여 쾌차해서 남은 여행도 잘 마무리하기를. 아디오스 이 살루드, 무이 아마블레 오스카... * La Paz - Copacabana: Nuevo Continente 08:00~11:30, 25볼, 터미널 사용료 2볼 라파스에서 코파카바나로 가려면 중간에 티키나 선착장(Puerto Tiquina)에서 배를 갈아타야 한다. 문제는 사람과 버스를 한꺼번에 실을 만한 큰 배가 없어서 버스는 버스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보트에 탔는데, 그 와중에 또 깨알 같이 1.5볼을 거둬갔다. 이렇게까지 해서 티티카카 호수를
Bolivia - La Paz - 산소가 필요해 [내부링크]
우유니 투어가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니 저녁 7시. 예상보다 2시간이나 늦었지만 어차피 라파스행 버스는 저녁 8시니까 아직 여유는 있다. 게다가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오스카도 함께 간다고 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 비록 몸은 골골거릴지라도... 여행사 소파에 계속 뻗어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자 기어올라가다시피 했더니 오스카가 걱정한다. 라파스는 우유니보다 고도가 더 높은데 괜찮겠냐고. 그래 봐야 200m라며 코웃음 쳤는데, 라파스에 도착해서 죽는 줄 알았다. 잠드는 순간조차 인공호흡기가 절실하더라는ㅡㅡ; (남미에선 단 1m의 해발고도도 소중하답니다.) * Uyuni - La Paz: 20:00~06:30(+1), 80볼 중간에 새벽 4시쯤 오스카가 흔들어 깨우더니 오루로(Oruro)에서 환승해야 한단다. 얼떨결에 따라 내려서 다른 버스로 갈아탔는데 왜 그래야 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여행사에서 티켓 예매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긴 없었는데. 아무튼, 오스카 덕분에 무사히 라파스 도착~ 라
Bolivia - Uyuni - 소금사막에서 고산병으로 고생한 썰 [내부링크]
포토시(Potosi), 신대륙 골드러시 1세대가 개발한 은광 도시이자 한때 남미에서 제일 부유했던 곳이며, 비록 은은 고갈됐지만, 여전히 볼리비아의 대표 광산이 있는 이곳에 왜 터미널이 없어ㅡㅡ? 황당한 건 둘째치고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일단 'Alojamiento(숙소)' 간판이 걸린 곳으로 들어갔는데, 무작정 체크인부터 하고 보니 방에는 떨렁 침대 하나에 화장실엔 샤워시설조차 없다. 어쩐지 싸더라. 20볼(4천 원). 귀찮아서 그냥 날 밝을 때까지만 쉬기로 했다. 그나저나 머리는 왜 이리도 지끈거리는 건가... 한숨 자고 일어나도 두통이 가시질 않는다. 칠레 공항에서 노숙하고, 거의 3일 연속으로 밤 버스를 타서 몸살이라도 났나 싶었는데,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고산병이었다. 머리가 아파도 너무 아파서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우울증보다도 무서운 병... 그래서 어쩔까 고민하다가 우유니(Uyuni)만 보고 최대한 빨리 볼리비아를 벗어나기로 했다. * Potosi - Uyun
다시 아르헨티나, 그리고 볼리비아 [내부링크]
이스터섬에서 산티아고로 돌아오던 날은 공항에서 노숙을 했다. 나오키가 일본인 민박집으로 가자고 꼬셨지만, 가면 또 눌러앉을 게 뻔하니까 아쉽지만 여기서 바이바이. 4박 5일 동안 길동무해줘서 고마워. 돌아가면 멋진 금융인이 되길. 참고로 나오키는 도쿄타워에 있는 금융회사에 취직이 확정된 상태라고 한다. 또 다른 순례 일정이 남아 있는 레오는 우리보다 하루 일찍 떠났는데, 나오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나한테만 미니 성경책을 주고 갔다.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자주 나오는 것만 빼면 오히려 어린 나오키보다 사회 물도 어느 정도 먹어서인지 통하는 구석도 많고 좋았는데,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던 레오, 어딜 가든 무얼 하든 너의 그 밝은 에너지로 잘 헤쳐나가기를. 그가 준 성경책은 숙소에 잘 기증하고 왔다.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리고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내보기로 했다. 그동안 적응기를 가진다는 핑계로 유럽 같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삐대다 보니
Chile - Rapa Nui 5 굿엔딩 [내부링크]
마지막 날은 나오키와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마을의 못다 본 곳도 둘러보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고, 해변에 앉아 '모아이'도 무한 반복해서 듣고, 맛있는 엠빠나다 가게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주고... 그리고 저녁엔 나오키와 약속한 석양을 보기 위해 아후 타하이로 향했다. 하지만 석양이 질 무렵 어김없이 몰려드는 먹구름. 곧 시원한 비가 쏟아진다. 이스터섬은 늘 이런 식이었다. 낮엔 쨍쨍하다가 밤엔 비가 내리고... 누가 타하이에서 석양을 보라고 했던가.ㅠㅠ 실망하며 돌아서는 순간, 위로라도 하듯 반대편에서 내려온 무지개. 이스터섬이 준 마지막 선물인가. 그래, 이만하면 굿엔딩이야.
Chile - Rapa Nui 4 가끔은 투어도 괜찮아 [내부링크]
오늘은 일일 투어를 신청했다. 히치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하자니 낯짝도 점점 얇아지고 해서ㅡㅡ; * Aku Aku Turismo: 09:30~17:00 차량/영어가이드 41$, 점심 포함 시 45$ 오늘의 루트는 동쪽 해안을 돌아 모아이 제조공장이라는 라노 라라쿠를 거쳐 북쪽의 아나케나 해변까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거리를 에어컨이 빵빵한 차를 타고 영어 설명까지 들으며 가는 것이다. 투어는 이 맛에 하는 거지. 8구의 모아이가 코를 박고 쓰러져 있는 아후 항가테(Ahu Hanga Te'e) 요 쓰러진 아이들은 16세기 무렵, 무리한 모아이 제조로 자원이 고갈되고 부족 간의 싸움이 잦아지면서 서로의 모아이를 파괴하던, 이른바 후리 모아이 시대(huri moai period)의 잔재라고 한다. (관련 자료 https://imaginaisladepascua.com/en/easter-island-sightseeing/easter-island-archaeology/ahu-hanga-te
Chile - Rapa Nui 3 화산, 조인, 모아이, 그리고 석양 [내부링크]
다음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찝찝한 텐트에서 눈을 뜨고 나오니 날씨가 대박이다. 햇살이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부엌으로 피신해서 아침을 먹고, 나오키랑 사이좋게 오롱고까지 걸어갔다. (신을 찾으러 온 레오는 교회 탐방하러 일찌감치 출타 중) 항가로아 마을에서 서쪽 해안가를 끼고 열심히 걸어가는데 중간에 'trekking route'란 팻말이 보인다. 언뜻 봐도 길이 전혀 안 보이는데 보란듯이 화살표가 있으니 더 고민된다. 설마 이런 유명 관광지에 잘못된 정보를 붙여놨겠냐며 풀숲을 헤치고 들어갔다가 이내 당황했다. 길이 없어!! 난감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까부터 뒤에서 졸졸 따라오던 개가 앞장을 서더니 우리 쪽을 돌아본다. 따라오란 건가? "키미가 펫?" "그럼 저 자식이 마츠준?" 그날 우린 마츠준의 덕을 톡톡히 봤다. 마츠준이 안내한 첫 번째 코스는 아나 카이 탕가타(Ana Kai Tangata) 단어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동굴(Ana), 먹다(Kai), 사람(Tangata)으
Chile - Rapa Nui 1 이스터섬에서 모아이 듣기 [내부링크]
"이스터섬에 가서 모아이는 들어줘야지!" 서태지 팬은 아니지만 애정하는 노래 몇 곡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아이.' 그땐 모아이가 뭔지도 몰랐는데, 시작부터 들려오는 신비한 물방울 소리와 적당한 비트감이 좋았고, 듣다 보니 가사까지 심오해서 더 좋아졌다. 네온사인 덫을 뒤로 등진 건 내가 벗어두고 온 날의 저항 같았어 떠나오는 내내 숱한 변명의 노를 저어 내 속된 마음을 해체시켜 본다 이 부분이 당시의 내 심정을 온전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슬럼프를 겪었다. 일도 일이지만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매일매일이 다구리(?) 당하는 기분이었달까. 저 모아이들에게 나의 욕심을 말해볼까 이젠 꼭 모아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지만, 그리도 남미가 당기는 덴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실물 영접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결국 와버렸다. 신비의 이스터섬에... 산티아고에서 비행기로 6시간, 시차는 -2시간. 같은 칠레 영토지만
Chile - Rapa Nui 2 항가로아의 터줏대감, 아후 타하이 [내부링크]
모아이를 보려면 투어나 차량 렌트를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숙소가 있는 항가로아에서도 쉽게 모아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섬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눈알이 박혀 있는 아후 바이우리(Ahu Vai Uri) 아후(Ahu)는 바닥이 아닌 제단 위에 세워진 모아이를 뜻하며, 아후를 제외한 뒤에 붙은 이름은 현지인도 그 뜻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 중간에 약간 훼손된 아후 코테리쿠(Ahu Koteriku)와 훼손도가 심한 5구의 아후 타하이(Ahu Tahai) 역시 아후를 제외한 각 이름의 뜻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다. 모두 바다를 등진 채 섬의 안쪽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 언뜻 제주도의 돌하르방을 연상케 하는 이 모아이들은 주술적인 의미로 세워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조상신의 콘셉트로 작게 만들었다가 부족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크기도 점점 커졌는데, 말년에는 거대한 석상을 옮기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멸망했다는 설도 있다. 아후 타하이
Chile - Valparaiso - 네루다 만나러 가는 길 [내부링크]
"하늘이 운다는 게 뭐지?"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게 은유야." 학창 시절 국어시간에 지겹도록 배웠던, 졸업과 함께 더 이상 써먹을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은유'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준 영화 <일 포스티노> 칠레의 정치가이자 저항시인인 파블로 네루다의 망명 생활을 그린 이 영화는 시종일관 낭만적인 매력을 뽐내는 시인과 순수 청년 우편배달부의 투닥거리는 브로맨스도 일품이지만,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섬과 카페 같은 시인의 집을 마치 여행하듯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게다가 내 인생 최고의 영화 <시네마 천국>의 알프레도 할아버지가 나와서 더없이 반가웠던는데,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정말 네루다와 싱크로율 100%라는. 당신은 노년의 굵직한 역을 맡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약 4년 간의 망명 생활 후 칠레로 돌아온 네루다는 산티아고와 발파라이소 일대에 그만의 개성이 담긴 집을 짓고 작품 활동에 몰두했는데, 그중 이슬라 네그라에 있는 집이 영화 속의 배경과 가장 비슷
Chile - Santiago 2 악마의 저장고 [내부링크]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와 같은 위도, 비슷한 고도에 위치한 산티아고 역시 포도 재배와 함께 와이너리가 발달한 곳이다. 멘도사의 어설픈 와인 투어에 실망한 적이 있어서 투어는 따로 안 하려고 했는데, 숙소에서 만난 용웅 브라더스가 적극 추천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따라갔다가 그만 팬이 되어버렸다는. * 콘차이토로(Vina Concha y Toro) 가는 방법 주소: Virginia Subercasequx 210 지하철 L4선 Las Mercedes역에 하차, 요금 400페소 역에서 나오면 택시 기사들이 알아서 데려다줌. 2400페소 버스를 이용할 경우 Metrobus 73, 74, 80, 81번 450페소 입구에 매표소가 있는데, 투어는 2가지로 영어와 스페인어 팀으로 구분해서 신청받는다. - 4 wine + cheese + bread 11500페소 - 2 wine 7000페소 와인 맛을 1도 모르는 초짜가 먹어 봐야 얼마나 먹겠으며, 안주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싼 걸 신청했는데, 투
Chile - Santiago 1 의외로 할 게 많은 도시 [내부링크]
코르도바에서 다시 멘도사를 거쳐 칠레 산티아고로 왔다. 칠레도 2번째로 들어오니 이젠 고향 같은 느낌.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남미 대륙에서도 아래로 사이좋게(?) 뻗어 있고,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가고자 하는 도시들이 같은 위도 상에 분포해 있어서 본의 아니게 국경을 자주 넘나들게 된다. * Cordoba - Mendoza: AndesMar 18:45~07:20(+1), 세미카마 105페소 * Mendoza - Santiago de Chile: RadioMovil 08:30~13:00, 50페소 그러고 보니 벌써 남미 온 지 한 달째. 이제 2주만 있으면 꿈의 이스터섬으로 들어간다. 서태지의 '모아이' 뮤비에도 나왔던 신비의 거석상이 있는 그곳으로. 부끄럽지만 이스터섬이 칠레 영토인 건 남미 여행을 준비하면서 겨우 알았고, 국영항공사 란칠레(이듬해인 2010년 브라질의 TAM 항공과 합병하면서 LATAM으로 개칭)가 독점으로 운항하고 있어서 칠레에 들어가면 비행기표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Argentina - Alta Gracia -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내부링크]
"길에서 지내는 동안 무슨 일인가 일어났어요." 23살의 한 의학도는 학위를 마치자마자 남미라는 거대한 대륙을 모터사이클로 여행할 결심을 한다. 초원을 지나 눈 덮인 파타고니아를 넘어 안데스의 고원과 사막을 건너는 동안 길 위에서 그는 처음에는 풍경을 보고, 그다음에는 사람을 보고, 점점 그들이 처한 사회 부조리에 눈을 뜨면서 혁명가로서의 삶을 결심하게 된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쿠바인인 줄 알았던 그가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심지어 유년시절을 보낸 곳은 지금 내가 있는 코르도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하니 온 김에 들러보기로 한다. 코르도바에서 알타 그라시아로 가는 버스는 터미널에도 있지만, 시내에서 좀 더 가까운 Mercado Sud 지하에 있는 간이터미널에서도 탈 수 있다. 버스 회사 이름은 Sarmiento, 차비는 6페소. 1시간 거리에 버스도 꽤 자주 발착한다. 다만 터미널이 아닌 버스회사 앞에 내려줘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내린 곳에서 조금만 걸으니
Argentina - Cordoba - 묘하게 매력적인 도시 [내부링크]
원래는 멘도사에서 바로 칠레 산티아고로 넘어가려 했으나, 우연히 발견한 이스터섬 특가 항공권을 예매하는 바람에 갑자기 2주간의 시간이 붕 떠버렸다. 산티아고가 아무리 수도라지만 2주일 동안 거기서 뭐하지? 고민하다가 체 게바라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다는 코르도바를 거쳐가기로 했다. * Mendoza - Cordoba: San Juan Mar del Plata, 20:30~06:50(+1), 세미까마 107페소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보니 아침 7시가 다 됐는데도 밖은 아직 어두컴컴하다. 곧 해가 뜨겠지 하며 터미널 밖으로 나가려는데 입구 직원이 말린다. 그리고 방언 터지듯 나오는 에스빠뇰.ㅠㅠ 어벙벙한 내 표정을 보더니 옆에 있는 사전을 막 들추다가 심봤다는 듯이 외친다. "Dangerous!" 순간 빵 터져서 잠이 확 깨더라는.ㅋㅋㅋ 다시 터미널 안으로 들어와서 커피와 남미식 핫도그 판초로 아침을 먹고, 터미널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호스텔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띈다. 이름이 왜 저
Argentina - Mendoza - 술 익는 마을 [내부링크]
맥주보단 소주 가끔은 소맥 누가 사줄 땐 양주를 고르는 내 별명은 바커스 하지만 와인에 대해선 1도 모르는 와인 토들러 그런 내가 와인의 도시 멘도사(Mendoza)로 간다. 아르헨티나 최고의 와인 산지이자 박목월 시인의 '술 익는 마을'이 생각나는 그곳으로. * Bariloche - Mendoza: AndesMar 13:00~08:00(+1), semi cama 198페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앙증맞은 간식 상자가 제공되었다. 여기에 무한 제공되는 달달한 커피까지 아르헨티나의 버스는 진짜 사랑이다. 다음날 아침 8시 넘어서 도착한 멘도사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를 보니 파타고니아에서 꽁꽁 얼었던 심신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느낌이다. 참고로 여긴 해발 785m의 포도 재배에 적합한 건조기후 지대. 그래서 햇볕에 나가면 덥고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한,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날씨다. 숙소가 아직 문을 안 열어서 독립광장(Plaza de Independencia)으로 갔는데, 잠시 둘러본 멘
Argentina - Bariloche - 센트로까지만 볼 걸 그랬어 [내부링크]
겨울의 칠로에 섬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아르헨티나로 넘어왔다. 중간에 안데스 산맥이 있고 아직까진 파타고니아여서 눈밭은 계속됐지만, 아르헨티나로 돌어오니 왠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 * Puerto Montt(Chile) - Bariloche(Argentina): Bus Norte Internacional, 08:00~15:00, 13000칠레페소 바릴로체 버스터미널에서 시내까지는 5km 거리. 걸을까 택시를 탈까 고민하고 있는데 삐끼가 나타났다. 차를 가져왔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서 따라갔더니 이런 콘도미니엄 같은 건물에 시설도 완전 좋다. 대박~ * Penthouse 1004, San Martin 127, Bariloche Center bldg.1004: 조식 포함 6인 도미 40페소, 키 보증금 10페소 도미마다 욕실이 딸려 있고, 라디에이터 성능도 빵빵하다. 같은 위도의 푸에르토몬트가 난방이 안 된 걸 생각하면 여긴 완전 천국이라는. 조식도 나름 훌륭하다. 시리얼, 우유
Chile - Puerto Montt - 칠로에섬은 여름에 가시길 [내부링크]
푸에르토 나탈레스에서 푸에르토몬트까지는 직행이 없고 중간에 콘아이켄(Kon Aiken)을 경유해야 한다. 이것도 모르고 Bus Sur 회사에서 직행 티켓을 예매했다고 굳게 믿은 나. 콘아이켄에 도착해서도 계속 꿋꿋하게 앉아 있으니까 버스 기사가 와서 스페인어로 막 뭐라 그러는데 당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ㅜㅜ 그러다 리 페이스를 닮은 청년이 "푸에르토 몬트?" 하며 따라 오라고 손짓을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 내렸더니 버스가 휑하니 떠나버리는 게 아닌가! 이건 지금 무슨 시츄에이숀ㅡㅡ?? 같이 내린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나 슬프게도 영어가 안 되는 그들과 더욱 슬프게도 에스빠뇰이 안 되는 나.ㅜㅜ 그 와중에도 "푸에르토 몬트 ok"라며 살인미소를 날려주는 리 페이스. 나는 여행에서 가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상황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아무런 의사소통도 할 수 없을 때 어린아이를 보살피듯 내밀어주는 도움의 손길 같은 것 말이다. 더군다나 그 손길의 주인공이 훈남일 땐 그야말로 인생
Chile - Puerto Natales - 스페인어 못하면 미개인 [내부링크]
남미에서 2번째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와 세상에서 제일 긴 나라로 유명한 칠레는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칼라파테가 빙하로 유명하다면, 칠레의 푸에르토 나탈레스는 빙하를 품은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세 개나 우뚝 솟은 토레스 델 파이네로 유명한데, 등산을 좋아하지 않지만, 온 김에 옆 동네까지 돌아보기로 한다. 참고로 5시간밖에 안 걸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 남미 와서 이동한 가장 짧은 국경 이동이었다. * Calafate(Argentina) - Puerto Natales(Chile): Cootra 매일 08:30~12:30, 60페소(18000원) Cootra 말고 10페소 저렴한 Zaahj 버스도 있지만, 일주일에 3번밖에 운행을 안 해서 타이밍 맞추기가 애매하다. 빙하 말곤 딱히 할 게 없는 칼라파테에서 고작 10페소 아끼겠다고 하루 더 머물 수는 없어서 그냥 쿠트라 버스를 이용했는데, 5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구간임에도 좌석 넓고
Argentina - El Calafate - 세상의 끝 대신 빙하 보러 [내부링크]
"너의 슬픔을 땅 끝에 묻어줄게." 장국영 광팬이지만 영화 <해피 투게더>만큼은 양조위가 이겼다. 장국영이 온몸으로 연기했다면 양조위는 표정만으로 화면을 올킬했고, 그래서 제일 슬픈 사람은 양조위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의 옆엔 장첸이 있더라. 세상의 끝에서 그의 가장 큰 슬픔을 묻어준 단 한 사람. 그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배경은 아르헨티나지만 홍콩만큼이나 컬러풀하게 나온 이 영화 때문에 거기가 몹시도 궁금했다. 덩그러니 서 있는 등대 외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남미의 땅끝마을이자 세상의 최남단이라는 우수아이아(Ushuaia)가. 하지만... 하필 내가 남미에 갔을 땐 겨울이 한창인 6월 중순이었고, 안 그래도 남극과 가까운 그곳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라 투어란 투어는 죄다 막힌 상황. 그 와중에 발견한 몇몇 여행기에서는 우수아이아가 세상에서 가장 심심한 곳이라며 마구 저주하더라는. 부정적인 여행기만큼이나 내 마음도 땅끝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Argentina - Buenos Aires 4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내부링크]
산텔모에서는 딱 일요일까지만 묵고, 비용의 압박으로 다시 판초네로 옮겼다. 다행히 첫날 북적이던 인파들은 다들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4~5명만이 오붓하게 남아서 김치찌개를 해 먹고 있더라는ㅋㅋㅋ 나 역시 부에노스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한식을 먹으며 체력 보충도 좀 하고, 이미 남미를 돌고 온 사람들한테서 정보도 얻고, 저녁엔 조촐하게 아르헨티나산 와인도 기울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서야 겨우 에비타를 보기 위해 레콜레타 묘지(Cementerios Recoleta)를 찾았다. 물론 걸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도로 구획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길찾기도 쉽고, 무엇보다 지대가 굴곡 없는 평지여서 걷기에 더할 나위 없는 도시였다. (세상을 돌고 돌아보니 걷기 좋은 도시가 의외로 많진 않더라. 그중 투톱을 꼽으라면 맨해튼과 부에노스아이레스라 하겠다.) 거리 구경을 하며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음침한 레콜레타 지구. 묘지가 있는 곳이어서인지
Argentina - Buenos Aires 3 플로리다 거리에서 탱고를 feat. 산텔모 벼룩시장 [내부링크]
우루과이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다시 돌아오던 날, 판초네로 가지 않고 산텔모로 향했다. 얼마 안 있으면 곧 일요일. 이 세상에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산텔모 벼룩시장을 가까이에서 느껴 보고 싶어서였다. * Asterion House, Carlos Calvo 614: 조식 포함 4인 도미 11$ or 40페소(12000원) 예전에 산텔모 지구에 놀러 갔다가 찜해둔 숙소였는데, 생각보다 비싸고, 토스트 하나에 커피 1잔 달랑 나오는 조식도 부실하지만, 남미에서 묵었던 숙소 중 제일 깨끗하고 쾌적한 곳이었다. 일하는 아줌마가 아침저녁으로 쓸고 닦아서 방에는 먼지 하나 없고, 아늑한 소파와 최첨단 사양의 데스크톱이 구비된 거실도 쉬어기가 딱 좋은 공간.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단 한 명뿐이라는 거. 체크인 하는 날엔 다행히 이 직원이 있어서 안내를 잘 받았는데 그 뒤로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체크아웃 하는 날 영어 1도 못하는 직원이 계산을 엉터리로 해서 약
Uruguay - Colonia del Sacramento - 누구의 식민지도 아닌 우루과이 [내부링크]
남미에서 넓디넓은 땅덩어리를 자랑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끼인 죄(?)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번갈아 받아왔던 우루과이. 심지어 포르투갈이 물러가고 난 뒤에는 브라질의 식민 통치까지 받았던 이곳에는 이름 자체가 '식민지(colonia)'인 곳이 있다. 거대한 라플라타강을 사이에 두고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마주하고 있는 콜로니아주의 주도 콜로니아델사크라멘토(Colonia del Sacramento, 줄여서 콜로니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모습이 뒤섞여 이베리아스러우면서도 독특한 식민 도시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 라는 가이드북의 설명에 혹해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이동한 콜로니아. 역시 우루과이의 버스 시설은 최고다. 몬테비데오에서 2시간 거리인데 등받이가 거의 일자로 넘어간다. * Montevideo - Colonia: COT, 2시간 간격 출발, 2시간 소요, 167페소, 터미널 이용료 10페소 당시 환율이 1페소 = 50원 정도했으니 2
Uruguay - Montevideo 2 에브리데이 도밍고 [내부링크]
커다란 강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 몬테비데오 저기 보이는 저 물은 아르헨티나와 마주하고 있는 라플라타강이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대서양이기도 하다. 노인과 바다 @ Punta Santa Teresa 산타테레사 해변에서 시장으로 가는 길에 미래의 축구 꿈나무들을 발견했다. 못 들어가고 구경만 하는 곱슬머리 흑인 소년을 보니 <천사들의 합창>에 나오는 초코렛 시릴로가 생각나고, 저 헤어밴드를 한 소년은 남자 마리아 호아키나 같더라. 공이 자기 쪽으로 안 오면 막 짜증내고ㅡㅡ; (BGM: 천사들의 합창 opening) 선착장 근처 Mercado del Puerto에서 사 먹은 초리소 60페소(3천 원)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서비스 빵과 과자가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든든했다. 사실 아사도를 먹어 보고 싶었는데, 혼자 다 먹을 자신이 없어서... 이것이 혼여의 한계다.ㅜㅜ 시내에서 해안가를 돌아 선착장에서 시장 한 번 찍고 왔더니 금새 해가 지려고 한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자
Uruguay - Montevideo 1 나는 우루과이가 좋다 [내부링크]
여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장거리 버스터미널(Terminal de Omnibus) 오자마자 이틀 만에 아르헨티나를 뜨게 된 사연은 첫날부터 바닥에서 자게 된 초절정 인기 숙소 판초네 때문이었다. 그때는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바닥 신세를 졌지만, 계속 그렇게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숙소를 옮기기도 뭔가 애매해서 가까운 우루과이부터 다녀오기로 한 것이다. 숙소 문제는 그 뒤에 천천히 생각하자. * Buenos Aires - Montevideo: Cauvi, semi cama 21:30~07:00(+1), 130페소 asiento(좌석), ventana(창가 자리), plataforma(플랫폼)... 시작부터 에스빠뇰 어택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플랫폼 번호를 물으러 갔더니 70~75로 써줘서 두 번 당황했다. 영어도 안 통하고, 정보는 신통찮고, 출발 10분 전인데도 버스는 오지를 않고... 불안해서 다시 버스회사 창구로 가 보려는데, 옆에서 줄담배를 피던 아줌마
Argentina - Buenos Aires 2 국제학생증 만들러 갔다가 역사의 현장에서 울컥 [내부링크]
아르헨티나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국제학생증 만들기. 나이로는 학생증 만들 때가 훨씬 지났지만, 돈만 내면 가라로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기에 시도는 해 보기로 했다. * Oviajes, Uruguay 385, 6 Piso of.601 판초네가 있는 라바예 거리에서 우루과이 거리는 한 블록 아래에 있고, 거기서 여행사까지는 오벨리스코 방향으로 10블록쯤 직진하면 되는 거리.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격자 형태로 도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주소 찾기가 제법 쉬웠다. 간판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다행히 직원은 영어가 유창했고, 대학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여권 복사본과 사진 1장, 50페소(15000원)를 받아가더니 다음날 오후 4시에 찾으러 오란다. 뭐 이렇게 간단해ㅡㅡ? 다음날 발급받은 국제학생증을 보니 생뚱맞게도 소속은 UBA(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ㅋㅋㅋ 덕분에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국내 학생만 적용되는 10%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참고로 10% DC가 아니라 10% only라는
Argentina - Buenos Aires 1 판초네 가는 길 [내부링크]
"돌아오시는 거죠?" 이티켓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에어캐나다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어 본다. 리턴 날짜가 내년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린 모양이다. 머무는 여행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니 돌아와야죠. 반드시. 인천-밴쿠버, 밴쿠버-토론토, 토론토-부에노스아이레스 남미까지 가는데 보딩패스만 3장이다. 게다가 첫 경유지 밴쿠버에서는 짐을 찾아서 입출국 수속도 따로 해야 한다. 같은 에어캐나다임에도 수하물이 한 번에 연결 안 되는 머나먼 대륙. 라틴으로 가는 길은 정녕 멀고도 험하구나. 그 험난한 여정의 신고식은 밴쿠버 입국심사대에서 톡톡히 치렀다. 난 그냥 환승만 하는 건데 캐나다엔 왜 왔냐며, 최종 목적지는 부에노스아이레스고 여행 왔다니까 경비는 어떻게 마련했냐며, 직업란에 학생이라고 적었더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비행기표를 샀냐며, 꼬치꼬치 캐묻는 게 은근 기분 나빠서 나도 모르게 욱할 뻔했으나, 국경에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배운지라 침착하게 전 직장 명함을
남미 여행 준비 [내부링크]
작년 여름 우울증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늘 그렇듯 출근해서 근무시간 전까지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상사가 웬 스페인어냐며, 스페인 가냐며, 스페인만 스페인어 쓰는 거 아니잖아요 했더니 그럼 또 어디가 스페인어 쓰냐며, 남미요 했더니 거긴 너무 멀지 않냐며 만담을 이어갔던 기억... 그 먼 곳으로 드디어 떠난다. 진짜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거기에 맞게 행동이 옮겨지는 것을.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중 1. 뱅기표 고민 끝에 에어캐나다로 낙찰 밴쿠버 스탑오버 택스 4만 원 추가해서 1,744,200원 경유를 좀 많이 하는 게 단점이나, 모로 가도 남미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스케줄 표에는 복병이 하나 숨어 있었다. 보이는가? 토론토-부에노
다시 비욘드 랭군 [내부링크]
삔우린에서 다시 만달레이로 돌아오던 날은 비가 내렸다. 띤잔이 끝났으니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건가. 온 김에 눈에 삼삼하던 우베인 다리를 다시 한번 더 보고, 양곤으로 가는 기차표를 알아보기 위해 기차역으로 갔는데, 완전 고급 호텔 같은 외관에 깜놀! 역시 경제의 중심지답군, 만달레이~ 하며 좋아했는데, 몇 개 없는 창구에 그마저도 텅텅 빈 을씨년스러운 이 분위기는 뭔가요... 다들 기차 안 타고 버스 타러 갔나ㅡㅡ? * Mandalay - Yangon : 21:45~12:40*, ordinary class 15$ 기차 삯은 외국인의 경우 달러로만 계산이 가능하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현지인보다 3배인가 5배인가 더 비싸다고 한다. 게다가 보이는가? 저 살인적인 스케줄이. 만달레이에서 양곤까지 무려 15시간... 그럼에도 굳이 기차를 선택한 건 미얀마에서의 마지막 이동을 철도로 해보고 싶다는 로망 때문이었는데, 타고 나서 대박 후회했다. 내 평생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적이 또 있었던가
삔우린에서 띤잔을 [내부링크]
삔우린(Pyin Oo Lwin)의 첫인상은 딱 유럽이었다. 아기자기한 건물과 장난감 같은 시계탑, 그리고 동화에 나올 법한 마차까지, 과연 여기가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미얀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넘나 이국적인 분위기이지 뭔가. 그도 그럴 것이 삐우린은 영국 식민지 시절의 여름 휴양지이자 제2의 행정중심지였던 거다. 스산한 해양성 기후의 영국인들이 와서 살기엔 남국의 열대기후가 무척이나 버거웠을 터, 특히 여름철 혹서기에는 불가마 같은 더위를 피할 곳이 더더욱 필요했는데, 그러기엔 삐우린 만한 곳도 없었을 것이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여서 사시사철 서늘하고, 대도시인 만달레이에서 2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니 접근성도 좋고, 주위의 티크나무와 루비 산지와도 가까워서 쉬면서 식민지 경영을 하기엔 딱이었을 듯. 그래서 삔우린에는 영국인들이 살다 간 유럽풍 가옥이 많이 남아 있다. 예쁜 집을 찾아다니며 구경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 게다가 각 잡고 걸어 다니는 군인들까지 은근 볼거리가
애잔한 만달레이 [내부링크]
만달레이는 왠지 그 말랑말랑한 어감 때문에 더 기대를 했던 것 같다. 영국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마지막 왕조의 수도였고, 지금도 양곤에 이은 제2의 도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러고 보니 이번 여행을 시작했던 양곤에서 감미로운 노래로 먼저 들은 적이 있었구나. 애처롭게 노래 부르던 펍의 그 청년이 문득 생각나네. 아무튼, 그런 이유로 무척이나 기대했던 만달레이건만, 인레에서 험준한 산길을 밤새 달려 도착한 이곳은 양곤보다 더 정신없고 탁한 대도시였다. 하필 도착했을 때가 새벽 4시여서 무턱대고 택시를 잡아타고 간 곳이 나일론 호텔. 가격은 욕실/조식 포함 싱글룸 5$. 청결 상태도 별로고 아침도 부실하지만, 싱글룸 상태는 여기가 그나마 제일 나았다. 바로 옆에 있는 가든 호텔의 싱글룸은 4$로 저렴하지만, 공용 욕실에 완전 감옥소 feelㅡㅡ; 대신 조식이 대박이다. 식빵 퀄리티도 좋고, 계란, 바나나도 2개씩 나오고, 미얀마식 밀크티 러펫예도 무한 리필된다. 조식이냐 시설이
인레의 선물 [내부링크]
메마른 파고다의 도시 바간에서 촉촉한 호수 마을 낭쉐(Nyaungshwe)로 이동했다. 물이 부족한 거기선 샤워하는 것도 신경 쓰이더니, 여기선 뭔가 많이 여유로워진 느낌. 확실히 물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바간에서 인레 호수가 있는 낭쉐로 가는 길 역시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버스표는 다행히 숙소에서 예매할 수 있었고, 버스도 숙소 바로 앞까지 픽업해주었지만, 꼭두새벽부터 비포장 도로에 시달리다 쉐낭에 도착했을 땐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근데 쉐낭이라니, 낭쉐가 아니었던가? 버스 기사가 이름을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쉐낭과 낭쉐는 다른 곳이었다. 쉐낭(Shwe Nyaung)이 호수 마을인 낭쉐로 들어가는 길목의 읍 정도 되는 마을이라면, 낭쉐(Nyaungshwe)는 인레 호수(Inle Lake)에 인접한 깡시골이어서 버스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일단 쉐낭에서 내렸다가 합승 지프를 갈아타고 낭쉐로 들어가야 하며, 바간처럼 마을 자
바간의 앙상블 [내부링크]
미얀마에 온 첫 번째 이유가 <비욘드 랭군>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사진 때문이었다. 황량한 땅 위로 흩뿌려진 수천 개의 인공 탑이 자연과 묘하게 어우러지던 모습. 탑은 불심으로 가득한데 그 모양새는 마치 키세스 초콜릿을 부어놓은 듯 서양의 도그마를 품고 있는 모습. 바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에 이어 세계 3대 불교 성지라는 바간(Bagan)의 풍경이다. 양곤에서 바간으로 가려면 직행이 없고, 메익띨라(Meiktila)라는 곳을 거쳐야 한다. 띤잔(Thingyan; 새해를 알리는 물 축제) 때문에 표를 못 구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메익띨라는 제2도시 만달레이로 가는 거점인 만큼 버스도 자주 배차되고 자리도 많이 남아 있었다. 다만 양곤의 아웅밍글라 터미널까지 가는 교통편이 불편해서 택시를 타야 했던 것과 터미널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버스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 게 흠이었지만, 다행히 터미널 직원도 친절했고, 버스도 제 시각에 출발했다. 중간 휴게
여행의 시작과 끝,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내부링크]
다시 방콕의 카오산로드로 돌아왔다.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내일이면 이 방황도 끝이 난다. 차오프라야강을 한 바퀴 돌고 시암스퀘어로 가는 길에 4년 전에 본 그 코끼리가 아직도 있는 걸 발견하고 한없이 반가웠다. 그때 난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영혼이 고갈되어버린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내 안에서 보내온 사인을 계속 놓치고 있었다. 아니, 모른 척한 게 맞다고 해야겠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밀고 나간 게 쌓이고 쌓여서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감기는 관리만 해주면 금방 낫지만,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게 또한 감기라서 초장에 바로잡지 못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내가 지금 딱 그런 상태인 거지.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는 전혀 의욕이 저하되지 않았다는 거다. 우울증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란 걸 알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 뭐든 새로 시작할 힘
다시 치앙마이 [내부링크]
루앙프라방에서 버스를 타고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밤새 달려 도착한 국경도시 훼이사이(Huai Xai) 저 강만 건너면 자유(?)의 땅 태국이다. 허름한 라오스 이민국에서 여권 체크를 하고, 사람들을 따라 보트에 올라탄 순간 boat people이라도 된 것 같은 오묘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어서 빨리 선진국으로 가고 싶은 이 간절함은 뭐지ㅡㅡ? 노를 젓는 보트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모터가 달려있어 10분 만에 도착했고, (보트 10000낍 또는 40밧) 태국 치앙콩 이민국에서 "Welcome" 하는 인사와 함께 여권을 건네주는 태국 직원의 미소를 본 순간, 간밤의 고통스러웠던 밤 버스의 기억은 눈 녹듯 사그라들고 말았다. 역시 인간의 마음을 녹이는 건 인간이다. 치앙콩 이민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뚝뚝 30밧 치앙콩 - 치앙라이 버스 70밧, 4시간 소요 치앙라이 - 치앙마이 버스 100밧, 4시간 소요 그래도 태국은 버스가 정시에 출발한다. 라오스에 있다가 여기 오니 모든 게 선진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여행지 루앙프라방 [내부링크]
방비엥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버스는 무려 VIP 클라스, 가격은 195,000낍. 하지만 시설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일반고속보다 못하고, 9:30 출발이라더니 사람이 다 찰 때까지 1시간 넘게 기다리고, 것도 모자라 중간중간에 계속 사람을 태우는 바람에 복도까지 빽빽하게 들어찼다. 이런 라오틱... 중간에 길거리 휴게소에 들러 5천 낍짜리 바게트 샌드위치를 사 먹은 거 말고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달려서 어두컴컴한 저녁 무렵에야 겨우 루앙프라방 외곽에 있는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라오스 최고의 관광지라 예상대로 삐끼들이 벌떼같이 모여든다. 다들 10만 낍 이상 부르는 가운데 7만 낍을 외치는 삐끼가 하필 키아누 리브스를 닮아서 고민 없이 따라갔다. 일종의 계시였다고나 할까. 그 순간 영화 <리틀 부다>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했던 잘생긴 싯다르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긴 불교 테마 도시 루앙프라방이 아니던가. (끼워 맞추기 오짐ㅋㅋ) 숙소에 막상 도착해보니 중심지에서 한참
스치듯 방비엥 [내부링크]
아침 7시에 방비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비엔티안을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섭섭할 수가... 겨우 이틀 있었을 뿐인데 그새 정들었나 보다. 수도이면서 전혀 수도스럽지 않은 수도 같은 너... 터미널에서 아침으로 사 먹은 라오 샌드위치는 하나에 5000낍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세 개가 한 묶음이었다. 그러고 보면 비엔티안은 물가도 착했어. 라오스도 베트남처럼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아서 바게트 버거가 대세다. 차이점이라면 베트남의 반미는 고기류가 많이 들어가고, 라오 샌드위치는 속을 고를 수 있어서 취향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 그래서 고기를 안 좋아하는 내겐 채소를 듬뿍 넣어먹을 수 있는 라오 샌드위치가 더 잘 맞았다. 비엔티안에서 서너 시간쯤 달려 도착한 방비엥(Vang Vieng). 라오스 발음으로는 '왕위앙'이라고 하며, 중국의 계림, 베트남의 하롱베이와 같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다. 한마디로 자연 말고는 볼 게 딱히 없고, 자연을 이용한 액티비티 말고는 즐길 게 딱히
집 나간 멘탈 찾으러 라오스까지 [내부링크]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려니 했던 거 같다. 심하게 의욕 저하가 된 건 그냥 그 일이 하기 싫었던 건데, 늘 잘하던(?) 애가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으니 정신과에 가보라고, 하물며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까지 신경정신과 약을 적극 권장했다. 요즘은 약이 잘 나와서 꾸준히 복용만 해도 좋아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약은 내게 조울증을 유발했고 (약을 먹으면 조증이 됐다가 약발이 떨어지면 우울해지는...) 한 2주쯤 조울증에 시달리다가 약 때문인 것 같아서 끊었더니 꾸준히 우울한 상태가 되어 기분상의 기복은 없어져서 오히려 살 만해진 역설. 이쯤 되니 신경정신과가 과연 도움이 될까 의구심마저 들었다. 지금도 병원에 처음 갔던 그날을 기억한다. "그래, 뭐 때문에 왔는데?" 마치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물어보시던 의사 선생님께 그동안 마음속에 묵혀둔 걸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끄집어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내 의욕 저하의 원인이 내가 살
흐르는 메콩강처럼 [내부링크]
베트남의 마지막을 메콩강으로 마무리해 보려 한다. 메콩강은 동남아 일부에만 흐르는 강인 줄 알았는데, 찾아 보니 그 발원지가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베트남 호찌민에 이르기까지 장장 4000km에 달하는 동남아 최대의 젖줄이며, 지나가는 나라만 해도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무려 6개국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지도 출처: 두산백과) 강줄기의 끝은 호찌민 남단에 있는 미토(My Tho)와 벤째(Ben Tre)로 수렴되어 그 유명한 메콩 델타를 형성하는데, 생물학적 다양성 면에서는 세계 Top 3에 들 정도로 야생의 보고라는. 그런 유명세로 인하여 신카페에서 신청한 투어는 대형버스가 3대나 움직일 정도로 사람이 미어터졌다. 가격은 교통, 중식, 간식 포함 9$ 또는 144,000동. 호찌민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달려 도착한 미토는 생각보다 번화한 어촌이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수상시장을 한 바퀴 돌아 코코넛 농장으로 이동했다. 코코넛이 주렁주렁
종교와 전쟁 [내부링크]
한국전쟁과 함께 20세기 마지막 이념 전쟁으로 대표되는 베트남 전쟁은 우리에게 '월남전쟁'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6.25 이후 '한강의 기적'을 달리고 있던 한국도 참전한 전쟁이어서 더욱 가슴 아픈 역사로 기억되는데, 북한과 남한처럼 베트남 역시 2차 대전 이후 남북으로 분리되어 공산과 민주 세력의 지배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념 대립으로 촘촘한 접전을 펼치다 다시 분단국이 된 남북한과 달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베트남에 의해 통일되면서 미국이 패배한 이례적인 전쟁으로 기록되는 베트남 전쟁은 이 외에도 무분별한 고엽제 살포와 후유증, 라이따이한, 베트콩과 게릴라전 등 수많은 상징어를 낳았는데, 그중 가장 참신한 전술로 평가되는 게릴라전의 현장인 구찌터널이 호찌민 근교에 있다고 하여 가보기로 했다. 대중교통편도 있으나 터미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배차 간격을 고려하면 그냥 투어가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역시 신카페를 이용했다. 가격은 6$ 또는 96000동. 하지만 그룹 투
호찌민보다 사이공 [내부링크]
드디어 잠바를 벗어던졌다. 따뜻한 남국의 정취가 느껴진다. 드디어 호찌민(Ho Chi Minh)에 온 건가... 기차역 이름은 예전의 도시명을 그대로 딴 사이공(Sai Gon). 뮤지컬 <미스 사이공> 때문에 더욱 애잔하게 다가오는 이름이다. 밤이 이슥해졌지만 다시 찾은 데탐 거리가 더없이 반갑다. 날씨가 따뜻하니 없던 여유도 생기는 듯. 전에 묵었던 호텔로 갔더니 또 와줘서 고맙다며 1$ 깎아준다. 대박~ 오랜만에 여장을 풀고 빨래 day를 가졌다. 그러고 보니 지난 5일간 신카페 샤워실에서 딱 1번 씻은 거 말고는 제대로 씻지도 못했다는. 다음날 아침, 활기찬 데탐 거리를 어슬렁거리다 신카페에서 구찌터널과 메콩강 투어를 예약하고 아침을 먹으러 갔다. 식당 이름은 역시나 '사이공'. 여기서는 거의 한 집 걸러 사이공이다. 후에부터 계속 퍼만 먹어서 오랜만에 반미를 시켰더니 입천장 다 까지고, 커피 대신 딸기 요거트를 시켰더니 장이 놀랐는지 폭풍설사가 이어진다. 아놔, 갈 때 다 돼
고산족 마을에는 고산족이 살고 [내부링크]
하노이에서 고산족 마을이 있는 사파(Sa Pa)까지 바로 가는 사설 버스가 있지만, 하노이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그만 스케줄을 놓쳐버렸다. 그렇다고 하루 자고 다음날 출발하자니 새삼 숙소 잡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밤기차를 예매했는데, 알고 보니 제일 낮은 등급의 딱딱한 나무 의자ㅡㅡ; 어쩐지 너무 싸더라. Ha Noi - Lao Cai : 18:45~04:30 hard seat 90000동 예상대로 외국인은 나 혼자였고, 주위엔 시커먼 남자들뿐이고,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앞뒤칸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줌마 한 명이 지나가자 순간 반가워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대뜸 내 팔을 잡아끌고는 어떤 할아버지 앞으로 데려간다. "你是中国人吗?" 회사에서 잠깐 배운 중국어로 띄엄띄엄 대화를 하다가 결국 필담으로 이어졌는데, 그들은 라오까이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국인 아빠 Vu와 베트남 딸 Hao였다. 비록 사진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지루할 뻔한 기차
하노이의 겨울 [내부링크]
간밤에 얼어 죽는 줄 알았다. 무슨 에어컨을 그리도 세게 틀었나 했더니 버스에 난방이 안 돼서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든 거라는. 아놔, 신카페라서 믿고 예매했는데 이 무슨 뒤통수인가ㅡㅡ? 베트남에선 겨울에 웬만하면 밤 버스는 피하시길. 아무튼, 드디어 수도 하노이까지 왔다. 후에를 수도로 삼았던 응우옌 왕조 이전부터 줄곧 도읍지였고, 1902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절에는 북부의 본거지였으며,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베트남의 중심지로 1976년 월남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면서 통일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정식 수도가 된 하노이.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어린 시절 반공교육을 받으며 접했던 북한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에 굉장히 경직된 사회일 줄 알았는데, 호찌민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본 베트남은 중국처럼 시장경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 어딜 가든 네고는 필수이며, (여행 한 번씩 다녀올 때마다 협상 전문가 과정 한 단계씩 밟는 느낌) 우리나라만큼은
마지막 왕조의 자취와 분보후에 [내부링크]
간밤에 추워서 잠바를 꺼내 입었는데, 후에(Hue)에 내리니까 꽤 스산하다. 동남아는 다 따뜻한 게 아니었던가ㅡㅡ? 겨울의 베트남 중부는 완전 겨울 날씨군. 원래는 후에에서 하루를 묵어가려 했으나, 너무 추워서 아예 하노이까지 밤차로 계속 달렸다가 따뜻한 호찌민에서 쉬자며 아침 일찍 신카페에 내리자마자 그날 밤 하노이로 가는 버스를 예약해버렸다. 후에-하노이 17:30~05:30 9$ 또는 144000동 참고로 이 신카페란 곳은 주요 도시마다 지점이 있고, 나처럼 밤차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샤워시설도 겸비하고 있으며, 버스 탑승 시 물이랑 간단한 간식거리도 제공해준다. 거기다 은행 환율로 환전도 해주고, 달러로도 계산이 가능하니 여러 모로 편리한 시스템. 호찌민에서 처음 컨택한 곳이 신카페라 그 뒤로도 계속 여기만 이용했는데, 베트남에 이런 여행 인프라가 있다는 거에 상당히 놀랐다. 이만하면 여행 선진국이라 할 만하지 않은지. 신카페에 짐을 맡겨놓고 흐엉강을 건너 후에의 구
베트남 커피와 고수의 매력 [내부링크]
다음날 아침 신카페로 갔더니 완전 쾌적한 관광버스가 서 있다. 기대도 안 했는데 물이랑 과자도 주고, 출발시각도 정확하게 지켜서 깜놀. 베트남은 선진국이었구나. 11시쯤 도착한 무이네(Mui Ne) 리조트가 있는 휴양지라더니 뭐 이래 휑하냐ㅡㅡ? 어리둥절해하는 내게 기사 아저씨가 밥 먹고 오라는 시늉을 하며 손목시계를 꺼내더니 12자를 가리킨다. ㅋㅋㅋ 좀 귀여우심 도로변에 몇 안 되는 식당 중 그나마 사람이 좀 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메뉴판엔 퍼(pho)가 없다. 아침에 먹은 반미 샌드위치가 생각나서 에그 반미를 시켰더니 저렇게 바게트 빵에 계란 프라이 하나 달랑 나옴. 알고 보니 반미(banh mi)는 그냥 '빵'이란 뜻이고, 샌드위치는 반미껩(banh mi kẹp)이라고 하지만 편의상 '반미'로 퉁치는 듯. 그러니 반미만 적혀 있을 땐 물어봐야 한다. 샌드위치인지 저스트 브레드인지. 그래도 베트남 커피는 정말 맛있었다. 스테인리스로 된 베트남 전통 드리퍼에 내려서 설탕을 타
쌀국수 먹으러 베트남까지 [내부링크]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또 휴가를 놓칠 뻔했다. 벌써 2008년 2월. 3월이 되기 전에 쓰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휴가는 시스템 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그래서 우겨서 썼다.ㅡㅡ; 프로젝트 뒤에 또 프로젝트, 그 와중에 다른 계열사로 파견 갔다가 돌아와서 또 프로젝트의 연속이지만, 아직 시작된 건 아니니 써도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다. 팀원들은 이 바쁜 와중에 어딜 가냐며.ㅜㅜ 그래도 질렀다. 왜냐하면 꿈에 쌀국수가 시리즈로 나올 정도로 베트남에 가고 싶었으니까. 친구들은 주변에 널린 게 쌀국숫집인데 굳이 비행기를 타야 하냐며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먹는 퍼와 거기서 먹는 퍼는 느낌의 결이 다르지 않나. 선릉의 그렇고 그런 체인점에서 최고 비싼 메뉴를 시켰다고 치자. 식당 인프라와 음식의 퀄리티는 여기가 나을지 몰라도 우리가 먹고만 사나ㅡㅡ? 그 음식을 둘러싼 스토리와 그 주위의 환경이 어우러지는 경험이 하고 싶은 거다. 그것이 그해 베트남 쌀국수를 수도 없이 사
여행이 시작되는 소리 [내부링크]
드디어 터키 여행의 마지막 날, 호텔에서 마지막 조식을 먹고, 버스에 짐을 싣고서 술탄 아흐메트로 향했다. 술탄 아흐메트 광장에 웬 오벨리스크가? 동로마 제국 시절, 이 광장은 전차 경주를 위한 경마장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1세가 경마장 트랙 안쪽에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에서 기둥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사진의 오벨리스크다. 운반해올 당시 길이가 너무 길고 무거워서 3등분으로 쪼갰다는데, 저렇게 보존 상태가 좋은 걸 보면 로마인의 축조 기술은 수준급인 듯. 아무튼, 그리하여 이집트에 있는 3개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는 이스탄불로 오게 되고, 또 하나는 프랑스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세워졌으며, 나머지 하나는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의 멋대가리 없는 오벨리스크는 테오도시우스보다 700여 년이나 늦은 콘스탄티누스 7세 때 경마장의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벨리스크와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
에페스에서 에페스 한잔 [내부링크]
비 오는 파묵칼레에서 발만 담갔다가 급하게 이동한 곳은 로마 시대 가장 번성한 도시이며, 신약성서에 나오는 에베소서(에페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배경이 된 터키 최대의 고대 도시 에페스(Efes). 예전 이름은 에페소스(Ephesos) 또는 에페수스(Ephesus)라고 한다. 사실 맥주로 먼저 알게 된 곳이고, 지금은 거의 옛터만 남았지만,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서 성경의 내용도 잘은 모르지만, 꽤 잘 계획된 고대 도시의 표본을 제대로 감상하고 온 느낌이다. 그 옛날에도 도로의 대부분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수도가 발달했던 로마의 흔적을 잘 보여주듯 수도관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걸 보면 도시 인프라가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모임의 장소였던 아고라와 바실리카,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를 떠올리게 하는 원형극장과 더불어 목욕탕과 화장실까지 공공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사회복지의 개념도 어느 정도 장착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귀족들을 위한 커뮤
파묵칼레는 여름에 가세요 [내부링크]
버스 창밖은 모노크롬의 세계다. 풀이 거의 보이지 않는 갈색 땅의 향연 한없이 단조로운데 그 느낌이 싫진 않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움이랄까. 오늘은 카파도키아에서 콘야를 거쳐 파묵칼레까지 장장 8시간을 버스로 이동하는 날. 사람들은 모두 곯아떨어졌고, 늘 한결같은 목소리로 열심히 설명해주던 가이드도 오늘만큼은 조용하다. 지금 이 순간은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 여행자의 신분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콘야의 한 식당 옛 실크로드 상인들(caravan)이 묵었던 숙소(saray)를 개조한 곳이어서 상당히 고풍스럽다. 그러고 보니 터키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이자 서역의 시작점. 이스탄불에서 비잔틴과 오스만에 너무 집중해서 중요한 걸 놓칠 뻔했다. 동서 교역의 물꼬를 틀었던 역사의 현장에 앉아 그들이 먹었음직한 볶음밥과 터키쉬 딜라이트를 음미한다. 솔직히 맛은 그저 그렇지만 여행의 맛(?)으로 감사히 먹는다. 다 끝
카파도키아의 로망 [내부링크]
오늘의 목적지는 이번 터키 여행에서 제일 기대했던 카파도키아(Cappadocia)다. 2년 전에 먼저 다녀온 언니가 강력 추천한 곳이기도 하고, SF물을 좋아하지 않은 나를 흠뻑 빠져들게 만든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이기도 해서 더욱 설렌다. 하기야 터키의 어디가 <스타워즈> 배경이 아닌 곳이 있겠냐마는. Star Wars - SF를 안 좋아하는 나도 빠져들게 만든 별들의 전쟁 조지 루카스 감독은 천재다.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에피소드 4~6편을 만들어놓고,그로부터 20년 후 프리퀄... blog.naver.com 앙카라에서 카파도키아로 가는 길에 소금 호수가 있다고 하여 잠시 들렀다. 터키어로는 Tuz(소금) Gölü(호수). 이 나라의 소금 대부분이 여기서 생산되며, 지금은 겨울철이라 저렇게 어중간한 형상을 하고 있지만, 날이 풀리면 물이 고여 하늘빛 영롱한 호수로 변한다고 한다. 나란 인간은 원체 물과는 인연이 없는 건지 터키의 소금 호수도 저 모양이더니, 3년 뒤에 간 볼리비
터키에서 2번째 패키지를 [내부링크]
지난번 캄보디아 이후 패키지는 두 번 다시 안 갈 거라고 선언했지만, 휴가 직전까지 날밤 새며 일에 쫓기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간이 있어야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ㅜㅜ 설상가상 휴가도 2주나 미뤄져서 뱅기표라도 끊어놨음 곤란할 뻔했다. 패키지는 이런 돌발 상황에서도 바로 신청해서 떠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이번 여행은 같은 바닥에서 개고생하다 퇴사하고 공무원 9급 합격 후 대기발령 중인 란과 함께하기로 했다. 해외여행이 처음인 그녀는 무조건 내 의견에 따르겠다는 고마운 의사를 보내왔고, 문득 크리스마스를 터키에서 보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러나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따위 개나 주라지ㅡㅡ;) 터키 핵심 지역으로 구성된 8박 9일짜리 패키지를 799,000\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에 득템. 물론 여기에 가이드비 10$/day, 물값 10$가 별도로 들어가고, 8박 9일 중 비행기 왕복에 하루씩 써서 실제 머무는 기간은 7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터키잖아. 옵션도 안 해도
파타야에서 아쉬운 안녕 [내부링크]
생약연구소 일정이 끝나마자 방콕에서 다시 파타야로 돌아왔고, 가이드는 약속대로 코끼리 트래킹을 시켜주었다. 들썩들썩거리며 모래사장 여기저기 활보하는 코끼리 아저씨를 보니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처음 탔던 바이킹처럼 이상하게 설레지 뭔가. 다음 코스는 태국 최대 열대 정원이라는 농눅빌리지(Nong Nooch Orchid Village) 74만 평에 이르는 Nong Nooch 부부의 사유지에 800명의 정원사가 동원되었다는 전설의 정원이라는데, 조경이나 가드닝에 관심이 없어서 별 메리트를 못 느꼈다. 농눅빌리지에서 제공된 전통 민속쇼는 차력쇼 같은 느낌이었고, 야외 공연장에서 보여준 코끼리 쇼는 이미 코끼리 트래킹을 하고 난 뒤라 식상했다. 그렇게 지루하던 파타야는 어둑어둑한 밤이 되면서 돌변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옵션인 씨푸드 뷔페로 저녁을 먹은 후 옵션이 더 이상 남지 않은 우리는 파타야의 한 쇼핑몰에서 내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카자 쇼를 보러 떠났다. 두 번째 사진에 나온 광란
앙코르 와트를 본다는 것 [내부링크]
앙코르에서 가장 울창하며 침식의 정도가 심각한 타 프롬(Ta Prom) 사원 앙리 무오가 처음에 보고 식겁했다는 큰 바위 얼굴의 모델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니에게 헌정한 사원이며, 정글과도 같은 울창한 모습으로 인해 영화 <툼 레이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덧붙이자면 안젤리나 졸리가 촬영을 마칠 때마다 들른 펍이 'Ankor What?'이었다는ㅋㅋ 타 프롬 사원의 백미는 돌을 뚫고 뻗어 나온 Spung tree(벵골보리수)의 위용이다. 자연의 위대함과 모든 것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색즉시공의 불교 철학이 엿보이는 장면. 동시에 자연을 파괴할 수도, 복원을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듯. 드디어 앙코르 유적의 핵심 앙코르 와트(Angkor Wat)로 가는 길, 해자의 규모 또한 남다르다. 힌두교 3대 신 중 유지를 관장하는 비슈뉴 신에 봉헌된 사원이지만, 입구에는 파괴를 관장하는 시바 신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후기에는 불교사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계
드디어 앙코르 유적으로 [내부링크]
셋째 날, 드디어 앙코르 유적으로 들어간다. 앙코르(Angkor)는 캄보디아의 역사가 시작되는 9세기경,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볼모로 잡혀 있던 자야바르만 2세가 독립하여 세운 크메르 제국의 수도이다. 자야바르만 2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바가 없어서 확실히 알 순 없지만, 독실한 힌두교도로서 브라만 계급이었다는 것과 자바섬의 공주와 혼인함으로써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앙코르 일대까지 크고 작은 나라를 통합하여 크메르 제국을 건국한 것까지가 크메르 제국 시대의 유물을 통해 추측한 전부이다. 아무튼, 시조인 자야바르만 2세가 세운 크메르 제국은 17대 왕인 수리야바르만 2세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현재의 태국, 라오스, 베트남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했으며, 캄보디아의 상징과도 같은 앙코르 사원군을 세운 것도 바로 이때 이루어진 업적이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사원을 크게 짓기 위해 무리하게 국고를 낭비했고, 주변국의 침략과 내란으로 국력은
씨엠립에서 앙코르 비어를 [내부링크]
오후에 간단하게 앙코르 사원을 둘러보자며 프놈 바켕(Phnom Bakeng)으로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근사한 일몰을 볼 수 있다는 프놈 바켕이건만, 선셋 따위 개나 주라지ㅡㅡ; 힌두교의 짱이라는 시바 신을 모시는 사원인 만큼 높이가 예사롭잖다. 올라가는 계단도 가파른데 비까지 내려서 유적 답사의 현장이 갑자기 극기훈련의 장으로 변신했다. 밑에선 낑낑대며 올라가고 위에선 힘내라며 응원하고ㅡㅡ; 여기저기서 들리는 한국말에 서로 놀라 "한국인이세요?" 확인하고ㅋㅋㅋ 실컷 고생해서 올라갔더니 정작 위에는 조그만 신전 하나가 다였다. 시바... 이러긴가요ㅡㅡ? 저녁은 캄보디아의 전통 춤이라는 압사라(Apsara) 디너쇼 작년에 태국에서 봤던 칸톡 디너쇼보다 동작이 훨씬 섬세해졌다. 특히 손끝을 강조한 춤사위가 압권인데, 이 춤추는 여인상은 내일 가게 될 앙코르 사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멜로디는 역시나 지루했고, 제공되는 뷔페도 딱히 먹을 게 없었다. 여기도 향이
망망대해만큼이나 씁쓸했던 톤레삽 [내부링크]
앙코르 유적이 있는 씨엠립 근처에 캄보디아 최대 호수 톤레삽(Tonle Sap)이 있다. 크메르어로 톤레(tonle)는 강, 삽(sap)은 거대한 담수호라는 뜻이다. 앙코르 사원과 킬링필드 외에는 딱히 유명 관광지가 없는 이곳에 이만한 호수가 있다는 건 관광업자들에겐 기회였을 것이다. 바로 관광용 모터보드를 만들고, 휴게소를 지어서 시내보다 비싼 값에 팔 생각을 했을 테지. 저 모터보트에 올라탄 순간 알았다. 타고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란 것을. 우리가 가는 길이 노를 젓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의 진지한 삶을 아무렇지 않은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관광객을 발견한 아이들이 다라이를 타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그들이 내뱉은 말은 "Money." 같이 온 팀원 중 한 명이 과자를 내밀자 시무룩해져서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휴게소 한쪽에서 양식되고 있는 악어와 뱀을 두르고
동남아 패키지 난생 설화 [내부링크]
작년 가을, 태국 학회에 간 것이 신의 한 수였나.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잠깐 마주친 앙코르와트 사진이 그 후로 계속 아른거려서 올여름휴가의 목적지는 자연히 캄보디아로 정해졌다. 목적지를 정했으니 그다음엔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숙소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해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퇴근하면 곯아떨어지기 일쑤여서 학생 때처럼 여행을 준비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패키지. 마침 내가 가고자 하는 앙코르와트가 포함된 6일짜리 상품이 단돈 599,000\에 나와 있었고, 또 마침 절친이 휴가를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와서 난생처음으로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동남아 패키지에 관한 '난생 설화' 여행 상품은 6일로 나와 있지만, 밤 도착 새벽 출발이라 실상은 4일짜리이고, 가이드비 45$, 음료수(이건 왜 들어가 있는지ㅡㅡ;) 10$, 캄보디아 비자 30$, 그리고 옵션까지 추가 경비를
아우랑가바드 - 엘로라 석굴, 그리고 사색 [내부링크]
아우랑가바드의 석굴사원 시리즈 2번째 엘로라(Ellora)로 향한다. 엘로라 석굴사원은 아잔타보다 조금 후인 기원후 5~10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12곳의 불교 사원, 17곳의 힌두교 사원, 5곳의 자이나교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제 갔던 아잔타는 순수 불교 사원인데 비해 여러 종교가 섞인 걸 보면 엘로라가 좀 더 인도답다는 생각. 1~12번 불교 석굴 외부는 아잔타와 비슷하지만 안에는 벽화 대신 불상이 있으며, 그 주위로 조각이 다들 에로틱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인도만의 종교적 특징인 듯하다. 힌두교의 종교화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신은 남성과 여성의 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니. 하물며 힌두교보다 뒤에 나온 불교는 어떻겠나. 나는 인도의 이런 점이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아무리 예술이라도 종교가 들어가면 뭔가 경건하고 정갈해야 할 것 같은데, 인도에서는 예술 그 자체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 저런 말랑말랑한 종교 예술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굽타
아우랑가바드 - 아잔타 석굴과 패키지 아줌마들 [내부링크]
새벽 5시도 안 돼서 아우랑가바드(Aurangabad)에 도착했다. 밖은 한없이 어둡지만 내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버스 터미널로 향한다. 어차피 지금 유스호스텔에 가봤자 문도 안 열었을 테니, 아우랑가바드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아잔타 석굴부터 먼저 다녀오기로 한다. 버스에서 무한 헤드뱅잉을 하며 졸다 일어나 보니 어느새 아잔타(Ajanta). 매표소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가는데 한국말이 들려온다. 가이드인 듯한 남자를 따라가는 한 무리의 한국 아줌마와 비구니 승려들이 보여 반갑게 인사하니 내 복장을 보고 중국인인 줄 아셨다는ㅋㅋ 여자 혼자 온 게 대견하다고 입장권도 끊어주시고, 신라면에 계란 프라이를 곁들인 점심도 얻어먹었다. 오늘 완전 운수 좋은 날^^ 아우랑가바드 인근에는 거대한 석굴사원이 2군데 있다. 그중 아잔타는 벽화 중심의 석굴이 발달한 반면, 엘로라는 불상이나 기둥 같은 조각 위주로 지어졌다고 한다. 특히 아잔타의 경우 벽화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활영을 금지하고
뭄바이 - 인도 최대 도시의 클라스 [내부링크]
벵갈루루-뭄바이 기차 34시간... 오랜만에 이틀을 꼬박 기차에서 보내 본다. 이번엔 6 좌석 모두 여자여서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극동의 아시아에서 온 여인이 펀자비를 입고 있는 게 신기한지 다들 질문 공세를 퍼붓는다. 호구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 이번엔 도시락 타임. 외국인인 나만 빼고 전부 도시락을 싸왔다. 아까 대기실에서 나키드가 사준 브리야니를 먹어서 배가 안 고팠지만, 다들 잔치라도 하듯 도시락을 들이밀어서 결국 커리, 짜파티, 커드를 배 터지게 얻어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수다... 여자들끼리 있으니 못할 얘기가 없다. 대부분 남자 이야기ㅋㅋㅋ 그중 제일 어린 스네하(벵갈루루역에서 만난 스네하와는 다른 인물)가 인도 남자를 특히 조심하라며, 그들은 집적거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절대 상종하지 말란다, 그리고 어딜 가든 가방 조심해라,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지 마라, 물은 무조건 사 먹어라 등등의 인도 십계명도 빠지지 않았다. 고국에
마이소르 - 마이 소울 [내부링크]
이것이 마이소르(Mysore)의 첫인상이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기품 있는 도시. 옛날 마이소르 왕국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사람들도 한층 젠틀해진 것 같다. 인도에 이런 곳이 다 있다니~ 대부분의 번왕국은 독립 이후 인도 정부로 흡수됐는데, 마이소르는 특이하게 아직까지도 왕가의 혈통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현재 마이소르의 마하라자는 Yaduveer Krishnadatta Chamaraja Wadiyar 이런 연유로 어딘가 절제미가 느껴지는 마이소르는 릭샤 왈라들의 막무가내식 들이댐이나 집적거림이 없어서 여행하기도 한결 수월했다. 숙소는 캘커타의 도미토리에서 만난 여행자가 추천한 Green lodge에서 욕실 포함 더블 60루피. 이름처럼 방이 온통 초록색이다. 공간도 넓고, 천장의 팬 소음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 침대 위에 모기장이 레이스처럼 드리워져 있어 유서깊은 고저택에 묵는 느낌^^ 1층에 있는 레스토랑도 싸고 맛있고, 주인아저씨와 스탭도 친절하다.
하이데라바드 - 알라... [내부링크]
캘커타에서 바로 남부로 가기엔 뭔가 허전해서 중간에 한 곳을 찍는다는 게 하이데라바드(Hyderabad)가 당첨됐다. 이름에 '~abad'가 붙은 곳은 이슬람교도들이 세운 도시라고 해서 그 분위기가 궁금하기도 했고. 캘커타에서 하이데라바드까지 기차로 서른 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인도에서 이 정도쯤이야ㅡㅡ; 이젠 숙소보다 기차에서 더 편하게 잘 정도로 인드레일에 완전 적응했다. 하이데라바드에 내려 기차역 바로 앞에 있다는 Hotel Asian을 찾았으나,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인다. 지나가던 검은 히잡을 쓴 여인에게 물어보니 내가 내린 곳은 세쿤데라바드(Secunderabad)역이고, 숙소에 나와 있는 주소는 남팔리(Nampali)역이란다. 응? 여인의 영어가 짧아서 지나가던 또 다른 아저씨를 붙잡고 물어보니 남팔리역이 하이데라바드역이고, 여기는 위성도시쯤 되는 세쿤데라바드라고 한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 대도시마다 기차역도 여러 개라는. 다행히 남팔리역으로 가는 버스도 알려주시고,
캘커타 - 시티 오브 조이 [내부링크]
내가 캘커타를 처음 접한 건 오래된 영화 <시티 오브 조이>에서였다. <사랑과 영혼>의 로맨틱한 영혼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번에는 되려 상처 받은 영혼을 캘커타에서 치유받는 이야기인데, -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죠? - 그래서 기쁨이 더 큰지도 모르죠. 인력거꾼 김첨지, 아니 옴 푸리와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진정한 삶의 기쁨이란 뭔지 되짚어보게 만든 영화였다. 그때 그 감동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 2002년도의 캘커타에서... 영국 식민지 시대의 중심지였던 캘커타는 딱 봐도 유럽이었다. 높은 빌딩과 빅토리아풍 건축 양식의 혼재, 도로에는 빽빽한 교통수단의 홍수, 수도 뉴델리보다 몇만 배는 더 모던한데 물가는 그보다 싸고, 골목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인력거가 돌아다니는 언밸런스한 풍경... 나는 이런 콜카타가 좋았다. 너무 인도스럽지 않아서 숨통이 트였달까. 오랜만에 묵어보는 도미토리도 좋았다. 여행자 거리가 있는 Sudder st.에서 2번째로 인기 있었던 Centr
사르나트 - 성지 순례는 아무나 하나 [내부링크]
인도에는 총 세 군데의 불교 성지가 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드가야(Bodhgaya) 첫 설법을 펼친 사르나트(Sarnath) 열반에 들었던 쿠시나가르(Kushinagar) 이 세 곳 모두 바라나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문득 불교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바라나시에 온 김에 가장 가까운 사르나트까지만 다녀오기로 했다. 대중교통이 없어서 사이클릭샤를 탔는데 편도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가격은 20루피. 불교 성지라고 해서 마구 불교스러울 줄 알았는데, 불교 국가 위주의 절 몇 군데만 있을 뿐 사르나트는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한국 절에 가면 사르나트와 인도와 불교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스님은 출타 중이셨고, 인도 관리인도 바쁜지 부엌에서 밥이나 먹고 가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러고 보니 아침을 거르고 온 게 생각나서 염치 불고하고 쌀밥에 양파를 넣고 고추장에 비벼서 마구 퍼먹었
바라나시 - 성스러움과 쌍스러움의 공존 [내부링크]
사트나에서 탄 기차가 바라나시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예상 시각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하다니 인도에서 이런 일이~~@@ 어두컴컴한 새벽에 정신 없이 내려서 제일 싼 값을 부르는 릭샤 왈라를 따라갔다. Om Vishwanath Lodge 욕실 포함 더블 80 루프탑 뷰가 기똥차다는 건 역시나 뻥이었다. 강가 바로 앞도 아니고, 골목 구석에 있어서 뷰도 별로고, 메인 가트에서도 완전 멀잖아ㅡㅡ+ 그냥 싼 맛에 묵었다. 언니랑 쉐어하니 인당 40. Puja GH 욕실 포함 싱글 50 언니가 바라나시를 떠나던 날 옮긴 숙소다. 메인 가트 바로 앞이어서 편하긴 한데, 모기가 많은 게 흠. 그래도 주인은 친절하고 개념도 있었다. 밤 10시에 숙박객이 안전하게 돌아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나서야 대문을 잠그더라는. 이것이 인도의 베네치아라는 바라나시의 클라스. 성스러운 갠지스강은 영국 식민지의 때를 벗기 위해 힌두식 이름인 강가(Ganga)로 개칭됐고, 오픈된 화장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강물에
카주라호 - 색기가 흐르는 마을 [내부링크]
아그라에서 카주라호까지는 좀 힘들게 이동했다. 기차가 바로 연결이 안 돼서 사트나(Satna)란 곳에 내려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데, 기차에서 만난 아저씨가 카주라호 버스는 일찍 끊겼다며 근처 호텔을 추천하는 바람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곳에서 200루피나 하는 비싼 곳에 묵게 된 것이다. 오후 3시면 버스가 끊길 시간도 아닌데 왜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을까. 델리에서 자이푸르로 가는 기차에서 너무 친절한 사람들만 만나서 내가 잠시 정신줄을 놓은 모양이다. 아,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200루피는 교육비 낸 셈 치자. 다음날 아침, 첫차가 6:30이래서 늦을까 봐 서둘러 체크아웃하고 버스 스탠드로 갔더니 호텔에서 완전 가깝다. 버스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며 매표소 아저씨가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란다. 아무리 인도라도 11월의 아침은 꽤 쌀쌀해서 다들 담요를 둘둘 말고 있더라는. 안으로 들어가니 난로도 피워주고 따뜻한 짜이도 한 잔 내어주신다. 아, 정말 하늘은 한쪽 문을 닫으
아그라 - 왕가의 무덤 [내부링크]
자이푸르에서 아그라까지는 기차로 4~5시간 거리. 하지만 직접 표를 예매한 게 아니어서 시간대가 모두 제각각이다. 델리 편에서도 썼지만 여행사를 통해 거의 반강제로 구매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한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하는 운명... 이번 자이푸르-아그라 기차도 내가 직접 예매했다면 한낮에 타서 어둑어둑한 밤에 도착하는 같은 스케줄은 피했을 텐데. 날이 어두워지니 숙소까지 갈 일이 또 걱정돼서 기차역 앞에 있는 프리페이드 릭샤를 이용했다. 하지만 가이드북에 나온 숙소로 갔더니 자리가 없다며 튕기고, 이 늦은 밤에 어디로 가나 겁이 덜컥 날 무렵, 걱정하지 말라며 마담한테 딱 맞는 숙소를 소개해주겠다는 릭샤 왈라. 그래, 삐끼는 이럴 때 필요한 거지.ㅋㅋㅋ 릭샤 왈라를 따라간 곳은 위대한 황제의 이름을 딴 Akbar Inn. 그 명성 못지않게 멋진 정원도 있고, 건물 외관도 완전 고풍스럽다. 심지어 욕실 포함 싱글룸에 온수까지 되는데 100루피밖에 안 한대서 당장 체크인했다가 그 온수가 샤
자이푸르 - 마냥 핑크빛은 아닌 [내부링크]
자이푸르역에 내리자마자 우르르 몰려드는 삐끼들. 그중 80루피를 외치는 릭샤꾼을 따라 갔는데, 욕실 포함 더블이 120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간다. 릭사꾼을 쳐다보니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듯 어깨만 으쓱해서 그냥 묵었다. 실컷 낯선 곳으로 데려와놓고 지는 커미션만 챙겨가면 된다는 심보. 질린다, 아주 그냥... 노 프로블럼이라 했지만, 인도의 숙소는 늘 그렇듯 프로블럼이 있기 마련이다. 벽에는 페인트칠이 벗겨져 흩날리고, 화장실에서는 계속 물 새는 소리가 나고... 하지만 그런 모습도 곧 익숙해지더라는. 급변하는 환경에 이토록 재빨리 적응하는 인간의 본능이 참으로 경이로울 따름이다. 80보다 비싸게 묵었으니 릭샤는 싸게 해 주겠다며 2박 3일에 150루피를 부르는 릭샤 왈라. 언뜻 둘러보니 외국인은 다들 릭샤를 타는 분위기여서 100으로 깎았는데 말렸다. 시내는 그냥 돌아다니고, 외곽에 있는 암베르 성만 타고 가도 됐었는데. 하지만 초장부터 릭샤 왈라한테 제대로 데어서 그다음부턴 조심
델리 - 인도의 첫 번째 사기, 그리고 백만 번의 친절 [내부링크]
왜 인도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20세기 마지막에 갔던 유럽에서 만난 라디오 PD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나 자신을 찾고 싶을 땐 인도에 가라고. 마드리드에서 플라멩코 쇼를 기다리며 달달한 상그리아 한 잔 기울이고 있는 그 시끌벅적한 와중에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울림이 느껴졌다. 마치 언젠가는 꼭 인도에 가야 할 것 같은 신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 켠에는 늘 그때의 울림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대학생 때 인턴십을 하면서도, 그리고 말년에는 대학원을 준비하면서도 언젠가 될지 모를 인도 여행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대학원 시험을 치고 나서 발표일까지 2달 정도 시간이 났을 때 드디어 실행에 옮긴 것이다. 나 자신을 찾으러 가자고. 그래서 인디아. 비행기는 에어인디아. 아직 우리나라에 에어인디아가 취항을 안 해서 홍콩을 경유했는데, 사대천왕의 로망으로 가득했던 그곳의 공항은 너무나 지저분했다. 여
영국 1 런던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내부링크]
영국은 어차피 유레일 패스가 안 되니 한 달이라는 기한에 쫓겨서 급하게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이번 유럽행의 종착지인 만큼 지치기도 했고, 뭘 봐야겠다는 욕심도 없어서 아웃하는 그날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현지인의 시선으로 평범하게(?) 살아보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격의 숙소가 필요한데, 학생인 우리에겐 저렴한 한인민박이 최선이었고, 파리의 흥부네에서 추천받은 Queen's house로 자연스레 예약이 진행되었다. 가격은 조식 포함 여성 전용 도미토리가 10파운드(1파운드 = 2000\). 파리에서 유로라인을 타고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 땅에 도착했을 땐 한밤중이었는데, 그동안 유럽에서 봐온 국경의 모습과 전혀 다른 분위기에 순간 긴장했다. 여권을 꼼꼼히 체크하며 압박 질문을 마구 해대는 사람들. 여긴 어쩐지 유럽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했더니 결국 브렉시트가 일어날 줄이야.ㅡㅡ; 아무튼, 그렇게 바짝 긴장하며 도착한 런던의 코치 스테이션에서 친히 외제차를 끌고 마중 나
프랑스 2 미워도 파리 [내부링크]
세계 3대 박물관이라는 루브르 박물관 저렇게 찍어놓으니 루브르인지 어느 시골에 있는 조그만 미술관인지 알게 뭐람. 애초에 내가 찍고 싶었던 건 저런 게 아니라 루브르 입구에 있는 투명한 유리 피라미드였는데... 하필 방문한 날이 그달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고, 무료입장이 가능한 날이어서 인파가 제대로 몰린 탓에 박물관 입구 광장의 유리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건물을 돌고 돌아 겹겹이 줄 서서 기다리길 2시간. 옆 사람들 머리에 가려서 유리 피라미드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지.ㅜㅜ 겨우 입장해서 모나리자를 보러 갔는데, 방탄유리를 씌워놔서 빛 반사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그림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놀랐다는. 이것이 다빈치의 클라스였나ㅡㅡ? 그냥 소싯적에 갔던 어린이회관의 커다란 모나리자가 더 뭉클했던 것 같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루브르의 전시물은 너무 방대해서 감히 하루 만에 섭렵할 수 없었고, 유럽의 투머치 살롱문화는 결국 우릴 체하게 만들었다. (독일부터 프랑스까지
스페인 2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내부링크]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싸디 싼 아리랑 민박이다. 방 2개에 거실 하나인 조그만 아파트에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났었지. 인당 1000페세타(한화로 7~8천 원)라는 경이로운 가격대에 비록 청결하진 않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했던 친절한 주인 노부부도 계셨고. 구석 공간에 알아서 잠자릴 만들었던 우리 자매를 착하다며 머리도 여러 번 쓰다듬어 주셨더랬는데. 그리고 아마 여기서부터였던 것 같다. 스페인-프랑스-영국으로 이어지는 한인민박 연계 시스템으로 만났던 인연을 또 만나고 비슷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이, 성별 불문하고 '배낭여행' 하나로 전우애를 다졌던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면 꼭 다시 보자고 약속에 약속을 했건만, 돌아와서 각자의 삶에 충실하느라 어느새 추억으로만 간직하게 되었지. 잘 살고 있을까, 다들... 그리고 안토니 가우디 스페인이 낳은 희대의 천재 건축가 직선의 허용을 일체 용납하지 않았던 곡선의 로맨티시스트 바르셀로나는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으로 인해 충분히
스페인 1 노숙의 추억 [내부링크]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는 기차 역시 예약을 해야 했다. 2인 1445에스꾸두(1esc = 6.5\) 마드리드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구간인 바르셀로나와 파리까지도 미리 예약을 해놓고 나니 그제서야 드는 생각, 이놈의 유레일 패스는 서유럽 몇몇 국가만 적용되는 건가? 그래 놓고 한 달 프리패스라고 퉁쳐서 50만 원에 팔았나? 여기는 세고비아의 로마 수도교 마드리드에서 기차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다. 이 정도 짧은 구간은 다행히 예약이 필요 없어서 유레일 패스로 가볍게 이동했는데, 세고비아에 도착하니 햇볕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 땡볕이 거의 직선으로 내리 꽂히는 느낌ㅡㅡ; 이렇게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니 예로부터 이런 상수도 시설이 필수였는지도 모르겠다. 저 돌길 속에서 어떻게 물을 끌어오나 했더니 이런 원리가 숨어 있었군. (이미지 출처: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2/2016120202697.
포르투갈 1 리스본이 좋다 [내부링크]
드디어 로마에서의 마지막 날, 부푼 가슴을 안고 기차역으로 출발했다. 이 더럽고 무질서한 이탈리아는 이제 안녕이라며. 하지만...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기차는 유레일 패스와는 별도로 예약표를 요구했고, 그 금액이 자그마치 5천 페세타. 달러로 환산하면 50$이고, 2명이면 100$가 든다는 얘기ㅜㅜ 무슨 예약비가 10만 원이 넘냐며 충격과 짜증이 뒤섞여 잠시 멘붕이 왔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그 길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유레일 패스가 있으니 최대한 서쪽까지 갔다가 국경부터 타면 될 것을. 그래서 생각해낸 루트는 로마-밀라노-파리-바르셀로나. 밤기차를 이틀 연짱 타야 하지만, 어차피 컴파트먼트 하나 점령해서 자면 되니까 문제될 것도 없겠다 싶었다. (하지만 저 구간은 사람도 많고 컴파트먼트를 잠글 수도 없었다는ㅡㅡ;) 밀라노를 거쳐 다음날 아침 파리 리옹역에 도착하니 새삼 선진국 냄새가 난다. 그래, 이탈리아는 유럽이 아니었어... 하지만 프랑스는 또 그만의 진입 장벽이 있었으니 자부심
이탈리아 3 꽃 같은 피렌체 [내부링크]
피렌체는 프라하 다음으로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래서 '꽃의 도시'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Florence라고 하는구나. Duomo, 피렌체의 모든 것. 세상 어디에 이토록 화려하면서도 독특한 성당이 있을까.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인 만큼 그 예술의 밀도는 엄청나다. 두오모 맞은편에 있는 저 황금색 문은 산 지오반니 성당의 상징인 천국의 문(Porta del Paradiso)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건물의 건축가는 서로 라이벌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각자의 소질을 빛내줄 수 있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으니 이만한 윈윈이 또 어디 있겠나. 잘생긴 다비드상이 마중 나온 듯 서 있는 우피치 미술관 이 더운데 1시간이나 기다려 12000리라나 하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 미술사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과 극명한 사람 간의 취향을 서로 존중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 로마에서 실컷 본 르네상스의 산물을 여기서 재탕하고 있으려니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고작 유물만 보
이탈리아 2 폼페이의 그날 [내부링크]
로마 테르미니역에서 나폴리로 가는 기차를 탄 순간 또 한 번 느꼈다. 이탈리아는 결코 쉽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더러워도 더러워도 어쩜 이리 더럽단 말인가! 나폴리까지는 기차로 2시간이 걸렸고, 기차역에서 폼페이까지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폼페이 유적 입구 입장료는 12000리라 폼페이는 원래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한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규모는 넓진 않으나 구획 정리가 꽤 잘 되어 있고, 도로 폭은 좁지만 차도와 보도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수도관이 발달해 있어서 그 옛날에도 도시계획이 꽤 잘 된 곳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Vesuvio산은 그날 폭발한 걸까? 마침맞게도 화산이 폭발하던 날은 불의 신 Vulcanus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었다고 한다. 떠들썩한 분위기 때문에 땅의 진동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데, 저 멀리서 밀려오는 심상찮은 먹구름을 보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럴 틈도 없이 화산재가 순식간에 덮쳤을
이탈리아 1 로마는 힘들어 [내부링크]
로마는 카오스였다. 기차역은 한없이 지저분하고 정신없고, 신호등은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도로 위는 무법천지였으며, 거리에는 소똥 개똥 파리똥... 그들의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이 아니었다면 여긴 당최 올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지. 더 웃긴 건 이 느낌을 3년 후 인도에서 고스란히 느꼈다는... 이것이 이탈리아의 첫인상이었다. 기차역에서 만난 삐끼들은 하나같이 1박에 3만 리라(1Lire = 0.7\)를 제시했고, 땐땐한 우린 끝까지 2만을 불렀으며, 그렇게 하나둘씩 나가떨어지더니 결국 단 한 명의 삐끼만이 남았다. 사실 처음부터 그들을 따라갈 생각이 없었기에 그냥 던져본 가격인데 딜이 성사되어 우리도 얼떨떨했다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덥석 문 삐끼는 숙소로 가는 버스비도 내주고, 숙소 주인과 싸우면서까지 2만에 성사시켜주었다. 뒤늦게 고맙네.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숙소는 비록 후졌지만, 주변 상권은 대박이었다. 바티칸과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등 유명 관광지까
스위스 - 알프스에 대한 환상 [내부링크]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알프스 정확한 지명은 인터라켄(Interlaken)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스위스 루체른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내린 곳. 하지만 오늘의 목적지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에 가려면 산악 기차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한다 슬프게도 산악 기차는 유레일 패스가 적용이 안 돼서 인당 110프랑(1프랑 = 800\)의 거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했다. 그렇게 몇 번의 환승을 거쳐 올라간 융프라우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어 어디가 어디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통유리로 막아놔서 굳이 여기까지 올라온 보람을 느낄 수가 없더라는. 9만 원에 달하는 차비는 왜 낸 건가.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같은 풍경을 느끼고 싶다면 그냥 인터라켄까지만 가시길.ㅜㅜ 루체른으로 돌아왔더니 벌써 해가 저물어간다. 이렇게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를 이대로 떠나야 하다니... 유럽은 참 독특한 대륙 같다. 밤기차만 타면 다음날 아침엔 다른 나라에 도착해 있고, 솅겐
헝가리 - 어딘가 허전했던 부다페스트 [내부링크]
지금도 생각난다. 부다페스트 기차역에서 노란 커플티를 입고 호객하던 발리 아줌마네 부부를.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유럽을 돌면서 숱하게 들어왔던 그들의 명성을 실물로 영접한(?) 순간, 엄마 미소를 한껏 띠며 가슴팍에 달린 태극기 배지를 뽐내던 발리 아줌마와 니콜라스 케이지를 닮은 발리 아저씨. 정작 한국어는커녕 간단한 영어 몇 마디로 겨우 의사소통을 하는 그들이었지만, 게스트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신경 써준 덕분에 부다페스트에서는 내 집처럼 편하게 잘 묵었다. 여기가 바로 발리 아줌마네 아파트 한 집에 방 3개씩 총 두 채를 운영하는데, 더블룸이 8$로 상당히 저렴하다. 욕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람이 많을 땐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까지 가 본 민박 중 가장 청결해서 좋았고, 발리 아줌마가 가끔 만들어주는 헝가리 음식도 감동이었다. 파프리카 란쵸... 아직도 그 맛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헝가리 건국 100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영웅광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국회의사당 헝
오스트리아 2 비 내리는 잘츠부르크 [내부링크]
뮌헨까지는 해가 쨍쨍하다가 오스트리아부터 비가 찔끔찔끔 내리더니 잘츠부르크에 도착하니까 주룩주룩 장대비가 내린다.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강행해 본다. 오스트리아가 나은 음악의 신 모차르트를 찾아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어리바리하면서도 광기 어린 모습으로 인상 깊었던 그의 생가는 사람들로 미어터졌다. 독일의 본에서 한산했던 베토벤 생가와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 스산한 날씨 탓인지 오늘따라 부쩍 두 영혼이 생각난다. 두 사람 모두 영화 <아마데우스>와 <불멸의 연인>에서 종류는 다르지만 나름의 불행한 유년기를 겪었고, 천재이기에 평범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던 청년기를 보냈으며,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아픔이 와서 요절하거나 고통스럽게 생을 살다 간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비록 모차르트 상표를 내건 초콜릿은 분홍빛으로 화려하게 물들었지만, 그의 생과 사를 생각했을 때 저 초콜릿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 하지만 사진으로는 남기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오스트리아 1 문화재보다 영화제가 좋았던 빈 [내부링크]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독어를 쓰고 있으니 계속 독일에 있는 느낌.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건물이 독일만큼 아기자기하지가 않다. 웅장하긴 한데 어딘가 디테일이 부족해 보여.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 동상이 있는 왕궁(Hofburg)를 보고 든 생각이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자식들을 정략결혼에 이용한 엄마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손 중 여자로서 유일하게 왕위에 오른 오스트리아의 국모 게다가 남편과의 금슬도 좋아서 20년간 배불러 있었고, 16명의 자녀를 낳은 다산의 여왕 그런 오스트리아니까 뭔가 여성스러운 섬세함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독일에서 이미 중세의 정수를 봐버려서 그런지 별 감흥이 없다. 쇤부른 궁(Schloβ Schönbrunn)도 그랬다. 웅장하긴 한데 심플하기 그지없는 드자인 언덕 꼭대기에서의 전망은 좋았지만...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과 비엔나 숲(Wiener Wald) 빈 서역에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온 보람이 충분히 있었다. 공기가
독일 5 동화나라 퓌센 [내부링크]
밤사이 다시 독일에 떨어졌다. 유레일 패스의 마법과도 같은 공간 이동. 3번쯤 오니 이젠 독일이 고향처럼 느껴진다. 가이드북에서 찜해둔 고성을 개조했다는 호스텔로 가기 위해 기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해당 역에 내려 열심히 걸어갔는데 지하에 있는 도미토리에 배정받았다. 같은 가격에 서양인들은 지상층 도미에서 묵는다는 걸 그날 밤 알게 되자 본에서 당했던 racism이 떠오르며 다시금 욱하더라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약소국의 이미지일 줄은 몰랐네. 비록 옛 성을 개조한 만큼 운치도 있고, 조식도 괜찮았지만, 차라리 이런 대접을 받을 거면 돈을 더 주고라도 시내에 묵을 걸 그랬다. 왜냐하면 뮌헨에는 Alte, Neue, Moderne Pinacothec 같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설령 입장료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거대한 문화 공간이 시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걸 감안하면 뮌헨은 꽤 매력적인 도시가 아닌지. 게다가 매 시간마다 인형쇼를 볼 수 있는 근사한
체코 - 프라하의 여름 [내부링크]
체코까지는 유레일 패스가 적용되지 않아서 독일 국경 Schöna에서 프라하까지 기차표를 따로 예매했다. 17.6마르크. 동유럽이라 바짝 긴장했는데, 국경에서 스탬프 한 번 찍고 끝. 독일 이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스탬프가 신기해서 엄지척을 해주니 경찰도 뿌듯해하더라는.ㅋㅋ 하지만... 기차에서 내려 역사로 들어서는 순간 벌떼처럼 몰려드는 삐끼에 어안이 벙벙해지고, (독일과 네덜란드가 얼마나 젠틀했는지 체코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얻어걸린 삐끼를 따라 가느라 처음엔 시세보다 조금 비싼 데서 묵어야 했지만. 프라하의 구시가지가 품고 있는 콘텐츠는 그 어느 곳보다도 풍성해서 결국 유럽 최애 도시가 되고 말았다. '프라하의 봄'의 상징인 바츨라프 광장은 저 음산한 국립박물관에서 시작된다. 입장료는 35코루나 또는 1유로. 올림픽 역사부터 악기, 자연사 등등 일관성은 없지만 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박물관에서 반나절쯤 보내고, 박물관 앞으로 난 길을 따라 쭉 직진해서 내려오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과 풍차,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추억 [내부링크]
섹스와 마약의 도시 암스테르담의 첫 인상은 우울... 흐린 날씨도 한몫했지만, 약 먹었는지 눈 풀린 아이들이 대놓고 구걸을 해서 식겁했고, (여긴 선진국이 아니었던가?) 달갑잖은 트래블 메이트를 만나 체코까지 얼떨결에 합류한 까닭에 그 우울함이 배가된 느낌... 아닐 땐 확실하게 No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착한 건 나도 상대도 모두 피곤하게 한다는 걸 머지않아 깨닫게 되었으니. 하지만 그가 추천한 숙소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기차역에서 트램을 타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야 하지만, 2층 침대 10개가 마구 나열된 믹스 도미토리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고, '악마의 크림'이라는 누텔라의 매력도 발견할 수 있었으니. 조식이 Bonn의 럭셔리 호스텔 이후로 점점 일취월장하고 있다. 먹는 것에 약한 우리ㅋㅋㅋ 암스테르담의 중심 담 광장 왕궁과 각종 박물관과 마담터소와 곳곳에 희한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곳. 여기뿐만 아니라 근처 중앙역도 멋있고, 그 주변을 가로지르는 운하도
독일 4 베를린에 실망하고 드레스덴에 반하다 [내부링크]
처음 밤 기차를 탔는데, 에어컨이 너무 셌나 보다. 둘 다 감기에 된통 걸려서 컨디션이 말이 아니게 됐다. 설상가상 1시간이나 걸려 찾아간 호스텔에서는 방이 없다며 튕겨 나왔고... 우리 아프고 힘든데 뭐 좀 먹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하여 처음으로 외식이란 걸 했다. 카이저돔 근처 식당에서 샌드위치 2.6마르크 먹고 힘내서 간 곳이 에로틱 박물관 10마르크 (어디까지나 궁금해서ㅡㅡ;) 2차 대전의 잔상 때문에 더욱 우울했던 베를린의 카이저 빌헬름 교회 날씨도 우중충한데 숙소도 못 잡고... 그래서 또 밤 기차를 감행하기로 한다. 그나마 유레일 패스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위로해보지만,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무슨 시간을 그리도 칼 같이 지키며, 시설만 고급진 이체(ICE)의 에어컨은 무슨 냉동고처럼 세냐고 불평에 불평을 하다가... 좀 느슨한 나라로 가볼까 하여 선택한 곳이 네덜란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우린 그렇게 암스테르담으로 가게 되었고... (네덜란드 편 https://b
독일 3 쾰른 성당과 라인강 [내부링크]
쾰른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거대한 고딕 물체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중세 고딕 양식의 결정체 쾰른 대성당이다. 오토 카메라의 한계로 전체 모습은 못 담았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성당 안이든 밖이든 장엄하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처음엔 성당 안에서만 죽쳤는데, 돌아다녀보니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입구가 보여서 나선형의 끝없는 계단이 좀 걱정되지만 도전해보기로 한다. 입장료는 1.5마르크 세어보진 않았지만 왕복 천 개에 달하는 계단을 오르고 올라 정상에 이르니 그 끝에는 라인강이 흐르는 쾰른의 멋진 구시가지 뷰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에는 비록 안개가 낀 것처럼 나오지만, 저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마도 필름에 빛이 들어간 듯. 성당에서 내려와 후들거리는 두 다리를 진정시키며 라인 강을 건너 본다. 그러다 한국인 여행자를 만나 다리 건너편에서 오랜만에 투샷도 찍어 보고. (인물 사진 이미지 툴: BeFunky) 이날은 한국인과 인연이 있었는지 쇼핑몰이
독일 2 호스텔 첫경험 [내부링크]
베토벤의 도시이자 옛 서독의 수도였던 본(Bonn) 하지만 그 명성 치고 가이드북의 정보가 너무 부실해서 또 걱정이 한바가지다. 그땐 여행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도 없었고, 심지어 인터넷 카페도 거의 없던 시절이어서 기차역 근처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유일한 정보통이었는데, 거기서 알려준 인터내셔널 호스텔 가격이 무려 하루 생활비에 버금간다. 게다가 기차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한다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일단 찾아가 보기로 한다. 기차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인포메이션이 알려준 번호의 버스에 올라타며 "학생"이라고 했더니 어린이 요금(1.8마르크)을 끊어줘서 본의 아니게 싸게 이동했다. 그렇게 30분쯤 달려서 꽤 외곽인 듯한 허허벌판에 내려서 당황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서 따라가니 전원주택 같은 어여쁜 집이 마구 늘어서 있는 게 아닌가. 시골이 아니라 부촌이었나ㅡㅡ? 전원주택이 늘어선 골목 끝에 이르자 오색 국기가 펄럭이는 호텔 같
독일 1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차 적응하기 [내부링크]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오사카-프랑크푸르트 구간을 14시간 동안 날아서 겨우 도착한 독일 거대한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나오니 멍해진다. 여긴 어디ㅡㅡ? 나는 누구ㅡㅡ?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걷다 보니 지하철 매표기가 보인다. 헤매고 있는데 옆에서 표를 뽑던 독일 부부가 도와주셨다. 다, 당케...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Hauptbahnhof)까지 지하철 5.9마르크(1999.06 당시 환율 1DM = 600\) 중앙역에 내리니 바로 인포메이션이 보인다. 혹시 몰라서 1마르크짜리 시내 지도를 사들고 호기롭게 밖으로 나왔는데... 유럽 온 첫날부터 한국인한테 픽업당했다. 기차역 앞에 죽치고 앉아 있을 줄이야ㅡㅡ; 나중에 알았지만 이것이 한인들이 한국 여행자를 호객하는 방식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끌려간(?) 곳은 다행히 가이드북에 나온 서왕모텔. 처음엔 인당 60마르크라고 하더니 우리가 주저하니까 바로 30마르크라며 꼬리 내려서 그냥 묵기로 했다. 오랜 비행
도쿄 산책 -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신주쿠 [내부링크]
밤에 잠들기 전,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나도 모르게 비가 오길 기도했다. 맑은 날엔 마치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마냥 초조해졌다. - <언어의 정원> 중 타카오의 독백 비 오는 날 신주쿠공원을 산책하는 것. 도쿄 와서 해 보고 싶은 로망 중 하나였다. 하지만 비는 당최 내리질 않고, 귀국날은 다가오고, 초조하게 하루하루 보내다 결국 아쉬운 대로 해가 쨍쨍한 날 신주쿠공원을 찾았다. 그렇게 신카이 마코토 작품에 나온 신주쿠 명소들을 산책하듯 둘러보았다. 신주쿠교엔(新宿御苑) 언어의 정원 도쿄에 있는 공원 중 몇 안 되는 유료 공원이라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9시 오픈에 임박해서 가니 대기줄 대박이다. 일본은 공원도 오픈런하나? 혼자 생각하는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린다. "쿄와 무료데스." '무료'가 일본어로도 발음이 같구나. 그러고 보니 오늘은 어린이날. 원래는 입장료가 500엔이지만, 어린이날엔 무료여서 다들 한 보따리씩 먹을 걸 싸들고 피크닉 온 거였다. 본
도쿄 롯폰기 건축 여행 - 국립신미술관, 도쿄 미드타운 [내부링크]
떠날 때가 되어서야 비 내리는 도쿄. 이런 날엔 실내 나들이가 짱이다. 오늘은 롯폰기에서 주목할 만한 건축물 2곳을 둘러보기로 한다. 국립신미술관(国立新美術館) 건축만으로 가 볼 만한 구로가와 기쇼의 유작 미국의 비벌리힐스나 우리나라의 압구정처럼 부촌으로 시작된 롯폰기(六本木, Roppongi), 그중에서도 국립신미술관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과 골목길의 콜라보다. 초행자에겐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지만, 일단 언덕을 올라가면 파도 치듯 일렁이는 곡선의 신기방기한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일본 현대 건축의 거장 구로가와 기쇼(黒川紀章, 1934~2007)가 설계한 국립신미술관(国立新美術館)이다. 구로가와 기쇼는 안도 다다오(1941)나 구마 겐고(1954)보다는 조금 이른 세대 사람으로, 롯데월드(출처: 위키백과) 우리나라와는 1989년 국내 최초 실내 테마파크로 개장한 롯데월드를 설계한 인연이 있다(관련 기사). 그러고 보니 사진 속 롯데백화점의 굽이진 파사드가 국립신박물관
요코하마 개항장 [내부링크]
19~20세기, 조선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를 식민지 삼았던 일본. 그런 일본도 일찍이 서구 열강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바로 조선에서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를 일으켰던 미국이다. 요코하마 아카렌가 소코에 전시된 역사화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은 아시아 원정을 목표로 일본 시모다항에 당도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요구 조건은 무역을 위한 개항. 당시 쇄국정책을 고수하던 일본은 청나라가 아편전쟁으로 무너지자 서구 열강에 두려움을 느끼며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한다. 그 결과 시모다와 하코다테가 개항되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858년에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요코하마, 나가사키, 니가타, 고베가 차례로 개항되는데, 그중 요코하마는 도쿄에서 전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 개항장의 역사 속으로 발걸음해 본다. 요코하마역 Yokohama Porta 도쿄역에서 요코하마역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요코스카선이나 우에노도쿄선을 타는 것이다. 구글맵
도쿄 B컷 [내부링크]
여행에서 목적 없이 걸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금쪽 같은 B컷이 기억에 더 남을 때가 있다. 최첨단 메트로폴리탄 시티 도쿄에서 크게 주목받진 않더라도 일본다움 하나로 족한 풍경들을 지금 풀어 본다. 닌교초(人形町) 도쿄역에서 니혼바시를 지나 오른쪽으로 직진하면 에도 시대 인형극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 닌교초(人形町)가 나온다. 지금은 수차례 산업혁명으로 극장과 인형사는 사라지고 현대판 카페와 상점이 들어섰지만, 그래도 에도 시대 태엽인형 시계탑 닌교초 가라쿠리야구라(からくりやぐら)는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시계탑에서 인형 그림이 그려진 곳과 검은단 위의 유리 상자 안에는 인형이 숨어 있는데, 매일 11~19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정각에 인형쇼가 펼쳐진다. 순산에 영험 있다는 스이텐구(水天宮) 신사 올드한 가게와 가정집이 있는 골목길 콘크리트 벽을 뚫고 박아넣은 자판기. 그 누구도 아닌 자판기만을 위한 자리. 소소한 골목에서 녹음가
도쿄 다크 투어리즘 - 야스쿠니 신사, 영친왕 저택 [내부링크]
암울하지만 알아야 할 역사가 있는 다크 투어리즘은 늘 양가적인 감정이 들게 한다. 여기까지 왔으니 보고 갈 것인가 아니면 우울해질 게 뻔하니 그냥 건너뛸 것인가... 물론 나의 선택은 늘 가는 쪽이었지만. 야스쿠니 신사 정국 신사 그래서 가 보았다. 말 많고 탈 많은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 정국신사)에. 1868년 왕정을 복고하자는 유신파와 도쿠가와 세력을 유지하자는 막부 간의 내전이 일어나면서 메이지유신의 서막을 연 보신전쟁(戊辰戦争)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곳은 처음에 '쇼콘사(招魂社)'란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한자 그대로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곳'이다. 그러던 1879년 메이지유신 덕분에 에도성에 무혈 입성한 메이지 덴노가 이곳에 참배를 오면서 '나라를 안정케 한다'라는 뜻의 '야스쿠니(靖国)'로 개칭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충렬사처럼 애국공신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었다. 하지만 2차 대전 때 진주만을 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주범 도조 히데키와
도쿄 긴자 명소 - 무지(무인양품, 무지 호텔, 무지 베이커리, 파운드 무지) [내부링크]
17세기 에도 시대 화폐 주조를 담당했고, 각 지방으로 가는 길에 바시(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발달한 긴자는 그래서 예로부터 은행이 밀집된 상업 중심지였다. 그런 이유로 현재 맨해튼 5번가에 버금가는 명품거리가 조성되었고, 우리나라에선 다이소보다 조금 비싼 중저가 상점에 해당되는 무인양품(無印良品)이 무지 호텔로 거듭나며 긴자의 노른자위를 점령했다. 개인적으로는 츠타야 서점의 설립자 마스다 무네아키보다 무인양품의 아트 디렉터 하라 켄야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더 마음에 들어서 한 번쯤 묵어보고 싶었으나, 오뉴월엔 이미 예약이 꽉 찼다. 그래서 매장이라도 성실히 둘러보려고 애썼는데, 그러면서 느낀 건 나의 결이 무지와 꽤 어울린다는 것. 하물며 외국 물건 중 일본다움을 모아놓은 파운드 무지(Found MUJI)마저 좋더라.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무인양품'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한 국가를 돌아다니며 무인양품다운 걸 찾음으로써 사례를 통한 귀납적 정의를 한 발상도 참신했다.
도쿄 긴자 명소 - 이토야 [내부링크]
명품숍이 즐비한 긴자에서 문구의 명품화를 선언한 곳이 있다. 무려 1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레드 클립의 창시자 이토야(伊東屋, Itoya)가 그 주인공이다. 빨간 클립의 전설, 이토야 흔한 클립에 정열의 빨간색을 최초로 입혀 판매한 팬시 문구의 대가 이토야(伊東屋). 그래서인지 명품 거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저 빨간 클립 간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토야 초창기 모습(출처: 이토야 공식 홈페이지) 이토야의 시작은 메이지 시대인 1904년, 이토 가쓰타로(伊藤勝太郎)가 긴자 3쵸메에 창업한 '와한양문방구(和漢洋文房具) STATIONERY'가 그 전신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문물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가쓰타로는 문구를 통해 서양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런 그의 전략이 먹혀들며 문구점은 번성하였고, 건물도 3개 층으로 증축하는 등 승승장구하지만,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소실되면서 마루노우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 후 긴자에 다시 신축, 전쟁으로
도쿄 긴자 명소 - 도큐플라자긴자 [내부링크]
긴자의 세련된 건축물 사이에서 매우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도큐플라자긴자(Tokyu Plaza Ginza). 언뜻 보면 그저 흔한 쇼핑몰 같은데, 그 안에는 쇼핑 매장 말고도 다양한 전시로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하다. 2층 싱가포르 차 브랜드 TWG 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제일 먼저 맞닥뜨린 매장은 놀랍게도 싱가포르 차 브랜드 TWG. 럭셔리의 대명사 긴자에서 찻잎계의 럭셔리 대명사 TWG가 있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순수 일본 브랜드만 봐서 그런지 간만에 보는 외국 브랜드가 오히려 낯설다. 차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모로코계 프랑스인 타하 북딥과 인도계 홍콩인 마노즈 무르자니가 아시아 무역의 거점 싱가포르로 건너와 설립한 TWG(The Wellness Group)는 브랜딩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창립 연도는 2007년이지만, 로고에는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상공회의소가 생기며 차 무역이 시작된 1837년을 새겨 전통 있는 콘셉트로 나간 것. 거기다 19
도쿄 긴자 명소 - 긴자식스(GSIX) [내부링크]
메이지 시대 은행(은화 제조소)이 집결된 곳이어서 은이나 화폐를 뜻하는 은(銀), 자리 좌(座), 그래서 긴자(銀座)로 명명된 이곳에는 전 세계 내로라하는 브랜드 샵이 밀집되어 있다. 도쿄역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옆동네여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역과 명동의 포지션 같달까. 그만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긴자식스(GINZA SIX, GSIX) 일대는 5월 골든 위크를 맞이해 차도를 모두 막아놓았다. 황금 연휴에 도쿄를 방문한 사람들을 위하는 이 도시의 배려가 느껴지는 순간. 그런데 왜 하필 여기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 건물 이름 자체에 '긴자'가 들어가서일까? 긴자 최초 백화점 마쓰자카야(松坂屋) 마쓰자카야 백화점, 1925(출처: 올드 도쿄) 일본 최초 서양식 백화점이 미쓰코시 니혼바시 본점(1904)이라면, 긴자 지역에서는 1924년 지금의 긴자식스 자리에 개점한 마쓰자카야(松坂屋)였다. 지하 1층, 지상 8층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문을
일본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숍 - 츠타야서점 [내부링크]
소유의 경제는 '경험의 경제'로 진화하고 있다. 그 경험 경제를 이끄는 주체는 자본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닌 '라이프스타일'이다. - <매거진 B Vol.37 : 츠타야(TSUTAYA)> 중 1983년 오사카 히라카타시의 조그만 가게에 책과 음반, DVD 대여 판매점으로 시작한 츠타야서점(Tsutaya Books, 蔦屋書店)은 현재 천여 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명실상부 일본의 국민 브랜드가 되었다. '츠타야(蔦屋)'라는 이름은 설립자 마스다 무네아키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 이름으로, '담쟁이(蔦)가 있는 집(屋)'이란 뜻이다. 그 네이밍부터 유서 깊은 사연을 머금은 만큼 마스다 무네아키의 철학도 남다른데, 그가 운영하는 그룹 CCC(Culture Convenience Club)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에 있는 츠타야서점 1호점(출처: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 츠타야서점의 스토리를 이해하려
일본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숍 - 디앤디파트먼트 [내부링크]
츠타야서점이 있는 도쿄의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도쿄에서 최고의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이곳이 고요해지는 순간은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녹색으로 바뀌기 직전이다. 지나가던 차들이 멈춤과 동시에 녹색불이 켜지기 전까지 누구 하나 도로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순간, 비로소 스크램블 교차로는 한숨 쉬어간다. 하지만 곧 신호등이 바뀌면서 사방, 아니 육방으로 오가는 사람들로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전철역과 고가도로까지 얽히고설킨 시부야역 일대는 그래서 초행길의 여행자에겐 길 찾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굳이 정신없는 여길 찾은 이유는 시부야 히카리에(渋谷ヒカリエ, Shibuya Hikarie) 8층에 있는 d47을 보기 위해서다. '시부야에 빛을 비춘다'라는 뜻의 시부야 히카리에는 1956년에 설립된 도큐문화회관을 백화점과 레스토랑, Hikarie Hall 등으로 리모델링한 복합 상업 시설이다. 그중에서도 8층은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라고 하여 디자인 관련 행사가 개최되는 곳인데
도쿄 산책 - 메구로강,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내부링크]
시부야에서 메구로로 가는 길, 갑자기 조용하고도 댄디한 부촌이 나왔다. 메구로는 분위기가 샤방샤방하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마무시한 언덕길인 줄 알지 못한 채. 내리막을 한참 내려가서야 모습을 드러낸 메구로강 초여름의 푸릇푸릇한 메구로강도 이렇게 멋진데, 봄날에 벚꽃이 만발하면 얼마나 더 멋질 거냐. 정갈한 마을, 강변 산책이 기분 좋다. 여기는 스벅이 없어도 올 만할 정도로 조경과 로드샵 배치가 잘 되어 있다. 거기에 독보적인 포스를 뿜어내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있어 메구로 지역에 프리미엄을 더한다. 미국에서 오리지널을 영접했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도쿄와 상하이에만 있는 귀한 존재라 굳이 들렀다. 그런데... 기나긴 줄을 보고 뒤에 섰다가 혹시나 싶어 앞에 있는 여자분께 물어보니 영어를 못한다며 직접 입구로 데려가 QR코드로 입장 순번 받는 걸 도와준다. 덕분에 신청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내 앞에 무려 144명이나 대
바닷마을 다이어리, 2015 - 가마쿠라 먹방 여행 [내부링크]
영화는 바다와 도시의 모습이 공존하는 가마쿠라의 해변 도로를 둘째 요시노(나가사와 마사미)가 걷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막 남친의 자취방에서 밤을 보내고 나오는 길. - 아르바이트 비 들어오면 금방 갚을게. 라는 남친의 첫 대사에서 좀 우울한 얘기가 아닐까 했는데, 제목처럼 바닷마을에 사는 자매들의 일상이 일기처럼 잔잔하게, 때로는 여행하는 것처럼 다이내믹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제목을 꽤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촌 같으면서도 도시스러운 거리를 걷던 요시노는 어느새 산골짜기 신사 같은 고풍스러운 건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바로 주인공 자매들이 사는 집이다. 전형적인 일본 전통가옥 2층집 구조로, 안에는 다다미로 도배되어 있고, 유리문 사이사이로 창호지가 붙여진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 거실 한쪽에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신당이 있는데, 외할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외할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그런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너의 이름은, 2016 - 다시 보니 띵작이네 [내부링크]
백두산 천지 같은 분화구가 있는 이토모리 마을에 혜성이 충돌한다. 본디 혜성이란,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한 얼음 먼지 덩어리로, 태양과 가까워지면서 가스로 된 머리와 꼬리가 나타나 긴 형태를 띠는데, 그 티끌이 지구 대기와 마찰하며 떨어지는 것이 별똥별, 즉 유성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혜성의 찌꺼기를 보며 소원을 빌면서도 정작 혜성은 불운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조선 시대에는 혜성이 흰 빛을 띠면 역모, 꼬리가 길면 재앙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했다 한다. 이거야말로 긍정과 부정의 아이러니 극치일세. 영화에서도 이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데, 혜성이 나타나면서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두 주인공이 하나로 연결되고, 나중에는 지구로 충돌하면서 마을 전체가 박살나지만, 두 주인공이 초능적인 힘을 발휘해 사람들을 구해내고야 마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생 같은 현생에서 만나며 감성 쩌는 코드로 후벼파는데, 이것이 바로 <초속 5센치미터, 2007>, <언어의 정원, 2013
도쿄 근대 건축 이야기 - 도쿄역과 마루노우치 광장 [내부링크]
철 지난 일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들여다보며 기약 없는 일본 여행 마음먹기를 반년, 그러다 5월 1일 노동절과 5일 어린이날 사이를 과감히 쉬기로 하고 도쿄로 날아 보았다. 이 시기 일본은 헌법기념일(5/3)과 녹색의 날(5/3)까지 끼여 그야말로 '골든 위크'라는데, 인해전술이 중국만 할까 하는 안일한 마음에 일단 go. 그렇게 봄이 가기 전 부랴부랴 일본 땅에 발을 디뎠다. 도쿄역 도쿄의 첫인상 나리타 공항 입국장으로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LCB(저렴한 버스)를 타고 도쿄역에 내리니 정확히 1시간이 흘러 있었다. 나란 인간은 수하물 찾기도 귀찮아서 가방 하나에 간소히 짐을 챙겼고, 비짓 재팬에 미리 등록해 놓은 QR 코드로 말 한마디 않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 버스에서는 한국어 안내까지 나오니 그냥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도시에 온 느낌이다. 버스에서 내린 곳은 도쿄역 중에서도 야에스(Yaesu) 방면 출구. 이대로는 방향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도쿄 근대 건축 이야기 - 니혼바시와 미쓰코시백화점(feat. 이상) [내부링크]
도쿄역을 중심으로 고쿄(황거), 행정부(정부청사), 입법부(국회의사당), 사법부(최고재판소)가 집결해 있는 치요다구(千代田区)는 일본 정치, 경제, 언론의 심장이자 15개국의 대사관과 마루노우치, 오테마치, 진보초 등 유명 번화가가 있는 도쿄의 원도심이다. 치요다구 외에도 주오구(야에스), 미나토구(롯폰기), 다이토구(아사쿠사), 스미다구(도쿄 스카이트리), 고토구(오다이바)를 도쿄도의 심장부에 있다 하여 '특별구'라 일컫는데, 그중에서도 치요다구는 바다로 연결되는 히비야 후미가 있어 에도 시대부터 관동지방의 수운 유통 중심지가 되어왔다. 니혼바시(日本橋) 전통과 현대의 공존 모래 삼각주였다가 17세기 에도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각 지방으로 가는 기점에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는데, 그중 도쿄의 상징과도 같은 다리가 바로 니혼바시(日本橋)다. 1830년대 니혼바시(출처: https://nihombashi-tokyo.com/kr/ ) 니혼바시강 위에 수
도쿄 산책 - 아사쿠사 [내부링크]
도쿄역을 중심으로 치요다구와 주오구를 가로지르는 칸다강, 니혼바시강, 스미다강... 그렇게 도쿄는 에도 시대 바다를 메꾸며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 까닭에 다른 나라의 수도와 달리 유독 물길이 발달해 있다. 그 물길을 따라 산책해 보는 것도 도쿄를 여행하는 좋은 방법. 도쿄역에서 칸다강 건너 아사쿠사 가는 길 이번 여행은 방향 감각을 잡기 쉽도록 도쿄역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 정확히는 도쿄역에서 니혼바시(일본교) 건너 닌교초(인형 마을) 가기 전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세계 최고 물가를 자랑하는 도쿄에서 혼여의 선택은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1인실 이코노미였는데, 도보로나 지하철 이동으로나 모든 면에서 매우 만족스런 여행이었다. 무엇보다 니혼바시에서 몇 걸음만 더하면 칸다강이 나오며 이런 멋진 풍경을 선사하니 아침 산책길이 더없이 즐겁지 아니한가. 참고로 여긴 구글 지도를 잘못 봐서 헤매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이 지점의 다리가 바로 <런치의 여왕>에서 준자브로가 나츠미에
도쿄 산책 - 우에노공원에서 도쿄대학까지 [내부링크]
우에노공원은 스킵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2번째로 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곳이어서인지 역이 완전 삐까뻔쩍하다. 고가로 이어진 다리에서 잠시 내려다본 활기찬 거리 풍경에 심쿵해서 도저히 안 내려갈 수가 없더란 말이지. 우에노역(上野駅) 붉은 도리이를 연상시키는 우에노역 광장. 일본에서 신주쿠역 다음으로 최다 이용객을 자랑하는 명실공히 일본 제2의 철도역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도쿄역만큼이나 다양한 출구가 표시되어 있으며, 바깥으로 연결되는 고가 다리는 우에노공원과 아메요코초 등 웬만한 핫스팟으로 바로 연결된다. 일본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라는 아메요코초(アメヤ横丁) 여기서 아키하바라역까지 고가도로 아래 상가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덕후들의 성지라더니 과연 곳곳에 캐릭터 샵이 즐비하며, 바닷가에 접해 있는 만큼 수산 시장도 빠질 수 없다. 오늘 저녁은 참치와 연어가 당기는구나. 아사쿠사가 관광지로서의 포스로 사람을 끈다면, 여긴 생생한 삶의 현장 그 자체로 사람을 끄는 곳. 역시 사람을
도쿄 산책 - 진보초 헌책방거리 [내부링크]
지금까지 이런 마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책방 하나하나에 저마다 색깔이 있다고 할까. 영화 <모리사키 서점의 하루하루>에 꽂혀서 여기까지 왔다. 대형서점과 도서관도 좋아하지만, 개개의 개성이 묻어나는 동네책방을 더 좋아하기에, 도쿄에 오면 꼭 진보초(神保町) 헌책방거리를 가 보리라 다짐했는데, 현실은 일본어 문맹ㅡㅡ; 그래도 분위기에 이끌려 열심히 돌아다녀 본다. 언뜻 보면 대로변에 헌책방이 줄지어 있는 상당히 심심한 곳인데, 사람들이 열심히 책을 보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다. 부산의 보수동 헌책골목만 해도 사진 찍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여긴 책에 진심인 사람들이 오는 느낌이라 차분해서 좋았다. 일본어를 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건물 벽면을 돌아 끝까지 서가가 형성되어 있는 참으로 이색적인 동네 그러다 슬램덩크를 발견하고 또 빵 터졌다. 이쯤 되니 10~11월에 열린다는 진보초 북 페스티벌이 사뭇 궁금해진다. 헌책 축제를 하면 말야, 진보쵸는 정말 책 같다고 느껴져. 펼치기
2023 늬우스 [내부링크]
2023.01 2023.01.16. 수능 9등급 교대 합격, 교권 추락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05734?ntype=RANKING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교권 하락과 교원수 감축 등이 맞물리면서 교육대학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교육개혁 일환으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추진을 예고해 교대 재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계는 교대의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임용문이 좁아졌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매년 학생 수 감소가 교원 수 감축으로 이어지자 초등교사의 직업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2023.01.25. 동북아 북극한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92770?sid=104 한국 기상청은 24일 동파 위험성을 알리는 한파특보를 발령했다. 서울은 영하 16도, 북한 접경지역인 철원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다. 북한의 국영방송은 이날
수창청춘맨숀 옆 대구예술발전소 [내부링크]
지난 겨울, 수창청춘맨숀에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대구예술발전소를 발견하고 간 김에 둘러보자며 들어갔는데, 같은 담배공사 건물을 리노베이션했음에도 전시물이 상대적으로 빈약해서 실망했던 적이 있다. 건물도 멋스러운 수창청춘맨숀에 비하면 딱딱한 학교 같고, 전시물은 그보다 더 헐빈해서 당황하던 찰나, 직원들까지 졸졸 따라다니며 설문지 작성을 강요해서 꽤 불편하게 돌아다녔던 기억.ㅡㅡ; 그랬던 대구예술발전소를 녹음이 짙은 이 여름에 다시 찾게 될 줄이야. 그런데 이번 전시는 시작부터 내 시선을, 마음을 제대로 후킹했다. 전시에 일가견 있다는 미술 전공자가 추천해서 간 거였는데 과연~~b 입구부터 한 포스 하는 녹색 바탕의 이 여인은 이채은 작가의 <로르샤흐 풍경>이다. 발랄한 차림새에 <오징어 게임> 속 이정재를 방불케 하는 빨강머리가 만화 같기도 하고 잡지 같기도 해서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팔 한쪽을 화면 분할로 떨어뜨려 놔서 그 메시지가 제법 심상찮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잊고 있었던 우크라이나를 생각한다 [내부링크]
출처: Ukraine War Map @war.mapper 2022.02.24.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군사작전 개시 2022.03.02. 유엔,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 2022.03.04. 러시아 국가부도 위기 2022.03.09. 우크라發 환율, 유가 폭등 2022.04.08.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2022.05.26.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러시아 시민권 발급 법안 서명 UN의 제제와 미국 지원으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느새 넉 달째를 훌쩍 넘기고 있다. 지금이 전후 20세기라면 또 모를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두 차례나 지나갔고, 한때 냉전이란 이름으로 세계를 두 동강 냈던 자유민주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도 와해됐으며, 심지어 IT를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에서 폭발적인 데이터량과 인공지능 개발이 박차를 가하며 4차 산업혁명이 한창인 21세기에 전쟁이라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하지만 생각해
론리플래닛 인스타 보다가 울컥해서 올려봄 [내부링크]
당신의 인생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티스토리 커뮤니티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