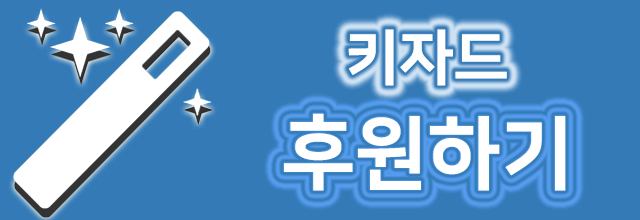노인요양보호사가 돌봄 상대와 함께 운동을 하고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그의 남편은 투석하러 매주 서너 번씩 병원에 간다. 당뇨가 있으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척수염이 있어 수술했다. "제가 허리도 지키고, 다리 근육도 더 키워야 합니다." 72세, 10년차 요양보호사. 서울 서대문구의 비교적 규모가 큰 재가장기요양센터에 적을 두고 있는 그는 우수요양보호사 표창도 받았다. 현재 79세인 남편이 10년 전 쓰러졌을 때,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동시에 방문요양 일을 시작했다. 현재 베테랑급으로 돌봄노동을 하는 60~70대 요양보호사들의 전형적 진입 동기다. "남편이 배움이 적어서 평생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애들도 형편이 좋지 않아요, 뭐 사이도 좀 그렇고… 해준 게 별로 없으니…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남편 처지가 참 딱해지는 거죠…" 고단한 생의 끝자락에 있는 남편의 '존엄'이 훼손될까, 말과 태도를 고른다. 3시간짜리 방문요양 두 군데, 집안 일과 남편 수발, 투석받으러 가는 남...
원문링크 : 폐 좀 끼치는 게 당연한 사회


!["실손보험금 못 받았다" 손보사-소비자 분쟁 급증[뉴스토마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TRfOTMg/MDAxNjc4NzU5MTA4ODk2.lmNY9-_y_iIxUAwTb_IWV-Qifw6qwcfRTKNqmGQzlwwg.H4S0-8Nuf3l5jMCBt2ICHA2GZd-hRoILAmu4GDbFlxYg.JPEG.impear/%BD%C7%BC%D5%BA%B8%C7%E8%B1%DD.jpg?type=w2)
![[카드뉴스]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zMDNfMTky/MDAxNjE0NzMzMzg4MTY3.BeElkEjjcrRpt3_ARK-ymO-BeVuv4JDYRZJOjvs5RCUg.RJAO9iJXfPywLnmP5o7cDi3v3DlI_3iWgwAk2nX4U1Ig.PNG.impear/%B0%E6%BB%F3%C8%AF%C0%DA.png?type=w2)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④보험설계사 낀 사기엔 보험사들 속절없이 당할 뿐](http://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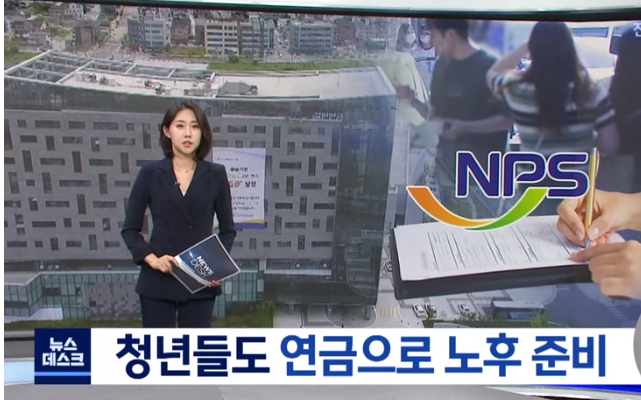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티스토리 커뮤니티
커뮤니티